목차
♧ 원문 및 해석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품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
1) 정서(鄭敘,?~?)와 그 시대상황
2) 명칭과 진작(眞勺)의 어원
3) 지은 동기(연군대상)와 시기
2. 어 석
3. 작품분석
1) 화자 ‘나’,갈등극복의 문학적 장치
2) 향가 형식의 계승과 그 의미
3) 진작양식
4) 한역된 「정과정」
5) 다른 속가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
Ⅲ. 결 론
♧ 원 전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품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
1) 정서(鄭敘,?~?)와 그 시대상황
2) 명칭과 진작(眞勺)의 어원
3) 지은 동기(연군대상)와 시기
2. 어 석
3. 작품분석
1) 화자 ‘나’,갈등극복의 문학적 장치
2) 향가 형식의 계승과 그 의미
3) 진작양식
4) 한역된 「정과정」
5) 다른 속가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
Ⅲ. 결 론
♧ 원 전
본문내용
찬으로 의종5년~24년(1151~1170)에 이루어 진 작품임.(『麗謠箋
注』,pp.22.)
장덕순 : 의종 5년(1151) 4월부터 의종 24년(1170) 10월, 소환될 때까지 配所에서 지은 것.(『國
文學通論』,pp.114.)
② 조윤제 : 「삼진작」 「정과정」곡은 익재 해시를 통해 저절로 이명동의임을 의심할 수 없다. 즉
「삼진작」은 과정 정서가 배소인 동래에서 소환의 명을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므로 스스
로 탄식하여 무금하여 부른 노래라 하겠다. 조윤제,『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동래시대, 의종 5년~11년까지.
서수생 : 의종 5년 5월부터 의종 11년 거제현 배소에 옮기기 전 곧 동래 배소에서 지은 작품이라
여긴다. 서수생,『한국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0.
최 철 : 정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때 정서가 동래에 유배된 때를 당하여 지었으며, 지은 연대
는 과정이 축조된 연대 이후 봄에서부터 거제 유배 전인 의종 10년 사이로 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군대상은 의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최 철,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③ 양염규는 『한국문학십강』에서 주석도 없이 거제시대로 잡았다.
④ 이가원 : 「정과정곡」은 반드시 의종에게 복직을 뜻하고, 애원을 하소연한 동래시대의 작품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의종이 정중부에게 피축되었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기의 곧은 절개를
변하지 않겠다는 맹세에서 이루어진 거제시대의 작품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정과정곡」은 의종 24년 9월에서 10월까지의 대략 1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작품
으로 인정하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가원,「정과정곡의 연구」,『성균』제4집, 성균관대, 1952.
또 한편으로 연모대상을 의종 다음에 位를 계승한 명종으로 보고 창작시기를 의종 24년 9~10월 사이로 정한 견해가 있다. 처음 김동욱은 의종 24년 10월에 소환되고 그 후 조정에 현요한 자리를 차지한 정서의 행상으로 본다면 이는 명종 연간의 작이 되어 악지의 사실과 모순이 되나, 이는 앞으로 더 고증을 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쾌덕은 「정과정곡 소고」,『국어국문학』20, 부산대, 1983에서 이를 구체화시켰다.
이 견해의 근거를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의종과 정서와의 관계는 실직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그러므로 이 「정과정」도 의종이 왕
위에 있을 때 정서가 의종을 대상으로 하여 불렀다기보다는,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왕위에 오
른 뒤 명종을 ‘님’으로 하여 의종 24년 9~10월 사이에 창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의종이 보현원의 난으로 정중부 등 무신의 무리에 의해 왕좌에서 축출되어 거제로 폐출되었을 때
는 정서가 동래 배소에서 거제 배소로 옮겨진 지 무려 13년이 되는 해였다. 그렇잖아도 의종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쌓여있었을 터인데, 전왕인 의종이 거제로 방축되어 왔을 때 자신에 대한 비
감과 울분, 의종에 대한 좋지못한 갖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같은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동병상련의 동류의식을 서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레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③ 정서가 의종 재위시에 의종을‘님’으로 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는 명종이 즉위한 후 곧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다.
2. 어 석
우리는 여기에서 「정과정」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보이는 부분의 어석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아니시면 거츠르신
양주동 : 非며 妄僞인 줄을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5, pp.22.
김형규 : 참소자들의 말이 非요 妄僞한 줄을 김형규, 『고가주석』, 백영사, 1955, pp.144.
권영철 : (서울에)안 있으며, (여기)동래에 (와서)있다 하더라도 권영철, 「정과정가 신연구」,『효성여대논문집』, 효성여자대학, 1968, pp.32.
서재극:‘아니시며 거츠르신 ’을 반드시 일방의 사람 또는 무지를 분명히 지적하는 첩어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어도 죄(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가능성에서 보
아 적편과 왕과 작자, 세편이 있다 하겠으나 구태여 존칭의 어간‘시’나 또는 작자
를 주체화하는 것 따위에 구애될 필요없이“(내가 또는 그 누가)그리고 허황한 줄”
로 보아야 옳은 것이다. 서재극, 「정과정곡의 신석기도」, 『어문학』6호, 문호사, 1960, pp.90
박병채 : (그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거짓인 줄을.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선명출판사, 1968, pp.179~180.
정재호 :‘아니시며’의 객체는 시의 화자 자신이고, 주체는 님이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한다. 곧“님이 나를 아니(非)라 하시며 거짓이라 하신 ”이라 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종이 정서를 잘못(非)되었으며 모든 것이 거짓되었다
고 생각하여 정서를 귀양보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附葉에서는
님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이며, 화자가 님의 생각과 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잔월효성’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리하여 님의 오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명
하고 있다. 정재호,「「정과정」에 대하여」,『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pp.I-178~194.
김쾌덕 : (의종께서 하신)머지 않아 불러주겠다는 말씀이 (그저 위로에 그치는)허황된 말인 줄. 김쾌덕, 「정과정곡 소고」,『국어국문학』20, 부산대, 1983, pp.8~10.
② 벼기더시니 최철박재민,『석주 고려가요』, 이회, 2003, pp.326.
어간‘벼기(盟誓)-’에 과거시상의‘더’,주체존대선어말어미‘시’,관형형의‘ㄴ’,사람을 의미하는‘이’가 결합한 것이다.
양주동 : ‘우기다(固執,抗言)’의 뜻으로 풀이.
박병채 : 『월인석보』에서 용례를 찾아 ‘어기다’로 수정 이해.
그러나 박병채의 용례는 전후문맥을 고려해 볼 때,‘어기다’의 의미가 아니라 ‘맹세하다다짐하다’의 의미이다. 양주동의 추측이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다.
어미 마조 가 손 자바 니르아 “盟誓 벼기니다 내 말옷 거츨린댄닐웨
注』,pp.22.)
장덕순 : 의종 5년(1151) 4월부터 의종 24년(1170) 10월, 소환될 때까지 配所에서 지은 것.(『國
文學通論』,pp.114.)
② 조윤제 : 「삼진작」 「정과정」곡은 익재 해시를 통해 저절로 이명동의임을 의심할 수 없다. 즉
「삼진작」은 과정 정서가 배소인 동래에서 소환의 명을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므로 스스
로 탄식하여 무금하여 부른 노래라 하겠다. 조윤제,『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동래시대, 의종 5년~11년까지.
서수생 : 의종 5년 5월부터 의종 11년 거제현 배소에 옮기기 전 곧 동래 배소에서 지은 작품이라
여긴다. 서수생,『한국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0.
최 철 : 정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때 정서가 동래에 유배된 때를 당하여 지었으며, 지은 연대
는 과정이 축조된 연대 이후 봄에서부터 거제 유배 전인 의종 10년 사이로 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군대상은 의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최 철,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③ 양염규는 『한국문학십강』에서 주석도 없이 거제시대로 잡았다.
④ 이가원 : 「정과정곡」은 반드시 의종에게 복직을 뜻하고, 애원을 하소연한 동래시대의 작품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의종이 정중부에게 피축되었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기의 곧은 절개를
변하지 않겠다는 맹세에서 이루어진 거제시대의 작품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정과정곡」은 의종 24년 9월에서 10월까지의 대략 1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작품
으로 인정하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가원,「정과정곡의 연구」,『성균』제4집, 성균관대, 1952.
또 한편으로 연모대상을 의종 다음에 位를 계승한 명종으로 보고 창작시기를 의종 24년 9~10월 사이로 정한 견해가 있다. 처음 김동욱은 의종 24년 10월에 소환되고 그 후 조정에 현요한 자리를 차지한 정서의 행상으로 본다면 이는 명종 연간의 작이 되어 악지의 사실과 모순이 되나, 이는 앞으로 더 고증을 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쾌덕은 「정과정곡 소고」,『국어국문학』20, 부산대, 1983에서 이를 구체화시켰다.
이 견해의 근거를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의종과 정서와의 관계는 실직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그러므로 이 「정과정」도 의종이 왕
위에 있을 때 정서가 의종을 대상으로 하여 불렀다기보다는,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왕위에 오
른 뒤 명종을 ‘님’으로 하여 의종 24년 9~10월 사이에 창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의종이 보현원의 난으로 정중부 등 무신의 무리에 의해 왕좌에서 축출되어 거제로 폐출되었을 때
는 정서가 동래 배소에서 거제 배소로 옮겨진 지 무려 13년이 되는 해였다. 그렇잖아도 의종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쌓여있었을 터인데, 전왕인 의종이 거제로 방축되어 왔을 때 자신에 대한 비
감과 울분, 의종에 대한 좋지못한 갖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같은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동병상련의 동류의식을 서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레 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③ 정서가 의종 재위시에 의종을‘님’으로 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는 명종이 즉위한 후 곧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다.
2. 어 석
우리는 여기에서 「정과정」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보이는 부분의 어석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아니시면 거츠르신
양주동 : 非며 妄僞인 줄을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5, pp.22.
김형규 : 참소자들의 말이 非요 妄僞한 줄을 김형규, 『고가주석』, 백영사, 1955, pp.144.
권영철 : (서울에)안 있으며, (여기)동래에 (와서)있다 하더라도 권영철, 「정과정가 신연구」,『효성여대논문집』, 효성여자대학, 1968, pp.32.
서재극:‘아니시며 거츠르신 ’을 반드시 일방의 사람 또는 무지를 분명히 지적하는 첩어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어도 죄(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가능성에서 보
아 적편과 왕과 작자, 세편이 있다 하겠으나 구태여 존칭의 어간‘시’나 또는 작자
를 주체화하는 것 따위에 구애될 필요없이“(내가 또는 그 누가)그리고 허황한 줄”
로 보아야 옳은 것이다. 서재극, 「정과정곡의 신석기도」, 『어문학』6호, 문호사, 1960, pp.90
박병채 : (그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거짓인 줄을.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선명출판사, 1968, pp.179~180.
정재호 :‘아니시며’의 객체는 시의 화자 자신이고, 주체는 님이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한다. 곧“님이 나를 아니(非)라 하시며 거짓이라 하신 ”이라 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종이 정서를 잘못(非)되었으며 모든 것이 거짓되었다
고 생각하여 정서를 귀양보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附葉에서는
님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이며, 화자가 님의 생각과 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잔월효성’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리하여 님의 오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명
하고 있다. 정재호,「「정과정」에 대하여」,『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pp.I-178~194.
김쾌덕 : (의종께서 하신)머지 않아 불러주겠다는 말씀이 (그저 위로에 그치는)허황된 말인 줄. 김쾌덕, 「정과정곡 소고」,『국어국문학』20, 부산대, 1983, pp.8~10.
② 벼기더시니 최철박재민,『석주 고려가요』, 이회, 2003, pp.326.
어간‘벼기(盟誓)-’에 과거시상의‘더’,주체존대선어말어미‘시’,관형형의‘ㄴ’,사람을 의미하는‘이’가 결합한 것이다.
양주동 : ‘우기다(固執,抗言)’의 뜻으로 풀이.
박병채 : 『월인석보』에서 용례를 찾아 ‘어기다’로 수정 이해.
그러나 박병채의 용례는 전후문맥을 고려해 볼 때,‘어기다’의 의미가 아니라 ‘맹세하다다짐하다’의 의미이다. 양주동의 추측이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다.
어미 마조 가 손 자바 니르아 “盟誓 벼기니다 내 말옷 거츨린댄닐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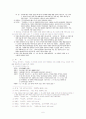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