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운의 비교
☺ 중세국어의 음운
☺근대국어의 음운
2. 자료의 비교
☺중세국어 자료
☺ 근대국어자료
3. 어휘의 비교
☺ 중세국어 어휘
☺ 근대국어 어휘
4. 표기법의 비교
☺ 중세국어 표기법
☺ 근세국어 표기법
☺ 중세국어의 음운
☺근대국어의 음운
2. 자료의 비교
☺중세국어 자료
☺ 근대국어자료
3. 어휘의 비교
☺ 중세국어 어휘
☺ 근대국어 어휘
4. 표기법의 비교
☺ 중세국어 표기법
☺ 근세국어 표기법
본문내용
의 침투가 매우 심각하게 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에 대체되지 않고 폐어가 된 예들도 적지 않았다.
2. 차용어
1592년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우리 민족은 각각 두 차례씩 왜란과 호란을 경험하게 된다. 국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이 기간은 국어와 주변의 다른 언어가 접촉하는 기간이 된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다른 언어와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국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접촉을 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 만큼 양대 난을 겪으면서 국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많건 적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언어 접촉의 결과는 음운, 문법보다는 어휘에 쉽게 반영된다.
1) 한자어
중세 국어 시기에도 한자어의 수는 상당히 많았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근대 국어 어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한자어의 사용은 한문 중심으로 문자 생활을 한 데 원인이 있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와서도 사대부 계층에서 한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문이 문자 생활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중세 국어의 한자어와 근대 국어 한자어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2) 중국어
근대어의 시기에도 중국어가 차용어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당지, 다홍, 자디, 망긴, 던링, 간계, 슈판, 비단, 토슈, 탕건, 무명, 보리 등의 단어들이 그 예이다. 물론 이들의 차용연대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는 아마도 중세에 차용된 것도 있을수도 있다. 정양욕은 중국어 차용어의 흥미있는 일면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보리’를 예로 들면 중국의 보리의 차용임에도 불구하고 ‘보리’라는 발음에 맞는 한자를 찾아 우리나라에서는 ‘菩里’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용은 근대에 상당히 유행했던 듯하며 오늘날도 그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있음을 본다.
4. 표기법의 비교
중세국어 표기법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 15세기 국어의 분철 표기
일반적으로 한자어를 제외하면 15세기 정음으로 표기된 초기 자료는 대체로 연철로 표기되어 있지만, 특이한 환경에서 분철되는 예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그 예가 자주 나타난다. 15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분철 표기 환경과 그 예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한자어 아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
中國+에 -> 듕귁에,
ㄴ. 자음탈락이 있은 위치
: ‘ㄱ’ 탈락한 자리 : 를와, ㅁ어늘, 몰애
: ‘ ’ >변천한 경우 : 글+발-> 글발> 글왈, + 바 > 와
ㄷ. /르 불규칙 용언의 활용시 : 다 + 아 -> 달아
ㅁ. 어간 말음이 ‘ㄹ’이며, 이어 피/사동접사(‘이,오/우’형)가 연결될 경우
: 어울+ 우 + 어 -> 어울워
ㅂ. 어간 말 자음이 불청불탁음이고 후행음이 모음일 경우
: , 긔별
이들 15세기 국어의 분철 표기형과 현대 국어의 분철 표기형이 그 형태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 모두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현대 국어의 분철 표기형이 형태론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면, 15세기 국어의 분철 표기형은 음운론적 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예 중에서 일부의 예들은 음운론적 표기로 이해하기 곤란한 자료도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종성표기법(終聲表記法)
일반적으로 종래의 일부 논의에서는 훈민정음의 종성 표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는 『훈민정음』에 등장하는 규정의 상이성과 문헌에 따라 표기법상으로 약간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성 표기법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종성표기법의 역사적 변천*
종성복용초성 ⇒ 팔종성가족용⇒칠종성법 ⇒종성복용초성
그러나 15세기 종성 표기법을 단순히 위의 표와 같이 도식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종성표기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에 제시된 규정과 15세기 문헌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먼저 『훈민정음』에 등장하는 종성표기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訓民正音』에 등장하는 종성표기법의 규정
ㄱ. 終聲復用初聲…(例義篇)
ㄴ. 終聲之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解例篇 制字解)
ㄷ.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不類入聲之促急
不淸不濁之字 其聲不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 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 如爲梨花 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解例篇 終聲解)
ㄹ. 終聲 ㄱ如닥爲楮 독爲甕 ㆁ 如굼벙爲 ㄷ如갇爲笠 ……
ㄹ如달爲月별爲星之류… (解例篇 用字例)
일반적으로 초창기 국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의 예의편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예의편의 규정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을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종성표기법 상의 규정이라기보다 문자 제자상의 규정으로 이해함이 합당하다. 『훈민정음』의 성격상 예의편은 새 문자 즉,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예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종성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규정은 역시 해례편 종성해의 규정이다. 다만, 종성해에서 \'ㅿ\'과 \'ㅅ\'은 발음상으로 차이가 남을 암시하고서도 8종성체계에서 \'ㅿ\'을 빼버렸음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였다
『훈민정음』의 규정대로 15세기 종성표기법을 팔종성법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 창제자는 종성 표기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즉,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표기상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八終聲法)과 모든 형태소들을 그 기본형에 의해 대표시키는 방법(終聲復用初聲法)을 인지했으며, 새로운 문자의 창제였으므로 보다 쉬운 방법인 전자를 선택하여 실용성을 도모했던 것이다.
둘째, 팔종성법의 선택은 당시의 음운 현상에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인 음운론적 처리의 결과였다. 오늘날의 음운 현상에 비추어 볼 때, \'ㄷ·ㅅ\'의 구별 등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당시의 표기례의 검토와 다른 자료를 볼 때 팔종성법은 합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일반적인 종성표기법을 \'팔종성법\'으로 가정했을
2. 차용어
1592년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우리 민족은 각각 두 차례씩 왜란과 호란을 경험하게 된다. 국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이 기간은 국어와 주변의 다른 언어가 접촉하는 기간이 된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다른 언어와 접촉이 있기는 했지만 국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접촉을 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 만큼 양대 난을 겪으면서 국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많건 적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언어 접촉의 결과는 음운, 문법보다는 어휘에 쉽게 반영된다.
1) 한자어
중세 국어 시기에도 한자어의 수는 상당히 많았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근대 국어 어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한자어의 사용은 한문 중심으로 문자 생활을 한 데 원인이 있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와서도 사대부 계층에서 한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문이 문자 생활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중세 국어의 한자어와 근대 국어 한자어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2) 중국어
근대어의 시기에도 중국어가 차용어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당지, 다홍, 자디, 망긴, 던링, 간계, 슈판, 비단, 토슈, 탕건, 무명, 보리 등의 단어들이 그 예이다. 물론 이들의 차용연대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는 아마도 중세에 차용된 것도 있을수도 있다. 정양욕은 중국어 차용어의 흥미있는 일면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보리’를 예로 들면 중국의 보리의 차용임에도 불구하고 ‘보리’라는 발음에 맞는 한자를 찾아 우리나라에서는 ‘菩里’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용은 근대에 상당히 유행했던 듯하며 오늘날도 그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있음을 본다.
4. 표기법의 비교
중세국어 표기법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 15세기 국어의 분철 표기
일반적으로 한자어를 제외하면 15세기 정음으로 표기된 초기 자료는 대체로 연철로 표기되어 있지만, 특이한 환경에서 분철되는 예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그 예가 자주 나타난다. 15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분철 표기 환경과 그 예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한자어 아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
中國+에 -> 듕귁에,
ㄴ. 자음탈락이 있은 위치
: ‘ㄱ’ 탈락한 자리 : 를와, ㅁ어늘, 몰애
: ‘ ’ >변천한 경우 : 글+발-> 글발> 글왈, + 바 > 와
ㄷ. /르 불규칙 용언의 활용시 : 다 + 아 -> 달아
ㅁ. 어간 말음이 ‘ㄹ’이며, 이어 피/사동접사(‘이,오/우’형)가 연결될 경우
: 어울+ 우 + 어 -> 어울워
ㅂ. 어간 말 자음이 불청불탁음이고 후행음이 모음일 경우
: , 긔별
이들 15세기 국어의 분철 표기형과 현대 국어의 분철 표기형이 그 형태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 모두를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현대 국어의 분철 표기형이 형태론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면, 15세기 국어의 분철 표기형은 음운론적 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예 중에서 일부의 예들은 음운론적 표기로 이해하기 곤란한 자료도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종성표기법(終聲表記法)
일반적으로 종래의 일부 논의에서는 훈민정음의 종성 표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는 『훈민정음』에 등장하는 규정의 상이성과 문헌에 따라 표기법상으로 약간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성 표기법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종성표기법의 역사적 변천*
종성복용초성 ⇒ 팔종성가족용⇒칠종성법 ⇒종성복용초성
그러나 15세기 종성 표기법을 단순히 위의 표와 같이 도식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종성표기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에 제시된 규정과 15세기 문헌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먼저 『훈민정음』에 등장하는 종성표기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訓民正音』에 등장하는 종성표기법의 규정
ㄱ. 終聲復用初聲…(例義篇)
ㄴ. 終聲之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解例篇 制字解)
ㄷ.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不類入聲之促急
不淸不濁之字 其聲不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 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 如爲梨花 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解例篇 終聲解)
ㄹ. 終聲 ㄱ如닥爲楮 독爲甕 ㆁ 如굼벙爲 ㄷ如갇爲笠 ……
ㄹ如달爲月별爲星之류… (解例篇 用字例)
일반적으로 초창기 국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의 예의편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예의편의 규정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을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종성표기법 상의 규정이라기보다 문자 제자상의 규정으로 이해함이 합당하다. 『훈민정음』의 성격상 예의편은 새 문자 즉,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예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종성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규정은 역시 해례편 종성해의 규정이다. 다만, 종성해에서 \'ㅿ\'과 \'ㅅ\'은 발음상으로 차이가 남을 암시하고서도 8종성체계에서 \'ㅿ\'을 빼버렸음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였다
『훈민정음』의 규정대로 15세기 종성표기법을 팔종성법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 창제자는 종성 표기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즉,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표기상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八終聲法)과 모든 형태소들을 그 기본형에 의해 대표시키는 방법(終聲復用初聲法)을 인지했으며, 새로운 문자의 창제였으므로 보다 쉬운 방법인 전자를 선택하여 실용성을 도모했던 것이다.
둘째, 팔종성법의 선택은 당시의 음운 현상에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인 음운론적 처리의 결과였다. 오늘날의 음운 현상에 비추어 볼 때, \'ㄷ·ㅅ\'의 구별 등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당시의 표기례의 검토와 다른 자료를 볼 때 팔종성법은 합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일반적인 종성표기법을 \'팔종성법\'으로 가정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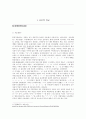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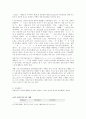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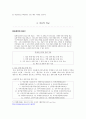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