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우리민족과 글자
► 한자
► 한자 차용 표기법이란?
►이두(吏讀)
►향찰(鄕札) (신라~고려초)
► 구결
► 한자
► 한자 차용 표기법이란?
►이두(吏讀)
►향찰(鄕札) (신라~고려초)
► 구결
본문내용
이 오히려 부적합하게도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 장적 등에도 이러한 표기법이 나타나는 것은 일찍이 이두가 바로 이서들의 것이었으리라는 추측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어의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다 이른 시기의 서기체(胥記體) 표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문법형태소들을 보충하여 그 문맥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법형태를 보충하여 문맥을 보다 정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구결과 공통점을 보이지만, 구결은 중국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두와 차이가 있다. 이두는 신라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추측된다. 대체로 의미부는 한자의 새김[釋]을 취하고 형태부는 한자의 음을 취하여 특히 곡용이나 활용에 나타는 격이나 어미를 표기하다가(이두를 이러한 요소들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음), 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하게 되는 향찰에 와서 그 난숙기에 다다른다. 〈서동요〉·〈혜성가〉가 진평왕대(579~631)의 작품이므로 7세기경에는 그 표기법이 고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소송문·고시문·보고서 등의 관용문서에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었다. 이두의 설총제작설은 〈서동요〉·〈혜성가〉의 제작연대 및 경주 남산 신성비(591)의 예와 설총이 신문왕대(681~691)에 활약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예)必于 七出乙 犯爲去乃 三不出有去乙
비록 칠출을 범하거나 삼불출잇거늘
(1) 이두의 성립
남산 신성비와 갈항사 조탑기를 통해 볼 때 7세기 경에 이두가 성립.
제왕운가, 대명률직해 에서는 설총이 이두를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삼국사기(권 46)에 설총이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방언으로 구경을 읽고 후생을 지도하고 가르쳐 오늘에 이르러 학자들이 이를 으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했고 이두보다는 구결을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2) 초기이두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국어의 문장구조에 따라 서기식으로 배열하고 여기에 빠진 조사와 어미는 이두로 표기하였다. 이두는 吏道, 吏吐, 吏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경주남산 신성비(591)>
辛亥年二月二十六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
신해년 22일 남산신성에 법대로 지은후 3년 안에 붕괴하면 죄주실 일로 삼아 듣게 하시고 이것을 맹세하게 하니라.
->어순은 국어와 같고, 節, 以(으로), 敎, 爲(
(예)必于 七出乙 犯爲去乃 三不出有去乙
비록 칠출을 범하거나 삼불출잇거늘
(1) 이두의 성립
남산 신성비와 갈항사 조탑기를 통해 볼 때 7세기 경에 이두가 성립.
제왕운가, 대명률직해 에서는 설총이 이두를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삼국사기(권 46)에 설총이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방언으로 구경을 읽고 후생을 지도하고 가르쳐 오늘에 이르러 학자들이 이를 으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했고 이두보다는 구결을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2) 초기이두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국어의 문장구조에 따라 서기식으로 배열하고 여기에 빠진 조사와 어미는 이두로 표기하였다. 이두는 吏道, 吏吐, 吏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경주남산 신성비(591)>
辛亥年二月二十六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
신해년 22일 남산신성에 법대로 지은후 3년 안에 붕괴하면 죄주실 일로 삼아 듣게 하시고 이것을 맹세하게 하니라.
->어순은 국어와 같고, 節, 以(으로), 敎, 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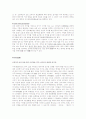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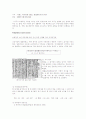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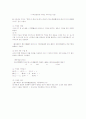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