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자 차용 표기법의 등장
2. 표기법의 원리
(1) 音讀 表記(음독 표기)
(2) 釋讀 表記(석독 표기)
3. 한자차용 표기법의 종류
(1) 고유명사 표기
1) 사람 이름
2) 땅 이름
(2) 吏讀(이두)
1) 이두의 정의
2) 이두의 성립
3) 이두의 자료
4) 이두의 구체적 모습(大明律直解, 대명률직해)
5) 이두의 사용
6) 이두의 혼란과 한계
(3) 구결(口訣)
1) 구결의 정의
2) 구결의 성립
3) 구결과 이두의 다른 점
4) 구결의 구체적 자료
5) 구결의 내용
(4) 향찰(鄕札)
1) 향찰의 구체적 자료
2) 향찰의 소멸
4. 한자 차용 표기법의 한계: 한자 빌어쓰기에 실패한 이유
(1) 쓰인 범위의 좁아짐
(2) 서로 다른 길을 밟은 이유
2. 표기법의 원리
(1) 音讀 表記(음독 표기)
(2) 釋讀 表記(석독 표기)
3. 한자차용 표기법의 종류
(1) 고유명사 표기
1) 사람 이름
2) 땅 이름
(2) 吏讀(이두)
1) 이두의 정의
2) 이두의 성립
3) 이두의 자료
4) 이두의 구체적 모습(大明律直解, 대명률직해)
5) 이두의 사용
6) 이두의 혼란과 한계
(3) 구결(口訣)
1) 구결의 정의
2) 구결의 성립
3) 구결과 이두의 다른 점
4) 구결의 구체적 자료
5) 구결의 내용
(4) 향찰(鄕札)
1) 향찰의 구체적 자료
2) 향찰의 소멸
4. 한자 차용 표기법의 한계: 한자 빌어쓰기에 실패한 이유
(1) 쓰인 범위의 좁아짐
(2) 서로 다른 길을 밟은 이유
본문내용
(금석문)이 보이니, 설총이 처음 만들었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이두글은 한 때 한 사람이 창작함과 같은 조직이 정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한자를 빌어 적어오는 동안 차차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두의 자료
① 壬申誓記石(임신서기석)
② 慶州(경주)의 南山 新城碑(남산 신성비, 591)
4) 이두의 구체적 모습(大明律直解, 대명률직해)
명률
凡僧道聚妾者
대명률직해
凡僧人等赤 聚妻妾爲在乙良
(赤=이, 爲在乙良=하겨늘랑)
의미
무릇 중이 (처첩을) 장가들거든
5) 이두의 사용
이두는 신라로부터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19세기 말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두의 역사가 이토록 오랜 이유는 첫째로 고려와 조선에서 이두는 주로 공사문서에 사용되어 吏胥들 사이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었고, 둘째로 우리나라 문자 생활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한문의 후광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 이두는 한문의 번역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와 養蠶經驗撮要(양잠경험촬요, 1415)가 그 대표적인 예다. 오늘날 전하는 이두 자료는 신라 이래의 고대적 요소와 후대의 새로운 요소가 뒤섞여 있으니, 이두 연구는 이것을 가리는 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6) 이두의 혼란과 한계
이두는 오랫동안 별반 정리되고 통일된 일이 없이, 관청과 민간에서 임시응변적인 수단으로 쓰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 같은 이두를 읽는 데 있어서도 그 법이 한 가지로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령 ‘爲行如’는 ‘엿다’로 읽기도 하고, ‘얏다’로 읽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정한 기관에서 정리하는 통일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또 말 자체는 변하는데 적는 법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두가 문자 체계로서 한계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혼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한문과 한자의 지식 없이는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즉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문으로써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문을 어느 정도는 아는 얼치기 지식인들은 이두글이라도 써서 글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 틈에 끼지 못한 대다수의 민중들은 완전히 글자 생활과는 담을 싼 원시상태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3) 구결(口訣)
1) 구결의 정의
구결이란 ‘입
3) 이두의 자료
① 壬申誓記石(임신서기석)
② 慶州(경주)의 南山 新城碑(남산 신성비, 591)
4) 이두의 구체적 모습(大明律直解, 대명률직해)
명률
凡僧道聚妾者
대명률직해
凡僧人等赤 聚妻妾爲在乙良
(赤=이, 爲在乙良=하겨늘랑)
의미
무릇 중이 (처첩을) 장가들거든
5) 이두의 사용
이두는 신라로부터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19세기 말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두의 역사가 이토록 오랜 이유는 첫째로 고려와 조선에서 이두는 주로 공사문서에 사용되어 吏胥들 사이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었고, 둘째로 우리나라 문자 생활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한문의 후광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 이두는 한문의 번역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와 養蠶經驗撮要(양잠경험촬요, 1415)가 그 대표적인 예다. 오늘날 전하는 이두 자료는 신라 이래의 고대적 요소와 후대의 새로운 요소가 뒤섞여 있으니, 이두 연구는 이것을 가리는 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6) 이두의 혼란과 한계
이두는 오랫동안 별반 정리되고 통일된 일이 없이, 관청과 민간에서 임시응변적인 수단으로 쓰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 같은 이두를 읽는 데 있어서도 그 법이 한 가지로만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령 ‘爲行如’는 ‘엿다’로 읽기도 하고, ‘얏다’로 읽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정한 기관에서 정리하는 통일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또 말 자체는 변하는데 적는 법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두가 문자 체계로서 한계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혼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한문과 한자의 지식 없이는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즉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문으로써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문을 어느 정도는 아는 얼치기 지식인들은 이두글이라도 써서 글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 틈에 끼지 못한 대다수의 민중들은 완전히 글자 생활과는 담을 싼 원시상태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3) 구결(口訣)
1) 구결의 정의
구결이란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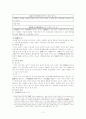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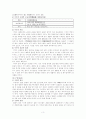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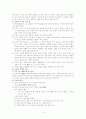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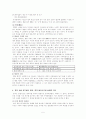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