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서민가사 개관
Ⅱ. 본론
1. 주제별 분류와 대표작품 분석
1.1. 현실적 모순의 폭로와 비판 - <갑민가>, <거창가> 등
1,2. 기존 관념에의 도전과 인간 본성의 추구 - <과부가>, <노처녀가> 등
1.3. 연정 및 신세한탄
1.3.1. 연정
① 관능적인 사랑 - <양산화답가>, <이별곡> 등
② 상사(相思)의 정 - <규슈상사곡>, <단장사> 등
1.3.2. 신세한탄 - <청상가>, <원한가>, <노인가> 등
1.4. 인생무상과 취락(醉樂) - <회심곡>, <새타령> 등
1,5. 소박한 꿈과 소망
1.5.1. 서민의 소박한 꿈 - <농부가>, <치산가>
1.5.2. 서민의 소망 - 영웅의 희구 - <적벽가>, <초한가>
2. 서민가사의 특징
1) 현실인식의 이원성
2) 비판 정신과 그 한계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주제별 분류와 대표작품 분석
1.1. 현실적 모순의 폭로와 비판 - <갑민가>, <거창가> 등
1,2. 기존 관념에의 도전과 인간 본성의 추구 - <과부가>, <노처녀가> 등
1.3. 연정 및 신세한탄
1.3.1. 연정
① 관능적인 사랑 - <양산화답가>, <이별곡> 등
② 상사(相思)의 정 - <규슈상사곡>, <단장사> 등
1.3.2. 신세한탄 - <청상가>, <원한가>, <노인가> 등
1.4. 인생무상과 취락(醉樂) - <회심곡>, <새타령> 등
1,5. 소박한 꿈과 소망
1.5.1. 서민의 소박한 꿈 - <농부가>, <치산가>
1.5.2. 서민의 소망 - 영웅의 희구 - <적벽가>, <초한가>
2. 서민가사의 특징
1) 현실인식의 이원성
2) 비판 정신과 그 한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현실적 모순의 폭로와 비판
조선조는 철저한 신분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주로 수탈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에, 특히 양반관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서민을 이용하고 착취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하였다. 이중에서도 서민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혹한 징세였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인 <갑민가>와 <거창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갑민가>
저기가는 저사람아 네행색 보아하니
군사도망 네로구나
요상으로 볼작시면 배적삼이 깃만남고
허리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가고 전태발이 뒤에간다
<갑민가:현문 143>
갑민가는 조선 정조 때 함경도 갑산 사람이 불렀다는 가사이다. 성대중(成大中)이 북청부사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이웃에 자자했는데 그때 이웃 갑산의 한 백성이 학정(虐政)을 견디지 못해 북청으로 도망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위의 부분은 <갑민가>의 서두부분인데 갑산(甲山)의 한 백성이 가중한 군포 징수를 견디다 못해 가산을 다 팔아 세금으로 바치고 빈 털털이로 늙으신 어머니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 군사도망(軍士逃亡)을 가는 처량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누대봉사 이내몸은 하릴없이 매어있고
시름없는 제족인 한집안의 모든 겨레붙이
은 자취없이 도망하고
여러사람 모은신역 한몸에 모두무니
한몸신역 삼량오전 돈피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장 의법이라
십이명 없는구실 합쳐보면 사십륙량
연부 대신의 저택. 정승을 대신 이르는 말
연에 맡아무니 석숭 중국 서진(西晉)의 부호
인들 당할소냐
전토가장(田土家藏) 진매(盡賣)하여 사십륙량 돈가지고
파기소(記所) 찾아기니 중군파총(中軍把摠) 호령하되
우리사도(使徒) 분부내(分付內)에 각초군(各哨軍)의 제신역(諸身役)을
관령여차(官令如此) 지엄하니 하릴없이 퇴하늣다
해마다 누적된 족징으로 인해 서진 시대의 부호 석숭이라도 당해 낼 수 없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 갑민은 논이며 밭이며 집안살림 다 팔아 13인분 군포(軍布) 46량을 만들어 파기소(記所)에 가지고 갔으나 돈피(皮)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여 퇴짜를 맞고 말았다. 종군파총이 규정을 들먹이며 받아 줄 수 없다 하는 장면이다.
노부모의 원행치장 먼길 가는데 필요한 물건
팔승네필 두었더니
팔량돈을 빌어받고 달아다가 채워내니
오십여량 도겄고야
삼수각진 함경남도 삼수군의 각 진
두루돌아 이십륙장 돈피사니
십여일이 장근이라
성화같은 관가본부 차지잡아 가두었네
불쌍한 병든처는 영어 감옥
중에 던지어서
결항치사 목을 메달아 죽음
하단말가
내집문전 돌아드니 어미불러 우는소리
구천에 사무치고 의지없는 노부모는
불성인사 누었으니 기절하온 탓이로다
모든신역 바친후에 시체찾아 매장하고
사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4대 조상의 신위를 모신 사당
모셔 땅에묻고 애끓도록 통곡하니
무지미물 뭇조작 조작 : 참새 따위의 작은 새
이 저도또한 설리운다
관가에 간곡히 호소해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할 수 없이 노모(老母)의 먼 길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베 4필을 팔아 삼수의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돈피를 사러간 사이 관가에서는 그의 아내를 투옥시켜 죽게 하였던 것이다. 원망을 가득 안은 체 모든 징세를 다 바치고 아내의 시체를 찾아 매장하고, 군사도망을 하게 된 것이다. 징세를 바치고 아내를 매장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들의 지저귐 조차 작자에겐 아내를 잃고 고향을 떠나가야 하는 슬픈 심정을 더해주고 있다. 군포의 징세는 인징(隣徵), 족징(族徵)으로 변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더욱 짜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서민들의 고통과 원망이 가득했으며 갑민가의 작자가 그들의 심정과 시대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거창가>
황구충정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 군적에 올려 세를 부과하던 일
가련듕의 가련하던 차에
백골징포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놓고 군포를 받던일
무삼일고
일신양역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장에게 부과하던 공역, 노역에 종사하던 요역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
삼사역의 부O남 중여라 남자들이 불쌍하다.
관문압 저송은 네쥬건제 몃와도
주근영 다시야 골징포 단말가
월낙삼경 깁푼밤과 천음우심 실푼밤의
원통타 우소 동헌대공 동네 관아의 들보,기둥
함긔운다
청상수 과부
우아여 너의우람 처랑
엄동설 진진밤의 독숙공방 어이리
남산의 지슨바슬 어부 가쥬며
동원의 익은술을 뉘라함기 화답고
어린식 아비불너 어무간 녹히
헐벗고 식 곱파 후럼준다
가각 서른O의 주근가 가포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 그에 준하여 바치던 베
달나
필필이 한필 한필마다
난을 이 하나하나씩
어가
<거창가 : 국문 39*40>
이 가사는 서부경남지방을 무대로 유행되었던 것으로 모두 430구로 되어 있다. 경삼 남도 서부지방의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실의 부조리를 개탄하고 현실비판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위의 내용은 산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사람에게 조차 군포를 가하게 되자 아들 낳는 것 보다 딸을 낳는 것이 더 중하다고 토로 하고 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를 작자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 밭은 누가 갈 것 이며 담가둔 술은 누구와 함께 마실 것 이며 어린자식은 배고파 울고 있는데 겨우 겨우 짜놓은 베를 죽은 남편의 백골징포 즉 가포라며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잘 그려내 주고 있다. 양반 관료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족징, 인징 뿐만이 아니라 백골징포 등 각종 가포(加布)와 남살(濫殺)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서리(胥吏)의 갖은 토색질과 이권개입으로 인해 서민들은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원한도 가득 쌓였을 것이다. 그 어려운 시대에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김일광 츌타후 면임 직책에서 물러난 서울의 각 방(坊)이나 지방의 동리에서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을 통틀어 이르던 말
순포 조선 후기에, 경무청에 속해 있던 판임관 벼슬의 하나
제
양반졍 부녀자가 거처 하는 곳
돌닙여
1,1 현실적 모순의 폭로와 비판
조선조는 철저한 신분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주로 수탈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에, 특히 양반관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서민을 이용하고 착취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하였다. 이중에서도 서민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혹한 징세였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인 <갑민가>와 <거창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갑민가>
저기가는 저사람아 네행색 보아하니
군사도망 네로구나
요상으로 볼작시면 배적삼이 깃만남고
허리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가고 전태발이 뒤에간다
<갑민가:현문 143>
갑민가는 조선 정조 때 함경도 갑산 사람이 불렀다는 가사이다. 성대중(成大中)이 북청부사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이웃에 자자했는데 그때 이웃 갑산의 한 백성이 학정(虐政)을 견디지 못해 북청으로 도망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위의 부분은 <갑민가>의 서두부분인데 갑산(甲山)의 한 백성이 가중한 군포 징수를 견디다 못해 가산을 다 팔아 세금으로 바치고 빈 털털이로 늙으신 어머니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 군사도망(軍士逃亡)을 가는 처량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누대봉사 이내몸은 하릴없이 매어있고
시름없는 제족인 한집안의 모든 겨레붙이
은 자취없이 도망하고
여러사람 모은신역 한몸에 모두무니
한몸신역 삼량오전 돈피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장 의법이라
십이명 없는구실 합쳐보면 사십륙량
연부 대신의 저택. 정승을 대신 이르는 말
연에 맡아무니 석숭 중국 서진(西晉)의 부호
인들 당할소냐
전토가장(田土家藏) 진매(盡賣)하여 사십륙량 돈가지고
파기소(記所) 찾아기니 중군파총(中軍把摠) 호령하되
우리사도(使徒) 분부내(分付內)에 각초군(各哨軍)의 제신역(諸身役)을
관령여차(官令如此) 지엄하니 하릴없이 퇴하늣다
해마다 누적된 족징으로 인해 서진 시대의 부호 석숭이라도 당해 낼 수 없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 갑민은 논이며 밭이며 집안살림 다 팔아 13인분 군포(軍布) 46량을 만들어 파기소(記所)에 가지고 갔으나 돈피(皮)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여 퇴짜를 맞고 말았다. 종군파총이 규정을 들먹이며 받아 줄 수 없다 하는 장면이다.
노부모의 원행치장 먼길 가는데 필요한 물건
팔승네필 두었더니
팔량돈을 빌어받고 달아다가 채워내니
오십여량 도겄고야
삼수각진 함경남도 삼수군의 각 진
두루돌아 이십륙장 돈피사니
십여일이 장근이라
성화같은 관가본부 차지잡아 가두었네
불쌍한 병든처는 영어 감옥
중에 던지어서
결항치사 목을 메달아 죽음
하단말가
내집문전 돌아드니 어미불러 우는소리
구천에 사무치고 의지없는 노부모는
불성인사 누었으니 기절하온 탓이로다
모든신역 바친후에 시체찾아 매장하고
사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4대 조상의 신위를 모신 사당
모셔 땅에묻고 애끓도록 통곡하니
무지미물 뭇조작 조작 : 참새 따위의 작은 새
이 저도또한 설리운다
관가에 간곡히 호소해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할 수 없이 노모(老母)의 먼 길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베 4필을 팔아 삼수의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돈피를 사러간 사이 관가에서는 그의 아내를 투옥시켜 죽게 하였던 것이다. 원망을 가득 안은 체 모든 징세를 다 바치고 아내의 시체를 찾아 매장하고, 군사도망을 하게 된 것이다. 징세를 바치고 아내를 매장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들의 지저귐 조차 작자에겐 아내를 잃고 고향을 떠나가야 하는 슬픈 심정을 더해주고 있다. 군포의 징세는 인징(隣徵), 족징(族徵)으로 변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더욱 짜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서민들의 고통과 원망이 가득했으며 갑민가의 작자가 그들의 심정과 시대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거창가>
황구충정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 군적에 올려 세를 부과하던 일
가련듕의 가련하던 차에
백골징포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놓고 군포를 받던일
무삼일고
일신양역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장에게 부과하던 공역, 노역에 종사하던 요역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
삼사역의 부O남 중여라 남자들이 불쌍하다.
관문압 저송은 네쥬건제 몃와도
주근영 다시야 골징포 단말가
월낙삼경 깁푼밤과 천음우심 실푼밤의
원통타 우소 동헌대공 동네 관아의 들보,기둥
함긔운다
청상수 과부
우아여 너의우람 처랑
엄동설 진진밤의 독숙공방 어이리
남산의 지슨바슬 어부 가쥬며
동원의 익은술을 뉘라함기 화답고
어린식 아비불너 어무간 녹히
헐벗고 식 곱파 후럼준다
가각 서른O의 주근가 가포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 그에 준하여 바치던 베
달나
필필이 한필 한필마다
난을 이 하나하나씩
어가
<거창가 : 국문 39*40>
이 가사는 서부경남지방을 무대로 유행되었던 것으로 모두 430구로 되어 있다. 경삼 남도 서부지방의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실의 부조리를 개탄하고 현실비판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위의 내용은 산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사람에게 조차 군포를 가하게 되자 아들 낳는 것 보다 딸을 낳는 것이 더 중하다고 토로 하고 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를 작자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 밭은 누가 갈 것 이며 담가둔 술은 누구와 함께 마실 것 이며 어린자식은 배고파 울고 있는데 겨우 겨우 짜놓은 베를 죽은 남편의 백골징포 즉 가포라며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잘 그려내 주고 있다. 양반 관료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족징, 인징 뿐만이 아니라 백골징포 등 각종 가포(加布)와 남살(濫殺)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서리(胥吏)의 갖은 토색질과 이권개입으로 인해 서민들은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원한도 가득 쌓였을 것이다. 그 어려운 시대에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김일광 츌타후 면임 직책에서 물러난 서울의 각 방(坊)이나 지방의 동리에서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을 통틀어 이르던 말
순포 조선 후기에, 경무청에 속해 있던 판임관 벼슬의 하나
제
양반졍 부녀자가 거처 하는 곳
돌닙여
추천자료
 [교육학] 조선시대 여성교육
[교육학] 조선시대 여성교육 [한국문화사]조선시대 여성의 美의식 조사-화장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조선시대 여성의 美의식 조사-화장문화를 중심으로 고려- 조선시대 교육사 요약정리
고려- 조선시대 교육사 요약정리 검계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의 생활상
검계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의 생활상 조선시대의 교육의 내용과 목적 및 교육사적 의의 조사분석
조선시대의 교육의 내용과 목적 및 교육사적 의의 조사분석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조선시대의 호적제도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고찰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고찰  조선시대 사상가 (권근, 조식, 서경덕, 이황, 김굉필, 이이).PPT자료
조선시대 사상가 (권근, 조식, 서경덕, 이황, 김굉필, 이이).PPT자료 신개념 한국사 정리노트(조선시대~근현대): 공무원-한국사능력검정 대비
신개념 한국사 정리노트(조선시대~근현대): 공무원-한국사능력검정 대비 조선시대의 서당과 서원
조선시대의 서당과 서원  [우수 독후감 요약] 조선시대 역사문화 여행 _ 최정훈, 오주환 저
[우수 독후감 요약] 조선시대 역사문화 여행 _ 최정훈, 오주환 저 한국 조선시대 조경 - 주택정원
한국 조선시대 조경 - 주택정원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정과 조선시대 구제사업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정과 조선시대 구제사업 한국민속문화사 -철저한 기록으로 다가가는 조선시대 궁중의 향연과 의례
한국민속문화사 -철저한 기록으로 다가가는 조선시대 궁중의 향연과 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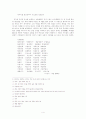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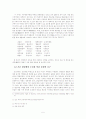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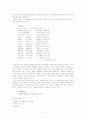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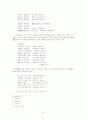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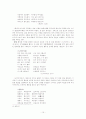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