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소월 시어 조사
정지용 시어 조사
백석 시어 조사
이용악 시어 조사
정지용 시어 조사
백석 시어 조사
이용악 시어 조사
본문내용
우고 보아도 : 시적 자아는 유리창의 양면적 성격 -외부 세계와 시적 자아를 이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단하고 있는-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시적 자아가 유리창에 다가서면 설수록 유리창은 입김 때문에 흐려져서 시적 자아가 창 밖을 볼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입김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유리를 닦는 행위는 \'별\'로 표상된 아들의 영혼을 좀더 잘 보기 위해 자신의 슬픈(입김)을 절제하고 극복하려는 안타까운 노력을 암시한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외롭다는 것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버이의 심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황홀하다는 것은 자식의 영혼과의 순간적 교감에서 빚어지는 정신적 기쁨을 암시한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자식이 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사실과 시적 자아가 극도의 비애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자식의 죽음을 산새가 잠시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간 것에 비유하여 슬픔의 감정을 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 구성동
골작에는 흔히
유성(流星)이 묻힌다.
황혼에
누뤼가 소란히 쌓이기도 하고,
꽃도
귀양 사는 곳,
절텃 드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 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구성동 : 환상의 공간
골작 : 골짜기
누뤼 : 누리가 본디말. 우박
3. 고향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뇨. : 회귀와 추억의 대상인 고향에 돌아왔으나, 고향이 그리워하던 모습이 아니고 면해 있음을 노래하였다.
산꿩이 알을 품고/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 산꿩(알)과 뻐꾸기(울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서, 변함없는 자연을 뜻한다. 이 연은 다음 3연과 대조적 상황을 노래하기 위한 전제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 산꿩(알), 뻐꾸기(울음), 메(꽃), 하늘 등 → 변함없는 자연사에 해당함.
마음은 제 고향 지이지 않고/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 고향에 돌아와서도 늘 타향을 떠도는 심경을 노래한 구절이다.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을 노래한 부분으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5 연과 대조된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고향에 돌아와도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은 없고, 고향 상실의 아픔만큼을 노래한 연이다.
백석 시어 조사
1. 여우난 곬족
명절날 나는 엄매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있는 큰집으로 가면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로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後妻)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 옷이 정하든, 말 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배나무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 엄매, 사춘 누이, 사춘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뽁운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오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 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 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 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츰 시누이 동세들이 육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 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여우난 곬족 : 여우난 골 부근에 사는 일가 친척들.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 아버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포족족하니 : 빛깔이 고르지 않고 파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매감탕 : 엿을 고거나 메주를 쑨 솥을 씻은 물로 진한 갈색.
토방돌 : 집의 낙수 고랑 안쪽으로 돌려가며 놓은 돌. 섬돌.
오리치 : 평북 지방에서 오리 사냥에 쓰이는 특별한 사냥 용구.
반디젓 : 밴댕이젓.
저녁술 :저녁 숟가락 또는 저녁밥.
숨굴막질 : 숨바꼭질.
아르간 : 아랫간. 아랫방.
조아질하고 - 제비손이구손이하고 : 아이들의 놀이 이름들.
화디 : 등장을 얹는 기구. 나무나 놋쇠로 만듦.
홍게닭 : 새벽닭.
텅납새 : 처마의 안쪽 지붕.
무이징게 국 : 민물새우에 무를 넣고 끓인 국.
2. 선 우 사 ( 膳 友 辭 )
낡은 나조반에 힌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어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힌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무슨이야기라도 다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없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긴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소리를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히여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외롭다는 것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버이의 심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황홀하다는 것은 자식의 영혼과의 순간적 교감에서 빚어지는 정신적 기쁨을 암시한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자식이 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사실과 시적 자아가 극도의 비애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자식의 죽음을 산새가 잠시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간 것에 비유하여 슬픔의 감정을 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 구성동
골작에는 흔히
유성(流星)이 묻힌다.
황혼에
누뤼가 소란히 쌓이기도 하고,
꽃도
귀양 사는 곳,
절텃 드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 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구성동 : 환상의 공간
골작 : 골짜기
누뤼 : 누리가 본디말. 우박
3. 고향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뇨. : 회귀와 추억의 대상인 고향에 돌아왔으나, 고향이 그리워하던 모습이 아니고 면해 있음을 노래하였다.
산꿩이 알을 품고/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 산꿩(알)과 뻐꾸기(울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서, 변함없는 자연을 뜻한다. 이 연은 다음 3연과 대조적 상황을 노래하기 위한 전제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 산꿩(알), 뻐꾸기(울음), 메(꽃), 하늘 등 → 변함없는 자연사에 해당함.
마음은 제 고향 지이지 않고/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 고향에 돌아와서도 늘 타향을 떠도는 심경을 노래한 구절이다.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을 노래한 부분으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5 연과 대조된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고향에 돌아와도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은 없고, 고향 상실의 아픔만큼을 노래한 연이다.
백석 시어 조사
1. 여우난 곬족
명절날 나는 엄매 아배 따라 우리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있는 큰집으로 가면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로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後妻)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 옷이 정하든, 말 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배나무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 엄매, 사춘 누이, 사춘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뽁운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오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 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 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 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츰 시누이 동세들이 육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 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여우난 곬족 : 여우난 골 부근에 사는 일가 친척들.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 아버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포족족하니 : 빛깔이 고르지 않고 파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매감탕 : 엿을 고거나 메주를 쑨 솥을 씻은 물로 진한 갈색.
토방돌 : 집의 낙수 고랑 안쪽으로 돌려가며 놓은 돌. 섬돌.
오리치 : 평북 지방에서 오리 사냥에 쓰이는 특별한 사냥 용구.
반디젓 : 밴댕이젓.
저녁술 :저녁 숟가락 또는 저녁밥.
숨굴막질 : 숨바꼭질.
아르간 : 아랫간. 아랫방.
조아질하고 - 제비손이구손이하고 : 아이들의 놀이 이름들.
화디 : 등장을 얹는 기구. 나무나 놋쇠로 만듦.
홍게닭 : 새벽닭.
텅납새 : 처마의 안쪽 지붕.
무이징게 국 : 민물새우에 무를 넣고 끓인 국.
2. 선 우 사 ( 膳 友 辭 )
낡은 나조반에 힌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어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힌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무슨이야기라도 다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없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긴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소리를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히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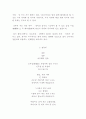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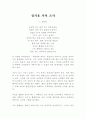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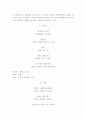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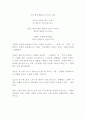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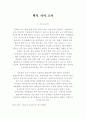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