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소학지희와 규식지희의 공연방식
1.1 공연 계기
1-2 공연 방식
2. 소학지희와 규식지희의 희곡의 특성
2.1 극의 진행방식
2.2 사실(事實)과 (허구)虛構
2.3 소극적 특성
2.4 소학지희의 소재와 주제
2.5 규식지희의 정리
3. 조희
4. 맺음말
Ⅱ.본론
1. 소학지희와 규식지희의 공연방식
1.1 공연 계기
1-2 공연 방식
2. 소학지희와 규식지희의 희곡의 특성
2.1 극의 진행방식
2.2 사실(事實)과 (허구)虛構
2.3 소극적 특성
2.4 소학지희의 소재와 주제
2.5 규식지희의 정리
3. 조희
4. 맺음말
본문내용
게 하는 셈이다. 또한 의식에 참여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의 확고히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엄숙하고 장엄한 의식 뒤에는 화려하고 난장적인 놀이가 이어지는 것이다.
소학지희는 나례의 본령이 아닐 수 있고 규식지희나 음악부의 중간에 삽입되어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객의 관심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소학지희는 그저 ‘보여주기’ 위하여 진열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죽, 대사를 통하여 관객과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게 된다. 배우의 말, 즉 소학지희에 담긴 규풍의 뜻을 받아드리고자 하는 것이 나례를 설치한 본뜻이라고 할 수 있다.
소학지희는 언어의 묘미를 살린 연극이므로 가청적인 거리가 확보된 무대에서만 연출할 수 있다.
(가) (귀석이) 자칭 수령이라 하며 동헌에 앉아서 진상을 맡은 아전을 불렀다. 한 배우가 아전이라고 하고 무릎으로 기어 앞으로 나왔다. 수령이 소리를 낮추고 큰 꾸러미를 하나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병조판께 드려라.” 또 큰 꾸러미 하나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이조판께 드려라.” 중간 꾸러미를 하나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대사헌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작은 꾸러미를 주고서는 “이것은 임금께 올려라.”라고 말했다.
自稱守令坐於東軒 召進奉色吏 有一優人自稱進奉色吏 膝行匍匐而前 貴石低聲 擧大苞一 與之曰 此獻吏曹判書 又擧大苞一 與之曰 此獻兵曹判書 又其中者一 與之曰 此獻大司憲 然後 與其小苞曰 以此進上
자칭수령좌어동헌 소진봉색리 유일우인자칭진봉색리 슬행포복이전 귀석저성 擧大苞一 여지왈 차헌이조판서 우거대포일 여지왈 차헌병조판서 우기중자일 여지왈 차헌대사헌 연후 여기소포왈 이차진상
(나) 이보다 앞서 공길이라는 우인이 <老儒戱노유희>를 만들어가지고 말하기를, “전하는 요순같은 임금이고 나는 고요같은 신하입니다. 요순과 같은 임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요와 같은 신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논어>를 외우면서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합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설사 쌀이 있은들 내가 먹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은 말이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형장을 치고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다.
先是優人孔吉作老儒戱曰 殿下爲堯舜之君 我爲皐陶之臣 堯舜不常有 皐陶常得存 又誦論語曰 君君臣臣父父子子 君不君臣不臣 雖有粟吾得而食諸 王以語涉不敬杖流遐方
선시우인공길작노유희왈 전하위요순지군 아위고도지신 요순불상유 고도상득존 우송론어왈 군군신신부부자자 군불군신불신 수유속오득이식제 왕이어섭불경장유하방
- (연산군일기 60권 22장) -
(가)에서는 사태의 반전이 가져다주는 소극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여야 공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관객과 배우의 현존 시간이 일정하면서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는 관나의 무대 공간이 적합하다. 관객이 중간에 다른 무대에 눈을 돌리거나 이동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연극은 공연의 의의가 없다.
관나의 무대 공간은 가청적이고 가시적인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배우가 직접 임금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이다. 관객인 임금은 또한 관람을 위하여 관나에 참여하였으므로 배우의 연기와 대사를 경청할 수 있었고 불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설나의 무대 공간은 관객과 배우의 현존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짧기 때문에 극적 구성을 이루며 언어를 위주로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 대사를 듣지 못하거나 임의로 어느 한 부분만 관람해서는 의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관나는 공식적으로 임금의 관람을 위하여 준비된 공연 종목을 연출하므로 그 내용과 공연 방식에 일차적인 검열이 전제되었다.
지시하기를 “思政殿(사정선)에 觀儺(관나)를 배설하는 것은 옛관례라고 하더라도 사정전은 경연을 여는 곳이므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전에도 후원에 설치한 때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후원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儺戱單字(나희단자)를 내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농사짓는 형상은 빈풍 7월편의 내용에 의하여 만들며 고을원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형상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을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유생 급제의 형상에 대한 첫째 조항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비록 선생들이 신래를 놀려주는 형상이기는 하지만 희부들이 채색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문제를 진실성 있게 만들어 아이들의 장난처럼은 하지 말것이다.”라고 하였다.
傳曰 思政殿觀儺排設 雖是舊例 殿卽經筵處也 似不合矣 古亦有設於後苑之時 今亦設於後苑可也 且下儺戱單子曰 農作形狀 須依風七月篇 而守令賑救飢民之狀 幷爲之可也 且指儒生及第一條曰 雖如此事先生弄新來之狀 戱夫服綵等事者 實爲之 毋如兒戱爲也
전왈 사정전관나배설 수시구례 전즉경연처야 사불합의 고역유설어후원지시 금역설어후원가야 차하나희단자왈 농작형상 수의빈풍칠월편 이수령진구기민지상 병위지가야 차지유생급제일조왈 수여차사선생농신래지상 희부복채등사자 실위지 무여아희위야
- 중종실록 43권 46장 -
관나의 공연 종목 가운데 특히 소학지희의 내용을 임금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임금이 그해의 관나에서 보게 될 연극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이다. (1)농사짓는 형상, (2)고을원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형상, (3)유생 급제의 형상. 이 가운데 비준을 받기 위하여 임금에게 올려진 내용은 (1)과 (3)이다. 임금은 (2)의 내용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3)의 내용을 연극으로 꾸밀 때 사실성 있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학지희는 관나의 공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연 종목으로서 민간의 풍속을 살피고 정치의 득실을 헤아린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언제나 강조되었던 것이다.
2. 소학지희와 규식지희의 희곡의 특성
2.1 극의 진행방식
소학지희의 진행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혼자서 자문자답하거나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여 극을 이끌어 나갔을 것이라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소학지희의 진행방식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단서를 마련해 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잡희가 함께 시작되어 방 이고에 역귀를
소학지희는 나례의 본령이 아닐 수 있고 규식지희나 음악부의 중간에 삽입되어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객의 관심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소학지희는 그저 ‘보여주기’ 위하여 진열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죽, 대사를 통하여 관객과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게 된다. 배우의 말, 즉 소학지희에 담긴 규풍의 뜻을 받아드리고자 하는 것이 나례를 설치한 본뜻이라고 할 수 있다.
소학지희는 언어의 묘미를 살린 연극이므로 가청적인 거리가 확보된 무대에서만 연출할 수 있다.
(가) (귀석이) 자칭 수령이라 하며 동헌에 앉아서 진상을 맡은 아전을 불렀다. 한 배우가 아전이라고 하고 무릎으로 기어 앞으로 나왔다. 수령이 소리를 낮추고 큰 꾸러미를 하나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병조판께 드려라.” 또 큰 꾸러미 하나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이조판께 드려라.” 중간 꾸러미를 하나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대사헌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작은 꾸러미를 주고서는 “이것은 임금께 올려라.”라고 말했다.
自稱守令坐於東軒 召進奉色吏 有一優人自稱進奉色吏 膝行匍匐而前 貴石低聲 擧大苞一 與之曰 此獻吏曹判書 又擧大苞一 與之曰 此獻兵曹判書 又其中者一 與之曰 此獻大司憲 然後 與其小苞曰 以此進上
자칭수령좌어동헌 소진봉색리 유일우인자칭진봉색리 슬행포복이전 귀석저성 擧大苞一 여지왈 차헌이조판서 우거대포일 여지왈 차헌병조판서 우기중자일 여지왈 차헌대사헌 연후 여기소포왈 이차진상
(나) 이보다 앞서 공길이라는 우인이 <老儒戱노유희>를 만들어가지고 말하기를, “전하는 요순같은 임금이고 나는 고요같은 신하입니다. 요순과 같은 임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요와 같은 신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논어>를 외우면서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합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설사 쌀이 있은들 내가 먹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은 말이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형장을 치고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다.
先是優人孔吉作老儒戱曰 殿下爲堯舜之君 我爲皐陶之臣 堯舜不常有 皐陶常得存 又誦論語曰 君君臣臣父父子子 君不君臣不臣 雖有粟吾得而食諸 王以語涉不敬杖流遐方
선시우인공길작노유희왈 전하위요순지군 아위고도지신 요순불상유 고도상득존 우송론어왈 군군신신부부자자 군불군신불신 수유속오득이식제 왕이어섭불경장유하방
- (연산군일기 60권 22장) -
(가)에서는 사태의 반전이 가져다주는 소극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여야 공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관객과 배우의 현존 시간이 일정하면서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는 관나의 무대 공간이 적합하다. 관객이 중간에 다른 무대에 눈을 돌리거나 이동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연극은 공연의 의의가 없다.
관나의 무대 공간은 가청적이고 가시적인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배우가 직접 임금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이다. 관객인 임금은 또한 관람을 위하여 관나에 참여하였으므로 배우의 연기와 대사를 경청할 수 있었고 불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설나의 무대 공간은 관객과 배우의 현존 시간을 예측할 수 없고 짧기 때문에 극적 구성을 이루며 언어를 위주로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 대사를 듣지 못하거나 임의로 어느 한 부분만 관람해서는 의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관나는 공식적으로 임금의 관람을 위하여 준비된 공연 종목을 연출하므로 그 내용과 공연 방식에 일차적인 검열이 전제되었다.
지시하기를 “思政殿(사정선)에 觀儺(관나)를 배설하는 것은 옛관례라고 하더라도 사정전은 경연을 여는 곳이므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전에도 후원에 설치한 때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후원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儺戱單字(나희단자)를 내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농사짓는 형상은 빈풍 7월편의 내용에 의하여 만들며 고을원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형상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을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유생 급제의 형상에 대한 첫째 조항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비록 선생들이 신래를 놀려주는 형상이기는 하지만 희부들이 채색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문제를 진실성 있게 만들어 아이들의 장난처럼은 하지 말것이다.”라고 하였다.
傳曰 思政殿觀儺排設 雖是舊例 殿卽經筵處也 似不合矣 古亦有設於後苑之時 今亦設於後苑可也 且下儺戱單子曰 農作形狀 須依風七月篇 而守令賑救飢民之狀 幷爲之可也 且指儒生及第一條曰 雖如此事先生弄新來之狀 戱夫服綵等事者 實爲之 毋如兒戱爲也
전왈 사정전관나배설 수시구례 전즉경연처야 사불합의 고역유설어후원지시 금역설어후원가야 차하나희단자왈 농작형상 수의빈풍칠월편 이수령진구기민지상 병위지가야 차지유생급제일조왈 수여차사선생농신래지상 희부복채등사자 실위지 무여아희위야
- 중종실록 43권 46장 -
관나의 공연 종목 가운데 특히 소학지희의 내용을 임금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임금이 그해의 관나에서 보게 될 연극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이다. (1)농사짓는 형상, (2)고을원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형상, (3)유생 급제의 형상. 이 가운데 비준을 받기 위하여 임금에게 올려진 내용은 (1)과 (3)이다. 임금은 (2)의 내용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3)의 내용을 연극으로 꾸밀 때 사실성 있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학지희는 관나의 공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연 종목으로서 민간의 풍속을 살피고 정치의 득실을 헤아린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언제나 강조되었던 것이다.
2. 소학지희와 규식지희의 희곡의 특성
2.1 극의 진행방식
소학지희의 진행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혼자서 자문자답하거나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여 극을 이끌어 나갔을 것이라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소학지희의 진행방식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단서를 마련해 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잡희가 함께 시작되어 방 이고에 역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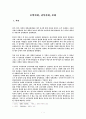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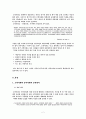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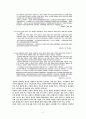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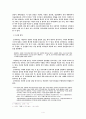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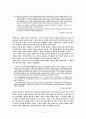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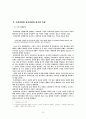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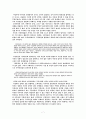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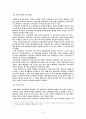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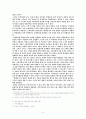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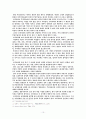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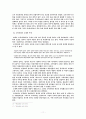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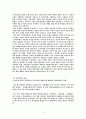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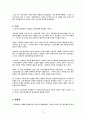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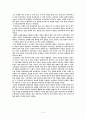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