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눌의 생애와 저서
Ⅱ. 지눌의 선교일치 사상
1.이론과 실천 사이의 긴장: 선과 교학 사이의 갈등
1)선종과 교종 간 갈등의 역사적 배경
2)지눌과 한국에서의 선교 논쟁
3)지눌의 선철학: 보조선의 근본 요소 세 가지
Ⅲ. 지눌과 한국불교
1.보조선 이전과 이후
2.지눌의 화엄선에 대하여
Ⅱ. 지눌의 선교일치 사상
1.이론과 실천 사이의 긴장: 선과 교학 사이의 갈등
1)선종과 교종 간 갈등의 역사적 배경
2)지눌과 한국에서의 선교 논쟁
3)지눌의 선철학: 보조선의 근본 요소 세 가지
Ⅲ. 지눌과 한국불교
1.보조선 이전과 이후
2.지눌의 화엄선에 대하여
본문내용
에 만족할 만한 수행을 해 왔건만 오히려 정견을 놓아 버리지 못한 채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 원수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지리산에서 대혜종고의 책을 보다가 다음 구절이 눈에 띄었다.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으며, 날마다 객관과 상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요한 곳, 일상인연이 따르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여의지 않고 참구하여야만 한다.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선은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이르러 눈이 열리고 당장에 안락해졌다\"
3년동안 참선한 후에 지눌은 선종으로 개종한 영향력 있는 정토신봉자 요세 등 제자들과 함께 1200년 길상사에 도착하였다. 1205년 9년간의 노력 끝에 선불교의 내면적 통합에 의한 불교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정혜사는 수선사로 이름을 고치고, 중국 선불교의 개조인 육조 혜능이 머물렀던 산의 이름을 따서 송광산은 조계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눌은 낮에는 「대혜어록」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참선 수련을 지도하였다. 아마도 정혜사의 결성 초기에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수행 지침서 격인 「계초심학인문」을 쓴 것 같다. 이 저서는 선원(禪院)의 행동 지침서로 채택되었고, 한국 토착 선불교의 기초가 되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였다. 「계초심학인문」은 세 명의 한국인 선사가 수동의 생활규범에 대하여 쓴 세 편의 저작 중 첫 번째 것이다. 오늘날 이것은 승려 지망생의 생활 지침서이기도 한데, 원효의 「발심수행장」과 같은 유형의 저서이다.
지눌은 이 저술에서 모든 초입학자에게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들의 정신적 수양의 바탕 저편에는 도덕적 삶의 질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단순하고도 간결한 선 수련서 「수심결」을 지었다. 이 책은 아마도 새로 완성된 수선사에 오는 중생들을 교도하기 위한 기본 수련서였을 것이다. 한국 선사상의 골자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지눌 사상의 두 가지 요소, 즉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다른 불교 개론서인 「진심직설」은 선 수련 방법에 관하여 쓴 가장 쉬운 해설서이다. 수심결과 비슷한 시기를 전후하여 쓰인 「진심직설」은 지눌 사상의 바전 단계로 보면 중반기에 해당하는 저술이다. 초기 저작인 「정혜결사문」의 초기 방법론을 탈피하여 미혹된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으로 무심(無心)이라는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심직설」에서 주장하는 수련 방법의 요체는 각자의 근기에 맞게 열 가지 중의 한 방법을 선택하여 완벽하게 행하면 미혹이 저절로 사라지고 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눌의 대작인 「별행록」은 그의 성숙한 사상과 일생을 바친 탐구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눌의 전체 사상을 통괄할 수 있는 최상의 저작이다. 실제로 이 책은 문하의 제자들을 가르치지 위하여 쓴 것이나 한국 전통 불교의 기본 사상이 너무도 잘 설명되어 있어 서구 중세 기독교의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한국 불교 승가에서 기본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눌이 생각한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적 접근 방법을 요약해보면 세가지 깨달음의 층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최초의 지적 해오(解悟)인데,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지적 깨달음은 수행자를 일시적으로 불도에 귀의하게 만든다. 둘째는 점수(漸修)의 단계이다. 왜냐하면 첫째단계의 지적 해오나 올바른 믿음의 단계를 거쳐 과거의 습기를 끊임없이 씻어 내어야 하고 건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단계에서는 점수가 마침내 완전한
3년동안 참선한 후에 지눌은 선종으로 개종한 영향력 있는 정토신봉자 요세 등 제자들과 함께 1200년 길상사에 도착하였다. 1205년 9년간의 노력 끝에 선불교의 내면적 통합에 의한 불교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정혜사는 수선사로 이름을 고치고, 중국 선불교의 개조인 육조 혜능이 머물렀던 산의 이름을 따서 송광산은 조계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눌은 낮에는 「대혜어록」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참선 수련을 지도하였다. 아마도 정혜사의 결성 초기에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수행 지침서 격인 「계초심학인문」을 쓴 것 같다. 이 저서는 선원(禪院)의 행동 지침서로 채택되었고, 한국 토착 선불교의 기초가 되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였다. 「계초심학인문」은 세 명의 한국인 선사가 수동의 생활규범에 대하여 쓴 세 편의 저작 중 첫 번째 것이다. 오늘날 이것은 승려 지망생의 생활 지침서이기도 한데, 원효의 「발심수행장」과 같은 유형의 저서이다.
지눌은 이 저술에서 모든 초입학자에게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들의 정신적 수양의 바탕 저편에는 도덕적 삶의 질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단순하고도 간결한 선 수련서 「수심결」을 지었다. 이 책은 아마도 새로 완성된 수선사에 오는 중생들을 교도하기 위한 기본 수련서였을 것이다. 한국 선사상의 골자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지눌 사상의 두 가지 요소, 즉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다른 불교 개론서인 「진심직설」은 선 수련 방법에 관하여 쓴 가장 쉬운 해설서이다. 수심결과 비슷한 시기를 전후하여 쓰인 「진심직설」은 지눌 사상의 바전 단계로 보면 중반기에 해당하는 저술이다. 초기 저작인 「정혜결사문」의 초기 방법론을 탈피하여 미혹된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으로 무심(無心)이라는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심직설」에서 주장하는 수련 방법의 요체는 각자의 근기에 맞게 열 가지 중의 한 방법을 선택하여 완벽하게 행하면 미혹이 저절로 사라지고 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눌의 대작인 「별행록」은 그의 성숙한 사상과 일생을 바친 탐구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눌의 전체 사상을 통괄할 수 있는 최상의 저작이다. 실제로 이 책은 문하의 제자들을 가르치지 위하여 쓴 것이나 한국 전통 불교의 기본 사상이 너무도 잘 설명되어 있어 서구 중세 기독교의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한국 불교 승가에서 기본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눌이 생각한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적 접근 방법을 요약해보면 세가지 깨달음의 층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최초의 지적 해오(解悟)인데,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지적 깨달음은 수행자를 일시적으로 불도에 귀의하게 만든다. 둘째는 점수(漸修)의 단계이다. 왜냐하면 첫째단계의 지적 해오나 올바른 믿음의 단계를 거쳐 과거의 습기를 끊임없이 씻어 내어야 하고 건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단계에서는 점수가 마침내 완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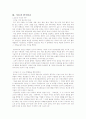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