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기체가
1.1 경기체가의 명칭
1.2 경기체가의 형성
1.3 경기체가의 작자층 및 작품의 내용적 성격
1.4 경기체가의 형식
1.5 경기체가와 고려가요의 공통점 및 차이점
2) 한림별곡
2.1 원문과 해석
2.2 작품배경
2.3 한림별곡 해성
2.4 작자층
3) 한림별곡과 쌍화점과의 연계성
3.1쌍화점 원문과 해석
3.2 한림별곡&쌍화점의 연계성
4) 고려가요의 특징과 사뇌시/시조와의 비교
4.1 고려가요 특징
4.2 고려가요와 사뇌시 비교
4.3 고려가요와 시조 비교
5) 관동별곡과 죽계별곡 원문과 해석 간략한 내용
3. 결론
2. 본론
1) 경기체가
1.1 경기체가의 명칭
1.2 경기체가의 형성
1.3 경기체가의 작자층 및 작품의 내용적 성격
1.4 경기체가의 형식
1.5 경기체가와 고려가요의 공통점 및 차이점
2) 한림별곡
2.1 원문과 해석
2.2 작품배경
2.3 한림별곡 해성
2.4 작자층
3) 한림별곡과 쌍화점과의 연계성
3.1쌍화점 원문과 해석
3.2 한림별곡&쌍화점의 연계성
4) 고려가요의 특징과 사뇌시/시조와의 비교
4.1 고려가요 특징
4.2 고려가요와 사뇌시 비교
4.3 고려가요와 시조 비교
5) 관동별곡과 죽계별곡 원문과 해석 간략한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분절된다는 사실은 고려 속요의 일반적 특성과 비슷하다.
금학사의 옥순문생 :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이 구절을 바탕으로 이 노래를 금의의 문하생들인 신진사류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금의나 임유 등은 무신 정권기에 여러 차례 과거 시험관에 임용되면서 힘을 길러 새로운 문벌을 형성하였다.
날조차 몃 부니잇고 : \'아아, 나까지 몇 분입니까, 참으로 많습니다\'의 설의적 표현으로, 작자를 비롯한 신흥 문벌들의 자만에 찬 의욕과 권세를 나타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2 작품 배경
고려 고종 때는 안으로는 무신의 집권과 밖으로는 몽고의 침입 등으로 국토가 유린되는 내우외환의 다난한 시대였으나, 귀족 계급의 문화는 난숙기에 달하였다. 최충헌은 정권이 안정되자 문인들을 적극 등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고, 문학이 융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은 등용되었다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대로 포부를 지니고 재능을 자랑하는 데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노래는 이런 분위기에서 흥청거리는 놀이를 벌이면서 지은 것이다.
또한 이 노래의 배경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도 있다. 고려 중기이후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문신들은 산야에 묻혀 기로회(耆老會)니 죽림칠현(竹林七賢)이니 하는 교계(交契)를 맺으면서 유흥과 퇴폐적인 향락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2). 3 한림별곡 해석
이 노래는 경기체가의 효시로, 고려 고종 때 한림원(왕의 명을 관장하는 관아)의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총 8장으로, 각 연마다 일경(一景)을 배치하고 있다. 각 장은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뉘어가며 공통된 후렴구가 있다. 음보는 3음보가 중심인데 3.3.4, 3.3.4, 4.4.4의 기본 율조로 후세에 가사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제 1장은 당대 문인의 시부, 제 2장은 한당서(당서와 한서. ‘당서’는 당나라 역사를 적은 책으로서, 구당서가 잇다. ‘한서’는 반고가 편찬한 한나라 역사책)를 비롯한 중국의 전적, 제 3장은 진경서9한자체의 한가지)와 비백서 등의 명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 4장은 황금구와 백자주 등의 명주, 제 5장은 모란 등의 화훼, 제 6장은 아양금과 문탁적(악기 이름) 등의 음악, 제 7장은 봉래산 등의 누각, 제 8장은 추천(그네)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의 호화스러움이 극에 달한 생활을 읊은 것으로, 당시 문인들의 생활상과는 거리가 먼 무신 집권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잇다.
그러나 당시 권좌를 꿈꾸는 신흥 사대부들의 활기찬 감정과 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 작품의 구체적인 배경을 새로 과거에 합격한 문인들이 최충헌의 l집에서 부른 찬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노래는 매 장 제 4행의 ‘위 .... 경긔 엇더니잇고’라는 구절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경기체가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지어진 최고(最古)의 현존 작품으로서, 경기체가의 전범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w가자는 첫 장에 나오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는데, <고려사 악지>의 기록에 ‘제한림’으로 되어있으며, 금의의 공거문인들로도 볼 수 있다. 이 노래 첫 장에 등장하는 문인들은 모두 당대에 실재했던 인물들로서 한결같이 같은 시대의 벼슬길에서 활약했다.
▶ 한림별곡 1, 2, 8장의 작품 해설
이 노래는 경기체가의 전형적인 작품이자 현전(現傳)하는 최고(最古)의 작품이다. 작자는 고려 고종 때 한림원의 유생들로, 바로 제 1장에 나오는 문인들로 여겨진다.
제 1장은 문장가, 시인 등의 시부(詩賦)를 나타낸 것으로 명문장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과거시험의 고시관(考試官)이었던 금의(琴儀)에 의해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시(詩), 부(賦)를 찬양함으로써 신진사류들의 당당한 기개를 엿보는 듯하며, ‘위 날조차 몃 부니잇고’는 자만이 넘치는 기개라 할 수 있어 당시 상층 문인들의 의식 세계를 짐작하겠으나, 명사나 나열에 그쳐 문학성이 희박하다.
제 2장은 신진 사대부들의 독서에의 긍지, 즉 학문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반복 구조 속에 사대부들의 호탕하고, 화려하고 득의만만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지식 수련에 대한 자신들의 자긍심과 기개를 나타내는 한편, 당시의 시대상과 사대부들의 사물관 내지 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한다.
제 8장은 이 노래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 남녀가 다정하게 어울려 그네를 뛰는 정겨운 광경과 그 흥을 노래한 것이다. 여자는 그네를 타고 남자는 그넷줄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노니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우리말 위주로 표현되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네와 같은 민속적인 소재를 다루는 데는 우리말이 훨씬 더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향락과 흥취가 극치에 이른 흐드러진 광경, 당시 상층 사회의 문신들의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풍류의 극치를 국어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으며, ‘唐唐唐(당당당)’과 같은 운율미는 상당히 세련되었다.
2). 4 작자층
한림제유 : <악장가사>에 한림제유가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림’이란 조저에서 벼슬을 하면서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고, 여러 유학자라는 뜻의 ‘제유’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한림별곡의 내용을 당시 권좌를 꿈꾸는 신진 사류들의 의욕적 기개와 의식 세계를 영탄한 거승로 보고, 그 구체적 배경은 고종 3년(1216) 학사연 때 새로 과거에 합격한 문인들이 최충헌의 집에서 부른 찬가라고 추정하고, 한림 제유가 아닌 금의 문하의 신진 인사라는 견해도 있다. 즉 유원순, 이인로, 이공로, 이규보, 진호, 유충기, 김인경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내용도 문신들의 향락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최충헌, 최이 부자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으로 최씨 부자의 호화를 극한 생활을 노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문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못했기 때문이다.
3) 한림별곡과 쌍화점의 연계성
3). 1 쌍화점 원문과 해석
솽화
금학사의 옥순문생 :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이 구절을 바탕으로 이 노래를 금의의 문하생들인 신진사류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금의나 임유 등은 무신 정권기에 여러 차례 과거 시험관에 임용되면서 힘을 길러 새로운 문벌을 형성하였다.
날조차 몃 부니잇고 : \'아아, 나까지 몇 분입니까, 참으로 많습니다\'의 설의적 표현으로, 작자를 비롯한 신흥 문벌들의 자만에 찬 의욕과 권세를 나타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2 작품 배경
고려 고종 때는 안으로는 무신의 집권과 밖으로는 몽고의 침입 등으로 국토가 유린되는 내우외환의 다난한 시대였으나, 귀족 계급의 문화는 난숙기에 달하였다. 최충헌은 정권이 안정되자 문인들을 적극 등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고, 문학이 융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은 등용되었다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대로 포부를 지니고 재능을 자랑하는 데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노래는 이런 분위기에서 흥청거리는 놀이를 벌이면서 지은 것이다.
또한 이 노래의 배경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도 있다. 고려 중기이후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문신들은 산야에 묻혀 기로회(耆老會)니 죽림칠현(竹林七賢)이니 하는 교계(交契)를 맺으면서 유흥과 퇴폐적인 향락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2). 3 한림별곡 해석
이 노래는 경기체가의 효시로, 고려 고종 때 한림원(왕의 명을 관장하는 관아)의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총 8장으로, 각 연마다 일경(一景)을 배치하고 있다. 각 장은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뉘어가며 공통된 후렴구가 있다. 음보는 3음보가 중심인데 3.3.4, 3.3.4, 4.4.4의 기본 율조로 후세에 가사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제 1장은 당대 문인의 시부, 제 2장은 한당서(당서와 한서. ‘당서’는 당나라 역사를 적은 책으로서, 구당서가 잇다. ‘한서’는 반고가 편찬한 한나라 역사책)를 비롯한 중국의 전적, 제 3장은 진경서9한자체의 한가지)와 비백서 등의 명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 4장은 황금구와 백자주 등의 명주, 제 5장은 모란 등의 화훼, 제 6장은 아양금과 문탁적(악기 이름) 등의 음악, 제 7장은 봉래산 등의 누각, 제 8장은 추천(그네)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의 호화스러움이 극에 달한 생활을 읊은 것으로, 당시 문인들의 생활상과는 거리가 먼 무신 집권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잇다.
그러나 당시 권좌를 꿈꾸는 신흥 사대부들의 활기찬 감정과 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 작품의 구체적인 배경을 새로 과거에 합격한 문인들이 최충헌의 l집에서 부른 찬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노래는 매 장 제 4행의 ‘위 .... 경긔 엇더니잇고’라는 구절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경기체가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지어진 최고(最古)의 현존 작품으로서, 경기체가의 전범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w가자는 첫 장에 나오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는데, <고려사 악지>의 기록에 ‘제한림’으로 되어있으며, 금의의 공거문인들로도 볼 수 있다. 이 노래 첫 장에 등장하는 문인들은 모두 당대에 실재했던 인물들로서 한결같이 같은 시대의 벼슬길에서 활약했다.
▶ 한림별곡 1, 2, 8장의 작품 해설
이 노래는 경기체가의 전형적인 작품이자 현전(現傳)하는 최고(最古)의 작품이다. 작자는 고려 고종 때 한림원의 유생들로, 바로 제 1장에 나오는 문인들로 여겨진다.
제 1장은 문장가, 시인 등의 시부(詩賦)를 나타낸 것으로 명문장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과거시험의 고시관(考試官)이었던 금의(琴儀)에 의해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시(詩), 부(賦)를 찬양함으로써 신진사류들의 당당한 기개를 엿보는 듯하며, ‘위 날조차 몃 부니잇고’는 자만이 넘치는 기개라 할 수 있어 당시 상층 문인들의 의식 세계를 짐작하겠으나, 명사나 나열에 그쳐 문학성이 희박하다.
제 2장은 신진 사대부들의 독서에의 긍지, 즉 학문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반복 구조 속에 사대부들의 호탕하고, 화려하고 득의만만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지식 수련에 대한 자신들의 자긍심과 기개를 나타내는 한편, 당시의 시대상과 사대부들의 사물관 내지 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한다.
제 8장은 이 노래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 남녀가 다정하게 어울려 그네를 뛰는 정겨운 광경과 그 흥을 노래한 것이다. 여자는 그네를 타고 남자는 그넷줄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노니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우리말 위주로 표현되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네와 같은 민속적인 소재를 다루는 데는 우리말이 훨씬 더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향락과 흥취가 극치에 이른 흐드러진 광경, 당시 상층 사회의 문신들의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풍류의 극치를 국어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으며, ‘唐唐唐(당당당)’과 같은 운율미는 상당히 세련되었다.
2). 4 작자층
한림제유 : <악장가사>에 한림제유가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림’이란 조저에서 벼슬을 하면서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고, 여러 유학자라는 뜻의 ‘제유’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한림별곡의 내용을 당시 권좌를 꿈꾸는 신진 사류들의 의욕적 기개와 의식 세계를 영탄한 거승로 보고, 그 구체적 배경은 고종 3년(1216) 학사연 때 새로 과거에 합격한 문인들이 최충헌의 집에서 부른 찬가라고 추정하고, 한림 제유가 아닌 금의 문하의 신진 인사라는 견해도 있다. 즉 유원순, 이인로, 이공로, 이규보, 진호, 유충기, 김인경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내용도 문신들의 향락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최충헌, 최이 부자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으로 최씨 부자의 호화를 극한 생활을 노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문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못했기 때문이다.
3) 한림별곡과 쌍화점의 연계성
3). 1 쌍화점 원문과 해석
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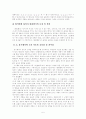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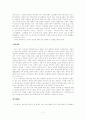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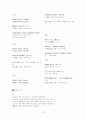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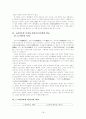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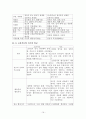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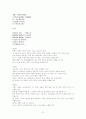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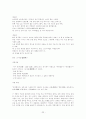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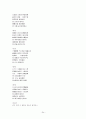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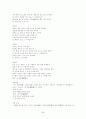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