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본론
1) 저자에 대하여
ㄱ> 연암의 생애와 문학
ㄴ> 연암의 저서
2) 소설의 줄거리
3) 시대적 배경
4) 연구 성과
II 맺음말(감상 및 비평)
III 연암소설의 한문원문 10작품
* 참고문헌
II 본론
1) 저자에 대하여
ㄱ> 연암의 생애와 문학
ㄴ> 연암의 저서
2) 소설의 줄거리
3) 시대적 배경
4) 연구 성과
II 맺음말(감상 및 비평)
III 연암소설의 한문원문 10작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자기처럼 추한 꼴을 한 남자를 반겨줄 여인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었다.그런 어느 날 그는 장안에서 가장 이름난 은심이란 기생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방에 있던 기인들은 그의 남루한 행색과 추한 얼굴을 보고는 불쾌해서 상대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태연히 상좌에 앉아 기품을 지켰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도 움직일 기색조차 없던 은심이 그의 높은 인격에 감복하여 흔연히 일어서서 그를 위해 춤을 추었다.
아. 김신선전(金神仙傳)
김신선의 속명 홍기(弘基)로 16세에 장가들어 단 한번 아내를 가까이 해서 아들을 낳았으며 화식(火食)을 끊고 벽을 향해 정좌한지 두어 해 만에 별안간 몸이 가벼워졌으며 그 뒤 각지의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다. 하루에 수 백리를 걸었으나 5년에 한번 신을 갈아 신었고 함한 곳에 다다르면 더욱 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아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으며, 겨울에 속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 남들은 그런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 키는 7척이 넘었으며, 여윈 얼굴에 수염이 길었고 눈동자는 푸르며 귀는 길고 누른빛이 났다. 술은 한 잔에도 취하지만 한 말을 마시고도 더 취하지는 않았고 남이 이야기하면 앉아서 졸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빙긋이 웃으며, 조용하기는 참선하는 것 같고, 졸(拙)하기는 수절과부와 같았다. 어떤 이는 김홍기의 나이가 백여 살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쉰 남짓 되었다고도 하며 지리산에 약을 캐러 가서 돌아오지 않은지가 수십 년 이라고도 하고 어두운 바위 구멍 속에 살고 있다고도 했다. 그 무렵 박지원은 마침 마음에 우울병이 있었는데 김신선의 방기(方技)가 기이한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 보고자 윤생과 신생을 시켜 몰래 탐문해 보았으나 열흘이 지나도 찾지 못하였다. 윤생은 김 홍기가 서학동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갔으나 그는 사촌 집에 처자를 남겨둔 채 떠나고 없었다. 그 아들에게서 홍기가 술, 노래, 바둑, 거문고, 꽃, 책, 고검(古劒 )따위를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서 놀고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았으나 아무데도 없었으며 창동을 거쳐 임동지의 집에까지 찾아갔으나 아침에 강릉을 떠나갔다는 말만 듣는다. 다시 복(福)을 시켜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 이듬해 박지원이 관동으로 유람 가는 길에 단발령을 넘으면서 남여를 메고 가는 어떤 스님으로부터 \"선암에서 벽곡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또한 그날 밤 장안사에 승녀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여러 날을 지체하여 선암에 올랐을 때에는 탑 위에 동불(銅佛)과 신발 두 짝이 있을 뿐 이었다.
자. 우상전(虞裳傳)
일본 관백이 새로 취임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기예(技藝)와 문사(文士)를 모아 달련을 시킨 후 우리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에서는 사신 일행을 엄선하여 보냈다. 일본 사람들은 서화(書畵)와 사장(詞章)을 좋아하여 그것을 우리 사신 일행에게 얻기 위해 중보(重寶)를 아끼지 않았다. 우상은 역관의 자격으로 수행하였으나 문장으로 격찬을 받았다. 그들은 우상에게 난제와 강운(强韻)으로 궁지에 몰아넣고자 했으나 그는 미리 지어 놓은 듯이 즉시 응대를 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우상의 문장이 이와 같이 뛰어났음에도 신분이 역관이기 때문에 새삼 사람들이 그의 문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항시 그것을 슬퍼하였다. 연암이 우상과 면식은 없으나 그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시를 보여 주면서 이 사람만은 알아줄 것이라 했는데, 연암은 희롱으로 보잘 것 없다고 했더니 그는 화를 냈다가 다시 탄식하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느냐 하며 죽었는데, 그의 나이 27세였다고 한다.
차.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제나라 사람의 말에 “열녀는 지아비를 둘로 바꾸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경>> 용풍(용풍) 백주(柏舟)의 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에서 서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반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것이랴” 작품의 첫 구절 이다. 예전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이의 벼슬길을 막아서니 그 부모가 까닭을 물었다. 아들이 그의 선조에 훼절한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꾸짖으며 품속에서 닳고 닳은 동전을 꺼내 보여주었다. 고독을 이기기 힘들 때마다 동전을 굴리며 참아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자는 부둥켜안고 울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며 작가는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녀라고 감탄하고, 이런 이야기는 묻혀버리며 목숨을 끊은 뒤에야 열녀로 알려진다고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소개한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난 박씨는 정혼한 뒤 남편 될 사람이 중병에 든 것을 알았으나 물리치지 않고 시집을 갔다. 남편은 성혼한 뒤 반년 만에 죽었으니 초례를 치렀으나 빈 옷만 지킨 셈이었다. 박씨는 남편의 초상을 예법대로 치르고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다가 삼년상을 다 치르고서 같은 날 목숨을 끊었다. 작가는 박씨가 젊은 과부로서 오래 이 세상에 머문다면 친척들의 연민을 받고 또 이웃사람 들의 망령된 생각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상기(상기)가 끝날 때를 기다려 지아비가 죽은 그 시각에 죽음으로써 그 처음의 뜻을 이룬 점을 크게 기리고 있다.
3) 시대적 배경
연암이 살던 18세기 전후하여 조선후기의 사회는 극심한 갈등으로 번민하면서 소리 없이 요동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잃은 것은 삶과 삶에 대한 윤리, 그리고 행복이었고, 얻은 것은 비참과 자아 각성이었다. 상감마마는 왜국이 쳐들어온다하여 압록강 쪽으로 도망가고 그 뒤를 좇아 삼공육경 등 절대 권력자들이 백성을 등지고 함께 도망갔다. 결국 짓눌려 지배 받던 백성들이 7년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행주산성, 평양성 진주남강에서 왜병을 무찔러 나라를 지켜내고 보니 백성들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식이 싹트지 않을 수 없었다.
병자호란의 시련과 삼정의 폐단은 이 무렵의 실학파들에게 그 해결 방법을 생각게 했고 그 결과 다산 정약용의 경세치용, 연암 박지원의 이용후생,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로 표현
아. 김신선전(金神仙傳)
김신선의 속명 홍기(弘基)로 16세에 장가들어 단 한번 아내를 가까이 해서 아들을 낳았으며 화식(火食)을 끊고 벽을 향해 정좌한지 두어 해 만에 별안간 몸이 가벼워졌으며 그 뒤 각지의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다. 하루에 수 백리를 걸었으나 5년에 한번 신을 갈아 신었고 함한 곳에 다다르면 더욱 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아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으며, 겨울에 속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 남들은 그런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 키는 7척이 넘었으며, 여윈 얼굴에 수염이 길었고 눈동자는 푸르며 귀는 길고 누른빛이 났다. 술은 한 잔에도 취하지만 한 말을 마시고도 더 취하지는 않았고 남이 이야기하면 앉아서 졸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빙긋이 웃으며, 조용하기는 참선하는 것 같고, 졸(拙)하기는 수절과부와 같았다. 어떤 이는 김홍기의 나이가 백여 살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쉰 남짓 되었다고도 하며 지리산에 약을 캐러 가서 돌아오지 않은지가 수십 년 이라고도 하고 어두운 바위 구멍 속에 살고 있다고도 했다. 그 무렵 박지원은 마침 마음에 우울병이 있었는데 김신선의 방기(方技)가 기이한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 보고자 윤생과 신생을 시켜 몰래 탐문해 보았으나 열흘이 지나도 찾지 못하였다. 윤생은 김 홍기가 서학동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갔으나 그는 사촌 집에 처자를 남겨둔 채 떠나고 없었다. 그 아들에게서 홍기가 술, 노래, 바둑, 거문고, 꽃, 책, 고검(古劒 )따위를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서 놀고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았으나 아무데도 없었으며 창동을 거쳐 임동지의 집에까지 찾아갔으나 아침에 강릉을 떠나갔다는 말만 듣는다. 다시 복(福)을 시켜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 이듬해 박지원이 관동으로 유람 가는 길에 단발령을 넘으면서 남여를 메고 가는 어떤 스님으로부터 \"선암에서 벽곡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또한 그날 밤 장안사에 승녀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여러 날을 지체하여 선암에 올랐을 때에는 탑 위에 동불(銅佛)과 신발 두 짝이 있을 뿐 이었다.
자. 우상전(虞裳傳)
일본 관백이 새로 취임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기예(技藝)와 문사(文士)를 모아 달련을 시킨 후 우리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에서는 사신 일행을 엄선하여 보냈다. 일본 사람들은 서화(書畵)와 사장(詞章)을 좋아하여 그것을 우리 사신 일행에게 얻기 위해 중보(重寶)를 아끼지 않았다. 우상은 역관의 자격으로 수행하였으나 문장으로 격찬을 받았다. 그들은 우상에게 난제와 강운(强韻)으로 궁지에 몰아넣고자 했으나 그는 미리 지어 놓은 듯이 즉시 응대를 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우상의 문장이 이와 같이 뛰어났음에도 신분이 역관이기 때문에 새삼 사람들이 그의 문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항시 그것을 슬퍼하였다. 연암이 우상과 면식은 없으나 그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시를 보여 주면서 이 사람만은 알아줄 것이라 했는데, 연암은 희롱으로 보잘 것 없다고 했더니 그는 화를 냈다가 다시 탄식하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느냐 하며 죽었는데, 그의 나이 27세였다고 한다.
차.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제나라 사람의 말에 “열녀는 지아비를 둘로 바꾸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경>> 용풍(용풍) 백주(柏舟)의 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정직에서 서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반백성과 무지한 평민들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것이랴” 작품의 첫 구절 이다. 예전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이의 벼슬길을 막아서니 그 부모가 까닭을 물었다. 아들이 그의 선조에 훼절한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꾸짖으며 품속에서 닳고 닳은 동전을 꺼내 보여주었다. 고독을 이기기 힘들 때마다 동전을 굴리며 참아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자는 부둥켜안고 울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며 작가는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녀라고 감탄하고, 이런 이야기는 묻혀버리며 목숨을 끊은 뒤에야 열녀로 알려진다고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소개한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난 박씨는 정혼한 뒤 남편 될 사람이 중병에 든 것을 알았으나 물리치지 않고 시집을 갔다. 남편은 성혼한 뒤 반년 만에 죽었으니 초례를 치렀으나 빈 옷만 지킨 셈이었다. 박씨는 남편의 초상을 예법대로 치르고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다가 삼년상을 다 치르고서 같은 날 목숨을 끊었다. 작가는 박씨가 젊은 과부로서 오래 이 세상에 머문다면 친척들의 연민을 받고 또 이웃사람 들의 망령된 생각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상기(상기)가 끝날 때를 기다려 지아비가 죽은 그 시각에 죽음으로써 그 처음의 뜻을 이룬 점을 크게 기리고 있다.
3) 시대적 배경
연암이 살던 18세기 전후하여 조선후기의 사회는 극심한 갈등으로 번민하면서 소리 없이 요동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잃은 것은 삶과 삶에 대한 윤리, 그리고 행복이었고, 얻은 것은 비참과 자아 각성이었다. 상감마마는 왜국이 쳐들어온다하여 압록강 쪽으로 도망가고 그 뒤를 좇아 삼공육경 등 절대 권력자들이 백성을 등지고 함께 도망갔다. 결국 짓눌려 지배 받던 백성들이 7년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행주산성, 평양성 진주남강에서 왜병을 무찔러 나라를 지켜내고 보니 백성들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식이 싹트지 않을 수 없었다.
병자호란의 시련과 삼정의 폐단은 이 무렵의 실학파들에게 그 해결 방법을 생각게 했고 그 결과 다산 정약용의 경세치용, 연암 박지원의 이용후생,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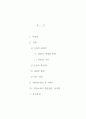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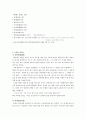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