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동엽의 삶과 문학세계
2. 신동엽 시 세계의 특징
3. 대표 작품의 분석 및 감상
4. 한반도 아픔에 대한 천착과 미래의지
5. 민중에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6. 신동엽의 시정신
2. 신동엽 시 세계의 특징
3. 대표 작품의 분석 및 감상
4. 한반도 아픔에 대한 천착과 미래의지
5. 민중에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6. 신동엽의 시정신
본문내용
항적 요소를 강렬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주체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층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지에 밀착된 발바닥, 즉 하층구조를 통해서 파악하는데 이 하층구조가 <조국>이라고까지 말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주체성 파악으로서 비주체인 상층구조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있으며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도 발바닥인 하층구조이다. 그러므로 [논밭 위에 세워 놓은 基地]를 발바닥으로 비벼끄는 것이며, 끄다가 발이 부러져도 그것은 <사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민중의 끈질긴 생명의 영원성을 강조한다. 부러져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절름거리면서 일어서는 정신이야말로 패배 할 줄 모르는 민중의 의지이며,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구제되지 않는 한 <발>은 언제까지나 끊임없는 자비인욕의 경지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직 <뚜벅뚜벅>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데,
너구리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를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십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마구 겨눠 있던
땡크들이 일백 팔십도로 뒤로 돌데
하더니 눈 깜박할 사이
물방게처럼
한 떼는 서귀포 밖
한 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는 향해
총칼을 내던져 버리데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오든 쇠붙이는 말끔히 씨겨가고
사랑뜨는 반도,
황금 이삭 타작하는 순이네 마을 돌이네 마을마다
높이높이 합창하는 분수는
나부끼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5-8연
꿈속의 환상을 통한 의지의 진술이지만, 이것은 환상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강렬한 인간 염원의 접근에 성공하여 [너구리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들]이 한 덩어리가 된 생명의 적나라한 세계는 인위적인 모든 장벽이 무너뜨려진 평화한 땅에 펼쳐진 한정된 완충지대는 [서귀포]에서[백두산]까지 확산되어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완전한 중립지대가 된다. 전쟁이 없는, 모든 이질적 요소가 없는 오로지 순수한 생명력만이 넘쳐나는 장소를 그리워하며 그 상상도를 한반도에 그려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완충지대]나[중립지대]를 국제정치학적인 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 하면 이 시의 진가는 망가지고 만다. 신화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인간의 염원에 밀착되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껍데기는 가라.
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中立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漢拏에서 白頭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전편
아사달과 아사녀로 비유되는 밝음, 원초, 희망, 주체성, 생명감,[그곳까지 내논] 순수 알맹이들의 동질성,<쇠붙이>로 비유되는 비동질성 및 외세의 횡포,<중립.으로 상징되는 인간 주체성의 발언 등은 모든 현실 속에서의 비리를 점검하고 극복하고 청산한 자의 냉철한 이성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외침인 것이다. 민족주체, 인간본질을 향한 무한한 애착은 <중립>이라는 것으로 나아간다. 어떤 이는 <중립>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윗글
모든 사물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고 근원을 뜻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펼쳐져 나아가려는 긴장된 현장확보의 응집의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모든 사물의 핵을 뜻하기도 하고 정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 뜻은 영원한 생명과 민중의 힘을 뜻하는 것으로 되며 그러므로 이 시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 앞에 서서 [가라][가라]고 외치고 있는 팽팽한 시인의 의지는 만만찮은 상상의 힘을 빌어 계속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공감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 주체성의 순수한 외침은 한반도 가득히 울려 퍼지면서 [맞절할]날을 기대하고 있다. 조금도 이일을 포기 할 줄 모르는 줄기찬 시인의 의지는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느끼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되나 쑥덕거렸다.봄은 自殺했다커니
봄은 장사지내 버렸다커니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새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뒷동산 바위밑에,마을 앞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집 울타리 밑에서
몇 날밤 우리를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와서
몸 단장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봄의 消息] 4-5연
이처럼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시이만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미래를 바라보는 밝은 신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사녀] 이후의 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반도 상황점검으로부터 그 밝고 생명력 있는 미래를 그리는 노력으로 가득차 있다.
5. 민중에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60년대에 가장 긴 시이고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준 시가 바로 [錦江]이다.
신동엽의 금강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취급한다. 신씨는 그의 시를 통하여 일정한 사실의 상상적인 이해를 꾀하고 다시 과거의 이해를 통하여 현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 한다. 연민은 분노로 이어진다. 연민을 느끼는데 주저하지 않고 연민의 근원을 생각하고 연민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를 폭발시킨다. 연민의 충동은 한쪽으로는 불의의 제거를 위한 노력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케 하려는 복원 작용으로 이어진다. 오늘에 대한 시인의 격렬한 감정 속으로 역사의 사실이 녹아들오올 때 역사의 사실 그 자체도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된다.>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창작과 비평> 통권 9호 1968년 봄
라는 평가와 더불어
서사시라는 한정사를 붙이고 있지만 니 시는 한편의 서정시이다. 전봉준에 관한 사사로운 표현이 소도구로 전락하는 비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윗글
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듣기도 한다. 하나 여기에서의 논점은 이 시가 잘된 문학작품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가의 의식의 큰 줄기를 잡고자 한다.
우리들은 하늘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짱을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데,
너구리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를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십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마구 겨눠 있던
땡크들이 일백 팔십도로 뒤로 돌데
하더니 눈 깜박할 사이
물방게처럼
한 떼는 서귀포 밖
한 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는 향해
총칼을 내던져 버리데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오든 쇠붙이는 말끔히 씨겨가고
사랑뜨는 반도,
황금 이삭 타작하는 순이네 마을 돌이네 마을마다
높이높이 합창하는 분수는
나부끼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5-8연
꿈속의 환상을 통한 의지의 진술이지만, 이것은 환상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강렬한 인간 염원의 접근에 성공하여 [너구리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들]이 한 덩어리가 된 생명의 적나라한 세계는 인위적인 모든 장벽이 무너뜨려진 평화한 땅에 펼쳐진 한정된 완충지대는 [서귀포]에서[백두산]까지 확산되어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완전한 중립지대가 된다. 전쟁이 없는, 모든 이질적 요소가 없는 오로지 순수한 생명력만이 넘쳐나는 장소를 그리워하며 그 상상도를 한반도에 그려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완충지대]나[중립지대]를 국제정치학적인 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 하면 이 시의 진가는 망가지고 만다. 신화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인간의 염원에 밀착되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껍데기는 가라.
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中立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漢拏에서 白頭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전편
아사달과 아사녀로 비유되는 밝음, 원초, 희망, 주체성, 생명감,[그곳까지 내논] 순수 알맹이들의 동질성,<쇠붙이>로 비유되는 비동질성 및 외세의 횡포,<중립.으로 상징되는 인간 주체성의 발언 등은 모든 현실 속에서의 비리를 점검하고 극복하고 청산한 자의 냉철한 이성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외침인 것이다. 민족주체, 인간본질을 향한 무한한 애착은 <중립>이라는 것으로 나아간다. 어떤 이는 <중립>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윗글
모든 사물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고 근원을 뜻하기도 하고 사방으로 펼쳐져 나아가려는 긴장된 현장확보의 응집의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모든 사물의 핵을 뜻하기도 하고 정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 뜻은 영원한 생명과 민중의 힘을 뜻하는 것으로 되며 그러므로 이 시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 앞에 서서 [가라][가라]고 외치고 있는 팽팽한 시인의 의지는 만만찮은 상상의 힘을 빌어 계속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공감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 주체성의 순수한 외침은 한반도 가득히 울려 퍼지면서 [맞절할]날을 기대하고 있다. 조금도 이일을 포기 할 줄 모르는 줄기찬 시인의 의지는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느끼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되나 쑥덕거렸다.봄은 自殺했다커니
봄은 장사지내 버렸다커니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새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뒷동산 바위밑에,마을 앞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집 울타리 밑에서
몇 날밤 우리를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와서
몸 단장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봄의 消息] 4-5연
이처럼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시이만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미래를 바라보는 밝은 신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사녀] 이후의 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반도 상황점검으로부터 그 밝고 생명력 있는 미래를 그리는 노력으로 가득차 있다.
5. 민중에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60년대에 가장 긴 시이고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준 시가 바로 [錦江]이다.
신동엽의 금강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취급한다. 신씨는 그의 시를 통하여 일정한 사실의 상상적인 이해를 꾀하고 다시 과거의 이해를 통하여 현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 한다. 연민은 분노로 이어진다. 연민을 느끼는데 주저하지 않고 연민의 근원을 생각하고 연민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를 폭발시킨다. 연민의 충동은 한쪽으로는 불의의 제거를 위한 노력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케 하려는 복원 작용으로 이어진다. 오늘에 대한 시인의 격렬한 감정 속으로 역사의 사실이 녹아들오올 때 역사의 사실 그 자체도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된다.>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창작과 비평> 통권 9호 1968년 봄
라는 평가와 더불어
서사시라는 한정사를 붙이고 있지만 니 시는 한편의 서정시이다. 전봉준에 관한 사사로운 표현이 소도구로 전락하는 비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윗글
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듣기도 한다. 하나 여기에서의 논점은 이 시가 잘된 문학작품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가의 의식의 큰 줄기를 잡고자 한다.
우리들은 하늘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짱을
추천자료
 21세기의 가족복지와 삶의 질
21세기의 가족복지와 삶의 질 가슴뛰는 삶을 살아라
가슴뛰는 삶을 살아라 지식경영과 내 삶의 적용
지식경영과 내 삶의 적용 박경리의 작가적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및 발표자료
박경리의 작가적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및 발표자료 창조과학과 우리 삶
창조과학과 우리 삶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 방랑하는 신경림의 삶과 문학
방랑하는 신경림의 삶과 문학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 자유시장과 복지국가사이에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 자유시장과 복지국가사이에서 이주 노동자의 삶과 꿈
이주 노동자의 삶과 꿈 시인 김광균의 삶과 시 세계
시인 김광균의 삶과 시 세계  2014년 1학기 숲과삶 중간시험과제물 A형(도시환경에서 숲의중요성, 훼손원인및보존방안)
2014년 1학기 숲과삶 중간시험과제물 A형(도시환경에서 숲의중요성, 훼손원인및보존방안) 2015년 1학기 숲과삶 중간시험과제물 A형(도시환경에서 숲의중요성, 훼손원인및보존방안)
2015년 1학기 숲과삶 중간시험과제물 A형(도시환경에서 숲의중요성, 훼손원인및보존방안) 대인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성숙한 대인관계를 위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서술하...
대인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성숙한 대인관계를 위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서술하... [숲과삶]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숲의 파괴요인 & 숲의 보전방안
[숲과삶]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숲의 파괴요인 & 숲의 보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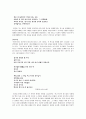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