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문
해석
해석
본문내용
성을 한씨(韓氏)로 택했다고 하는데
이가 곧 위숙 왕후(威肅王后)였다.
세조는 송악산 옛 집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했는데 그 터는 곧 연경궁 봉원전(延慶宮奉元殿) 터이다.
그때에 동리산(桐裏山)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을 배워 가지고 돌아왔는데 백두산에 올랐다가 곡령까지 와서
세조의 새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하고는 곧 가 버렸다.
부인이 마침 그 말을 듣고 세조에게 이야기하니
세조가 천방지축 급히 따라 가서 그와 만났는데 한 번 만난 후에는 단박 구면과 같이 되었다.
드디어 함께 곡령에 올라가서 산수의 내맥을 연구하며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시운을 살핀 다음 도선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땅의 지맥은 북방(壬方) 백두산 수모 목간(水母木幹)으로부터 내려와서
마두 명당(馬頭名堂)에 떨어졌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수(水)의 대수(大數)를 좇아서
六六三十六(6×6=36) 구(區)의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大數)에 부합하여
다음해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도선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만들고 그 겉에 쓰기를
“삼가 글을 받들어 백 번 절하면서 미래에 삼한을 통합할 주인 대원 군자(大原君子) 당신께 드리노라”라고 하였으니
때는 당 희종(僖宗) 건부(乾符) 3년 4월이었다.세조는 도선의 말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달부터 위숙이 태기가 있어 태조를 낳았다.
이제현(李齊賢)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관의는 말하기를 성골 장군 호경이 아간(阿干) 강충을 낳고
강충이 거사(居士) 보육을 낳았으니 보육이 곧 국조 헌덕 대왕이요
보육이 딸을 낳아 당나라 귀성(貴性)에게 시집보내 의조(懿祖)를 낳았으며
의조는 세조를 낳고 세조는 태조를 낳았다고 하였다.
만일 그의 말대로 한다면 당나라 귀성이라는 자는
의조에게 아버지요 보육은 그 의조 아버지의 장인이 되는데
보육을 국조라고 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김관의는 또 말하기를 태조가 3대의 조상들을 추존하였는데
아버지를 세조 위무 대왕으로, 어머니를 위숙 왕후로,
증조모를 정화 왕후로, 증조모의 아버지 보육을 국조 원덕 대왕으로 각각 추존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이 설은 추존에서 증조부를 생략하고 증조모의 아버지를 써넣어서 합하여 3대 조상들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에는 말하기를
국조는 태조의 증조요 정화 왕후는 국조의 왕후라고 하였다.
또 《성원록(聖源錄)》에는 말하기를 보육성인(寶育聖人)이라는 자는 원덕 대왕의 외조부라고 하였다.
이 두 설로 미루어 본다면 원덕 대왕은 곧 당나라 ‘귀성’의 아들로서
의조의 아버지가 되며 정화 왕후는 보육의 외손부로서
의조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의가 보육을 국조 원덕 대왕이라고 한 것은 오류인 것이다.”
이제현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관의의 말에는 의조가 당나라 사람인 자기 아버지가 남긴 궁시(弓矢)를 얻어 가지고 바다를 건너 멀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뜻은 대단히 간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용왕이 그의 소원을 물었을 때는 곧 동방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의조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원록》에는 흔강 대왕(昕康大王)〔즉 의조〕의 처 용녀는
평주 사람 두은점 각간(角干)의 딸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김관의의 기록과는 같지 않다.”
이제현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선은 “세조의 송악 남쪽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밭에 삼을 심었다고 말해 주었다. ‘기장’과 ‘왕’은 조선말로 비슷하기 때문에 태조는 ‘왕씨(王氏)’로 성을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자식이 혼자 성을 고치다니 천하에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더욱이 그런 일을 우리 태조가 하였다고 말하겠는가. 참 슬픈 일이다.
그리고 태조의 세조는 궁예(弓裔)를 섬겼는데 궁예는 원래 의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태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자서 왕씨로 성을 삼았다면
그것은 어찌 자기 자신이 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왕대종족기》를 보니 거기에는 국조의 성은 왕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태조 때에 와서 비로소 왕씨로 성을 삼은 것은 아니다.
소위 기장을 심었다는 설이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김관의는 또 말하기를 “의조와 세조의 이름 아랫자는 태조의 이름과 같다고 하였다.
그것은 개국 이전에는 풍속이 순박한 것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혹 그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김관의가 생각하고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의조로 말하면 육예에 정통하고 특히 글씨와 궁술은 한 때에 으뜸가는 사람이었으며 세조는 어렸을 때부터 큰 배포를 가지고
삼한에 차지할 뜻을 품고 있던 그러한 인물인데
어찌 자기 조부와 아버지의 이름에 저촉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삼았겠으며
또 그것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으로 정하였겠는가?
하물며 태조로 말하면 왕업을 창시하여 자손에게 전하고 모든 것에 옛날 왕들의 좋은 모범을 따랐는데
어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여 예법이 아닌 이름에 무관심하고 있었겠는가.
내 생각에는 신라 때에는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 하고
그 신하를 아간(阿干), 대아간(大阿干)이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시골 백성들까지도 대개 간(干)을 그 이름 밑에 붙여서 붙렀으니
“간”이라는 것은 대체로 존경어인 것이다.
그런데 아간은 또 아찬(阿粲) 혹은 알찬(閼餐)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간(干)”, “찬(粲)”, “찬(餐)” 세 자의 음이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의조, 세조의 이름 아랫자(건=建)가 역시 “간(干)”, “찬(粲)”, “찬(餐)”의 음과 가깝다는 것은
원래 존경어를 그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른 것이 와전된 것이요 원이름은 아닌 것이다.
태조가 마치 이 자(建)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호사가들이 견강부회해서 말하기를
3대가 같은 이름을 지으면 반드시 삼한의 왕이 된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믿을 바 못된다
이가 곧 위숙 왕후(威肅王后)였다.
세조는 송악산 옛 집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했는데 그 터는 곧 연경궁 봉원전(延慶宮奉元殿) 터이다.
그때에 동리산(桐裏山)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을 배워 가지고 돌아왔는데 백두산에 올랐다가 곡령까지 와서
세조의 새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하고는 곧 가 버렸다.
부인이 마침 그 말을 듣고 세조에게 이야기하니
세조가 천방지축 급히 따라 가서 그와 만났는데 한 번 만난 후에는 단박 구면과 같이 되었다.
드디어 함께 곡령에 올라가서 산수의 내맥을 연구하며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시운을 살핀 다음 도선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땅의 지맥은 북방(壬方) 백두산 수모 목간(水母木幹)으로부터 내려와서
마두 명당(馬頭名堂)에 떨어졌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수(水)의 대수(大數)를 좇아서
六六三十六(6×6=36) 구(區)의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大數)에 부합하여
다음해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도선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만들고 그 겉에 쓰기를
“삼가 글을 받들어 백 번 절하면서 미래에 삼한을 통합할 주인 대원 군자(大原君子) 당신께 드리노라”라고 하였으니
때는 당 희종(僖宗) 건부(乾符) 3년 4월이었다.세조는 도선의 말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달부터 위숙이 태기가 있어 태조를 낳았다.
이제현(李齊賢)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관의는 말하기를 성골 장군 호경이 아간(阿干) 강충을 낳고
강충이 거사(居士) 보육을 낳았으니 보육이 곧 국조 헌덕 대왕이요
보육이 딸을 낳아 당나라 귀성(貴性)에게 시집보내 의조(懿祖)를 낳았으며
의조는 세조를 낳고 세조는 태조를 낳았다고 하였다.
만일 그의 말대로 한다면 당나라 귀성이라는 자는
의조에게 아버지요 보육은 그 의조 아버지의 장인이 되는데
보육을 국조라고 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김관의는 또 말하기를 태조가 3대의 조상들을 추존하였는데
아버지를 세조 위무 대왕으로, 어머니를 위숙 왕후로,
증조모를 정화 왕후로, 증조모의 아버지 보육을 국조 원덕 대왕으로 각각 추존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이 설은 추존에서 증조부를 생략하고 증조모의 아버지를 써넣어서 합하여 3대 조상들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에는 말하기를
국조는 태조의 증조요 정화 왕후는 국조의 왕후라고 하였다.
또 《성원록(聖源錄)》에는 말하기를 보육성인(寶育聖人)이라는 자는 원덕 대왕의 외조부라고 하였다.
이 두 설로 미루어 본다면 원덕 대왕은 곧 당나라 ‘귀성’의 아들로서
의조의 아버지가 되며 정화 왕후는 보육의 외손부로서
의조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의가 보육을 국조 원덕 대왕이라고 한 것은 오류인 것이다.”
이제현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관의의 말에는 의조가 당나라 사람인 자기 아버지가 남긴 궁시(弓矢)를 얻어 가지고 바다를 건너 멀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뜻은 대단히 간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용왕이 그의 소원을 물었을 때는 곧 동방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의조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원록》에는 흔강 대왕(昕康大王)〔즉 의조〕의 처 용녀는
평주 사람 두은점 각간(角干)의 딸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김관의의 기록과는 같지 않다.”
이제현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선은 “세조의 송악 남쪽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밭에 삼을 심었다고 말해 주었다. ‘기장’과 ‘왕’은 조선말로 비슷하기 때문에 태조는 ‘왕씨(王氏)’로 성을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자식이 혼자 성을 고치다니 천하에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더욱이 그런 일을 우리 태조가 하였다고 말하겠는가. 참 슬픈 일이다.
그리고 태조의 세조는 궁예(弓裔)를 섬겼는데 궁예는 원래 의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태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자서 왕씨로 성을 삼았다면
그것은 어찌 자기 자신이 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왕대종족기》를 보니 거기에는 국조의 성은 왕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태조 때에 와서 비로소 왕씨로 성을 삼은 것은 아니다.
소위 기장을 심었다는 설이 또한 거짓이 아니겠는가.
김관의는 또 말하기를 “의조와 세조의 이름 아랫자는 태조의 이름과 같다고 하였다.
그것은 개국 이전에는 풍속이 순박한 것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혹 그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김관의가 생각하고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의조로 말하면 육예에 정통하고 특히 글씨와 궁술은 한 때에 으뜸가는 사람이었으며 세조는 어렸을 때부터 큰 배포를 가지고
삼한에 차지할 뜻을 품고 있던 그러한 인물인데
어찌 자기 조부와 아버지의 이름에 저촉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삼았겠으며
또 그것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으로 정하였겠는가?
하물며 태조로 말하면 왕업을 창시하여 자손에게 전하고 모든 것에 옛날 왕들의 좋은 모범을 따랐는데
어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여 예법이 아닌 이름에 무관심하고 있었겠는가.
내 생각에는 신라 때에는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 하고
그 신하를 아간(阿干), 대아간(大阿干)이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시골 백성들까지도 대개 간(干)을 그 이름 밑에 붙여서 붙렀으니
“간”이라는 것은 대체로 존경어인 것이다.
그런데 아간은 또 아찬(阿粲) 혹은 알찬(閼餐)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간(干)”, “찬(粲)”, “찬(餐)” 세 자의 음이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의조, 세조의 이름 아랫자(건=建)가 역시 “간(干)”, “찬(粲)”, “찬(餐)”의 음과 가깝다는 것은
원래 존경어를 그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른 것이 와전된 것이요 원이름은 아닌 것이다.
태조가 마치 이 자(建)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호사가들이 견강부회해서 말하기를
3대가 같은 이름을 지으면 반드시 삼한의 왕이 된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믿을 바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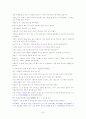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