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 속에 펼쳐진 하늘
2. 산, 시 속에서 우뚝 솟은 그 넉넉함
3. 시 속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4. 바닷가에 시를 널어 말리노라면,
5. 시 속에서 떠도는 바람과 구름, 흩날리는 눈과 비
Ⅲ. 소감
Ⅳ. 인용 시 전문보기
Ⅱ. 본론
1. 시 속에 펼쳐진 하늘
2. 산, 시 속에서 우뚝 솟은 그 넉넉함
3. 시 속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4. 바닷가에 시를 널어 말리노라면,
5. 시 속에서 떠도는 바람과 구름, 흩날리는 눈과 비
Ⅲ. 소감
Ⅳ. 인용 시 전문보기
본문내용
마음들아
툭 털고 일어서자 바닥 네 집이라
우리들 사슬 벗은 넋이로다 풀어놓인 겨레로다
기슴엔 잔뜩 별을 안으렴아
손에 잡히는 엄마별 아가별
머리엔 끄득 보배를 이고 오렴
별아래 좍 깔린 산호요 진주라
바다로 가자 우리 큰 바다로 가자
- 김영랑, <바다로 가자> -
김영랑은 지방 사투리를 포함해 우리말의 조탁에 있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던 서정시인이다. 그러나 어지러운 해방공간에서는 <바다로 가자> 같은 격정적인 시를 쓴다. 이 시에서 영랑은 우리민족이 일제 시대에 겪었던 수난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 광복의 감격도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분출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바다는 아마 광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1940년대는 이데올로기 대립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바다는 북이냐 남이냐의 망설이게 하는 바다, 또는 광복을 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1950년대
포로를 이송한 화물선도 이 길로 갔다.
비린내 풍기며 비 내리는 밤에
탈옥수를 실은 밀선도 이리 갔다.
침략과 같은 기억을 뒤로 가는 것,
사랑의 추억은 앞에서 오는 것,
포옹하고 흐느끼는-, 선과 악이여.
위도를 가로지른 뱃머리의 각도 너머로
그리움이 둥그렇게 돌아가고,
하늘 가까이 또 하루가 물결을 이룬다.
-고원, <파도에 부쳐서> 中 -
이 시는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간 시점에 씌어진 시이다. 바다는 ‘포로를 이송한 화물선’ 이 지나간 바닷길, 그리고 ‘탈옥수를 실은 밀선’이 지나간 바닷길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바다에 대한 의미부여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고난과 시련, 노동,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바다, 어두운 역사, 힘든 생활 터전, 무역항로, 동경의 바다 등.. 1920년대에서 1950년대의 바다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관념의 바다에서 구체성의 바다로, 미지의 바다에서 현실의 바다로, 동경의 바다에서 비극의 바다로 그 의미가 바뀌어 왔다고 본다.
5. 시 속에서 떠도는 바람과 구름, 흩날리는 눈과 비
가. 시 속에서 드리워진 자연의 모습
중국 도교 철학에서 볼 때 자연의 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를 자연이라고 말한다. 도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각 자연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이 의도하는 대로 되기 위해 완전히 무작위적인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쓴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극히 단순하며,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자연은 끊임없이 세상을 생성·소멸시킨다. 그러나 우주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인간은 자연의 힘에 합치되도록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변화하는 주변의 세계를 인지하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과 투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연의 뜻이 이토록 고차원 적이다. 평범한 오감을 훨씬 뛰어넘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접근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시와 자연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시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자 본질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시와 자연‘ 의 다섯 번째 테마는 앞의 테마들에 이어서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 특히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들인 구름. 바람. 비. 눈. 등과 관련하여 이 현상들이 각 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중심 소재로 쓰인 경우와 단순 소재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며 한 시 내에서 어떤 의미 변화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살펴보기
1) 구름
그대로의 그리움이
갈매기로 하여금
구름이 되게 하였다.
기꺼운 듯
푸른 바다의 이름으로
흰 날개를 하늘에 묻어보내어
이제 파도도
빛나는 가슴도
구름을 따라 먼 나라로 흘렀다.
그리하여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날아오르는 자랑이었다.
아름다운 마음이었다.
- 천상병, <갈매기...> -
이 시에서 구름이란 시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작가에 대한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의 작가 천상병 시인은 가난과 무직, 방탕함 그리고 주벽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고, 우주의 근원,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압축한 시를 썼다. 천상병 시인은 주벽이나 괴이한 행동으로 우리 시사에서 매우 이단적인 사람처럼 그려지기도 하지만, 시인이라는 세속적 명리를 떨쳐 버리고 온몸으로 자신의 시를 지킨, 진정한 의미의 순수 시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가난이 내 직업\' 이라고 썼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 수 밖에 없던 그에게 가난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 운명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평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가난에 대해서 소리쳐 주장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달관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이 시인의 미덕이라고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천상병의 시는 맑고 투명한 시 정신을 유지하면서 삶에 대한 무욕과 무사심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위의 갈매기란 시에서 1연을 보면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화 하는 도구로 구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구름은 그리움의 시각화 됨이고 구름의 이미지 특성상 작가의 그리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하게끔 만든다. 3연에서 보면 ‘이제 파도도 빛나는 가슴도 구름을 따라 먼 나라로 흘렀다’에서 볼 수 있드시 구름은 앞서 그리움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 구름은 ‘아름다운 마음’ 이 되고, 한 시 속에서도 구름의 의미 변화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존재 하면서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천상병 시인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천상병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선지 그의 시에는 이처럼 현실적 감각에서는 조금 벗어난 시각에서 삶의 부분을 초탈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작가의 시적 세계관에서 드러나는, 또 사용되는 시어들의 느낌 역시 다분히 떠돌고, 인생에 경지에 오른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이 시에서도 구름이라는 소재가, 천상병 시인만의 독특한 시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그 특유의 생명을 가지게
툭 털고 일어서자 바닥 네 집이라
우리들 사슬 벗은 넋이로다 풀어놓인 겨레로다
기슴엔 잔뜩 별을 안으렴아
손에 잡히는 엄마별 아가별
머리엔 끄득 보배를 이고 오렴
별아래 좍 깔린 산호요 진주라
바다로 가자 우리 큰 바다로 가자
- 김영랑, <바다로 가자> -
김영랑은 지방 사투리를 포함해 우리말의 조탁에 있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던 서정시인이다. 그러나 어지러운 해방공간에서는 <바다로 가자> 같은 격정적인 시를 쓴다. 이 시에서 영랑은 우리민족이 일제 시대에 겪었던 수난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 광복의 감격도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분출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바다는 아마 광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1940년대는 이데올로기 대립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바다는 북이냐 남이냐의 망설이게 하는 바다, 또는 광복을 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1950년대
포로를 이송한 화물선도 이 길로 갔다.
비린내 풍기며 비 내리는 밤에
탈옥수를 실은 밀선도 이리 갔다.
침략과 같은 기억을 뒤로 가는 것,
사랑의 추억은 앞에서 오는 것,
포옹하고 흐느끼는-, 선과 악이여.
위도를 가로지른 뱃머리의 각도 너머로
그리움이 둥그렇게 돌아가고,
하늘 가까이 또 하루가 물결을 이룬다.
-고원, <파도에 부쳐서> 中 -
이 시는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간 시점에 씌어진 시이다. 바다는 ‘포로를 이송한 화물선’ 이 지나간 바닷길, 그리고 ‘탈옥수를 실은 밀선’이 지나간 바닷길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바다에 대한 의미부여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고난과 시련, 노동,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바다, 어두운 역사, 힘든 생활 터전, 무역항로, 동경의 바다 등.. 1920년대에서 1950년대의 바다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관념의 바다에서 구체성의 바다로, 미지의 바다에서 현실의 바다로, 동경의 바다에서 비극의 바다로 그 의미가 바뀌어 왔다고 본다.
5. 시 속에서 떠도는 바람과 구름, 흩날리는 눈과 비
가. 시 속에서 드리워진 자연의 모습
중국 도교 철학에서 볼 때 자연의 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를 자연이라고 말한다. 도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각 자연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이 의도하는 대로 되기 위해 완전히 무작위적인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쓴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극히 단순하며,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자연은 끊임없이 세상을 생성·소멸시킨다. 그러나 우주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인간은 자연의 힘에 합치되도록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변화하는 주변의 세계를 인지하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과 투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연의 뜻이 이토록 고차원 적이다. 평범한 오감을 훨씬 뛰어넘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접근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시와 자연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시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자 본질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시와 자연‘ 의 다섯 번째 테마는 앞의 테마들에 이어서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 특히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들인 구름. 바람. 비. 눈. 등과 관련하여 이 현상들이 각 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중심 소재로 쓰인 경우와 단순 소재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며 한 시 내에서 어떤 의미 변화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살펴보기
1) 구름
그대로의 그리움이
갈매기로 하여금
구름이 되게 하였다.
기꺼운 듯
푸른 바다의 이름으로
흰 날개를 하늘에 묻어보내어
이제 파도도
빛나는 가슴도
구름을 따라 먼 나라로 흘렀다.
그리하여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날아오르는 자랑이었다.
아름다운 마음이었다.
- 천상병, <갈매기...> -
이 시에서 구름이란 시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작가에 대한 조금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의 작가 천상병 시인은 가난과 무직, 방탕함 그리고 주벽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고, 우주의 근원,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압축한 시를 썼다. 천상병 시인은 주벽이나 괴이한 행동으로 우리 시사에서 매우 이단적인 사람처럼 그려지기도 하지만, 시인이라는 세속적 명리를 떨쳐 버리고 온몸으로 자신의 시를 지킨, 진정한 의미의 순수 시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가난이 내 직업\' 이라고 썼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 수 밖에 없던 그에게 가난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 운명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평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가난에 대해서 소리쳐 주장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달관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이 시인의 미덕이라고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천상병의 시는 맑고 투명한 시 정신을 유지하면서 삶에 대한 무욕과 무사심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위의 갈매기란 시에서 1연을 보면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화 하는 도구로 구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구름은 그리움의 시각화 됨이고 구름의 이미지 특성상 작가의 그리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하게끔 만든다. 3연에서 보면 ‘이제 파도도 빛나는 가슴도 구름을 따라 먼 나라로 흘렀다’에서 볼 수 있드시 구름은 앞서 그리움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 구름은 ‘아름다운 마음’ 이 되고, 한 시 속에서도 구름의 의미 변화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존재 하면서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천상병 시인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천상병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선지 그의 시에는 이처럼 현실적 감각에서는 조금 벗어난 시각에서 삶의 부분을 초탈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작가의 시적 세계관에서 드러나는, 또 사용되는 시어들의 느낌 역시 다분히 떠돌고, 인생에 경지에 오른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이 시에서도 구름이라는 소재가, 천상병 시인만의 독특한 시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그 특유의 생명을 가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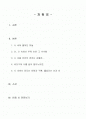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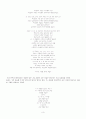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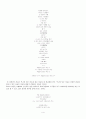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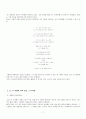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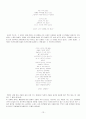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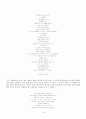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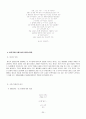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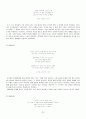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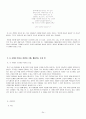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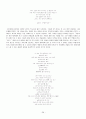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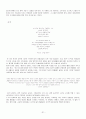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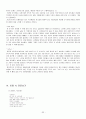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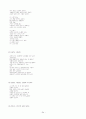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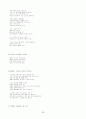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