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법가사상
① 법가 [法家]
☺ 법가사상이 생겨난 배경
☺동양의 법가정치사상
② 한비자의 법가 사상
☺ 각 편장들의 소개
③ 법가 사상의 대표적 인물
☺ 춘추시대의 대표적 인물
☺ 전국시대의 대표적 인물
④ 법가사상의 의의
2.진시황제의 정치사상
➀ 진의 건국
➁ 진시황제, 그는 누구인가?
2)진시황의 초기 생애
3)진제국의 통일 과정
③진시황의 정치사상
1) 최초의 황제 칭호
2)시황제의 통일 작업
3)분서갱유와 폭정, 대토목공사
4)불로장생의 꿈
5)전국 순행
6)진시황릉과 병마용갱
④황제의 최후
1.법가사상
① 법가 [法家]
☺ 법가사상이 생겨난 배경
☺동양의 법가정치사상
② 한비자의 법가 사상
☺ 각 편장들의 소개
③ 법가 사상의 대표적 인물
☺ 춘추시대의 대표적 인물
☺ 전국시대의 대표적 인물
④ 법가사상의 의의
2.진시황제의 정치사상
➀ 진의 건국
➁ 진시황제, 그는 누구인가?
2)진시황의 초기 생애
3)진제국의 통일 과정
③진시황의 정치사상
1) 최초의 황제 칭호
2)시황제의 통일 작업
3)분서갱유와 폭정, 대토목공사
4)불로장생의 꿈
5)전국 순행
6)진시황릉과 병마용갱
④황제의 최후
본문내용
대 단편소설로서의 측면도 지닌다.
4.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대(漢代)까지의 한비 후학(後學)들의 정론(政論)으로 추정되는 제편(諸編). 편수(編數)는 가장 많으며 그 중 <유도(有度)> <이병(二柄)> <팔간(八姦)> 등은 오래된 것이고, <심도(心度)> <제분(制分)> 등은 새로운 설이다. 후학들의 주장에서 한비의 사상은 현저하게 조직화되었고, 특히 군신통어(群臣統御:刑名參同)나 법의 운용(運用:法術)에 관한 술책이 세밀하게 고찰되었다. 그러나 군권강화(君權强化)와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점만이 농후하고, 법의 최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5. 도가(道家)의 영향을 받은 한비 후학들의 논저인 <주도(主道)> <양각(揚)> <해로(解老)> <유로(喩老)> 등의 4편. 유가의 덕치를 부정하고 법치를 제창한 법가는, 덕치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도가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육반(六反)> <충효> 등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나타낸다. 그러나 군주는 공평무사를 본지(本旨)로 하여 신하(臣下)에 대하여는 인간적 약점을 보이지 않는 심술(心術)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법가 중에도 도가의 허정(虛靜)의 설을 도입한 일파가 있다. 위의 4편은 이들 일파의 논저로서, 전(前) 편은 정론(政論)이고, 후 2편은 편명 그대로 《노자(老子)》의 주석(注釋) 또는 해설편이다.
6. 한비 학파 이외의 논저인 <초견진(初見秦)> <존한(存韓)> 등 2편 모두 한비의 사적(事蹟)에 결부시켜 책 첫머리에 편입되어 있으나 전자는 유세가의 작품이고, 후자는 한비의 작품을 모방한 상주문(上奏文)이 포함된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한비와 그 학파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편견적인 인간관 위에 성립된 것으로 지적되며, 특히 유가로부터는 애정을 무시하는 냉혹하고도 잔인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확실히 급소를 찌르는 적평(適評)이라 하겠으나, 그들이 유가·법가·명가(名家)·도가 등의 설을 집대성하여, 법을 독립된 고찰대상으로 삼고 일종의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진 ·한의 법형제도(法刑制度)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점, 또 감상(感傷)을 뿌리친 그들의 간결한 산문이나 인간의 이면을 그린 설화가 고대문학의 한 전형을 이룬 점에 있어 커다란 문화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간행본이 있으나 절강서국(浙江書局)의 22자본(子本)이 좋은 간본이라고 한다.
각 편장들의 소개
1. 초진견初秦見. 한비가 진왕에게 상주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지만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의 저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존한存韓. 한의 보존을 위해 진왕에게 상주한 글이다. 역시 한비의 저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3. 난언難言. 역시 군주에게 올리는 상주문이며, 설득의 어려움을 군주에게 알리는 형식이다.
4. 애신愛臣. \'총애받는 신하\'라는 머리글자를 딴 편이다. 신료를 통제하고 군주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명확한 관계를 세워야 함을 역설한다.
5. 주도主道. \'군주의 길\'. 《노자》와 흡사한 운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무위의 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담고 있다. 《노자》에 대한 독후감인 편장과 더불어 노자와 법가를 혼합한 황로파의 사상이 한바와 멀지 않은 진/한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문헌이다.
6. 유도有度. \'법도의 존재\'. 신료에게 법을 철저히 적용시킬 것을 이야기한다.
7. 이병二柄. 상·벌권을 함께 손에 쥐어야만 군주로서 군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편장이다.
8. 양권揚權. 5편 〈주도〉와 함께 운문으로 이뤄진 편장이다. 여기서는 군주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9. 팔간八姦. 군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여덟 가지로 유형화하며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10. 십과十過. 군주가 나라를 잃는 원인으로 저지를 수 있는 과오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다양한 옛 이야기들이 인용되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옛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다른 문헌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11. 고분孤憤. 법술지사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부분으로, 핵심적인 편장 가운데 하나다.
12. 세난說難. 3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13. 화씨和氏. 편장 제목은 화씨의 옥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법술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탄이 있다.
14. 간겁시신姦劫弑臣. 군주를 해치는 신하들의 유형을 분석한 편장이다. 매우 치밀한 모습을 보여준다.
15. 망징亡徵.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징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낸 장이다. 역시 대단히 치밀하다.
16. 삼수三守. 군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서술했다. 핵심은 정보와 결정권의 불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
17. 비내備內. 부인 및 자식들 역시 군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이뤄진다.
18. 남면南面. 편장의 제목은 군주가 마주하는 방향을 통해 군주의 군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낱말이다. 신료들을 상호 견제시키고,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 등의 군림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19. 식사飾邪. 미신을 타파하자는 \'합리주의적\' 성향이 드러나 있다. 한비는 여기서 어떠한 것도 법 이상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20. 해로解老. 《노자》에 대해 쓴 편장 가운데 하나. 노자 자체보다는 법가와 도가의 절충적 지점 즉 황로파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되는 《노자》의 문구들은 문헌학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21. 유로喩老. 《노자》에 대해 쓴 편장 가운데 하나. 좀 더 독자적인 비유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22·23. 설림說林 상/하. 옛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된 자료집으로 보인다.
24. 관행觀行. 행동의 관찰에도 역시 법술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25. 안위安危. 국가를 잘 보존하는 원칙과 위기에 빠지는 길에 대한 유형화. 법에 대한 존중은 역시 그 핵심이다.
26. 수도守道. 나라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역시 객관적 기준에 대한 강조가 눈에
4.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대(漢代)까지의 한비 후학(後學)들의 정론(政論)으로 추정되는 제편(諸編). 편수(編數)는 가장 많으며 그 중 <유도(有度)> <이병(二柄)> <팔간(八姦)> 등은 오래된 것이고, <심도(心度)> <제분(制分)> 등은 새로운 설이다. 후학들의 주장에서 한비의 사상은 현저하게 조직화되었고, 특히 군신통어(群臣統御:刑名參同)나 법의 운용(運用:法術)에 관한 술책이 세밀하게 고찰되었다. 그러나 군권강화(君權强化)와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점만이 농후하고, 법의 최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5. 도가(道家)의 영향을 받은 한비 후학들의 논저인 <주도(主道)> <양각(揚)> <해로(解老)> <유로(喩老)> 등의 4편. 유가의 덕치를 부정하고 법치를 제창한 법가는, 덕치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도가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육반(六反)> <충효> 등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나타낸다. 그러나 군주는 공평무사를 본지(本旨)로 하여 신하(臣下)에 대하여는 인간적 약점을 보이지 않는 심술(心術)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법가 중에도 도가의 허정(虛靜)의 설을 도입한 일파가 있다. 위의 4편은 이들 일파의 논저로서, 전(前) 편은 정론(政論)이고, 후 2편은 편명 그대로 《노자(老子)》의 주석(注釋) 또는 해설편이다.
6. 한비 학파 이외의 논저인 <초견진(初見秦)> <존한(存韓)> 등 2편 모두 한비의 사적(事蹟)에 결부시켜 책 첫머리에 편입되어 있으나 전자는 유세가의 작품이고, 후자는 한비의 작품을 모방한 상주문(上奏文)이 포함된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한비와 그 학파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편견적인 인간관 위에 성립된 것으로 지적되며, 특히 유가로부터는 애정을 무시하는 냉혹하고도 잔인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확실히 급소를 찌르는 적평(適評)이라 하겠으나, 그들이 유가·법가·명가(名家)·도가 등의 설을 집대성하여, 법을 독립된 고찰대상으로 삼고 일종의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진 ·한의 법형제도(法刑制度)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점, 또 감상(感傷)을 뿌리친 그들의 간결한 산문이나 인간의 이면을 그린 설화가 고대문학의 한 전형을 이룬 점에 있어 커다란 문화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간행본이 있으나 절강서국(浙江書局)의 22자본(子本)이 좋은 간본이라고 한다.
각 편장들의 소개
1. 초진견初秦見. 한비가 진왕에게 상주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지만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의 저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존한存韓. 한의 보존을 위해 진왕에게 상주한 글이다. 역시 한비의 저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3. 난언難言. 역시 군주에게 올리는 상주문이며, 설득의 어려움을 군주에게 알리는 형식이다.
4. 애신愛臣. \'총애받는 신하\'라는 머리글자를 딴 편이다. 신료를 통제하고 군주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명확한 관계를 세워야 함을 역설한다.
5. 주도主道. \'군주의 길\'. 《노자》와 흡사한 운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무위의 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담고 있다. 《노자》에 대한 독후감인 편장과 더불어 노자와 법가를 혼합한 황로파의 사상이 한바와 멀지 않은 진/한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문헌이다.
6. 유도有度. \'법도의 존재\'. 신료에게 법을 철저히 적용시킬 것을 이야기한다.
7. 이병二柄. 상·벌권을 함께 손에 쥐어야만 군주로서 군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편장이다.
8. 양권揚權. 5편 〈주도〉와 함께 운문으로 이뤄진 편장이다. 여기서는 군주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9. 팔간八姦. 군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여덟 가지로 유형화하며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10. 십과十過. 군주가 나라를 잃는 원인으로 저지를 수 있는 과오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다양한 옛 이야기들이 인용되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옛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다른 문헌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11. 고분孤憤. 법술지사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부분으로, 핵심적인 편장 가운데 하나다.
12. 세난說難. 3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13. 화씨和氏. 편장 제목은 화씨의 옥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법술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탄이 있다.
14. 간겁시신姦劫弑臣. 군주를 해치는 신하들의 유형을 분석한 편장이다. 매우 치밀한 모습을 보여준다.
15. 망징亡徵.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징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낸 장이다. 역시 대단히 치밀하다.
16. 삼수三守. 군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서술했다. 핵심은 정보와 결정권의 불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
17. 비내備內. 부인 및 자식들 역시 군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이뤄진다.
18. 남면南面. 편장의 제목은 군주가 마주하는 방향을 통해 군주의 군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낱말이다. 신료들을 상호 견제시키고,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 등의 군림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19. 식사飾邪. 미신을 타파하자는 \'합리주의적\' 성향이 드러나 있다. 한비는 여기서 어떠한 것도 법 이상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20. 해로解老. 《노자》에 대해 쓴 편장 가운데 하나. 노자 자체보다는 법가와 도가의 절충적 지점 즉 황로파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되는 《노자》의 문구들은 문헌학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21. 유로喩老. 《노자》에 대해 쓴 편장 가운데 하나. 좀 더 독자적인 비유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22·23. 설림說林 상/하. 옛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된 자료집으로 보인다.
24. 관행觀行. 행동의 관찰에도 역시 법술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25. 안위安危. 국가를 잘 보존하는 원칙과 위기에 빠지는 길에 대한 유형화. 법에 대한 존중은 역시 그 핵심이다.
26. 수도守道. 나라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역시 객관적 기준에 대한 강조가 눈에
추천자료
 [맹자][맹자사상][맹자의 의의][맹자의 사상][노자][노자사상][노자의 생애][노자의 사상]맹...
[맹자][맹자사상][맹자의 의의][맹자의 사상][노자][노자사상][노자의 생애][노자의 사상]맹... [논어][공자][공자사상][논어 내용][논어 사상][공자 인성론][도덕적 인격]논어의 정의, 논어...
[논어][공자][공자사상][논어 내용][논어 사상][공자 인성론][도덕적 인격]논어의 정의, 논어... [동양][동양 사상][동양 문화][동양의 사상][동양의 자연관][동양의 의학][동양의 식사예절][...
[동양][동양 사상][동양 문화][동양의 사상][동양의 자연관][동양의 의학][동양의 식사예절][... [유학][유학사상][신유학사상]삼국시대의 유학(유학사상), 신라시대의 유학(유학사상), 주희...
[유학][유학사상][신유학사상]삼국시대의 유학(유학사상), 신라시대의 유학(유학사상), 주희... [주자][주자사상][세계관][성즉이설][이][사][대학][중화신설]주자(주자사상)의 세계관, 주자...
[주자][주자사상][세계관][성즉이설][이][사][대학][중화신설]주자(주자사상)의 세계관, 주자... [왕부지][왕부지의 생애][왕부지의 업적][왕부지의 사상][왕부지사상의 수용][왕부지와 왕부...
[왕부지][왕부지의 생애][왕부지의 업적][왕부지의 사상][왕부지사상의 수용][왕부지와 왕부... [주자, 주자의 사상] 주자의 사상과 철학
[주자, 주자의 사상] 주자의 사상과 철학 [맹자][맹자의 시대적 배경][맹자의 생애][맹자의 교육사상][맹자의 정치사상][맹자의 철학][...
[맹자][맹자의 시대적 배경][맹자의 생애][맹자의 교육사상][맹자의 정치사상][맹자의 철학][... [공자][군자교육론][유가사상][정치사상][인간됨][仁(인)][禮(예)]공자의 약력, 공자의 군자...
[공자][군자교육론][유가사상][정치사상][인간됨][仁(인)][禮(예)]공자의 약력, 공자의 군자... 유가사상[유학사상] -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유가사상[유학사상] -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동서 문화 융합 사상의 기원- 위원(魏源)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 문화 융합 사상의 기원- 위원(魏源) 사상을 중심으로 [선종, 선종 의미, 선종 전래, 선종 도입, 선종 중도사상, 선종 한계, 선종 평가, 중도사상]...
[선종, 선종 의미, 선종 전래, 선종 도입, 선종 중도사상, 선종 한계, 선종 평가, 중도사상]... 노장사상과 경영전략 [도가 사상]
노장사상과 경영전략 [도가 사상] 공자(孔子)의 정치사상 (공자의 시대 및 생애,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정치사상, 공자의 정치...
공자(孔子)의 정치사상 (공자의 시대 및 생애,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정치사상, 공자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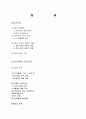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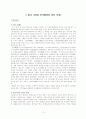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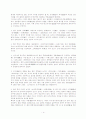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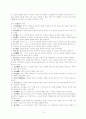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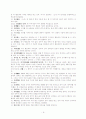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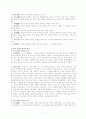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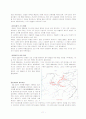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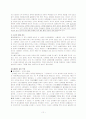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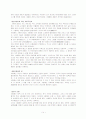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