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목차
1. 백제소개
2. 공주
-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출토품 중심), 공산성
3. 부여
- 부소산성,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2. 공주
-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출토품 중심), 공산성
3. 부여
- 부소산성,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본문내용
,용월대는 달그림자를 밟는 곳이다.아마 시인묵객들이 꼽는 절경의 고장이 아니었을까 싶다.
조룡대(釣龍臺)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마강의 용을 낚아 올렸다는 곳이다.소정방은 이곳에서 백제의 수호신격인 용을 낚아서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그 바위에는 긁힌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용이 잡혀 올라올 때 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이야기속으로] 고란약수 전설
고란사가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서 자라는 고란초와 약수에 얽힌 전설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란초와 약수에 얽힌 전설은 백제의 왕실과 연결이 된다. 백제 의자왕은 항상 고란사에 있는 약수를 애용하였는데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어 이 약수를 운반해 왔는데 진짜 고란약수라는 증명을 위해 약수에 고란초의 이파리 하나씩을 띄워서 운반했다고 한다. 백제의 왕은 이 약수를 마심으로써 원기가 왕성하고 위장병은 물론, 감기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로는 아득한 옛날 소부리에 살던 노부부의 이야기가 전한다. 노부부는 금실이 좋기로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늘 세월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일산(日山)의 도사로부터 부소산가,
지금의 고란사 바위에는 고란초의 부드러운 이슬과 바위에서 스며나오는 강한 물, 곧 유강(柔剛)이 합한 음양(陰陽)약수가 있으며 이 물에는 놀라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좋아서 다음날 새벽에 남편을 억지로 보내 그 약수를 마시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다음날이 되도록 돌아오지를 않았고, 걱정에 찬 할머니는 약수터로 가봤더니 왠 갓난아이가 남편의 옷 속에서 울며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도사가 한잔 마시면 삼년이 젊어진다고 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정림사터
백제시대의 절터
백제 때의 유구가 거의 남지 않은 부여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정림사터 탑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탑은 백제 시대의 부여를 대표한다. 중국 역사서인 『북사』의 ‘백제전’에는 ‘寺塔甚多’라고 하여 백제에는 탑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수도인 부여 땅에 남은 것은 오직 이 정림사터 탑뿐이다.
정림사터는 1942년에 절터를 발굴했을 때에 ‘대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비로소 이 절의 이름이 밝혀졌다. 그런데 대평8년은 고려 현종 19년인 1028년으로 그때에는 이 절의 이름이 \'정림사\'였으며 그때까지는 이 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 때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백제 때에 세워진 오층석탑과 고려 때의 석불좌상이 있으며 발굴에서 찾아 낸 백제와 고려 때의 기와 조각들과 벼루, 소조불상 조각 등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절터 한가운데에 의젓하게 자리한 이 오층석탑은 백제가 멸망해간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채 1,400년을 버텨 왔다. 어느 나라보다도 불교가 융성했을 백제의 불교 문화 가운데 자리로만 남아 있는 목탑은 다 스러지고 없지만, 지금 남아 있는 탑은 익산 미륵사터 탑과 이 정림사터 오층석탑 2기뿐이다. 특히 이 정림사터 탑은 백제 석탑의 완성된 형태로 손꼽는 것이다.
미륵사터 탑이 작은 부재들을 엮은 흔적이 보이는 점에서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한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비해, 이 정림사터 탑은 부재들이 한결 단순해지고 정돈되어 비로소 석탑으로서의 완성미를 보여 준다. 국보 제9호로서 손색없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정림사터 탑이 백제 사람들이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해 낸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의 태두인 우현 고유섭선생(又玄 高裕燮, 1905~1944)의 연구에 의해서이다. 그는 우리 나라에만 독특한 축조물인 석탑들을 그 생김새의 변천에 따라 연대적으로 추적하여 우리 나라 석탑이 백제에서는 목탑에서 석탑을, 신라에서는 전탑에서 석탑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그 두계보가 통일 신라에 이르러서 감은사터 탑과 같은 완결물로 정립되었음을 밝혀 냈다.
정림사터 탑은 8.33m나 되어 결코 작지 않은 탑인데도 멀리에서 보면 그리 육중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가갈수록 장중하고 위엄 있는 깊이가 느껴진다.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사방을 빙 둘러보면 보는 자리에 따라서 장중함과 경쾌함이 교차되어 느낌이 새롭다. 아마 단번에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곱씹는 맛을 느끼게 하는 백제의 맛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동안 이 탑은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세운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왔었다. 그것은 1층 탑신부 한 면에 새겨진 \'大唐平濟國碑銘\'이라는 글자 때문이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글자는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그것을 기념하려고 이미 세워져 있는 탑에
강당 자리에 고려 때의 석불 좌상이 한 분 있다. 이 자리에 근래에 전각을 복원해 놓아 석불좌상은 현재에는 집안에 모셔져 있다.
얼굴이나 몸체가 모두 몹시 비바람에 씻겨 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쪽의 대좌를 보면 안상이며 연꽃조각이 분명하고도 당당해서 이 불상도 본래는 매우 단정한 고려 때의 불상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림사 이름이 새겨진 기와대로 고려 현종대인 1028년에 절을 크게 중수할 때에 모신 듯하니 11세기 불상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높이는 5.62m이고 보물 제108호이다.
[집중탐구] 탑의 유래
약 2500년 전의 일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죽고 난 뒤 그의 사리를 인도의 여덟나라 왕이 나누어 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에 사리를 모시기 위한 건물을 지었다. 이것이 탑의 시초이다. 즉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이다.
(사진 : 기원적 2세기경에 세워진 인도산치 제1탑, 이의 소형화가 한국석탑의 상륜부에 적용되었다.)
1. 목탑 : 나무로 만들었다. 처음 인도에서 시작될 때에는 둥근 반달 모양이었는데 중국에 전래되면서 기와집 모양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주로 일본에 많다.
2. 전탑 : 구운 벽돌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안동 지방에서는 돌을 벽돌처럼 작게
조룡대(釣龍臺)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마강의 용을 낚아 올렸다는 곳이다.소정방은 이곳에서 백제의 수호신격인 용을 낚아서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그 바위에는 긁힌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용이 잡혀 올라올 때 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이야기속으로] 고란약수 전설
고란사가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서 자라는 고란초와 약수에 얽힌 전설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란초와 약수에 얽힌 전설은 백제의 왕실과 연결이 된다. 백제 의자왕은 항상 고란사에 있는 약수를 애용하였는데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어 이 약수를 운반해 왔는데 진짜 고란약수라는 증명을 위해 약수에 고란초의 이파리 하나씩을 띄워서 운반했다고 한다. 백제의 왕은 이 약수를 마심으로써 원기가 왕성하고 위장병은 물론, 감기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로는 아득한 옛날 소부리에 살던 노부부의 이야기가 전한다. 노부부는 금실이 좋기로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늘 세월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일산(日山)의 도사로부터 부소산가,
지금의 고란사 바위에는 고란초의 부드러운 이슬과 바위에서 스며나오는 강한 물, 곧 유강(柔剛)이 합한 음양(陰陽)약수가 있으며 이 물에는 놀라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좋아서 다음날 새벽에 남편을 억지로 보내 그 약수를 마시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다음날이 되도록 돌아오지를 않았고, 걱정에 찬 할머니는 약수터로 가봤더니 왠 갓난아이가 남편의 옷 속에서 울며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도사가 한잔 마시면 삼년이 젊어진다고 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정림사터
백제시대의 절터
백제 때의 유구가 거의 남지 않은 부여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정림사터 탑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탑은 백제 시대의 부여를 대표한다. 중국 역사서인 『북사』의 ‘백제전’에는 ‘寺塔甚多’라고 하여 백제에는 탑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수도인 부여 땅에 남은 것은 오직 이 정림사터 탑뿐이다.
정림사터는 1942년에 절터를 발굴했을 때에 ‘대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비로소 이 절의 이름이 밝혀졌다. 그런데 대평8년은 고려 현종 19년인 1028년으로 그때에는 이 절의 이름이 \'정림사\'였으며 그때까지는 이 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 때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백제 때에 세워진 오층석탑과 고려 때의 석불좌상이 있으며 발굴에서 찾아 낸 백제와 고려 때의 기와 조각들과 벼루, 소조불상 조각 등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절터 한가운데에 의젓하게 자리한 이 오층석탑은 백제가 멸망해간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채 1,400년을 버텨 왔다. 어느 나라보다도 불교가 융성했을 백제의 불교 문화 가운데 자리로만 남아 있는 목탑은 다 스러지고 없지만, 지금 남아 있는 탑은 익산 미륵사터 탑과 이 정림사터 오층석탑 2기뿐이다. 특히 이 정림사터 탑은 백제 석탑의 완성된 형태로 손꼽는 것이다.
미륵사터 탑이 작은 부재들을 엮은 흔적이 보이는 점에서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한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비해, 이 정림사터 탑은 부재들이 한결 단순해지고 정돈되어 비로소 석탑으로서의 완성미를 보여 준다. 국보 제9호로서 손색없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정림사터 탑이 백제 사람들이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해 낸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의 태두인 우현 고유섭선생(又玄 高裕燮, 1905~1944)의 연구에 의해서이다. 그는 우리 나라에만 독특한 축조물인 석탑들을 그 생김새의 변천에 따라 연대적으로 추적하여 우리 나라 석탑이 백제에서는 목탑에서 석탑을, 신라에서는 전탑에서 석탑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그 두계보가 통일 신라에 이르러서 감은사터 탑과 같은 완결물로 정립되었음을 밝혀 냈다.
정림사터 탑은 8.33m나 되어 결코 작지 않은 탑인데도 멀리에서 보면 그리 육중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가갈수록 장중하고 위엄 있는 깊이가 느껴진다.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사방을 빙 둘러보면 보는 자리에 따라서 장중함과 경쾌함이 교차되어 느낌이 새롭다. 아마 단번에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곱씹는 맛을 느끼게 하는 백제의 맛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동안 이 탑은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세운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왔었다. 그것은 1층 탑신부 한 면에 새겨진 \'大唐平濟國碑銘\'이라는 글자 때문이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글자는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그것을 기념하려고 이미 세워져 있는 탑에
강당 자리에 고려 때의 석불 좌상이 한 분 있다. 이 자리에 근래에 전각을 복원해 놓아 석불좌상은 현재에는 집안에 모셔져 있다.
얼굴이나 몸체가 모두 몹시 비바람에 씻겨 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쪽의 대좌를 보면 안상이며 연꽃조각이 분명하고도 당당해서 이 불상도 본래는 매우 단정한 고려 때의 불상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림사 이름이 새겨진 기와대로 고려 현종대인 1028년에 절을 크게 중수할 때에 모신 듯하니 11세기 불상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높이는 5.62m이고 보물 제108호이다.
[집중탐구] 탑의 유래
약 2500년 전의 일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죽고 난 뒤 그의 사리를 인도의 여덟나라 왕이 나누어 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에 사리를 모시기 위한 건물을 지었다. 이것이 탑의 시초이다. 즉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이다.
(사진 : 기원적 2세기경에 세워진 인도산치 제1탑, 이의 소형화가 한국석탑의 상륜부에 적용되었다.)
1. 목탑 : 나무로 만들었다. 처음 인도에서 시작될 때에는 둥근 반달 모양이었는데 중국에 전래되면서 기와집 모양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주로 일본에 많다.
2. 전탑 : 구운 벽돌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안동 지방에서는 돌을 벽돌처럼 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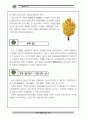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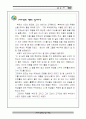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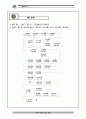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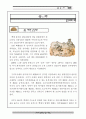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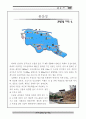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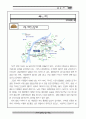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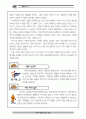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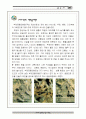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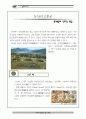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