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판소리의 <제>에 관하여
(1) 『판소리 연구』발췌본
가. <제>의 용법
나. <제>의 범주
다. <제>의 개념
라. <제>의 개념에 대한 검토
마. <제>의 개념 형성의 문화적 요인
바. <제>의 개념의 형성 시기
※ 참고문헌
(1) 『판소리 연구』발췌본
가. <제>의 용법
나. <제>의 범주
다. <제>의 개념
라. <제>의 개념에 대한 검토
마. <제>의 개념 형성의 문화적 요인
바. <제>의 개념의 형성 시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치하였으나>,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간 뒤에도 계속 그 본관을 사용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본래의 뜻을 상실하여 결국은 하나의 부호를 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본관은 <한 씨족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에 결정적인 구실은 한>인물의 본적지와 일치한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판소리 <제>의 지역성이란 어떤 제에 속하는 소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소리꾼이 기거하던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지역은 본래의 뜻을 상실하고 부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제>와 관련하여 동이니 서니 하는 말과, 순창·운봉·보성 등지의 지명을 사용해온 것은 <부호>로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화체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동·서의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들은 이러한 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제>의 개념의 형성 시기
앞에서 <제>의 개념은 특정한 시기의 판소리를 인식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바로 그 시대의 판소리에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서편의 분류가 박유전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의 형성과 이 개념에 의해 소급한 시조와를 구별하지 않고 생각한 결과이다. 박유전이 서편제의 시조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유파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세력을 형성해서, 판소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때 일 것이기 때문이다. 서편제 소리들이 세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시기는 김창환·김제만·정정렬 등에 이르러서인 것 같다.......(중략)...........
<제>의 개념이 구체적인 판소리 인식에 실효성이 있었던 하한선도 5명창시대의 끝인 1930년대 말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미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이선유·강소향·김녹주·이화중선·박녹주 뿐만 아니라, 정정렬의 소리를 충실히 이어받은 김여란까지도 <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에 오면, <제>의 구분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5명창시대 이후 소리꾼들이 단체를 이루며 공연을 다니고, 교통이 발달되어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여러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소리가 변하여, 이제는 유파 구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제>는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채 판소리 인식의 참조의 틀의 역할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변해 버린 판소리를 인식하는 새로운 틀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현상일 뿐이다.
결국 <제>는 5명창시대에 이들의 소리를 표준으로 하여 생긴 개념으로, 당시의 다양한 소리들을 간편하게 인식하는 참조의 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거의 사문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최동현,『판소리 연구』(서울:문학아카테미사, 1991), 173, 174, 176, 178, 179∼181, 185∼186, 191, 192, 198, 203, 204, 210∼214.
이상이 발췌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제>의 요점은 대중 가요에서 말하는 창법과 유사한 부분이며, 그것은 많은 유파가 생기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졌지만 그 대가닥이 비슷한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최동현.『판소리 연구』서울:문학아카데미사, 1991.
목 차
1. ♠ 판소리의 <제>에 관하여
(1) 『판소리 연구』발췌본
가. <제>의 용법
나. <제>의 범주
다. <제>의 개념
라. <제>의 개념에 대한 검토
마. <제>의 개념 형성의 문화적 요인
바. <제>의 개념의 형성 시기
별첨
참고문헌
그 동안 <제>와 관련하여 동이니 서니 하는 말과, 순창·운봉·보성 등지의 지명을 사용해온 것은 <부호>로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화체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동·서의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들은 이러한 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제>의 개념의 형성 시기
앞에서 <제>의 개념은 특정한 시기의 판소리를 인식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바로 그 시대의 판소리에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서편의 분류가 박유전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의 형성과 이 개념에 의해 소급한 시조와를 구별하지 않고 생각한 결과이다. 박유전이 서편제의 시조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유파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세력을 형성해서, 판소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때 일 것이기 때문이다. 서편제 소리들이 세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시기는 김창환·김제만·정정렬 등에 이르러서인 것 같다.......(중략)...........
<제>의 개념이 구체적인 판소리 인식에 실효성이 있었던 하한선도 5명창시대의 끝인 1930년대 말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미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이선유·강소향·김녹주·이화중선·박녹주 뿐만 아니라, 정정렬의 소리를 충실히 이어받은 김여란까지도 <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에 오면, <제>의 구분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5명창시대 이후 소리꾼들이 단체를 이루며 공연을 다니고, 교통이 발달되어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여러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소리가 변하여, 이제는 유파 구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제>는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채 판소리 인식의 참조의 틀의 역할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변해 버린 판소리를 인식하는 새로운 틀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현상일 뿐이다.
결국 <제>는 5명창시대에 이들의 소리를 표준으로 하여 생긴 개념으로, 당시의 다양한 소리들을 간편하게 인식하는 참조의 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거의 사문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최동현,『판소리 연구』(서울:문학아카테미사, 1991), 173, 174, 176, 178, 179∼181, 185∼186, 191, 192, 198, 203, 204, 210∼214.
이상이 발췌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제>의 요점은 대중 가요에서 말하는 창법과 유사한 부분이며, 그것은 많은 유파가 생기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졌지만 그 대가닥이 비슷한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최동현.『판소리 연구』서울:문학아카데미사, 1991.
목 차
1. ♠ 판소리의 <제>에 관하여
(1) 『판소리 연구』발췌본
가. <제>의 용법
나. <제>의 범주
다. <제>의 개념
라. <제>의 개념에 대한 검토
마. <제>의 개념 형성의 문화적 요인
바. <제>의 개념의 형성 시기
별첨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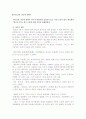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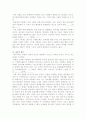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