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쳐야 미친다(조선 지식인의 내면 읽기)
정민 지음
정민 지음
본문내용
미쳐야 미친다 조선 지식인의 내면 읽기
바야흐로 ‘마니아 전성시대’다. 신도 이념도 풍문보다 빨리 살해된 시대, 떼 한줌 돋지 않은 붉은 무덤들 주위론 ‘개성’이란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만이 유령처럼 떠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스스로 ‘~폐인’이길 자처하며 심신의 상처와 후유증을 뽐내느라 분주하다, 자해의 크기로 신념의 부피를 자랑하는 양아치마냥. 허나 그들 앞에 진열된 ‘개성’이란 기껏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에 지나지 않는다. 저 수백만 명의 선남선녀들은 자기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똑같은 구두’를 소비하며 생의 허무와 조로한 존재감을 찬란한 판타지로 덧칠한다. 소비 사회야말로 모든 이들의 ‘꿈의 공장’이다.
표피적 상식과 완고한 기성의 문법, 그 ‘벽(壁)’들을 뚫고자 하는 마니아적 열정을 내포한 ‘개성’은 패션 코드처럼 소비되는 가당찮은 ‘개성타령’이나 기인 열전류의 ‘기벽’과는 번지수가 다르다. 그것은 외려 ‘미치려면[及] 미쳐라[狂]’는 불광불급의 ‘광기’ 혹은 ‘편벽’의 또 다른 표정이다. 일찍이 바보, 쪼다란 뜻의 치(痴), 또는 치(癡)와 더불어 벽(癖)은 창조의 열망에 몸살 앓던 선인들에게는 생성의 원천으로 존중받아 왔다.「북학의」를 집필한 초정 선생은 ‘독창적인 정신을 갖추고 전문의 기예를 익히는 것은 왕왕 벽이 있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다’며 칼날 같은 눈썹을 치켜세우기 까지 하였다.
정민 교수의 「미쳐야 미친다」는 창조적 고집불통들의 종합선물 세트다. ‘우연히 왕희지와 같게 써진 글씨에 제가 취해서 과거 답안지를 차마 제출하지 못했던 최흥효.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와중에도 저도 몰래 눈물을 찍어 새를 그리던 이징. 모래 한 알로 노래 한 곡을 맞바꿔, 그 모래가 신에 가득 찬 뒤에야 산을 내려온 학산수.’ 이들 모두는 허망한 허명이나 세속적 이득을 저만치 밀쳐둔 채 오로지 제 가야할 길만을 굼벵이처럼 묵묵히 걸었던 진정한 마니아들이었다. 이들 삶의 풍경이야말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크게 성취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일이 없다’던 순자의 ‘막신일호의 진경’이었던 셈이다.
바야흐로 ‘마니아 전성시대’다. 신도 이념도 풍문보다 빨리 살해된 시대, 떼 한줌 돋지 않은 붉은 무덤들 주위론 ‘개성’이란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만이 유령처럼 떠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스스로 ‘~폐인’이길 자처하며 심신의 상처와 후유증을 뽐내느라 분주하다, 자해의 크기로 신념의 부피를 자랑하는 양아치마냥. 허나 그들 앞에 진열된 ‘개성’이란 기껏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에 지나지 않는다. 저 수백만 명의 선남선녀들은 자기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똑같은 구두’를 소비하며 생의 허무와 조로한 존재감을 찬란한 판타지로 덧칠한다. 소비 사회야말로 모든 이들의 ‘꿈의 공장’이다.
표피적 상식과 완고한 기성의 문법, 그 ‘벽(壁)’들을 뚫고자 하는 마니아적 열정을 내포한 ‘개성’은 패션 코드처럼 소비되는 가당찮은 ‘개성타령’이나 기인 열전류의 ‘기벽’과는 번지수가 다르다. 그것은 외려 ‘미치려면[及] 미쳐라[狂]’는 불광불급의 ‘광기’ 혹은 ‘편벽’의 또 다른 표정이다. 일찍이 바보, 쪼다란 뜻의 치(痴), 또는 치(癡)와 더불어 벽(癖)은 창조의 열망에 몸살 앓던 선인들에게는 생성의 원천으로 존중받아 왔다.「북학의」를 집필한 초정 선생은 ‘독창적인 정신을 갖추고 전문의 기예를 익히는 것은 왕왕 벽이 있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다’며 칼날 같은 눈썹을 치켜세우기 까지 하였다.
정민 교수의 「미쳐야 미친다」는 창조적 고집불통들의 종합선물 세트다. ‘우연히 왕희지와 같게 써진 글씨에 제가 취해서 과거 답안지를 차마 제출하지 못했던 최흥효.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와중에도 저도 몰래 눈물을 찍어 새를 그리던 이징. 모래 한 알로 노래 한 곡을 맞바꿔, 그 모래가 신에 가득 찬 뒤에야 산을 내려온 학산수.’ 이들 모두는 허망한 허명이나 세속적 이득을 저만치 밀쳐둔 채 오로지 제 가야할 길만을 굼벵이처럼 묵묵히 걸었던 진정한 마니아들이었다. 이들 삶의 풍경이야말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크게 성취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일이 없다’던 순자의 ‘막신일호의 진경’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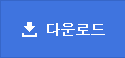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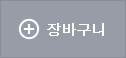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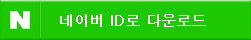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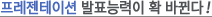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