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작가연보
2. 서론
3. 만해의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
3.1. 기존 연구 성과
3.2. 《님의沈黙》의 기본 구조와 만해의 세계관
3.2.1. 존재와 부재의 변증법
3.2.2. 적극적인 생성의 침묵
4. 선사상과 한용운의 시세계
4.1. 역설의 구성원리
4.2. 만해 시의 이중구조
4.2.1. 사물의 해체와 연속
4.2.2. 이별과 만남의 역설적 연속
4.2.3. 죽음과 삶의 순환
5. 만해 한용운에 대한 새로운 시각
5.1. 탈식민주의 문학론의 관점
5.2. 에코페미니즘의 관점
6. 대표 시 평설
6.1. 〈님의沈黙〉
6.2. 〈리별은美의創造〉
7. 결론3
8. 참고서지 목록
2. 서론
3. 만해의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
3.1. 기존 연구 성과
3.2. 《님의沈黙》의 기본 구조와 만해의 세계관
3.2.1. 존재와 부재의 변증법
3.2.2. 적극적인 생성의 침묵
4. 선사상과 한용운의 시세계
4.1. 역설의 구성원리
4.2. 만해 시의 이중구조
4.2.1. 사물의 해체와 연속
4.2.2. 이별과 만남의 역설적 연속
4.2.3. 죽음과 삶의 순환
5. 만해 한용운에 대한 새로운 시각
5.1. 탈식민주의 문학론의 관점
5.2. 에코페미니즘의 관점
6. 대표 시 평설
6.1. 〈님의沈黙〉
6.2. 〈리별은美의創造〉
7. 결론3
8. 참고서지 목록
본문내용
깨치고 보니, 이제는 산이 의연코 그 산이요 물도 의연코 그 물이더라.’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A=A (선 이전의 미혹의 단계, 상대성의 세계)
② A≠A (선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부정의 단계, 수련의 단계)
③ A=A (이중부정을 통한 절대긍정의 단계, 선의 세계)
여기서 ①과 ③은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차원에 있어서는 극과 극이다. ①은 상대적인 미혹의 세계인 반면, ③은 절대긍정의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이며 그 사이에는 철저한 자기부정을 거쳐 순수에 도달하고자 하는 ②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①의 세계 : 집이다
본다
→ ②의 세계 : 집이 아니다
③의 세계 : 집이면서 집이 아니다
선의 역설은 이러한 이치에서 나오게 되는 바, 유무의 상대성을 초월한 ③의 세계에서 보면 ‘A=A’의 세계와 ‘A≠A\'의 세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세계요, 포용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③의 세계는 텅 빈 空의 세계이기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티끌 없이 바라보는 순수직관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사물에 일어날 수 있는, 우주가 함유하는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평상심시도의 세계)
이러한 선의 원리에 의해서 《님의沈》의 역설은 존재하게 되는 바,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표현처럼 ‘이별’은 이별이면서 동시에 이별이 아닌 것이 된다. 또한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이별’ 속에서 창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물을 직관하여 꿰뚫어보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진리의 세계, 즉 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4.2. 만해 시의 이중구조 본문은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 김소월, 한용운을 중심으로》와 송욱, 《韓龍雲全集 님의 沈 全篇解說》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한용운 시의 근간을 이루는 역설과 불교적 선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그의 시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해체와 연속, 이별과 만남, 죽음과 삶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용운 시 특유의 이중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중구조는 표면적으로 대립되는 두 이미지가 시 속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삶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2.1. 사물의 해체와 연속
이 이중구조의 첫 번째 패턴은 사물의 해체와 연속이다. 한용운은 상실, 소멸과 같은 사물의 해체적인 속성을 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소멸을 해결하고 시화하는 방법과 그것의 궁극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재생과 연속을 지향한다. 그의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금속의 이미지, 특별히 칼과 바늘, 방패와 같은 금속성의 예리한 도구들과 타다 끊다 베다 가르다라는 단절의 서술어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義잇는사람은 올은일을위하야는 칼날을밟슴니다
-〈나의길〉부분
위의 시 행에 나타난 칼날을 밟는 행위는 대표적인 단절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단순한 단절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술된 옳은 일과 연결되면서 고통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까지 포괄하게 된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칼날을 밟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단절은 적극적 의지를 표상한다. 요컨대, 칼은 그 단단함과 예리함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진실된 것을 향한 고행자적 감각을 지니는 것이다. 칼의 이미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황금의 칼로 변주된다.
나는 황금의칼에베혀진 과가티 향긔롭고 애처로은 그대의當年을 回想한다
- 〈論介의愛人이되야서그의廟에〉부분
황금의 칼은 불변의 칼이다. 절단하는 것이자 동시에 영원하게 하는 것, 베어짐에 의해 논개의 이름은 영원히 시간 속에 살아남는 존재로 화한다. 의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영원히 의로운 정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칼날과 황금, 순간과 영원의 이 동시적인 대조는 한용운의 시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용운 시에 등장하는 칼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공간을 이어 주는 것이며 두 극단적인 세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칼로 끊지 않고서는, 절단의 아픔 없이는 새 살이 돋지 않는 외과의적 비유처럼 끊음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한용운 특유의 단절과 연속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시들에서는 저항의 대상을 칼로 절단하는 이미지가 등장한다.
비달빛이 이슬에저진 숩풀을 싸락이처럼부시듯이 당신의 난 恨은 드는칼이되야서 나의애를 도막도막 어노앗슴니다
-〈어늬것이참이냐〉부분
칼로베힌 리별의〈키쓰〉가 어데잇너냐
-〈리별〉부분
아아 진정한愛人을 사랑함에는 죽엄은 칼을주는것이오
-〈리별〉부분
만치안한 나의피를 더운눈물에 석거서 피에목마른 그들의칼에리고
-〈참말인가요〉부분
칼의 의지에 의해 끊어지는 대상은 화자의 애(창자), 피와 눈물, 죽음 등이다. 곧, 화자로 하여금 칼의 의지로 저항케 하는 세계는 이별의 세계인 것이다. 한용운 시학의 본질이 현실에서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계속성 위에 기초하며 이질적인 것의 통일에 대한 욕구와 초월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물의 통합은 단절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도된다. 끊는다는 것은 한용운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의 전환논법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생명의 단절에 속하는 이별, 죽음, 베는 것, 자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이미지는 한용운의 상상력에 있어서 적극적, 자의적인 능동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용운 시에서 단절의 이미지는 죽음을 통한 재생의 선행원리라고 할 수 있다.
4.2.2. 이별과 만남의 역설적 연속
단절과 연속의 이중구조를 인간관계라는 범주 안의 단절과 소멸에 적용할 때, 《님의 沈》 전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님과의 이별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용운의 이별의 형태는 님에의 슬픔이나 원망, 그리움의 형태를 거쳐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전진해 가는 의지의 표상, 혹은 의지를 가다듬는 결단의 계기가 된다. 〈님의 沈〉과 〈이별은 美의 創造〉은 이 이별의 슬픔이 희망과 의지로 진화해 이별을 극복하고 만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눈물이라는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맛날에 미리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은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A=A (선 이전의 미혹의 단계, 상대성의 세계)
② A≠A (선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부정의 단계, 수련의 단계)
③ A=A (이중부정을 통한 절대긍정의 단계, 선의 세계)
여기서 ①과 ③은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차원에 있어서는 극과 극이다. ①은 상대적인 미혹의 세계인 반면, ③은 절대긍정의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이며 그 사이에는 철저한 자기부정을 거쳐 순수에 도달하고자 하는 ②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①의 세계 : 집이다
본다
→ ②의 세계 : 집이 아니다
③의 세계 : 집이면서 집이 아니다
선의 역설은 이러한 이치에서 나오게 되는 바, 유무의 상대성을 초월한 ③의 세계에서 보면 ‘A=A’의 세계와 ‘A≠A\'의 세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세계요, 포용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③의 세계는 텅 빈 空의 세계이기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티끌 없이 바라보는 순수직관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사물에 일어날 수 있는, 우주가 함유하는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평상심시도의 세계)
이러한 선의 원리에 의해서 《님의沈》의 역설은 존재하게 되는 바,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표현처럼 ‘이별’은 이별이면서 동시에 이별이 아닌 것이 된다. 또한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이별’ 속에서 창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물을 직관하여 꿰뚫어보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진리의 세계, 즉 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4.2. 만해 시의 이중구조 본문은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 김소월, 한용운을 중심으로》와 송욱, 《韓龍雲全集 님의 沈 全篇解說》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한용운 시의 근간을 이루는 역설과 불교적 선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그의 시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해체와 연속, 이별과 만남, 죽음과 삶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용운 시 특유의 이중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중구조는 표면적으로 대립되는 두 이미지가 시 속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삶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2.1. 사물의 해체와 연속
이 이중구조의 첫 번째 패턴은 사물의 해체와 연속이다. 한용운은 상실, 소멸과 같은 사물의 해체적인 속성을 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소멸을 해결하고 시화하는 방법과 그것의 궁극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재생과 연속을 지향한다. 그의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금속의 이미지, 특별히 칼과 바늘, 방패와 같은 금속성의 예리한 도구들과 타다 끊다 베다 가르다라는 단절의 서술어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義잇는사람은 올은일을위하야는 칼날을밟슴니다
-〈나의길〉부분
위의 시 행에 나타난 칼날을 밟는 행위는 대표적인 단절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단순한 단절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술된 옳은 일과 연결되면서 고통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까지 포괄하게 된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칼날을 밟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단절은 적극적 의지를 표상한다. 요컨대, 칼은 그 단단함과 예리함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진실된 것을 향한 고행자적 감각을 지니는 것이다. 칼의 이미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황금의 칼로 변주된다.
나는 황금의칼에베혀진 과가티 향긔롭고 애처로은 그대의當年을 回想한다
- 〈論介의愛人이되야서그의廟에〉부분
황금의 칼은 불변의 칼이다. 절단하는 것이자 동시에 영원하게 하는 것, 베어짐에 의해 논개의 이름은 영원히 시간 속에 살아남는 존재로 화한다. 의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영원히 의로운 정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칼날과 황금, 순간과 영원의 이 동시적인 대조는 한용운의 시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용운 시에 등장하는 칼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공간을 이어 주는 것이며 두 극단적인 세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칼로 끊지 않고서는, 절단의 아픔 없이는 새 살이 돋지 않는 외과의적 비유처럼 끊음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한용운 특유의 단절과 연속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시들에서는 저항의 대상을 칼로 절단하는 이미지가 등장한다.
비달빛이 이슬에저진 숩풀을 싸락이처럼부시듯이 당신의 난 恨은 드는칼이되야서 나의애를 도막도막 어노앗슴니다
-〈어늬것이참이냐〉부분
칼로베힌 리별의〈키쓰〉가 어데잇너냐
-〈리별〉부분
아아 진정한愛人을 사랑함에는 죽엄은 칼을주는것이오
-〈리별〉부분
만치안한 나의피를 더운눈물에 석거서 피에목마른 그들의칼에리고
-〈참말인가요〉부분
칼의 의지에 의해 끊어지는 대상은 화자의 애(창자), 피와 눈물, 죽음 등이다. 곧, 화자로 하여금 칼의 의지로 저항케 하는 세계는 이별의 세계인 것이다. 한용운 시학의 본질이 현실에서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계속성 위에 기초하며 이질적인 것의 통일에 대한 욕구와 초월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물의 통합은 단절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도된다. 끊는다는 것은 한용운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의 전환논법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생명의 단절에 속하는 이별, 죽음, 베는 것, 자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이미지는 한용운의 상상력에 있어서 적극적, 자의적인 능동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용운 시에서 단절의 이미지는 죽음을 통한 재생의 선행원리라고 할 수 있다.
4.2.2. 이별과 만남의 역설적 연속
단절과 연속의 이중구조를 인간관계라는 범주 안의 단절과 소멸에 적용할 때, 《님의 沈》 전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님과의 이별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용운의 이별의 형태는 님에의 슬픔이나 원망, 그리움의 형태를 거쳐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전진해 가는 의지의 표상, 혹은 의지를 가다듬는 결단의 계기가 된다. 〈님의 沈〉과 〈이별은 美의 創造〉은 이 이별의 슬픔이 희망과 의지로 진화해 이별을 극복하고 만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눈물이라는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맛날에 미리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리별은 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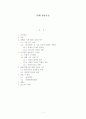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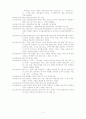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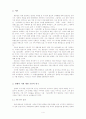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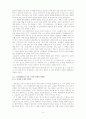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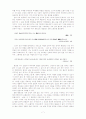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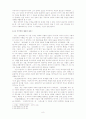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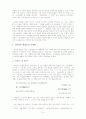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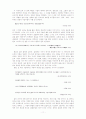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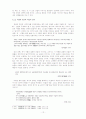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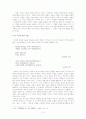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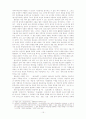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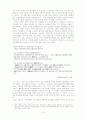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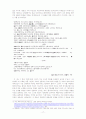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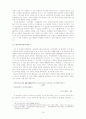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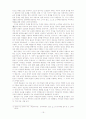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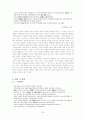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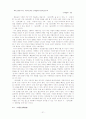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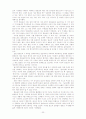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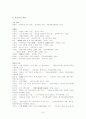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