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약용의 시와 실학사상
1)삶과 의식
2)시에 나타난 실학사상
가. 사실성과 조선시
나. 직설적 현실 비판
다. 우의와 풍자
라. 생활주변과 전원풍경
1)삶과 의식
2)시에 나타난 실학사상
가. 사실성과 조선시
나. 직설적 현실 비판
다. 우의와 풍자
라. 생활주변과 전원풍경
본문내용
.
가마솥 씻으니 닭이 울어대고 닫힌 사립문에 까치 벌써 지저귀네.
수고로운 삶도 원래 명이 있거니와 노는 자는 서로 몹시 경멸하네.
감히 부잣집 부러워 않는 건 누추한 집이나마 지탱하기 때문일세.
농부 위로하던 시대 멀어졌으니 은택이 어느 때 베풀어질는지
왜놈의 가래를 진기롭다 자랑하고 중국 골패로 승부내기 좋아하여
해마다 담요를 사들여오고 이역에서 얼음과자도 구해들이네.
모름지기 농가의 고통을 알아야만 겨우 녹봉으로 농사를 대신할 만 하리
山櫻黑。鮮鮮野紅。屋中餘鳥雀。林裏散孩童。委秧堆岸。收遺麥 滿籠。高田飛堀。私語禱天公。
魚賤羹多乙。蛙繁有丁。酒朝更督。耘賃夜相經。落籬根紫。驕蓬屋上靑。生憎船者婦。淸晝臥松亭。
圃犁如鼠。瓜樓結似熊。麥芒風處白。松火夜深紅。杵動喧止。匙一飽同。此中還有樂。眞不換三公。
犢逃驚踐菽。繭摘利餘薪。折須翁補。新仗。雨暘談有驗。良惡辨如神。愧書中。悠悠到七旬。
日今幾度。容易到天明。洗方唱。緘扉鵲已鳴。勞生元有命。游手苦相輕。不敢豪門羨。聊因破屋。
烝世已遠。膏擇편001幾時行。倭誇珍異。江牌樂算。頻年購羽。殊域致氷。須識田家苦。堪祿代耕。(全書I-8, 2b-3b)
이 시는 그가 67살(1828)에 지은 ‘송파수초(松坡酬酢)’에 들어있는 여섯 수의 연작율시이다. 전원풍경을 사실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시인의 서정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농촌풍경의 즉물적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송나라 육유(陸游)를 본받았다고 밝혔듯이 그는 말기에 당시를 버리고 송시에 기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식적 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보고 느낀 감회를 자연스레 표출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全書>I-6, ‘獨臥三首爲放翁體’ 其一. 競病敲推本爲誰。寫懷宜若放翁詩
이 시는 농촌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속하고 자질구레한 일상사를 소재로 하고 속어를 섞어 쓰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풍경과 사물 묘사 뒤에 청신한 아취를 표현해 놓았다.박무영, 앞의 책, 261쪽.
여섯 수의 시들은 모두 율시의 격식에 따라 수련*함련*경련*미련으로 구성되고, 수련*함련*경련은 각각 정밀한 대구를 형성하였으며 미련은 두 구가 한 문장을 이루면서 마무리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첫 수에는 산앵두와 들딸기, 참새와 아이, 모와보리는 물론이고, 그 밖의 글자들도 저밀하게 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섯째와 여섯째 수에서 조금 느슨해지긴 하지만 그 정밀한 짜임은 전편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속한 소재를 정밀하게 배치하여 맑은 운치를 사려내는 것이 그가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속위아(以俗爲我)’의 정취다. 이 연작시의 전개는 자질구레한 농촌생활의 나열 속에서도 가뭄에 대한 걱정, 게으름에 대한 미움, 삼공이 부럽지 않은 자족함, 그리고 농민의 지혜와 책만 읽은 자신의 부끄러움, 농민의 부지런한 생활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농촌현실을 파악하고 합당한 대책을 세우라고 벼슬아치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전원의 일상을 보고 느낀 대로 거침없이 사실적이고 즉물적으로 제시해 놓은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밀한 짜임으로 비속한 소재를 운치있게 표현해 내는 노련한 솜씨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士)의 본분도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상 살펴본 대로 그는 생활 주변의 일상사와 교유, 혈연에 대한 애정, 전원생활과 산천유람, 그리고 농촌 현실을 사실적이고 운치있게 표현했다.
☞☜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유교경전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유학사상을 새롭게 정립한 사상가요, 국가 현실의 제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가 경영의 대안을 제시한 경세가이며, 자신의 정감과 예술적 재능을 시문으로 표현한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당대부터 훌륭한 시인으로 인정받았으며, 민중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민생과 치세에 이바지하려 하였다. 그는 두시를 익혔고 시사를 결성하여 동인활동도 하였는데,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즉물적으로 제시하면서 당시풍에서 송시풍으로 점점 옮아갔다. 그의 시는 소박한 소재를 짜임새 있고 아취있게 다루어 고아한 품격을 지녔고, 현실의 부조리에 비분을 감추지 않는 ‘온유격절(溫柔激切)’의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현실을 개혁하여 민생을 이롭게 하고자 실학을 집대성하고 경전의 참뜻을 궁구했으며, 벼슬길의 험난함을 겪고 유배생활을 하면서 민중의 고통과 현실의 부조리를 체감하였다. 그리고 전원에 돌아가 산천을 유람하고 전원의 여유를 즐겼다. 그의 시에는 이러한 그의 삶과의식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조선후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즉물적으로 사물을 제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고통을 증언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비판적 현실주의의 시각도 드러나고 있다.
둘째, 자주적인 조선시를 주장하여 조선 후기의 풍속과 언어 등의 실상을 그대로 담은 조선시를 쓰고자 하였다. 이것은 중국 공안파의 영향으로 의고시를 버리고 개성과 독창을 중시하는 겨향으로 나아간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직설적인 현실 비판의 시를 들 수 있다.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실학사상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고통을 고발하고 증언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삼정의 문란과 관리의 횡포로 인한 조선 후기의 가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다.
넷째, 우의와 풍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의 현실을 구체적인 서사형태로 객관화시켜 재현하고 이를 통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한층 심도있게 비판하였다.
다섯째, 생활 주변의 일상사와 혈연에 대한 애정, 벗들에 대한 우정, 저원생활과 산천유람에서 느끼는 서정과 농촌 현실을 사실적이고도 운치있게 표현했다.
끝으로 그의 시가 한국 한시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숙종조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조선의 자연과 풍속, 그리고 조선인의 정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려는 경향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비록 한시이긴 하지만 조선의 풍속과 언어를 담아내고 우리 고전에서 용사를 취하려고까지 하였다. 이것이 우리말로 우리의 사상과정서를 표현한 진정한 조선시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주적 조선시를 주장한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
가마솥 씻으니 닭이 울어대고 닫힌 사립문에 까치 벌써 지저귀네.
수고로운 삶도 원래 명이 있거니와 노는 자는 서로 몹시 경멸하네.
감히 부잣집 부러워 않는 건 누추한 집이나마 지탱하기 때문일세.
농부 위로하던 시대 멀어졌으니 은택이 어느 때 베풀어질는지
왜놈의 가래를 진기롭다 자랑하고 중국 골패로 승부내기 좋아하여
해마다 담요를 사들여오고 이역에서 얼음과자도 구해들이네.
모름지기 농가의 고통을 알아야만 겨우 녹봉으로 농사를 대신할 만 하리
山櫻黑。鮮鮮野紅。屋中餘鳥雀。林裏散孩童。委秧堆岸。收遺麥 滿籠。高田飛堀。私語禱天公。
魚賤羹多乙。蛙繁有丁。酒朝更督。耘賃夜相經。落籬根紫。驕蓬屋上靑。生憎船者婦。淸晝臥松亭。
圃犁如鼠。瓜樓結似熊。麥芒風處白。松火夜深紅。杵動喧止。匙一飽同。此中還有樂。眞不換三公。
犢逃驚踐菽。繭摘利餘薪。折須翁補。新仗。雨暘談有驗。良惡辨如神。愧書中。悠悠到七旬。
日今幾度。容易到天明。洗方唱。緘扉鵲已鳴。勞生元有命。游手苦相輕。不敢豪門羨。聊因破屋。
烝世已遠。膏擇편001幾時行。倭誇珍異。江牌樂算。頻年購羽。殊域致氷。須識田家苦。堪祿代耕。(全書I-8, 2b-3b)
이 시는 그가 67살(1828)에 지은 ‘송파수초(松坡酬酢)’에 들어있는 여섯 수의 연작율시이다. 전원풍경을 사실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시인의 서정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농촌풍경의 즉물적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송나라 육유(陸游)를 본받았다고 밝혔듯이 그는 말기에 당시를 버리고 송시에 기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식적 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보고 느낀 감회를 자연스레 표출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全書>I-6, ‘獨臥三首爲放翁體’ 其一. 競病敲推本爲誰。寫懷宜若放翁詩
이 시는 농촌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속하고 자질구레한 일상사를 소재로 하고 속어를 섞어 쓰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풍경과 사물 묘사 뒤에 청신한 아취를 표현해 놓았다.박무영, 앞의 책, 261쪽.
여섯 수의 시들은 모두 율시의 격식에 따라 수련*함련*경련*미련으로 구성되고, 수련*함련*경련은 각각 정밀한 대구를 형성하였으며 미련은 두 구가 한 문장을 이루면서 마무리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첫 수에는 산앵두와 들딸기, 참새와 아이, 모와보리는 물론이고, 그 밖의 글자들도 저밀하게 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섯째와 여섯째 수에서 조금 느슨해지긴 하지만 그 정밀한 짜임은 전편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속한 소재를 정밀하게 배치하여 맑은 운치를 사려내는 것이 그가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속위아(以俗爲我)’의 정취다. 이 연작시의 전개는 자질구레한 농촌생활의 나열 속에서도 가뭄에 대한 걱정, 게으름에 대한 미움, 삼공이 부럽지 않은 자족함, 그리고 농민의 지혜와 책만 읽은 자신의 부끄러움, 농민의 부지런한 생활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농촌현실을 파악하고 합당한 대책을 세우라고 벼슬아치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전원의 일상을 보고 느낀 대로 거침없이 사실적이고 즉물적으로 제시해 놓은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밀한 짜임으로 비속한 소재를 운치있게 표현해 내는 노련한 솜씨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士)의 본분도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상 살펴본 대로 그는 생활 주변의 일상사와 교유, 혈연에 대한 애정, 전원생활과 산천유람, 그리고 농촌 현실을 사실적이고 운치있게 표현했다.
☞☜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유교경전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유학사상을 새롭게 정립한 사상가요, 국가 현실의 제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가 경영의 대안을 제시한 경세가이며, 자신의 정감과 예술적 재능을 시문으로 표현한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당대부터 훌륭한 시인으로 인정받았으며, 민중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민생과 치세에 이바지하려 하였다. 그는 두시를 익혔고 시사를 결성하여 동인활동도 하였는데,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즉물적으로 제시하면서 당시풍에서 송시풍으로 점점 옮아갔다. 그의 시는 소박한 소재를 짜임새 있고 아취있게 다루어 고아한 품격을 지녔고, 현실의 부조리에 비분을 감추지 않는 ‘온유격절(溫柔激切)’의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현실을 개혁하여 민생을 이롭게 하고자 실학을 집대성하고 경전의 참뜻을 궁구했으며, 벼슬길의 험난함을 겪고 유배생활을 하면서 민중의 고통과 현실의 부조리를 체감하였다. 그리고 전원에 돌아가 산천을 유람하고 전원의 여유를 즐겼다. 그의 시에는 이러한 그의 삶과의식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조선후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즉물적으로 사물을 제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고통을 증언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비판적 현실주의의 시각도 드러나고 있다.
둘째, 자주적인 조선시를 주장하여 조선 후기의 풍속과 언어 등의 실상을 그대로 담은 조선시를 쓰고자 하였다. 이것은 중국 공안파의 영향으로 의고시를 버리고 개성과 독창을 중시하는 겨향으로 나아간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직설적인 현실 비판의 시를 들 수 있다.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실학사상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고통을 고발하고 증언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삼정의 문란과 관리의 횡포로 인한 조선 후기의 가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다.
넷째, 우의와 풍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의 현실을 구체적인 서사형태로 객관화시켜 재현하고 이를 통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한층 심도있게 비판하였다.
다섯째, 생활 주변의 일상사와 혈연에 대한 애정, 벗들에 대한 우정, 저원생활과 산천유람에서 느끼는 서정과 농촌 현실을 사실적이고도 운치있게 표현했다.
끝으로 그의 시가 한국 한시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숙종조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조선의 자연과 풍속, 그리고 조선인의 정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려는 경향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비록 한시이긴 하지만 조선의 풍속과 언어를 담아내고 우리 고전에서 용사를 취하려고까지 하였다. 이것이 우리말로 우리의 사상과정서를 표현한 진정한 조선시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주적 조선시를 주장한 의의는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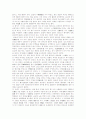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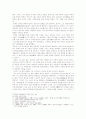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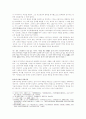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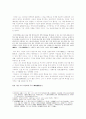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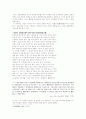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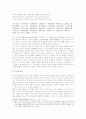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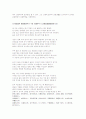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