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섹스를 광고하다
노출된 몸이 주는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몸의 이미지의 간접적 이용
주목을 위한 광고. 하지만 이대로 좋은가?
시에 드러나는 몸의 이미지
몸의 이미지 (1) - 거부의 대상
「키스」
「죽은 몸에 白夜가 흐르고」
「그녀라는 커다란 숨구멍, 혹은 시선의 감옥」
「생일」
「풍경의 눈빛」
「lady phantom」
몸의 이미지 (2) - 추구의 대상
「공과 아이」
「극빈」
「思慕」 - 물의 안쪽
몸의 이미지 (3) - 유머
「카메라, 키메라」
「공손한 손」
「효자」
몸의 재탄생
※참고문헌※
노출된 몸이 주는 선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몸의 이미지의 간접적 이용
주목을 위한 광고. 하지만 이대로 좋은가?
시에 드러나는 몸의 이미지
몸의 이미지 (1) - 거부의 대상
「키스」
「죽은 몸에 白夜가 흐르고」
「그녀라는 커다란 숨구멍, 혹은 시선의 감옥」
「생일」
「풍경의 눈빛」
「lady phantom」
몸의 이미지 (2) - 추구의 대상
「공과 아이」
「극빈」
「思慕」 - 물의 안쪽
몸의 이미지 (3) - 유머
「카메라, 키메라」
「공손한 손」
「효자」
몸의 재탄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떠드는 사람들 알까 봐/ 우스워 우스워/ 요즈음 떠도는 농담이라며/ 지어낸 얘기 들려준다/(중략)/ 나는 왜 방에다 불을 지르고 소리소리 지르다/ 그 사람의 몸에 물을 끼얹었을까/ 하루 종일 문 앞을 떠나지 않는/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같이 빤히 열린 그 눈알/ 그것을 닫고 오기는 했나?/ 두렵다/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 웃고 떠드는 나를 견딜 수 없다/ 아무래도 불꽃 머리칼 다시 길러야겠다/ 아무래도 나는 나를 다시 죽이러 가야겠다
화자는 살인을 범하고도 태연하게 술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동석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려 노력한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에서 그 일은 쉽지 않다.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이 느껴야 할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확실하게 일을 처리했을까 하는 걱정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제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제목을 보고 시의 결말부를 보면 시의 화자는 여자 유령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죽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훼손하고 결국 죽임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
일단 그녀가 자신의 몸을 제거한 행위는 그에 대한 부정의 극단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두려워하는가? 앞서 살핀 풍경의 눈빛을 참고해보자. 시인은 여성의 몸이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 생물학적으로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그 나약한 몸을 죽임으로써 앞의 시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자신에게서 떨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살인은 자신의 숙명적인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즉 그 몸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면 그녀는 다시 그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화자는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물을 끼얹’는 실수 따위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이러 간다.
몸의 이미지 (2) - 추구의 대상
공과 아이 문태준, 그늘의 발달, 문학과 지성사, 2008, pp. 60~61.
아이가 공을 몰고 간다/ 공이 아이를 몰고 간다/ 아이는 고개를 까닥까닥/ 흔들고/ 공은 배꼽을 내놓고/ 구르고/ 공중은/ 한번은 아이를/ 한번은 공을/ 둘러업는다/ 달밤까지/ 아이가 공을/ 공이 아이를/ 몰고 간다/ 저곳까지/ 공이 멈추고 싶어 할 때/ 아이가 멈추고 싶어 할 때/ 공과 아이는/ 등을 / 구부려/ 둥글게 껴안는다
위 작품에서 공과 아이는 동일하게 둥근 형태의 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개를 까닥까닥’ 흔드는 장난기 어린 아이와 ‘배꼽을 내놓고’ 구르는 공은 사실 서로의 속성을 바꿔도 될 만큼 닮은 존재이다. 시인은 그 속성을 포착하여 ‘공중’이라는 공간 안에서 둘을 묶는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둘러업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원(圓)의 모양새를 가지게 된다. 문태준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세계관을 둥근 몸을 가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극빈 문태준, 가재미, 문학과 지성사, 2006, pp. 22~23.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게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열무는 그 주로 뿌리를 얻기 위해 기른다. 그러나 위 시의 화자는 시기를 놓쳐 뿌리를 잃었다. 더군다나 아삭한 줄기도 잃었으며 결국 쓸모없는 열무꽃만 가지게 되었다. 끝에 살짝 보라색 물이 든 하얀 네 개의 이파리는 소박하고 아담한 맛을 준다. 그 이파리에 나비들이 내려앉은 순간 화자는 자신의 무릎을 생각해본다. 여기서 무릎은 단순히 다리의 중간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시에서 무릎은 누군가가 잠시 기대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등장한다. 자신에겐 그저 가끔 콕콕 쑤시는 고통만 가져올 뿐인 예쁘지도 않은 무릎은 다른 이에게 ‘편편하게 앉아있을’ 의자가 되는 것이다. 화자는 이 무릎을 그렇게 내어준 적이 있었는지 반성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꽃까지 잃어버리며 ‘극빈’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극빈이란 아름다움마저 포기해버린 이타적인 경지를 말하는 듯하다.
思慕 - 물의 안쪽 위의 책, p. 11.
바퀴가 굴러간다고 할 수밖에/ 어디로든 갈 것 같은 물렁물렁한 바퀴/ 무릎은 있으나 물의 몸에는 뼈가 없네 뼈가 없으니/ 물소리를 맛있게 먹을 때 이(齒)는 감추시게/ 물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네
미끌미끌한 물의 속살 속으로/ 물을 열고 들어가 물을 닫고/ 하나의 돌같이 내 몸이 젖네/ 귀도 눈도 만지는 손도 혀도 사라지네/ 물속까지 들어오는 여린 볕처럼 살다 갔으면/ 물비늘처럼 그대 눈빛에 잠시 어리다 갔으면/ 내가 예전에 한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낮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고요
이 작품에서도 ‘무릎’이 등장한다. 화자는 독특하게도 물이 무릎을 가진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 시의 물은 뼈가 없는 무릎이다. 오직 무릎만 있는 것이다. 그 물 속으로 화자가 걸어가면서 화자는 자신의 오감을 모두 잃어버린다. 그 뒤 그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평정의 상태를 맛보는 것이다. 이 뼈 없는 기묘한 무릎은 바퀴의 둥근 모양과 겹쳐진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수평의 상태가 드러난다. 시인이 곧게 뻗은 수직의 모양인 뼈를 제거한 이유는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는 수직을 부정하고 수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태준이 찾는 수평의 힘은 그의 같은 시집의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수련(위의 책, p. 12) - “오오 내가 사랑하는 이 평면의 힘!”, 수평(p. 19) - “하늘은 이렇게 무서운 수평을 길러내신다”, 넝쿨의 비유(p. 60) - “한 世界가 평면적으로
화자는 살인을 범하고도 태연하게 술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동석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려 노력한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에서 그 일은 쉽지 않다.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이 느껴야 할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확실하게 일을 처리했을까 하는 걱정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제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제목을 보고 시의 결말부를 보면 시의 화자는 여자 유령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죽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훼손하고 결국 죽임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
일단 그녀가 자신의 몸을 제거한 행위는 그에 대한 부정의 극단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두려워하는가? 앞서 살핀 풍경의 눈빛을 참고해보자. 시인은 여성의 몸이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 생물학적으로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그 나약한 몸을 죽임으로써 앞의 시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자신에게서 떨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살인은 자신의 숙명적인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즉 그 몸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면 그녀는 다시 그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화자는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물을 끼얹’는 실수 따위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이러 간다.
몸의 이미지 (2) - 추구의 대상
공과 아이 문태준, 그늘의 발달, 문학과 지성사, 2008, pp. 60~61.
아이가 공을 몰고 간다/ 공이 아이를 몰고 간다/ 아이는 고개를 까닥까닥/ 흔들고/ 공은 배꼽을 내놓고/ 구르고/ 공중은/ 한번은 아이를/ 한번은 공을/ 둘러업는다/ 달밤까지/ 아이가 공을/ 공이 아이를/ 몰고 간다/ 저곳까지/ 공이 멈추고 싶어 할 때/ 아이가 멈추고 싶어 할 때/ 공과 아이는/ 등을 / 구부려/ 둥글게 껴안는다
위 작품에서 공과 아이는 동일하게 둥근 형태의 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개를 까닥까닥’ 흔드는 장난기 어린 아이와 ‘배꼽을 내놓고’ 구르는 공은 사실 서로의 속성을 바꿔도 될 만큼 닮은 존재이다. 시인은 그 속성을 포착하여 ‘공중’이라는 공간 안에서 둘을 묶는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둘러업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원(圓)의 모양새를 가지게 된다. 문태준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세계관을 둥근 몸을 가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극빈 문태준, 가재미, 문학과 지성사, 2006, pp. 22~23.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게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열무는 그 주로 뿌리를 얻기 위해 기른다. 그러나 위 시의 화자는 시기를 놓쳐 뿌리를 잃었다. 더군다나 아삭한 줄기도 잃었으며 결국 쓸모없는 열무꽃만 가지게 되었다. 끝에 살짝 보라색 물이 든 하얀 네 개의 이파리는 소박하고 아담한 맛을 준다. 그 이파리에 나비들이 내려앉은 순간 화자는 자신의 무릎을 생각해본다. 여기서 무릎은 단순히 다리의 중간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시에서 무릎은 누군가가 잠시 기대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등장한다. 자신에겐 그저 가끔 콕콕 쑤시는 고통만 가져올 뿐인 예쁘지도 않은 무릎은 다른 이에게 ‘편편하게 앉아있을’ 의자가 되는 것이다. 화자는 이 무릎을 그렇게 내어준 적이 있었는지 반성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꽃까지 잃어버리며 ‘극빈’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극빈이란 아름다움마저 포기해버린 이타적인 경지를 말하는 듯하다.
思慕 - 물의 안쪽 위의 책, p. 11.
바퀴가 굴러간다고 할 수밖에/ 어디로든 갈 것 같은 물렁물렁한 바퀴/ 무릎은 있으나 물의 몸에는 뼈가 없네 뼈가 없으니/ 물소리를 맛있게 먹을 때 이(齒)는 감추시게/ 물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네
미끌미끌한 물의 속살 속으로/ 물을 열고 들어가 물을 닫고/ 하나의 돌같이 내 몸이 젖네/ 귀도 눈도 만지는 손도 혀도 사라지네/ 물속까지 들어오는 여린 볕처럼 살다 갔으면/ 물비늘처럼 그대 눈빛에 잠시 어리다 갔으면/ 내가 예전에 한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낮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고요
이 작품에서도 ‘무릎’이 등장한다. 화자는 독특하게도 물이 무릎을 가진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 시의 물은 뼈가 없는 무릎이다. 오직 무릎만 있는 것이다. 그 물 속으로 화자가 걸어가면서 화자는 자신의 오감을 모두 잃어버린다. 그 뒤 그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평정의 상태를 맛보는 것이다. 이 뼈 없는 기묘한 무릎은 바퀴의 둥근 모양과 겹쳐진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수평의 상태가 드러난다. 시인이 곧게 뻗은 수직의 모양인 뼈를 제거한 이유는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는 수직을 부정하고 수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태준이 찾는 수평의 힘은 그의 같은 시집의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수련(위의 책, p. 12) - “오오 내가 사랑하는 이 평면의 힘!”, 수평(p. 19) - “하늘은 이렇게 무서운 수평을 길러내신다”, 넝쿨의 비유(p. 60) - “한 世界가 평면적으로
추천자료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의 구축, 인지부조화이론,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의 태도변...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의 구축, 인지부조화이론,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의 태도변... 상표자산광고(브랜드자산광고)의 중요성, 형태, 상표자산광고(브랜드자산광고)의 선행연구, ...
상표자산광고(브랜드자산광고)의 중요성, 형태, 상표자산광고(브랜드자산광고)의 선행연구, ...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 특징, 일치이론,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 태도유발, 결합효...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 특징, 일치이론,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 태도유발, 결합효... 광고회사(광고사)의 연혁, 광고회사(광고사)의 형태, 광고회사(광고사)의 환경통제, 광고회사...
광고회사(광고사)의 연혁, 광고회사(광고사)의 형태, 광고회사(광고사)의 환경통제, 광고회사... 기업이미지광고(산업광고)의 의미, 기업이미지광고(산업광고)의 의의, 기업이미지광고(산업광...
기업이미지광고(산업광고)의 의미, 기업이미지광고(산업광고)의 의의, 기업이미지광고(산업광...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의 평가, 검증,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의 부정적 정보, 동기...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의 평가, 검증,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의 부정적 정보, 동기... 광고회사(광고사)의 형태, 광고회사(광고사)의 환경변화, 광고회사(광고사)의 현황, 광고회사...
광고회사(광고사)의 형태, 광고회사(광고사)의 환경변화, 광고회사(광고사)의 현황, 광고회사... 광고영역의 확대가능성 (광고의 학문적 개념, 광고의 중요성, 광고영역의 확대가능성,바이럴 ...
광고영역의 확대가능성 (광고의 학문적 개념, 광고의 중요성, 광고영역의 확대가능성,바이럴 ... 광고 속의 심리학,심리과 광고의 만남,광고의 개발과 심리학,광고 크리에이티브 개발과 심리학
광고 속의 심리학,심리과 광고의 만남,광고의 개발과 심리학,광고 크리에이티브 개발과 심리학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의 형성, 태도,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와 정교화가능성모델(...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의 형성, 태도, 광고에 대한 태도(광고태도)와 정교화가능성모델(... 광고회사(광고사)의 역사, 광고회사(광고사)의 자원의존이론, 광고회사(광고사)의 시장개방, ...
광고회사(광고사)의 역사, 광고회사(광고사)의 자원의존이론, 광고회사(광고사)의 시장개방, ...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의 검증, 태도,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와 태도변경, 상품광...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의 검증, 태도, 광고태도(광고에 대한 태도)와 태도변경, 상품광... 광고사(광고회사)의 성과, 광고사(광고회사)의 매체, 광고사(광고회사)의 사회자본, 광고사(...
광고사(광고회사)의 성과, 광고사(광고회사)의 매체, 광고사(광고회사)의 사회자본, 광고사(... 광고사(광고회사)의 연혁, 광고사(광고회사)의 특징, 광고사(광고회사)의 국제화, 광고사(광...
광고사(광고회사)의 연혁, 광고사(광고회사)의 특징, 광고사(광고회사)의 국제화, 광고사(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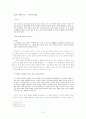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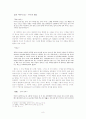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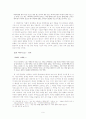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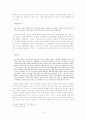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