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향가 ------------------ 헌화가 ------------------- 3
----------------- 우적가 ------------------- 5
Ⅱ. 별곡 ------------------ 청산별곡 --------------------- 6
----------------- 서경별곡 --------------------- 9
Ⅲ. 시조 ------------------ 단심가 ------------------- 11
---------------- 창을 내고쟈 ---------------- 12
Ⅳ. 가사 ------------------ 규원가 ---------------------- 13
Ⅴ. 설화 ------------- 용소와 며느리 바위 ------------------ 15
Ⅵ. 고소설 ----------------- 운영전 ---------------------- 17
Ⅶ. 참고문헌 ---------------------------------------------- 19
----------------- 우적가 ------------------- 5
Ⅱ. 별곡 ------------------ 청산별곡 --------------------- 6
----------------- 서경별곡 --------------------- 9
Ⅲ. 시조 ------------------ 단심가 ------------------- 11
---------------- 창을 내고쟈 ---------------- 12
Ⅳ. 가사 ------------------ 규원가 ---------------------- 13
Ⅴ. 설화 ------------- 용소와 며느리 바위 ------------------ 15
Ⅵ. 고소설 ----------------- 운영전 ---------------------- 17
Ⅶ. 참고문헌 ---------------------------------------------- 19
본문내용
한국문학개론
- 한국의 향가, 별곡, 시조, 가사, 설화, 고소설에서 각가 작품 1편을 선정하여 읽고 작품 분석과 감상을 정리
목차
Ⅰ. 향가 ------------------ 헌화가 ------------------- 3
----------------- 우적가 ------------------- 5
Ⅱ. 별곡 ------------------ 청산별곡 --------------------- 6
----------------- 서경별곡 --------------------- 9
Ⅲ. 시조 ------------------ 단심가 ------------------- 11
---------------- 창을 내고쟈 ---------------- 12
Ⅳ. 가사 ------------------ 규원가 ---------------------- 13
Ⅴ. 설화 ------------- 용소와 며느리 바위 ------------------ 15
Ⅵ. 고소설 ----------------- 운영전 ---------------------- 17
Ⅶ. 참고문헌 ---------------------------------------------- 19
향가 - 헌화가
[작품 분석 & 감상]
순정공이 강릉 태수가 되어 부임하던 길에 그의부인 수로가 바닷가 절벽 위에 핀 철쭉을 탐낼 적에, 위험한 일이므로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소를 끌고 가던 한노인이 나서서 꽃을 꺾어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헌화가>는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조에 실려 있으며, 견우노옹이 지은 4구체 향가이며, 민요의 기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배경설화 면에서는 <해가>와 유사하다.
작품의 성격을 분석해봤을 때 <헌화가>의 후반부는 노인의 헌화와 관련된 수로부인이야기의 전승담당층으로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담한 결과이다. 주술담당자들이 무엇보다 전승담당층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용절대(姿容絶代 - 절세미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미인들이 신물과 결부되곤 하는데, 이것은 미를 거리를 두고 대상화하기보다 가까이 두고 일체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결과이다. ‘자용절대’는 『삼국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관련된 표현이기에 신물이 수로부인을 탐하려는 의도 즉 일체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호칭+위협’의 노래를 통해 수로부인을 구출함으로써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헌화가>의 작품적 성격은 주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자주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
수로부인은 신라 제33대 성덕왕 (聖德王) 때 강릉태수(江陵太守) 순정공(純貞公)의 아내, 남편이 강릉으로 부임하는 도중, 벼랑에 핀 철쭉꽃을 꺾어 달라고 하자 소를 몰고 가던 늙은이가 \'헌화가\'와 함께 꽃을 바쳤다. 그러나 임해정(臨海亭)에 이르러 해룡(海龍)에게 붙들려 바다 속으로 잡혀가자, 백성들이 \'해가(海歌)\'를 불러 다시 육지로 나왔다.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神物)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한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이다.
이 작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헌화가〉는 사랑을 구하는 헌화의 노래가 아니라 미의 세계에 대한 추구를 본질로 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시대의 신라인들이 지니고 있는 미의 세계에 대한 경건한 추구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이다.
▲ 철쭉
향가 - 우적가
[작품분석 & 감상]
작가 : 영재
갈래 : 향가
연대 : 원성왕
형식 : 10구체
주제 : 도적을 회개시킨 노래
\"지금 나는 내 마음속 세속의 번뇌를 벗어버리고/깊은 산중으로 수도하러 가는 수도승이다/너희들 칼에 내가 찔림을 받으면 좋은 날이 바로 올 것이라 슬플 것이 없지만/아직도 정진해야 할 길은 멀리 남아 있는데 그렇게 무참히 명을 끊을 수 있겠느냐.\"
원성왕 때의 영재(永才)가 지은 것으로 삼국유사에 \'영재우적(永才愚賊)\'이라는 제목 아래 이 노래와 아울러 연기설화가 실려 있다. 영재가 도적을 만나 그들의 명에 따라 지은 노래로 <삼국유사>에는 이 노래의 제목이 전해져 있지 않다.
오구라(小倉進平)는 〈영재우적〉, 양주동(梁柱東)은 〈우적가〉, 김선기(金善琪)는 〈도둑 만난 노래〉, 김사엽(金思燁)은 〈도적가〉라 하였다.
영재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자 도적들은 노래에 감동하여 자신 등의 행동을 뉘우치고 비단 두 필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영재는 \"재물이 지옥 가는 죄악의 근본임을 알아 이제 깊은 산에 숨어서 일생을 지내고자 하는데 어찌 이것을 받겠는가\"
하고 땅에다 버렸다. 도적들은 더욱 감동하여 칼과 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었으며 지리산에 들어간 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90세까지 장수하며 화랑과 승려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영재가 만년에 산 속에 칩거하려 함은 \'제행무상\'을 깨닫고 \'제법무아\'를 통해 \'열반적정\'에 들고자 함이었을 것이며 가는 도중 도둑들과의 만남은 인과응보 즉 연기(緣起)의 결과로 인식했으며 도둑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은 죽음은 곧 번뇌를 마감하는 것으로 파악했거나 환생, 즉 윤회사상에 대한 돈독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만약 도둑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영재 자신으로서는 번뇌를 마감시켜주는 선업(先業)으로 받아드릴 수 있으나 도둑들의 입장에선 크나 큰 죄업(罪業)을 짓는 결과라 안타까웠을 것이다.
별곡 - 청산별곡 [작품 분석 & 감상]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라랑 먹고
- 한국의 향가, 별곡, 시조, 가사, 설화, 고소설에서 각가 작품 1편을 선정하여 읽고 작품 분석과 감상을 정리
목차
Ⅰ. 향가 ------------------ 헌화가 ------------------- 3
----------------- 우적가 ------------------- 5
Ⅱ. 별곡 ------------------ 청산별곡 --------------------- 6
----------------- 서경별곡 --------------------- 9
Ⅲ. 시조 ------------------ 단심가 ------------------- 11
---------------- 창을 내고쟈 ---------------- 12
Ⅳ. 가사 ------------------ 규원가 ---------------------- 13
Ⅴ. 설화 ------------- 용소와 며느리 바위 ------------------ 15
Ⅵ. 고소설 ----------------- 운영전 ---------------------- 17
Ⅶ. 참고문헌 ---------------------------------------------- 19
향가 - 헌화가
[작품 분석 & 감상]
순정공이 강릉 태수가 되어 부임하던 길에 그의부인 수로가 바닷가 절벽 위에 핀 철쭉을 탐낼 적에, 위험한 일이므로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소를 끌고 가던 한노인이 나서서 꽃을 꺾어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헌화가>는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조에 실려 있으며, 견우노옹이 지은 4구체 향가이며, 민요의 기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배경설화 면에서는 <해가>와 유사하다.
작품의 성격을 분석해봤을 때 <헌화가>의 후반부는 노인의 헌화와 관련된 수로부인이야기의 전승담당층으로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담한 결과이다. 주술담당자들이 무엇보다 전승담당층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용절대(姿容絶代 - 절세미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미인들이 신물과 결부되곤 하는데, 이것은 미를 거리를 두고 대상화하기보다 가까이 두고 일체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결과이다. ‘자용절대’는 『삼국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관련된 표현이기에 신물이 수로부인을 탐하려는 의도 즉 일체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호칭+위협’의 노래를 통해 수로부인을 구출함으로써 주술담당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영험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헌화가>의 작품적 성격은 주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자주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라
수로부인은 신라 제33대 성덕왕 (聖德王) 때 강릉태수(江陵太守) 순정공(純貞公)의 아내, 남편이 강릉으로 부임하는 도중, 벼랑에 핀 철쭉꽃을 꺾어 달라고 하자 소를 몰고 가던 늙은이가 \'헌화가\'와 함께 꽃을 바쳤다. 그러나 임해정(臨海亭)에 이르러 해룡(海龍)에게 붙들려 바다 속으로 잡혀가자, 백성들이 \'해가(海歌)\'를 불러 다시 육지로 나왔다.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神物)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한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이다.
이 작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헌화가〉는 사랑을 구하는 헌화의 노래가 아니라 미의 세계에 대한 추구를 본질로 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시대의 신라인들이 지니고 있는 미의 세계에 대한 경건한 추구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이다.
▲ 철쭉
향가 - 우적가
[작품분석 & 감상]
작가 : 영재
갈래 : 향가
연대 : 원성왕
형식 : 10구체
주제 : 도적을 회개시킨 노래
\"지금 나는 내 마음속 세속의 번뇌를 벗어버리고/깊은 산중으로 수도하러 가는 수도승이다/너희들 칼에 내가 찔림을 받으면 좋은 날이 바로 올 것이라 슬플 것이 없지만/아직도 정진해야 할 길은 멀리 남아 있는데 그렇게 무참히 명을 끊을 수 있겠느냐.\"
원성왕 때의 영재(永才)가 지은 것으로 삼국유사에 \'영재우적(永才愚賊)\'이라는 제목 아래 이 노래와 아울러 연기설화가 실려 있다. 영재가 도적을 만나 그들의 명에 따라 지은 노래로 <삼국유사>에는 이 노래의 제목이 전해져 있지 않다.
오구라(小倉進平)는 〈영재우적〉, 양주동(梁柱東)은 〈우적가〉, 김선기(金善琪)는 〈도둑 만난 노래〉, 김사엽(金思燁)은 〈도적가〉라 하였다.
영재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자 도적들은 노래에 감동하여 자신 등의 행동을 뉘우치고 비단 두 필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영재는 \"재물이 지옥 가는 죄악의 근본임을 알아 이제 깊은 산에 숨어서 일생을 지내고자 하는데 어찌 이것을 받겠는가\"
하고 땅에다 버렸다. 도적들은 더욱 감동하여 칼과 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었으며 지리산에 들어간 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90세까지 장수하며 화랑과 승려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영재가 만년에 산 속에 칩거하려 함은 \'제행무상\'을 깨닫고 \'제법무아\'를 통해 \'열반적정\'에 들고자 함이었을 것이며 가는 도중 도둑들과의 만남은 인과응보 즉 연기(緣起)의 결과로 인식했으며 도둑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은 죽음은 곧 번뇌를 마감하는 것으로 파악했거나 환생, 즉 윤회사상에 대한 돈독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만약 도둑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영재 자신으로서는 번뇌를 마감시켜주는 선업(先業)으로 받아드릴 수 있으나 도둑들의 입장에선 크나 큰 죄업(罪業)을 짓는 결과라 안타까웠을 것이다.
별곡 - 청산별곡 [작품 분석 & 감상]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라랑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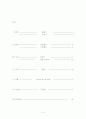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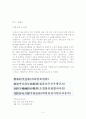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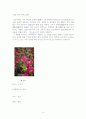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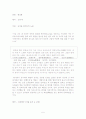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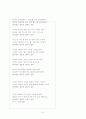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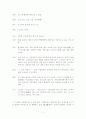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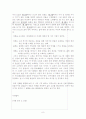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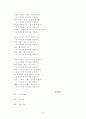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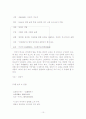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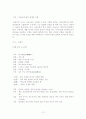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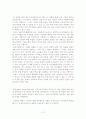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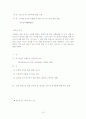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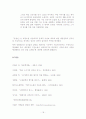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