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
1. 통치구조
2. 기본권 보장
Ⅲ.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
2. 집회․결사의 자유
Ⅳ. 결론
Ⅱ.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
1. 통치구조
2. 기본권 보장
Ⅲ.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
2. 집회․결사의 자유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통치구조에 따른 권력 통제와 기본권의 관계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Ⅰ. 문제 제기
‘권력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의에 선행할 수는 없다.’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한 국가의 통치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의 마그나카르타이다. 허 영,『한국헌법론』(서울:박영사), pp. 590. 1998.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통치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지표인 동시에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기능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통치 기구의 권능적인 시각에서 통치 질서를 이해 예컨대 법실증주의는 통치구조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한 국가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기목적적 강제기구’로 본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통치 구조는 결코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력내지는 권능의 기능적 제도적 제동 장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와 유리될 수 없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의의와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를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
1. 통치구조
“모든 권력은 부패될 경향을 갖는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경(Lord Acton)의 경고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역시 3권분립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 정부, 법원 이 세 국가 기관으로 권력 분립을 제도화 하고 있다.
1) 국회
(1) 지위와 구성 :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네이버 지식인
(2)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 규칙 제정권 등이 있으며,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결산 심사권, 국채 모집과 예산 이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국가 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도 있는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선출권 등이 있다.
‘국정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 및 승인권, 국무총리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탄핵소추권, 계엄 해제 요구권 등이 있다. 웰메이드 정치(법문사)참조
(3) 의의 : 국회의 권한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 이외에도 국채 모집과 해산, 이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 집행, 판결을 구분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4) 문제점 :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써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기관의 역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끌려가거나, 다수파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주 정치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모습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은 국회에서의 거대여당의 출현은 형식적인 다수의 힘에 의해 의회 정치를 무력화 시키고 더 나아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버리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수개월 간에 걸쳐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 집단, 각종 시민사회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미디어 법’을 행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를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Ⅰ. 문제 제기
‘권력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의에 선행할 수는 없다.’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한 국가의 통치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의 마그나카르타이다. 허 영,『한국헌법론』(서울:박영사), pp. 590. 1998.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통치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지표인 동시에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기능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통치 기구의 권능적인 시각에서 통치 질서를 이해 예컨대 법실증주의는 통치구조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한 국가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기목적적 강제기구’로 본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통치 구조는 결코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력내지는 권능의 기능적 제도적 제동 장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와 유리될 수 없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의의와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를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
1. 통치구조
“모든 권력은 부패될 경향을 갖는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경(Lord Acton)의 경고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역시 3권분립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 정부, 법원 이 세 국가 기관으로 권력 분립을 제도화 하고 있다.
1) 국회
(1) 지위와 구성 :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네이버 지식인
(2)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 규칙 제정권 등이 있으며,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결산 심사권, 국채 모집과 예산 이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국가 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도 있는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선출권 등이 있다.
‘국정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 및 승인권, 국무총리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탄핵소추권, 계엄 해제 요구권 등이 있다. 웰메이드 정치(법문사)참조
(3) 의의 : 국회의 권한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 이외에도 국채 모집과 해산, 이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입법, 집행, 판결을 구분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4) 문제점 :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써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기관의 역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끌려가거나, 다수파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주 정치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모습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은 국회에서의 거대여당의 출현은 형식적인 다수의 힘에 의해 의회 정치를 무력화 시키고 더 나아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버리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수개월 간에 걸쳐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 집단, 각종 시민사회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미디어 법’을 행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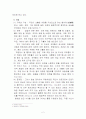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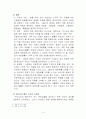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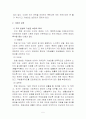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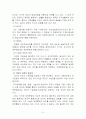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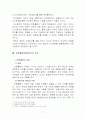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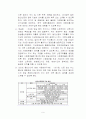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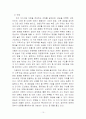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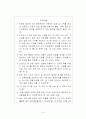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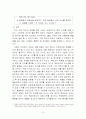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