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지은이는 주장하고 있다.
중국인의 전통적인 종교-신앙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타이완이나 홍콩지역을 지나다보면 불교나 도교와는 다른 계통의 신들을 主神으로 받드는 크고 작은 종교건축물들을 도처에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신들은 대부분 土地神을 비롯하여 關羽神등 수많은 신들이 흔히 祠 혹은 廟라 칭하는 장소에서 기층민들에 의해 폭넓게 숭배되고 있다. 보통 종교는 사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다양성이 많어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그래도 사묘라는 작은 제사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묘신앙은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중국인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이러한 사묘신앙은 언제부터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 송 · 원 이래 대다수 지방지의 편자들은 한 지역의 종교예배 장소를 보통 불교사원 · 도교궁관과 사묘로 나누어 기술하곤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묘가 당시 지역사회에 있어서 불사 · 도관 이외의 제삼의 종교예배 장소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교 · 도교 등 소위 제도화 종교와 더불어 민간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식의 거점으로 한 축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몇몇 학자들은 송대를 사묘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있다. ~10세기 이래 불교와 도교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민간의 토착신앙이 유교와 더불어 악진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돈 당 · 송 변혁기에 일어난 급속한 사회 · 경제적인 변화가 민간 사묘신앙의 전개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당대이 민간에 불교와 도교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신앙체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송대 이후에는 지방지 · 통속문학 작품 등 기층민의 생황을 전해 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급격히 증대하는 데 반해, 당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 중로 정치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정메서 볼 때 당대 중앙정부와 지방관들에 의해 주도된 淫祀에 대한 대규모 철폐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적인걸이 수공 4년(688)에 강남지역에서 1,700여 개소의 淫祀를 폐기시킨 이래, 당조 290년의 역사 속 사료에 보이는 저명한 철폐사례만 무려 10여 차례에 육박한다. 이는 당대 시대에 사묘신앙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묘는 민간신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국가제사형 사묘가 있는데 이는 당대 국가제사 체계에 속하거나 잉 상응하는 조정의 인가하에 정식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 사묘를 지칭한다. 사묘형태의 고정된 제사장소를 갖게 되고, 점차 관 · 민이 함께 숭배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런 까닭에 예제상의 운용원리와 예제 자체의 변화는 당대 민간사묘신앙의 전개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예제이론의 외연에 있어서 이렇게 사형 사묘 역시 점차 민간신앙적 성격을 자연스레 흡수하게 된다. 즉,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자연신에 대한 제사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嶽鎭海瀆과 山林川澤제사의 기원과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제사는 상대의 卜辭資料 가운데 이미 빈번하게 출현하지만, 주대에 이르면 현격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점차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어 지역수호신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인 종교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등급제와 분봉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즉각적으로 통일국가에 상응하는 제사체계를 건설킹 nl해 제후들과 민간의 제사권을 회수하여, 황제권력을 기초로 제신의 등급을 다시 정리 조정하였고, 전국각지의 지방관들에게 현지의 산천신을 제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의 제사제도는 새롭게 변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대에 이르면 산천제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선제 神爵 원년(61BC) 五嶽四瀆이 제사가 정식으로 사전에 편입되어 상례화되었다. 태산과 황하의 제사는 매년 다섯 차례, 강수는 매년 네 차례, 그 밖에 거은 매년 세 차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교사제도가 점차 완비되어 5악4독을 위시한 산천제사 역시 점차 교사제도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이는 주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점차 人格神적인 특징이 소실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예제화의 진전이 이처럼 산천신 신성의 추상화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이로 인해 민중들은 점차 이러한 제사로부터 이탈해 가따.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신앙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관묘나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음사 등 인격신 쪽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후한대에 널리 유행하는 城王景王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신 제살르 사묘에 드리는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북위시대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북위시대 이후 수대에 이르면 묘우가 더욱 확대되는데 제진과 남해 · 동해 등 여타 자연신의 소재지에도 사묘해 아래 사묘가 건립되었고, 묘굴의 무사 한 명씩을 뽑아 묘우의 관리를 책임지게 했다. 이러한 면 국가제사 차원에 있어서 사묘에서 드리는 자연신 제사가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초기 국가주도 산천제사의 전개는 대략 비정기 제사와 정기제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비정기적인 제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거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비정기적인 제사는 황제의 순수중 명산대천 부근을 통과할 때 관리를 파견해서 드리는 제사를 들 수 있다.
정기제사는 제사장소에 따라 교지와 악독진해의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교지에서 거행하는 산천제사는 1백신 가운데 하나의 명목으로 지기의 부속인 명목으로 제사를 받는 것인데, 한 대 교사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사는 현지의 도독과 자사가 예관을 겸하여 진행했느
중국인의 전통적인 종교-신앙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타이완이나 홍콩지역을 지나다보면 불교나 도교와는 다른 계통의 신들을 主神으로 받드는 크고 작은 종교건축물들을 도처에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신들은 대부분 土地神을 비롯하여 關羽神등 수많은 신들이 흔히 祠 혹은 廟라 칭하는 장소에서 기층민들에 의해 폭넓게 숭배되고 있다. 보통 종교는 사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다양성이 많어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그래도 사묘라는 작은 제사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묘신앙은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중국인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이러한 사묘신앙은 언제부터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 송 · 원 이래 대다수 지방지의 편자들은 한 지역의 종교예배 장소를 보통 불교사원 · 도교궁관과 사묘로 나누어 기술하곤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묘가 당시 지역사회에 있어서 불사 · 도관 이외의 제삼의 종교예배 장소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교 · 도교 등 소위 제도화 종교와 더불어 민간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식의 거점으로 한 축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몇몇 학자들은 송대를 사묘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있다. ~10세기 이래 불교와 도교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민간의 토착신앙이 유교와 더불어 악진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돈 당 · 송 변혁기에 일어난 급속한 사회 · 경제적인 변화가 민간 사묘신앙의 전개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당대이 민간에 불교와 도교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신앙체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송대 이후에는 지방지 · 통속문학 작품 등 기층민의 생황을 전해 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급격히 증대하는 데 반해, 당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 중로 정치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정메서 볼 때 당대 중앙정부와 지방관들에 의해 주도된 淫祀에 대한 대규모 철폐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적인걸이 수공 4년(688)에 강남지역에서 1,700여 개소의 淫祀를 폐기시킨 이래, 당조 290년의 역사 속 사료에 보이는 저명한 철폐사례만 무려 10여 차례에 육박한다. 이는 당대 시대에 사묘신앙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묘는 민간신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국가제사형 사묘가 있는데 이는 당대 국가제사 체계에 속하거나 잉 상응하는 조정의 인가하에 정식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 사묘를 지칭한다. 사묘형태의 고정된 제사장소를 갖게 되고, 점차 관 · 민이 함께 숭배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런 까닭에 예제상의 운용원리와 예제 자체의 변화는 당대 민간사묘신앙의 전개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예제이론의 외연에 있어서 이렇게 사형 사묘 역시 점차 민간신앙적 성격을 자연스레 흡수하게 된다. 즉,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자연신에 대한 제사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嶽鎭海瀆과 山林川澤제사의 기원과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제사는 상대의 卜辭資料 가운데 이미 빈번하게 출현하지만, 주대에 이르면 현격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점차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어 지역수호신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인 종교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등급제와 분봉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즉각적으로 통일국가에 상응하는 제사체계를 건설킹 nl해 제후들과 민간의 제사권을 회수하여, 황제권력을 기초로 제신의 등급을 다시 정리 조정하였고, 전국각지의 지방관들에게 현지의 산천신을 제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의 제사제도는 새롭게 변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대에 이르면 산천제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선제 神爵 원년(61BC) 五嶽四瀆이 제사가 정식으로 사전에 편입되어 상례화되었다. 태산과 황하의 제사는 매년 다섯 차례, 강수는 매년 네 차례, 그 밖에 거은 매년 세 차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교사제도가 점차 완비되어 5악4독을 위시한 산천제사 역시 점차 교사제도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이는 주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점차 人格神적인 특징이 소실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예제화의 진전이 이처럼 산천신 신성의 추상화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이로 인해 민중들은 점차 이러한 제사로부터 이탈해 가따.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신앙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관묘나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음사 등 인격신 쪽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후한대에 널리 유행하는 城王景王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신 제살르 사묘에 드리는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북위시대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북위시대 이후 수대에 이르면 묘우가 더욱 확대되는데 제진과 남해 · 동해 등 여타 자연신의 소재지에도 사묘해 아래 사묘가 건립되었고, 묘굴의 무사 한 명씩을 뽑아 묘우의 관리를 책임지게 했다. 이러한 면 국가제사 차원에 있어서 사묘에서 드리는 자연신 제사가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초기 국가주도 산천제사의 전개는 대략 비정기 제사와 정기제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비정기적인 제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거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비정기적인 제사는 황제의 순수중 명산대천 부근을 통과할 때 관리를 파견해서 드리는 제사를 들 수 있다.
정기제사는 제사장소에 따라 교지와 악독진해의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교지에서 거행하는 산천제사는 1백신 가운데 하나의 명목으로 지기의 부속인 명목으로 제사를 받는 것인데, 한 대 교사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사는 현지의 도독과 자사가 예관을 겸하여 진행했느
추천자료
 [동서양 고전]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요약하시요
[동서양 고전]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요약하시요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과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중점정책의 예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과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중점정책의 예 [러시아 푸틴정부][러시아 푸틴정부 대외정책][러시아 푸틴정부 대한반도 정책]러시아 푸틴정...
[러시아 푸틴정부][러시아 푸틴정부 대외정책][러시아 푸틴정부 대한반도 정책]러시아 푸틴정... [법학]헌법재판소,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정치적 기관인가? 독립된 재판기관인가?)
[법학]헌법재판소,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정치적 기관인가? 독립된 재판기관인가?) [독후감 감상문 서평 요약] 글로벌 트렌드 2030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
[독후감 감상문 서평 요약] 글로벌 트렌드 2030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 [루소]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사...
[루소]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사...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내용, 법치주의와 법치국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법치주의와 ...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내용, 법치주의와 법치국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법치주의와 ... [시민사회][시민]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성격,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시민사회의 국...
[시민사회][시민]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성격,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시민사회의 국...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성격, 5 16쿠데타(5 1...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성격, 5 16쿠데타(5 1...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개념과 차원, 권력 개념 속에 공통된 본질, 권력 행사 메카니즘)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개념과 차원, 권력 개념 속에 공통된 본질, 권력 행사 메카니즘)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 (행정법상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의 기초, 국가별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 (행정법상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의 기초, 국가별 법치주의, ... [평가우수자료] 타오르는 종교개혁의 불씨 [루터, 칼뱅,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종교개혁가 루...
[평가우수자료] 타오르는 종교개혁의 불씨 [루터, 칼뱅,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종교개혁가 루...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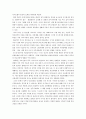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