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유란 무엇인가
수사학인가 철학인가
수사학과 비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사학과 비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유는 어떤 구실을 하는가
비유와 세계관
2. 은유는 무엇인가
언어학자는 은유를 어떻게 보는가
은유를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는가
은유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은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유에는 어떤 갈래가 있는가
직유와 은유 사이
수사학인가 철학인가
수사학과 비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사학과 비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유는 어떤 구실을 하는가
비유와 세계관
2. 은유는 무엇인가
언어학자는 은유를 어떻게 보는가
은유를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는가
은유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은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유에는 어떤 갈래가 있는가
직유와 은유 사이
본문내용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종과 속의 그것에 가깝다. 그러므로 은유와 직유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꽤 큰 차이가 있다.
은유에서와는 달리 직유에서는 ‘~처럼’이나 ‘~와 같이’ 또는 ‘~인 듯’이나 ‘~보다’ 같은 보조 수단을 써서 의미의 전이를 제안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 직유는 전이 과정의 뼈대만 보여줄 뿐 그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달리 바꾸면 비유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직유를 두고 ‘은유의 가난한 친척’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그것을 깨닫는 독자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유적 유추 과정에 기대는 은유는 무엇보다도 독자의 반응이 필요하다. 연극이 청중들로부터의 참여를 요구하듯이 은유도 독자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만약 독자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참여가 없다면 저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축어적 비교에 기대는 직유는 은유처럼 독자의 창조적 참여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직유 속에는 이미 그 답이 들어 있는 탓에 싱겁기 짝이 없다. 가령 ‘백년 전쟁은 년에 걸쳐 일어났는가?’ 라든지, ‘무화과는 꽃이 피는가?’ 라든지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심하게 말하면 직유는 아예 비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비유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이유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은유와 비유의 이러한 속성을 원시 시대의 소비자와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자를 견줄 수 있을 것 같다. 원시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쓸 연장을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창조적 기쁨을 느꼈다. 이 무렵 생산자와 소비자는 엄격히 나뉘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요 생산자가 곧 소비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와 그것을 쓰는 소비자 사이에 높다란 벽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은유에서와는 달리 직유에서 독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처럼 시인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은유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직유와는 크게 다르다. 조금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론가들은 비균형성과 역전성이라고 부른다. 은유에서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를 역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유에서와는 달리 은유에서 이 두 관념을 저울에 달면 그 무게는 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한 떨기 장미꽃’이라는 은유는 잘 어울려도 ‘한 떨기 장미꽃을 사랑’이라는 표현은 은유로서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사랑’이라는 축어적 관념과 ‘장미꽃’이라는 비유적 관념을 뒤바꾸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은유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이 서로 뒤바꾸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홀로 지샌 긴 밤이여’ ‘그 겨울의 찻집’ 이라는 유행가 가사는 이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름다운 죄 사랑’이 언뜻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서로 뒤바꾸어놓은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좀더 찬찬히 살펴보면 이 표현은 ‘사랑은 아름다운 죄’ 라는 은유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치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사랑은 아름다운 죄’ 라는 은유는 성립하여도 ‘아름다운 죄는 사랑’ 이라는 은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직유에서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서로 바꾸어놓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격언도 있듯이 두 관념을 뒤집어놓았을 때와 그러하지 않을 때 그 의미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유도 때로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바꾸어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타원은 원과 같다’ 라거나 ‘쿠바는 소련과 같다’라고 말하지 거꾸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유의 관습 때문이다. 이 직유의 관습에 따라 ‘이순신 장군이 초상화를 닮았다’ 라고 하지 ‘초상화가 이순신 장군을 닮았다’ 라고는 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에이머스 트버스키는 이러한 직유의 관습을 심리적 측면에서 처음 밝힌 이론가로 흔히 꼽힌다. 주제와 지시 대상의 관계는 결코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트버스키에 따르면 좀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시 대상이고, 덜 뚜렷하거나 원형이 아닌 것을 주제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영국의 비평가 데이빗 롯지는 은유와 환유 같은 비유를 현대 문학의 특성을 밝혀내는 열쇠로 삼아온 그는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언어의 은유 축과 환유 축 사이의 좀더 완전한 차이에 상응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환유를 즐겨 쓰는 작가는 좀처럼 은유적 장치를 쓰지 않는다. 리처드 램핸도 직유는 차별성에서 유사성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은유와 비슷하지만 선택보다는 결합의 축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환유와 더 많이 닮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직유의 한계나 단점으로 지적해 온 특징들이 오히려 가능성이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사람에게는 흠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덕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령 은유에서 비유적 의미는 때로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치 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하거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직유는 은유와 비교해 볼 때 의미를 통제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 직유에서 비유적 의미는 말뚝에 고삐가 매인채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좀처럼 제한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쉽게 손에 잡힌다.
그렇다면 문제는 은유를 쓰느냐 직유를 쓰느냐에 있지 않고 직유이든 은유이든 그것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데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실에 꿰어야 보배가 된다’ 는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은유라고 하여도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적절히 구사하는 능력이야말로 천재의 징표라고 하였지만 은유를 잘못 쓰면 둔재의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은유에서와는 달리 직유에서는 ‘~처럼’이나 ‘~와 같이’ 또는 ‘~인 듯’이나 ‘~보다’ 같은 보조 수단을 써서 의미의 전이를 제안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 직유는 전이 과정의 뼈대만 보여줄 뿐 그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달리 바꾸면 비유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직유를 두고 ‘은유의 가난한 친척’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그것을 깨닫는 독자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유적 유추 과정에 기대는 은유는 무엇보다도 독자의 반응이 필요하다. 연극이 청중들로부터의 참여를 요구하듯이 은유도 독자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만약 독자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참여가 없다면 저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축어적 비교에 기대는 직유는 은유처럼 독자의 창조적 참여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직유 속에는 이미 그 답이 들어 있는 탓에 싱겁기 짝이 없다. 가령 ‘백년 전쟁은 년에 걸쳐 일어났는가?’ 라든지, ‘무화과는 꽃이 피는가?’ 라든지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심하게 말하면 직유는 아예 비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비유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이유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은유와 비유의 이러한 속성을 원시 시대의 소비자와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자를 견줄 수 있을 것 같다. 원시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쓸 연장을 직접 손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창조적 기쁨을 느꼈다. 이 무렵 생산자와 소비자는 엄격히 나뉘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요 생산자가 곧 소비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와 그것을 쓰는 소비자 사이에 높다란 벽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은유에서와는 달리 직유에서 독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처럼 시인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은유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직유와는 크게 다르다. 조금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론가들은 비균형성과 역전성이라고 부른다. 은유에서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를 역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유에서와는 달리 은유에서 이 두 관념을 저울에 달면 그 무게는 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한 떨기 장미꽃’이라는 은유는 잘 어울려도 ‘한 떨기 장미꽃을 사랑’이라는 표현은 은유로서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사랑’이라는 축어적 관념과 ‘장미꽃’이라는 비유적 관념을 뒤바꾸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은유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이 서로 뒤바꾸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홀로 지샌 긴 밤이여’ ‘그 겨울의 찻집’ 이라는 유행가 가사는 이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름다운 죄 사랑’이 언뜻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서로 뒤바꾸어놓은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좀더 찬찬히 살펴보면 이 표현은 ‘사랑은 아름다운 죄’ 라는 은유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치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사랑은 아름다운 죄’ 라는 은유는 성립하여도 ‘아름다운 죄는 사랑’ 이라는 은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직유에서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서로 바꾸어놓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격언도 있듯이 두 관념을 뒤집어놓았을 때와 그러하지 않을 때 그 의미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유도 때로는 축어적 관념과 비유적 관념을 바꾸어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타원은 원과 같다’ 라거나 ‘쿠바는 소련과 같다’라고 말하지 거꾸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유의 관습 때문이다. 이 직유의 관습에 따라 ‘이순신 장군이 초상화를 닮았다’ 라고 하지 ‘초상화가 이순신 장군을 닮았다’ 라고는 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에이머스 트버스키는 이러한 직유의 관습을 심리적 측면에서 처음 밝힌 이론가로 흔히 꼽힌다. 주제와 지시 대상의 관계는 결코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트버스키에 따르면 좀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시 대상이고, 덜 뚜렷하거나 원형이 아닌 것을 주제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영국의 비평가 데이빗 롯지는 은유와 환유 같은 비유를 현대 문학의 특성을 밝혀내는 열쇠로 삼아온 그는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언어의 은유 축과 환유 축 사이의 좀더 완전한 차이에 상응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환유를 즐겨 쓰는 작가는 좀처럼 은유적 장치를 쓰지 않는다. 리처드 램핸도 직유는 차별성에서 유사성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은유와 비슷하지만 선택보다는 결합의 축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환유와 더 많이 닮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직유의 한계나 단점으로 지적해 온 특징들이 오히려 가능성이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사람에게는 흠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덕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령 은유에서 비유적 의미는 때로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치 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하거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직유는 은유와 비교해 볼 때 의미를 통제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 직유에서 비유적 의미는 말뚝에 고삐가 매인채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좀처럼 제한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쉽게 손에 잡힌다.
그렇다면 문제는 은유를 쓰느냐 직유를 쓰느냐에 있지 않고 직유이든 은유이든 그것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데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실에 꿰어야 보배가 된다’ 는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은유라고 하여도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적절히 구사하는 능력이야말로 천재의 징표라고 하였지만 은유를 잘못 쓰면 둔재의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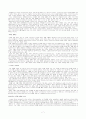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