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2. 1 ‘한글’과 ‘맞춤법’의 정의
2. 2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2. 1 표준어
2. 2. 2 소리대로 적다. - 표음주의 표기법
(1) 불규칙적이 음운 변동 현상
(2) 실질 형태소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2. 2. 3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의주의 표기법
(1) 무조건적인 음운 변동 현상-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음
(2) 실질 형태소나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
3. 정리 및 몇 가지 문제점
<표 1> 어간의 불규칙 <표 2> 어미의 불규칙 <표 3>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표 4> 규칙적인 음운 현상
<표 5>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의 음운 현상
<표 6>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음운 현상
<표 7> 표음주의 표기법과 표의주의 표기법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2. 1 ‘한글’과 ‘맞춤법’의 정의
2. 2 현행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2. 1 표준어
2. 2. 2 소리대로 적다. - 표음주의 표기법
(1) 불규칙적이 음운 변동 현상
(2) 실질 형태소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2. 2. 3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의주의 표기법
(1) 무조건적인 음운 변동 현상-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음
(2) 실질 형태소나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
3. 정리 및 몇 가지 문제점
<표 1> 어간의 불규칙 <표 2> 어미의 불규칙 <표 3>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표 4> 규칙적인 음운 현상
<표 5>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의 음운 현상
<표 6>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음운 현상
<표 7> 표음주의 표기법과 표의주의 표기법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
본문내용
집』의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과 <표준어 규정> 해설에 나타나 있다. 어문 규정집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표준어 규정> 해설에서 ‘교양 있는 사람’은 1933년 조선어 학회의 ‘중류 사회’라는 말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바꾼 말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사회 계층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중간 계층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상류층이나 하류층에서 쓰는 말들은 사회 방언으로 보는 견해로 풀이된다. 다만 표준어를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로 보고, 학교 교육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며,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두루 쓰는’ 이라는 말은 보편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를 보편성으로 볼 것인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현대’라는 말은 시대적 조건인데, 이는 언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되며, ‘서울말’은 지역적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칙으로 한다.’ 말은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준어 규정>에서는 언어의 역사성의 입장에서 발음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방언 중에서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는 것이나 사어(死語)가 된 것 대신 새로운 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멍게’는 방언이었는데, 원래 표준어였던 ‘우렁쉥이’보다 널리 쓰이기에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 2. 2 소리대로 적다. - 표음주의 표기법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은 표음주의 표기법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전체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소리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규정집에 예시된 단어들인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등의 단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외에 표음주의 표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맞은데, 한글 맞춤법 각 조항을 통해서 살펴보자.
(1) 불규칙적이 음운 변동 현상
음운의 변동 현상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는 표음주의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규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 없다는 말은 음운 변동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억개’가 아닌 ‘어깨’로 적는다.
②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6항과 제18항
제18항은 불규칙 용언에 대한 규정이다. 불규칙 용언이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중의 하나 또는 둘 다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경우이다. 말 그대로 불규칙 활용이기에 소리대로 표기한다. 불규칙 용언은 크게 어간 불규칙, 어미의 불규칙,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어간의 불규칙>
불규칙 용언
변화 양상
용례
비고
‘ㅅ’ 불규칙
어간 받침 ‘ㅅ’이 모음 앞에서 탈락
낫다 → 나아
벗다→벗어
‘ㄷ’ 불규칙
어간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묻다(문(問))→
물어라
묻다(매(埋)→
묻어라
‘ㅂ’ 불규칙
어간 받칩 ‘ㅂ’이 모음 앞에서 ‘오/우’로 바뀌는 현상
곱다→고와
뽑다→뽑아
‘ㅜ’불규칙
어간의 모음 ‘우’가 어미 ‘-어’와 결합할 때 ‘ㅜ’가 탈락하는 현상
푸다→퍼
푸르다→
푸르러
‘르’불규칙
어간의 끝음절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로 변하는 현상
흐르+어→
흘러
흐르고
<어미의 불규칙>
불규칙 용언
변화 양상
용례
비고
‘여’ 불규칙
어간 ‘하-’ 뒤에 어미 ‘-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결합
하다 → 하여
받다→받아
‘러’ 불규칙
‘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될 때, ‘러’로 바뀌는 현상
이르(至)+어→이르러
치르+어→
치러
‘거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거라’로 바뀌는 현상
가+거라→
가거라
먹+어라→
먹어라
‘너라’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너라’로 바뀌는 현상
오+너라→
오너라
먹+아라→
먹어라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불규칙 용언
변화 양상
용례
비고
‘ㅎ’ 불규칙
어간 받침 ‘ㅎ’이 모음 어미를 만나면 ‘ㅎ’이 탈락하면서 어미의 일부도 변하는 현상
파랗+아→
파래
좋+아→
좋아
③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21항, ‘다만’
제21항은 어근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도 ‘다만’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과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이다.
‘실쭉하다’를 ‘싫+죽하다’로 분석하면 ‘실축하다’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발음되지 않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말끔하다’ 역시 ‘맑+음하다’로 분석된다면 ‘말금하다’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뒤의 자음이 발음되지 않기에 소리나는 대로 ‘말끔하다’로 적는다. 이에 비해 ‘넓적다리’는 [넙쩍다리]로 발음되기에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다.
④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제30항
제30항은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이다. 사이시옷 역시 불규칙적인 음운 현상이기에 사잇소리가 날 경우도 있고, 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음주의의 원칙에 의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로 ‘나룻배’ 등이 그 예이다. 둘째,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뱃놀이, 냇물’ 등이 있다. 셋째, 뒷말의 첫소리 ‘ㅣ’이나 \'j\'계 이중 모음이 와서 ‘ㄴㄴ’ 소리가 나는 경우로 ‘깻잎, 나뭇잎’ 등이 그 예이다.
이 때 표기 기호로 ‘ㅅ’을 적은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시옷의 두 번째 경우 ‘냇물’이라고 표기해도 음절 끝소리 규칙(
다음으로 ‘원칙으로 한다.’ 말은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준어 규정>에서는 언어의 역사성의 입장에서 발음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방언 중에서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는 것이나 사어(死語)가 된 것 대신 새로운 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멍게’는 방언이었는데, 원래 표준어였던 ‘우렁쉥이’보다 널리 쓰이기에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 2. 2 소리대로 적다. - 표음주의 표기법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은 표음주의 표기법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전체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소리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규정집에 예시된 단어들인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등의 단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외에 표음주의 표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맞은데, 한글 맞춤법 각 조항을 통해서 살펴보자.
(1) 불규칙적이 음운 변동 현상
음운의 변동 현상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는 표음주의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규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 없다는 말은 음운 변동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억개’가 아닌 ‘어깨’로 적는다.
②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6항과 제18항
제18항은 불규칙 용언에 대한 규정이다. 불규칙 용언이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중의 하나 또는 둘 다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경우이다. 말 그대로 불규칙 활용이기에 소리대로 표기한다. 불규칙 용언은 크게 어간 불규칙, 어미의 불규칙,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어간의 불규칙>
불규칙 용언
변화 양상
용례
비고
‘ㅅ’ 불규칙
어간 받침 ‘ㅅ’이 모음 앞에서 탈락
낫다 → 나아
벗다→벗어
‘ㄷ’ 불규칙
어간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묻다(문(問))→
물어라
묻다(매(埋)→
묻어라
‘ㅂ’ 불규칙
어간 받칩 ‘ㅂ’이 모음 앞에서 ‘오/우’로 바뀌는 현상
곱다→고와
뽑다→뽑아
‘ㅜ’불규칙
어간의 모음 ‘우’가 어미 ‘-어’와 결합할 때 ‘ㅜ’가 탈락하는 현상
푸다→퍼
푸르다→
푸르러
‘르’불규칙
어간의 끝음절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로 변하는 현상
흐르+어→
흘러
흐르고
<어미의 불규칙>
불규칙 용언
변화 양상
용례
비고
‘여’ 불규칙
어간 ‘하-’ 뒤에 어미 ‘-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결합
하다 → 하여
받다→받아
‘러’ 불규칙
‘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될 때, ‘러’로 바뀌는 현상
이르(至)+어→이르러
치르+어→
치러
‘거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거라’로 바뀌는 현상
가+거라→
가거라
먹+어라→
먹어라
‘너라’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너라’로 바뀌는 현상
오+너라→
오너라
먹+아라→
먹어라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불규칙 용언
변화 양상
용례
비고
‘ㅎ’ 불규칙
어간 받침 ‘ㅎ’이 모음 어미를 만나면 ‘ㅎ’이 탈락하면서 어미의 일부도 변하는 현상
파랗+아→
파래
좋+아→
좋아
③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21항, ‘다만’
제21항은 어근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도 ‘다만’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과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이다.
‘실쭉하다’를 ‘싫+죽하다’로 분석하면 ‘실축하다’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발음되지 않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말끔하다’ 역시 ‘맑+음하다’로 분석된다면 ‘말금하다’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뒤의 자음이 발음되지 않기에 소리나는 대로 ‘말끔하다’로 적는다. 이에 비해 ‘넓적다리’는 [넙쩍다리]로 발음되기에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다.
④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제30항
제30항은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이다. 사이시옷 역시 불규칙적인 음운 현상이기에 사잇소리가 날 경우도 있고, 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음주의의 원칙에 의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로 ‘나룻배’ 등이 그 예이다. 둘째,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로 ‘뱃놀이, 냇물’ 등이 있다. 셋째, 뒷말의 첫소리 ‘ㅣ’이나 \'j\'계 이중 모음이 와서 ‘ㄴㄴ’ 소리가 나는 경우로 ‘깻잎, 나뭇잎’ 등이 그 예이다.
이 때 표기 기호로 ‘ㅅ’을 적은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시옷의 두 번째 경우 ‘냇물’이라고 표기해도 음절 끝소리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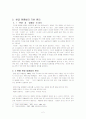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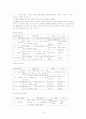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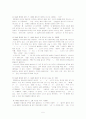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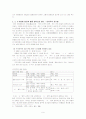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