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자의 역사
Ⅱ. 차자표기(借字表記)의 원리와 종류
2. 1 차자표기의 원리
2. 1. 1 음차(音借) 2. 1. 2 훈차(訓借)
2. 2 서기문식(誓記文式) 표기
2. 3 이두(吏讀) 표기법 2. 3. 1 이두 표기의 사회성
2. 4 향찰(鄕札) 표기
2. 5 구결 2. 5. 1 구결과 이두의 비교
Ⅲ. 결론
<표 1> 고유 명사 표기의 예
<표 2> 구결 음차와 훈차의 예
<표 3>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글살이
<표 4> 차자표기 방법의 정리
Ⅱ. 차자표기(借字表記)의 원리와 종류
2. 1 차자표기의 원리
2. 1. 1 음차(音借) 2. 1. 2 훈차(訓借)
2. 2 서기문식(誓記文式) 표기
2. 3 이두(吏讀) 표기법 2. 3. 1 이두 표기의 사회성
2. 4 향찰(鄕札) 표기
2. 5 구결 2. 5. 1 구결과 이두의 비교
Ⅲ. 결론
<표 1> 고유 명사 표기의 예
<표 2> 구결 음차와 훈차의 예
<표 3>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글살이
<표 4> 차자표기 방법의 정리
본문내용
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연 어떤 글자를 훈독하고 어떤 글자를 음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어떤 언어가 자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언어의 본래의 목적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뿐이다. 무슨 방식으로든지 통일이 필요했다.
2. 3. 1 이두 표기의 사회성
이두는 조선까지 이어진 표기 방식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문자는 권위의 상징이었기 문자 생활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중간 계층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 중간 계층이 국가의 업무 전반을 맡았을 것이다.
상층 문화의 담당층인 귀족 계급은 한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기에 이두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급 관리들은 한문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귀족 계급보다는 부족했지만 실무 행정은 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하급 관리들을 위한 한문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들 관리의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이두의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관습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법과 행정 실무에 관한 사항들의 표현이란 문학적 표현과 달리 고정화시키기에 유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 관습화된 표현 양식이 세대를 통해 세습되면서 그 생명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두의 한자 표기가 이두(吏頭)라는 점이 그 증거이며, 이두로 표기된 문학 작품이 없다는 점 역시 관습화된 이두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실제 이두로 기록된 것들은 『대명률직해』와 같은 법전들이다. 이 법전과 이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명률직해>
凡以妻爲妾者 杖一白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改正○
若有妻更娶妻者 亦杖九十 離異 基民四十以上無子者 方聽取妾 違者苔四十
<이두 직해>
凡嫡妻乙爲妾爲在乙良杖一白 嫡妻生存爲去乙以妾爲妻者杖九十改正齊○
正妻現在爲去乙他妾更娶爲遣乙良杖九十遣離異齊 年至四十爲已只無子息爲去等沙聽許取妾爲 乎矣 違者苔四十
<해석>
무릇, 처로써 첩을 삼은 자는 장 일백의 형에 처한다. 처가 있는데 첩으로서 처를 삼은 자도 장 구십의 형에 처하고 모두 바로 고친다.
여기서 쓰인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두
의미
음차
훈차
乙
목적격 조사 ‘을’
○(새을)
爲在乙良
하거들랑
乙-을, 良-랑
爲- 하 在-거
齊
-다
○(다 제)
爲去乙
하거늘
去-거 乙-를
爲 -하
爲遣乙良
하거들랑
遣-거, 乙-를, 良-랑
爲 -하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 문장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표현 중 음차를 하는 글자와 훈자를 하는 글자 역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표현은 다음 세대로 넘어 가면서 굳어졌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4 향찰(鄕札) 표기
우리 고전 문학 중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문학이다. 이 향찰 역시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다. 앞의 이두와 달리 향찰의 경우는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어서 향찰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향찰은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 즉, 신라어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는 「처용가(處容歌)」와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의 몇 구절을 중심으로 향찰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처용가」의 첫 구절인 “東京明期月良”을 김완진 “東京 기 라라”로 해독하고 있다. 여기서 ‘명(明)’은 뜻을 빌려 ‘’로 해석하고 ‘기(期)’는 음을 빌려 ‘기’로 해석했다. ‘月良’ 역시 ‘월(月)’은 훈차, ‘량(良)’은 음차를 한 경우이다. 그 외에도 ‘入伊, 行如可, 入良沙, 見昆, 四是良羅, 爲理古’ 은 각각 ‘들-이, 니-다가, 들-랑사, 보-곤,
2. 3. 1 이두 표기의 사회성
이두는 조선까지 이어진 표기 방식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문자는 권위의 상징이었기 문자 생활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중간 계층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 중간 계층이 국가의 업무 전반을 맡았을 것이다.
상층 문화의 담당층인 귀족 계급은 한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기에 이두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급 관리들은 한문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귀족 계급보다는 부족했지만 실무 행정은 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하급 관리들을 위한 한문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들 관리의 신분은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이두의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관습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법과 행정 실무에 관한 사항들의 표현이란 문학적 표현과 달리 고정화시키기에 유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 관습화된 표현 양식이 세대를 통해 세습되면서 그 생명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두의 한자 표기가 이두(吏頭)라는 점이 그 증거이며, 이두로 표기된 문학 작품이 없다는 점 역시 관습화된 이두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실제 이두로 기록된 것들은 『대명률직해』와 같은 법전들이다. 이 법전과 이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명률직해>
凡以妻爲妾者 杖一白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改正○
若有妻更娶妻者 亦杖九十 離異 基民四十以上無子者 方聽取妾 違者苔四十
<이두 직해>
凡嫡妻乙爲妾爲在乙良杖一白 嫡妻生存爲去乙以妾爲妻者杖九十改正齊○
正妻現在爲去乙他妾更娶爲遣乙良杖九十遣離異齊 年至四十爲已只無子息爲去等沙聽許取妾爲 乎矣 違者苔四十
<해석>
무릇, 처로써 첩을 삼은 자는 장 일백의 형에 처한다. 처가 있는데 첩으로서 처를 삼은 자도 장 구십의 형에 처하고 모두 바로 고친다.
여기서 쓰인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두
의미
음차
훈차
乙
목적격 조사 ‘을’
○(새을)
爲在乙良
하거들랑
乙-을, 良-랑
爲- 하 在-거
齊
-다
○(다 제)
爲去乙
하거늘
去-거 乙-를
爲 -하
爲遣乙良
하거들랑
遣-거, 乙-를, 良-랑
爲 -하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 문장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표현 중 음차를 하는 글자와 훈자를 하는 글자 역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표현은 다음 세대로 넘어 가면서 굳어졌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4 향찰(鄕札) 표기
우리 고전 문학 중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문학이다. 이 향찰 역시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다. 앞의 이두와 달리 향찰의 경우는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어서 향찰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향찰은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 즉, 신라어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는 「처용가(處容歌)」와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의 몇 구절을 중심으로 향찰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처용가」의 첫 구절인 “東京明期月良”을 김완진 “東京 기 라라”로 해독하고 있다. 여기서 ‘명(明)’은 뜻을 빌려 ‘’로 해석하고 ‘기(期)’는 음을 빌려 ‘기’로 해석했다. ‘月良’ 역시 ‘월(月)’은 훈차, ‘량(良)’은 음차를 한 경우이다. 그 외에도 ‘入伊, 行如可, 入良沙, 見昆, 四是良羅, 爲理古’ 은 각각 ‘들-이, 니-다가, 들-랑사, 보-곤,
추천자료
 상고가요와 향가의 전반적 특성
상고가요와 향가의 전반적 특성 안민가와 청산별곡을 통한 향가와 고려가요의 비교
안민가와 청산별곡을 통한 향가와 고려가요의 비교 제망매가의 신해석
제망매가의 신해석 향가에서 살펴본 신라여성
향가에서 살펴본 신라여성 제망매가와 처용가의 문학적 표현
제망매가와 처용가의 문학적 표현 [국문학] 고전문학의 종류별 정의와 설명(향가,속요,시조,가사..)
[국문학] 고전문학의 종류별 정의와 설명(향가,속요,시조,가사..) 향가 3수 분석(안민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향가 3수 분석(안민가,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향가][신라시대 향가][처용가]향가(신라시대) 처용가의 작품해제, 향가(신라시대) 처용가의 ...
[향가][신라시대 향가][처용가]향가(신라시대) 처용가의 작품해제, 향가(신라시대) 처용가의 ... [처용가][신라 향가]신라 향가 처용가의 작품해제, 신라 향가 처용가의 원문, 신라 향가 처용...
[처용가][신라 향가]신라 향가 처용가의 작품해제, 신라 향가 처용가의 원문, 신라 향가 처용... 중학교 국어 <서동요> 수업자료
중학교 국어 <서동요> 수업자료 향가의 성격 규정과 작품에 적용하기
향가의 성격 규정과 작품에 적용하기 향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작품들의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하시오.
향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작품들의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하시오. 원왕생원왕생 그리는 이 있다 사뢰로서 - 고전시가 교육론 - 원왕생가(願往生歌)
원왕생원왕생 그리는 이 있다 사뢰로서 - 고전시가 교육론 - 원왕생가(願往生歌) 보현십원가 분석과 지도 방안
보현십원가 분석과 지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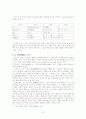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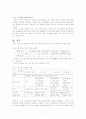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