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사적 관점에서 분석
1)자본주의적 욕망
2) 소통 불가능성
(2)서사의 이미지화
(3)극복의 서사 <오아시스>
종합 및 결론
1)자본주의적 욕망
2) 소통 불가능성
(2)서사의 이미지화
(3)극복의 서사 <오아시스>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망은 삶을 추동하는 에너지이지만, 그 욕망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바깥으로부터 오는 욕망이기 때문에 심리적 헛헛함만 남길 뿐이다. 심리적 공허함은 자신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항상 빗나가는 ‘자신’속에서 자신을 그리워한다.
영호는 그 공허함을 고문경찰관 당시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자전거로 주위를 빙빙 회전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그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 사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요구하는 욕망의 늪이다. 영호가 순임을 사랑하고 야생화를 사랑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고문을 해야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와 살아야하고, 사기꾼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영호 아닌 또 다른 영호의 모습을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사회적 강요 때문에 영호는 폭력 경찰이 되고,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간다.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수록 그 심리적 헛헛함은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영호는 미쳐간다. 자신에게 돌아갈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자의식은 영호를 광적으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자신도 알 수없는 무엇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그 욕망의 늪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인의 삶이며,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시대적 가치이다.
이러한 갈등은 <초록물고기>에서도 나타난다. 가족화합의 차원에서 가족야유회를 왔지만, 큰형과 큰형수가 싸우는 둥, 불화의 모습만이 가득하다, 그 불편한 심기가 차를 타고 빙빙도는 모습을 통해서 난타난다. 가족을 떠날 수도 없고, 가족의 화합의 소망은 단지 자신만의 허망한 꿈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영호에게 고문경찰관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나, 사랑하지 않는 아내, 홍자의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은 일상인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살아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욕망에 자신을 투신해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은 더 커지고, 그러한 공허함 때문에 자신은 더 폭력적인 인간으로 변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다른 그 욕망이 대체된다. 영호는 고문을 하고도 그 고문한 손이 자신의 손 같지 않고, 홍자의 엉덩이를 만진 손도 자기 손 같지 않아 유심히 쳐다본다. 자신의 삶을 추동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그 거짓 욕망이다. 그러나 영호는 이 세상에 몸을 담그고 있는 한,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알기에 영호는 더욱더 광적으로 변한다.
2) 소통 불가능성
사람들은 가끔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혹은 그룹에서, 영향력을 행세하는 중심인물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중심 세력에서 벗어나 주변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싶어 한다. 세력을 가진자의 편에 섰을 때나 권력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저 반대쪽에 있는 새로운 환타지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 한다. 권력이나 세력을 통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심리적 공허는 또 다른 환상을 불러온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동일지 모른다.
이창동의 서술세계에서 끊임없이 삶의 본능을 충동, 삶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타자로서 밀려나있는 노동자(진짜 사나이(소설)), 사회주의 지식인(용천뱅이(소설), 제대로 밥벌이도 할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들<오아시스>(영화) 등. 주변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맑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환상 속에 사는 인물이다. 그들은 헛된 꿈만
영호는 그 공허함을 고문경찰관 당시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자전거로 주위를 빙빙 회전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그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 사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요구하는 욕망의 늪이다. 영호가 순임을 사랑하고 야생화를 사랑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고문을 해야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와 살아야하고, 사기꾼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영호 아닌 또 다른 영호의 모습을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사회적 강요 때문에 영호는 폭력 경찰이 되고,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간다.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수록 그 심리적 헛헛함은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영호는 미쳐간다. 자신에게 돌아갈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자의식은 영호를 광적으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자신도 알 수없는 무엇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그 욕망의 늪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상인의 삶이며,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시대적 가치이다.
이러한 갈등은 <초록물고기>에서도 나타난다. 가족화합의 차원에서 가족야유회를 왔지만, 큰형과 큰형수가 싸우는 둥, 불화의 모습만이 가득하다, 그 불편한 심기가 차를 타고 빙빙도는 모습을 통해서 난타난다. 가족을 떠날 수도 없고, 가족의 화합의 소망은 단지 자신만의 허망한 꿈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영호에게 고문경찰관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나, 사랑하지 않는 아내, 홍자의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은 일상인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살아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욕망에 자신을 투신해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은 더 커지고, 그러한 공허함 때문에 자신은 더 폭력적인 인간으로 변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다른 그 욕망이 대체된다. 영호는 고문을 하고도 그 고문한 손이 자신의 손 같지 않고, 홍자의 엉덩이를 만진 손도 자기 손 같지 않아 유심히 쳐다본다. 자신의 삶을 추동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그 거짓 욕망이다. 그러나 영호는 이 세상에 몸을 담그고 있는 한,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알기에 영호는 더욱더 광적으로 변한다.
2) 소통 불가능성
사람들은 가끔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혹은 그룹에서, 영향력을 행세하는 중심인물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중심 세력에서 벗어나 주변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싶어 한다. 세력을 가진자의 편에 섰을 때나 권력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저 반대쪽에 있는 새로운 환타지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 한다. 권력이나 세력을 통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심리적 공허는 또 다른 환상을 불러온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동일지 모른다.
이창동의 서술세계에서 끊임없이 삶의 본능을 충동, 삶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타자로서 밀려나있는 노동자(진짜 사나이(소설)), 사회주의 지식인(용천뱅이(소설), 제대로 밥벌이도 할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들<오아시스>(영화) 등. 주변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맑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환상 속에 사는 인물이다. 그들은 헛된 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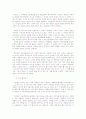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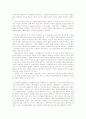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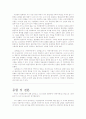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