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시대적 배경에 따른 식민지지주제 동향
1) 1910~1920년대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제 동향
2) 농업공황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3)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4) 소작쟁의와 농민사회운동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5)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식민지지주의 정치적 동향
3. 조선농지령 연구를 통한 식민지지주제
1) 조선농지령의 시행 전 배경
2) 조선농지령의 기존 연구 성과
3) 조선농지령의 제정과정
4) 조선농지령의 내용
4. 소작료통제령에 관련된 연구 성과
1) 소작료 통제령의 지주제 강화에 대한 근거
2) 소작료 통제령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5. 공출에 관련된 연구 성과
1) 전시체제의 배경
2) 공출의 지주제 강화에 대한 근거
3) 공출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4) 조선증미계획(제3차 산미증식계획)
6. 결론
2. 시대적 배경에 따른 식민지지주제 동향
1) 1910~1920년대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제 동향
2) 농업공황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3)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4) 소작쟁의와 농민사회운동이 식민지조선농업과 식민지지주에 미친 영향
5)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식민지지주의 정치적 동향
3. 조선농지령 연구를 통한 식민지지주제
1) 조선농지령의 시행 전 배경
2) 조선농지령의 기존 연구 성과
3) 조선농지령의 제정과정
4) 조선농지령의 내용
4. 소작료통제령에 관련된 연구 성과
1) 소작료 통제령의 지주제 강화에 대한 근거
2) 소작료 통제령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5. 공출에 관련된 연구 성과
1) 전시체제의 배경
2) 공출의 지주제 강화에 대한 근거
3) 공출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4) 조선증미계획(제3차 산미증식계획)
6. 결론
본문내용
이미 소작지 비율이 70~80%을 웃도는 극한적인 전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연한 증가가 없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각 도별 답지 소작지율의 추이 (단위:%)
1930
1934
1938
전남
64.6
67.9
67.3
충북
65.7
67.8
67.5
경기
74.1
74.5
74.4
평북
63.3
67.4
69.0
함남
43.6
48.3
49.8
정연태,「193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에 대한 재검토」
소작지율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 수 자체도 이 시기 증가했다. 특히 50정보 이상 대지주수는 194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60%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인 지주 수는 점감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본인지주는 식민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40년대 초까지도 지주 수는 계속 증가됐다. 경지 50정보 이상 대지주수의 증감추이
1925-27년
1930년
1942년
50~100정보
조선인
일본인
총 계
1483
129
1612
1438
251
1689
1351
642
1993
100정보이상
조선인
일본인
총 계
968
201
1169
800
301
1101
488
567
1055
계
조선인
일본인
총 계
2451
330
2781
2238
552
2790
1839
1209
3048
장시원,「日帝下 大地主의 存在形態에 관한 硏究」
소작료 통제령이 농가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소작지율은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해야 했다. 그러나 소작료 통제령 시행 이후에도 소작지율의 감소가 목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주 수가 증가했다.
소작료 통제령은 ‘총후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한다기 보다는 전시생산력 확충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주와 농민 간 계급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농업생산력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주제가 근본적 토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제의 소작료 통제령은 지주제 약화를 의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고소작료와 소작지율의 높은 비중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시기 한국인 대지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인 대지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소작료율 감소에 따라 상당수 지주들이 농외투자로 자산증식방법에 변화를 꾀했다. 1930년대 후반의 농외투자는 대부분이 금융권이었고 이 시기 금융권은 대부분이 일본자본이었으므로 조선인 지주의 일본자본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즉, 소작료 통제령 이후에도 지주제는 약화되지 않았으나 일본인 지주의 비율이 늘었고 동태적 지주의 대다수는 일본자본에 예속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2) 소작료통제령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소작료 통제령(1939년)은 “소작료를 통제하여 일반 물가 그중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농업 생산력의 확충을 기함과 동시 후방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특별법령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 위의 농지관계 법령들은 지주들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시켜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1939년은 農死, 1940년은 商死, 본년은 富死가 된 즉1939년의 농사는 미증유의 한발로서 농민수난의해, 1940년의 商死는 통제경제의 강화로 상업자의 수난, 本年(1941)의 富死는 농지 및 곡류의 통제강화에 의해 지주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소작료를 收受할 수 없어 지주 수난의 해가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警務局 經濟警察課, 經濟統制ニ不滿ヲ有スル地主ノ言動」 『情報週間展望』 제25집(1941.8.30).
문제는 소작료 통제령의 주요 법령들은 추후에 시행되는 공출의 실시와 함께 지주제 약화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소작료 통제령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소작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많은 부분들이 없어졌다. 또한 일제는 소작관계에 대한 결정과 명령, 알선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주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臨時農地價格統制令이 시행되면서 농지 가격의 안정을 꾀했다. 토지매매를 통해서 많이 이득을 보던 지주들의 수익수단에도 제제를 가한 것이다. 농지가격의 안정은 소작료 인상을 억제하여서 결국 소작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에 생산력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여러 법령들이 나오면서 관리대상 농지가 면적에 관계없이 전 농지로 확대되었고, 경작 목적이 아닌 농지의 소유권 및 경작권 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관리 통제의 목적은 ‘농업생산력 확충’에 있었지만 농지소유자인 지주들은 자신의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당 부분 박탈당한 것이었다.
또한 소작료 통제령은 실질 주요 법령인 가격 통제 즉, 공정미가(公定米價) 체제를 법령에 포함함으로써 소작료액 감소를 야기해 지주 경제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공출미에 대해서는 식량 증산과 공출 독려책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었고, 생산자에게는 출하장려금이 지급 되었다. 그러나 지주가 소작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만이 지급 되었고,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공출할 경우는 ‘지주가격’으로 대금을 지불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작료가 저하 되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지급 되어야할 생산 장려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1942년 전라남도에서 지주들의 소작인에 대한 미곡 생산 장려금 지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각종의 이유로 벼 10,684石分 장려금 11,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는 1) 소작료를 일부 미납하였기 때문에 全納시킬 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2) 前年의 소작료 미납한 것을 공제하거나 완납하였지만 그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3) 소작료로 납부한 벼를 공출한 후 생산장려금을 지불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것 4) 立春資力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은 것 5) 소작미를 白米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장려금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은 것 6) 본인 불참 또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後日 수령을 요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 7) 수납기간에 全納시키기 위해 지불은 하였어도 교부하지 않은 것 8) 本年의 소작계약과 동시에 지불하였지만 교부하지 않은 것 (警務局 經濟警察課, 『小作人ニ對スル米穀生産
1930
1934
1938
전남
64.6
67.9
67.3
충북
65.7
67.8
67.5
경기
74.1
74.5
74.4
평북
63.3
67.4
69.0
함남
43.6
48.3
49.8
정연태,「193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에 대한 재검토」
소작지율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 수 자체도 이 시기 증가했다. 특히 50정보 이상 대지주수는 194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60%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인 지주 수는 점감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본인지주는 식민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940년대 초까지도 지주 수는 계속 증가됐다. 경지 50정보 이상 대지주수의 증감추이
1925-27년
1930년
1942년
50~100정보
조선인
일본인
총 계
1483
129
1612
1438
251
1689
1351
642
1993
100정보이상
조선인
일본인
총 계
968
201
1169
800
301
1101
488
567
1055
계
조선인
일본인
총 계
2451
330
2781
2238
552
2790
1839
1209
3048
장시원,「日帝下 大地主의 存在形態에 관한 硏究」
소작료 통제령이 농가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소작지율은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해야 했다. 그러나 소작료 통제령 시행 이후에도 소작지율의 감소가 목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주 수가 증가했다.
소작료 통제령은 ‘총후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한다기 보다는 전시생산력 확충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주와 농민 간 계급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농업생산력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주제가 근본적 토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제의 소작료 통제령은 지주제 약화를 의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고소작료와 소작지율의 높은 비중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시기 한국인 대지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인 대지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소작료율 감소에 따라 상당수 지주들이 농외투자로 자산증식방법에 변화를 꾀했다. 1930년대 후반의 농외투자는 대부분이 금융권이었고 이 시기 금융권은 대부분이 일본자본이었으므로 조선인 지주의 일본자본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즉, 소작료 통제령 이후에도 지주제는 약화되지 않았으나 일본인 지주의 비율이 늘었고 동태적 지주의 대다수는 일본자본에 예속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2) 소작료통제령의 지주제 약화에 대한 근거
소작료 통제령(1939년)은 “소작료를 통제하여 일반 물가 그중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농업 생산력의 확충을 기함과 동시 후방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특별법령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 위의 농지관계 법령들은 지주들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시켜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1939년은 農死, 1940년은 商死, 본년은 富死가 된 즉1939년의 농사는 미증유의 한발로서 농민수난의해, 1940년의 商死는 통제경제의 강화로 상업자의 수난, 本年(1941)의 富死는 농지 및 곡류의 통제강화에 의해 지주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소작료를 收受할 수 없어 지주 수난의 해가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警務局 經濟警察課, 經濟統制ニ不滿ヲ有スル地主ノ言動」 『情報週間展望』 제25집(1941.8.30).
문제는 소작료 통제령의 주요 법령들은 추후에 시행되는 공출의 실시와 함께 지주제 약화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소작료 통제령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소작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많은 부분들이 없어졌다. 또한 일제는 소작관계에 대한 결정과 명령, 알선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주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臨時農地價格統制令이 시행되면서 농지 가격의 안정을 꾀했다. 토지매매를 통해서 많이 이득을 보던 지주들의 수익수단에도 제제를 가한 것이다. 농지가격의 안정은 소작료 인상을 억제하여서 결국 소작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에 생산력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여러 법령들이 나오면서 관리대상 농지가 면적에 관계없이 전 농지로 확대되었고, 경작 목적이 아닌 농지의 소유권 및 경작권 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관리 통제의 목적은 ‘농업생산력 확충’에 있었지만 농지소유자인 지주들은 자신의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당 부분 박탈당한 것이었다.
또한 소작료 통제령은 실질 주요 법령인 가격 통제 즉, 공정미가(公定米價) 체제를 법령에 포함함으로써 소작료액 감소를 야기해 지주 경제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공출미에 대해서는 식량 증산과 공출 독려책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었고, 생산자에게는 출하장려금이 지급 되었다. 그러나 지주가 소작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만이 지급 되었고,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공출할 경우는 ‘지주가격’으로 대금을 지불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작료가 저하 되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지급 되어야할 생산 장려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1942년 전라남도에서 지주들의 소작인에 대한 미곡 생산 장려금 지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각종의 이유로 벼 10,684石分 장려금 11,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는 1) 소작료를 일부 미납하였기 때문에 全納시킬 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2) 前年의 소작료 미납한 것을 공제하거나 완납하였지만 그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3) 소작료로 납부한 벼를 공출한 후 생산장려금을 지불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것 4) 立春資力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은 것 5) 소작미를 白米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장려금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은 것 6) 본인 불참 또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後日 수령을 요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 7) 수납기간에 全納시키기 위해 지불은 하였어도 교부하지 않은 것 8) 本年의 소작계약과 동시에 지불하였지만 교부하지 않은 것 (警務局 經濟警察課, 『小作人ニ對スル米穀生産
추천자료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 다양한 가족유형
다양한 가족유형 한국인의 시민성과 권위주의
한국인의 시민성과 권위주의 공창제에 대한 보고서
공창제에 대한 보고서 우리나라의 교육(교육과정<1~8차까지>, 고교평준화 및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접근)
우리나라의 교육(교육과정<1~8차까지>, 고교평준화 및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접근) [아동복지]아동의 사회환경과 양육위기에 관한 대처방안
[아동복지]아동의 사회환경과 양육위기에 관한 대처방안 주거학(주거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및 한국 주거생활양식의 특성)
주거학(주거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및 한국 주거생활양식의 특성) 성의 정치 사회학 - 정체성과 패미니즘으로 인한 성 정치학과 양성평등
성의 정치 사회학 - 정체성과 패미니즘으로 인한 성 정치학과 양성평등 식민지근대화론 - 식민지 근대화론 등장배경, 내재적발전론 비교, 의의 및 한계
식민지근대화론 - 식민지 근대화론 등장배경, 내재적발전론 비교, 의의 및 한계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목표와 다양성,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및 과제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목표와 다양성,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및 과제 [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 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노사관계론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
[노사관계론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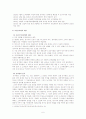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