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6장 국어와 민족문화
우리말의 옛모습 : 차자표기법 중 이두, 향찰과 구결
이두
향찰
구결
우리말의 옛모습 : 중세국어
<훈민정음>
음운의 변천
1. 모음조화
2. 구개음화
3. 원순모음화
4. 전설 모음화
5. 단모음화
6. ‘ㅣ’모음 동화
7. 축약
8. 탈락
9. 동음 생략
10. 이화
11. 강화
12. 첨가
13. 두음법칙
14. 모음 충돌 회피
15. 자음 충돌 회피
16. 설측음화
17. 유추 작용
18. 음운 도치
단어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4. 조사
5. 체언의 형태 바꿈
단어의 형성(파생법, 합성법)
1. 파생법
문장과 이야기
국어와 민족문화
<‘혼불’에 드러난 민족문화>
***참고자료
<이름으로 살펴보는 민족문화 : ‘태백’이란 이름에서부터>
우리말의 옛모습 : 차자표기법 중 이두, 향찰과 구결
이두
향찰
구결
우리말의 옛모습 : 중세국어
<훈민정음>
음운의 변천
1. 모음조화
2. 구개음화
3. 원순모음화
4. 전설 모음화
5. 단모음화
6. ‘ㅣ’모음 동화
7. 축약
8. 탈락
9. 동음 생략
10. 이화
11. 강화
12. 첨가
13. 두음법칙
14. 모음 충돌 회피
15. 자음 충돌 회피
16. 설측음화
17. 유추 작용
18. 음운 도치
단어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4. 조사
5. 체언의 형태 바꿈
단어의 형성(파생법, 합성법)
1. 파생법
문장과 이야기
국어와 민족문화
<‘혼불’에 드러난 민족문화>
***참고자료
<이름으로 살펴보는 민족문화 : ‘태백’이란 이름에서부터>
본문내용
소, 1986와
박성종, 조선초기의 이두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1993, p.46을 참고하였다.
이두 항목에서 이기문은 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 은합에 쓰여진 글자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완벽한 초기의 이두자료로는 591년 세워진 경주 남산 신성비(新城碑)의 비문이 있다.
辛亥年二月二十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敎事爲聞敎令 誓事之
위에서 밑줄을 그은 것은 이두자로서 주로 한자의 뜻을 따서 우리말의 문법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節’은 후대의 ‘-디위’로, ‘以’는 ‘-로’, ‘者’는 ‘-은/는’으로, ‘敎’는 ‘-이신-’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爲’는 후대의 구결에 이르기까지 ‘-’의 어간으로 풀이되며, ‘令’은 ‘시키다’의 의미를, ‘之’는 종결어미인 ‘-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이두문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법칙을 고려하면 위의 문장은 대체로 ‘신해년 2월20일 남산 새 성을 지을 때 법대로 만들었다. 후삼년 무너지는 것은 죄 주실 것을 시키도록 맹세하였다’ 정도의 뜻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의 이두는 문법 형태만의 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나 어미류 외에도 의미부에 속하는 명사나 동사 등도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표기하기도 하였다. 갈항사 조탑기의 첫째 줄에서 ‘立在之’를 ‘세웠다’로, 둘째 줄에서 ‘成在之’를 ‘이루었다’로 읽는다면 문장의 서술어인 동사 ‘立’과 ‘成’을 각각 훈독한 것이 된다. 시대가 지날수록 문법 형태로부터 명사나 동사 어간, 부사 등으로 표기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두에서 중요한 요소로 첨기자를 들 수 있는데 첨기자란 어휘 형태의 끝 부분을 표기하는 데에 이용되는 차자를 말한다. 이 첨기자의 기능은 차자 표기의 어려움 덜어 주고 해독의 정확성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에 있다. 첨기자는 8세기에 등장했는데 이는 삼국통일 이전이 초기 이두문과 이후의 후기 이두문을 가르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두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여 19세기말까지 사용된다. 서종학은 이두의 변천을 750년, 1000년, 1250년 경으로 하여 그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데 서종학, 이두의 문법 형태 표기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인데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에서 재인용 하였다.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 60여 점의 자료를 비롯해 조선 초의 집대성까지 이두가 이렇게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는 주목을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이두가 정통 한문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해도 우리나라 문자 생활의 상층부를 담당했던 한문의 후광을 입고 있었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주로 행정의 실무와 관련된 공문서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향찰
향찰(鄕札)은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차자표기의 방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말다운 특징을 가장 잘 살린 표기라고 할 수 있다. 향찰이란 명칭은 옛 기록으로서는 균여전에 오직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최행귀의 보현십원가를 한역하기 위해 평하면서 한문(唐文)에 대하여 보현십원가와 같은 우리말의 문장을 향찰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도 본래는 ‘이두’와 같이 차자표기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두와 향찰의 구별은 표기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그 한계를 명쾌하게 구별지을 만한 특징들을 지적하기 힘들다. 이두는 문서로서의 자리가 굳어지고 그 사용 범위가 한정되므로 일정한 투식(套式)이 있고 비교적 한정된 투어(套語)가 사용되지만, 향가는 시정(詩情)의 발로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이 없이 시작 당시의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선인들이 문자생활을 한문과 국어 문장으로 양분하면 순수 국어 문장 표기를 지향하는 것이 향찰이고 이보다는 한문적인 성격을 지향하거나 그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띠는 것이 이두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밖에도 이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사용되었지만, 향찰은 통일신라시대에 완성되어 고려 시대까지만 이어졌던 것으로 믿어지므로 이것도 한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향찰표기의 마지막은 고려시대의 보현십원가와 도이장가뿐이지만, 13세기 중엽의 향약구급방의 향명표기에도 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시대까지는 향찰표기법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찰표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구체 향가인 처용가를 예를 들어 보자. 처용가의 첫 구를 살펴보면 동경명기월랑(東京明其月良(향가원문))- 東京--긔-랄-랑(당시의 독법 추측 재현)-東京 은 달에(현대어 번역)로 나타난다. 특히 처용가는 고려가요에도 그 내용이 전하고 있어 향가의 이해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던져 준 작품이다.
먼저 위에서 ‘東京明其月良’은 ‘東京--긔-랄-랑’으로 읽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각각 ‘東京, 明, 月’이다. 일단 ‘東京’은 지명으로, 당시에 어떻게 읽었을지 불분명하므로 제쳐 놓는다면 ‘明’과 ‘月’은 모두 한자의 뜻을 따서 읽었음을 알게 된다. 이에 반해 실질적 의미보다는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其, 良’은 각각 ‘긔, 랑’으로 읽어 음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향찰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주로 훈독을, 형식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주로 음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구의 脚烏伊는 가리로 해석이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 어간 등 실질적 요소들에까지 차자표기의 방식을 이두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하였다. 향찰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창작하는 글에 쓰인 만큼 우리말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기하려 하였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로 운문에만 독특하게 쓰여 상대적으로 우리말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구결
구결(口訣)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吐)’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자료들에서는 ‘구결’에 대하여 ‘입
박성종, 조선초기의 이두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1993, p.46을 참고하였다.
이두 항목에서 이기문은 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 은합에 쓰여진 글자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완벽한 초기의 이두자료로는 591년 세워진 경주 남산 신성비(新城碑)의 비문이 있다.
辛亥年二月二十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敎事爲聞敎令 誓事之
위에서 밑줄을 그은 것은 이두자로서 주로 한자의 뜻을 따서 우리말의 문법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節’은 후대의 ‘-디위’로, ‘以’는 ‘-로’, ‘者’는 ‘-은/는’으로, ‘敎’는 ‘-이신-’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爲’는 후대의 구결에 이르기까지 ‘-’의 어간으로 풀이되며, ‘令’은 ‘시키다’의 의미를, ‘之’는 종결어미인 ‘-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이두문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법칙을 고려하면 위의 문장은 대체로 ‘신해년 2월20일 남산 새 성을 지을 때 법대로 만들었다. 후삼년 무너지는 것은 죄 주실 것을 시키도록 맹세하였다’ 정도의 뜻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의 이두는 문법 형태만의 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나 어미류 외에도 의미부에 속하는 명사나 동사 등도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표기하기도 하였다. 갈항사 조탑기의 첫째 줄에서 ‘立在之’를 ‘세웠다’로, 둘째 줄에서 ‘成在之’를 ‘이루었다’로 읽는다면 문장의 서술어인 동사 ‘立’과 ‘成’을 각각 훈독한 것이 된다. 시대가 지날수록 문법 형태로부터 명사나 동사 어간, 부사 등으로 표기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두에서 중요한 요소로 첨기자를 들 수 있는데 첨기자란 어휘 형태의 끝 부분을 표기하는 데에 이용되는 차자를 말한다. 이 첨기자의 기능은 차자 표기의 어려움 덜어 주고 해독의 정확성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에 있다. 첨기자는 8세기에 등장했는데 이는 삼국통일 이전이 초기 이두문과 이후의 후기 이두문을 가르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두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여 19세기말까지 사용된다. 서종학은 이두의 변천을 750년, 1000년, 1250년 경으로 하여 그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데 서종학, 이두의 문법 형태 표기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인데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에서 재인용 하였다.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 60여 점의 자료를 비롯해 조선 초의 집대성까지 이두가 이렇게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는 주목을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이두가 정통 한문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해도 우리나라 문자 생활의 상층부를 담당했던 한문의 후광을 입고 있었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주로 행정의 실무와 관련된 공문서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향찰
향찰(鄕札)은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차자표기의 방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말다운 특징을 가장 잘 살린 표기라고 할 수 있다. 향찰이란 명칭은 옛 기록으로서는 균여전에 오직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최행귀의 보현십원가를 한역하기 위해 평하면서 한문(唐文)에 대하여 보현십원가와 같은 우리말의 문장을 향찰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도 본래는 ‘이두’와 같이 차자표기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두와 향찰의 구별은 표기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그 한계를 명쾌하게 구별지을 만한 특징들을 지적하기 힘들다. 이두는 문서로서의 자리가 굳어지고 그 사용 범위가 한정되므로 일정한 투식(套式)이 있고 비교적 한정된 투어(套語)가 사용되지만, 향가는 시정(詩情)의 발로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이 없이 시작 당시의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선인들이 문자생활을 한문과 국어 문장으로 양분하면 순수 국어 문장 표기를 지향하는 것이 향찰이고 이보다는 한문적인 성격을 지향하거나 그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띠는 것이 이두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밖에도 이두는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사용되었지만, 향찰은 통일신라시대에 완성되어 고려 시대까지만 이어졌던 것으로 믿어지므로 이것도 한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향찰표기의 마지막은 고려시대의 보현십원가와 도이장가뿐이지만, 13세기 중엽의 향약구급방의 향명표기에도 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시대까지는 향찰표기법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찰표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구체 향가인 처용가를 예를 들어 보자. 처용가의 첫 구를 살펴보면 동경명기월랑(東京明其月良(향가원문))- 東京--긔-랄-랑(당시의 독법 추측 재현)-東京 은 달에(현대어 번역)로 나타난다. 특히 처용가는 고려가요에도 그 내용이 전하고 있어 향가의 이해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던져 준 작품이다.
먼저 위에서 ‘東京明其月良’은 ‘東京--긔-랄-랑’으로 읽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각각 ‘東京, 明, 月’이다. 일단 ‘東京’은 지명으로, 당시에 어떻게 읽었을지 불분명하므로 제쳐 놓는다면 ‘明’과 ‘月’은 모두 한자의 뜻을 따서 읽었음을 알게 된다. 이에 반해 실질적 의미보다는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其, 良’은 각각 ‘긔, 랑’으로 읽어 음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향찰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주로 훈독을, 형식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은 주로 음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구의 脚烏伊는 가리로 해석이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 어간 등 실질적 요소들에까지 차자표기의 방식을 이두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하였다. 향찰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창작하는 글에 쓰인 만큼 우리말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기하려 하였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로 운문에만 독특하게 쓰여 상대적으로 우리말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구결
구결(口訣)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吐)’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자료들에서는 ‘구결’에 대하여 ‘입
키워드
추천자료
 교과교육으로서의 독서와 독서교육지도방안
교과교육으로서의 독서와 독서교육지도방안 제7차 초등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문제점과 대안)
제7차 초등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문제점과 대안) 수행 평가의 이론과 실제 -국어과 수행평가
수행 평가의 이론과 실제 -국어과 수행평가 현재 초등학교 문법교육의 문제점과초등 문법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현재 초등학교 문법교육의 문제점과초등 문법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매체교육을 활용한 국어교육 수용방안 연구 (비교 중심)
매체교육을 활용한 국어교육 수용방안 연구 (비교 중심) [동사][품사][국어][힌디어][독일어][중국어][일본어]국어 품사 동사의 정의, 국어 품사 동사...
[동사][품사][국어][힌디어][독일어][중국어][일본어]국어 품사 동사의 정의, 국어 품사 동사... 직접교수(직접교수법, DI)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직접교수(직접교수법, DI)의 기본절차, 직...
직접교수(직접교수법, DI)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직접교수(직접교수법, DI)의 기본절차, 직... [표준말][표준어]표준말(표준어)의 역사, 표준말(표준어)의 자연성, 표준말(표준어)의 기능, ...
[표준말][표준어]표준말(표준어)의 역사, 표준말(표준어)의 자연성, 표준말(표준어)의 기능, ... 국어논술연습_국어
국어논술연습_국어 요약과 주제 확정의 4원칙 분석 자료
요약과 주제 확정의 4원칙 분석 자료  지식교육의 실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둘째마당 한걸음 더. 되돌아보기
지식교육의 실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둘째마당 한걸음 더. 되돌아보기 문학 영역 &#8228; 문학 과목
문학 영역 &#8228; 문학 과목 [국어교육] 인쇄매체언어와 국어교육 _ 인쇄매체언어의 개념과 연구의 범주, 인쇄매체언어 특...
[국어교육] 인쇄매체언어와 국어교육 _ 인쇄매체언어의 개념과 연구의 범주, 인쇄매체언어 특... 2016년 1학기 우리말의역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국어의 계통 저서나 논문 요약)
2016년 1학기 우리말의역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국어의 계통 저서나 논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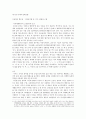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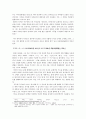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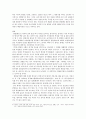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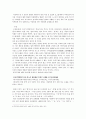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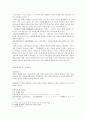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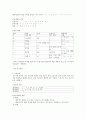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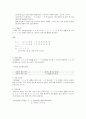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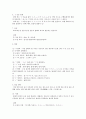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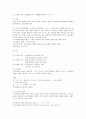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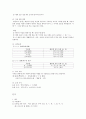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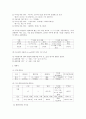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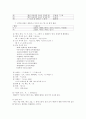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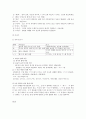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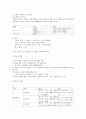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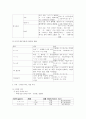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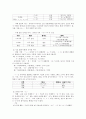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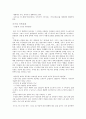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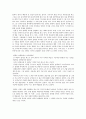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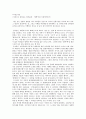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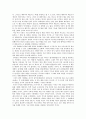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