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어의 특질
1.1. 국어의 유형론적 특질
1.2. 국어의 계통론적 특질
2. 국어의 역사
2.1. 국어 역사의 시대 구분
2.2. 음운 변화
2.3. 문법 변화
2.4. 의미 변화
2.5. 어휘 변화
3. 국어의 문자
3.1. 언어와 문자
3.2. 한자를 빌려 쓰던 시대
3.3. 훈민정음의 창제
3.4. 훈민정음 이후의 문자 생활
4. 국어 탐구과 국어 사랑
4.1. 국어 탐구의 흐름
4.2. 국어 탐구가 나아갈 방향
4.3. 국어 사랑의 길
1.1. 국어의 유형론적 특질
1.2. 국어의 계통론적 특질
2. 국어의 역사
2.1. 국어 역사의 시대 구분
2.2. 음운 변화
2.3. 문법 변화
2.4. 의미 변화
2.5. 어휘 변화
3. 국어의 문자
3.1. 언어와 문자
3.2. 한자를 빌려 쓰던 시대
3.3. 훈민정음의 창제
3.4. 훈민정음 이후의 문자 생활
4. 국어 탐구과 국어 사랑
4.1. 국어 탐구의 흐름
4.2. 국어 탐구가 나아갈 방향
4.3. 국어 사랑의 길
본문내용
통사 기능이 변화하기도 하며 이들이 소멸하거나 생성되기도 한다. 접속문과 내포문의 구성 방식이 변화하기도 하며, 문장을 구성하는 어순이 바뀌기도 한다.
2.3.1. 문장 종결법의 변화
문장종결법은 언어내용 전달 과정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도를 실현하는 문법범주로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의 하위범주로 나뉜다. 이 중 의문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거쳤다.
15세기에는 의문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의문어가 있을 때는 ‘-ㄴ-고’나 ‘-ㄹ-고’와 같은 ‘ㅗ’형 어미로 의문어가 없는 경우에는 ‘-ㄴ-가’, ‘-ㄹ-가’와 같은 ‘ㅏ’형 어미로 달리 표현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의문문에 의문어가 있든 없든, 주어의 인칭이 어떠하든 의문어미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2.3.2. 높임법의 변화
15세기 국어는 선어말 어미가 각각 높임법을 실현한다. 석보상절에서 살펴보면, 청자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잇-’이 나타나 있고, 주어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가 나타나고 목적어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나타나 있다. 이런 선어말 어미 가운데 ‘-으시-’만 현대 국어로 이어지고 나머지 선어말 어미는 모두 소멸했다. 그 결과 청자높임법은 문장 종결어미에 의해 높임의 등급이 분화되고 객체높임법은 객체높임동사 ‘드리다, 모시다 등’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 탐구문제
1. ‘--’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 기능의 역사적인 변화를 기술해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가를 높이기 위해 ‘-오-’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엄친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이 사용된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를 높이기 위한 분리적 선어말 어미인 ‘-시-’가 사용된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샹’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이 연결어미 앞에서 ‘사오’로 표현된다. 나머지 두 문장에서는 대비가 대비보다 높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쇼셔’라고 사용된다.
‘--’은 중세국어에서 목적어 명사나 부사어 명사가 가리키는 인물이 주어명사보다 높을 때 실현되는 문법적 절차이다. 즉 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에 객체 존대 선어말 어미 ‘--’, ‘--’, ‘--’을 개입시킴으로써 형태상으로는 객어(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높이나, 내용상으로는 객어와 관련된 有情명사를 높이는 존대법이다. 객체 높임법의 대표적 형태는 ‘--’인데 앞뒤의 음성적 환경에 따라 ‘--’, ‘--’, ‘--’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화기에 들어 객체 높임법에 쓰이던 ‘--’이 상대 높임법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어마니 넘우 걱졍마시고 안심하시 옵소셔’ 등에서 나타난다.
2.3.3. 시제법의 변화
시제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제어미 ‘-었-’과 ‘-겠-’이 새로이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에서 ‘-었-’은 과거 또는 완결 등을 실현하는데, 이 시제어미는 15세기 국어에서 통사적 구성 ‘-어 잇/이시-’에서 문법화 되어 생성되었다. 15세기 국어에서 ‘-어 잇/이시-’구성은 원래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결되어 그것의 모습이 지속됨을 실현(제1형)하기도 하고 모음이 축약하여 중모음 형태가 된 ‘-엣/에시-’가 나타나기도 하고(제2형), 이 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 ‘-엇/어시-’(제3형)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6,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제3형이 확대되면서, 과거 또는 완결의 기능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 제3형이 과거 또는 완결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제어미를 생성하여 현대 국어로 이어지게 되었다.
15세기 국어에서 추정이나 의지를 실현하던 ‘-으리-’는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다. 16세기부터 이 선어말어미의 형태와 기능이 약화, 쇠태하면서 새로운 시제어미 ‘-겠-’을 생성하여 ‘-으리-’와 교체되었다.
* 탐구문제
1. 15세기 국어 회상어미의 형태가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 국어에 이르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회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상어미인 ‘-더-’가 사용되고 있다. ‘-더-’는 ‘-러-’나 ‘-다-’로 변형되어 사용되거나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결되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시-’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회상어미는 ‘-더-’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시-’는 완결 시제와 과거 시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 ‘-았-’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2.3.4. 사동법의 변화
‘머기거늘[먹-이-거-늘]’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파생 접미사 ‘-이-’로써 사동법을 실현하고 있다. ‘맛디시고’는 파생 접미사 ‘-이-’로 사동법을 실현하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기-’로 실현하고 있어 실현 방법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파생접미사 ‘-오-’, ‘-이-’로 사동법을 실현하는 ‘녀토시고, 기피시니’가 현대 국어에서는 통사적 구성 ‘-게 하-’로써 사동법을 실현하고 있다.
* 탐구문제
1.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접미사의 결합으로 사동법을 실현했던 동사, 형용사들이 현대 국어에서는 통사적 방법으로 사동법을 실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동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술해보자.
15세기 국어에서는 사동 접미사인 ‘이, 우’ 등을 이용하여 모든 사동법을 실현하고 현재와 같은 통사적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동 접미사가 ‘이, 히, 리, 기, 우, 구, 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동 접미사의 결합으로 사동법을 실현할 수 없는 동사나 형용사가 생겨 ‘-게 하다’는 통사적 방법으로 사동법을 실현하다.
2.3.5. 피동법의 변화
15세기 국어에서 피동법은 파생 접미사 ‘-히-’(다티고)나 ‘-이-’(들이니)로 파동법이 실현되고 있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이-’에서 ‘-리-’로 실현하고 있음이 다르다. 또한 현대 국어에는 파생 접미사에 의하지 않고 통사적 구서 ‘-어 지-’에 의해 피동법이 실현되고 있다.
2.3.6. 부정법의 변화
15세기 국어의 부정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아니/
2.3.1. 문장 종결법의 변화
문장종결법은 언어내용 전달 과정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도를 실현하는 문법범주로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의 하위범주로 나뉜다. 이 중 의문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거쳤다.
15세기에는 의문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의문어가 있을 때는 ‘-ㄴ-고’나 ‘-ㄹ-고’와 같은 ‘ㅗ’형 어미로 의문어가 없는 경우에는 ‘-ㄴ-가’, ‘-ㄹ-가’와 같은 ‘ㅏ’형 어미로 달리 표현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의문문에 의문어가 있든 없든, 주어의 인칭이 어떠하든 의문어미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2.3.2. 높임법의 변화
15세기 국어는 선어말 어미가 각각 높임법을 실현한다. 석보상절에서 살펴보면, 청자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잇-’이 나타나 있고, 주어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가 나타나고 목적어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나타나 있다. 이런 선어말 어미 가운데 ‘-으시-’만 현대 국어로 이어지고 나머지 선어말 어미는 모두 소멸했다. 그 결과 청자높임법은 문장 종결어미에 의해 높임의 등급이 분화되고 객체높임법은 객체높임동사 ‘드리다, 모시다 등’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 탐구문제
1. ‘--’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 기능의 역사적인 변화를 기술해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가를 높이기 위해 ‘-오-’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엄친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이 사용된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를 높이기 위한 분리적 선어말 어미인 ‘-시-’가 사용된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샹’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이 연결어미 앞에서 ‘사오’로 표현된다. 나머지 두 문장에서는 대비가 대비보다 높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쇼셔’라고 사용된다.
‘--’은 중세국어에서 목적어 명사나 부사어 명사가 가리키는 인물이 주어명사보다 높을 때 실현되는 문법적 절차이다. 즉 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에 객체 존대 선어말 어미 ‘--’, ‘--’, ‘--’을 개입시킴으로써 형태상으로는 객어(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높이나, 내용상으로는 객어와 관련된 有情명사를 높이는 존대법이다. 객체 높임법의 대표적 형태는 ‘--’인데 앞뒤의 음성적 환경에 따라 ‘--’, ‘--’, ‘--’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화기에 들어 객체 높임법에 쓰이던 ‘--’이 상대 높임법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어마니 넘우 걱졍마시고 안심하시 옵소셔’ 등에서 나타난다.
2.3.3. 시제법의 변화
시제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제어미 ‘-었-’과 ‘-겠-’이 새로이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에서 ‘-었-’은 과거 또는 완결 등을 실현하는데, 이 시제어미는 15세기 국어에서 통사적 구성 ‘-어 잇/이시-’에서 문법화 되어 생성되었다. 15세기 국어에서 ‘-어 잇/이시-’구성은 원래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결되어 그것의 모습이 지속됨을 실현(제1형)하기도 하고 모음이 축약하여 중모음 형태가 된 ‘-엣/에시-’가 나타나기도 하고(제2형), 이 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 ‘-엇/어시-’(제3형)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6, 17세기를 거치는 동안 제3형이 확대되면서, 과거 또는 완결의 기능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 제3형이 과거 또는 완결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제어미를 생성하여 현대 국어로 이어지게 되었다.
15세기 국어에서 추정이나 의지를 실현하던 ‘-으리-’는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다. 16세기부터 이 선어말어미의 형태와 기능이 약화, 쇠태하면서 새로운 시제어미 ‘-겠-’을 생성하여 ‘-으리-’와 교체되었다.
* 탐구문제
1. 15세기 국어 회상어미의 형태가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 국어에 이르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회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상어미인 ‘-더-’가 사용되고 있다. ‘-더-’는 ‘-러-’나 ‘-다-’로 변형되어 사용되거나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결되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시-’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회상어미는 ‘-더-’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시-’는 완결 시제와 과거 시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 ‘-았-’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2.3.4. 사동법의 변화
‘머기거늘[먹-이-거-늘]’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파생 접미사 ‘-이-’로써 사동법을 실현하고 있다. ‘맛디시고’는 파생 접미사 ‘-이-’로 사동법을 실현하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기-’로 실현하고 있어 실현 방법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파생접미사 ‘-오-’, ‘-이-’로 사동법을 실현하는 ‘녀토시고, 기피시니’가 현대 국어에서는 통사적 구성 ‘-게 하-’로써 사동법을 실현하고 있다.
* 탐구문제
1.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접미사의 결합으로 사동법을 실현했던 동사, 형용사들이 현대 국어에서는 통사적 방법으로 사동법을 실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동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술해보자.
15세기 국어에서는 사동 접미사인 ‘이, 우’ 등을 이용하여 모든 사동법을 실현하고 현재와 같은 통사적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동 접미사가 ‘이, 히, 리, 기, 우, 구, 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동 접미사의 결합으로 사동법을 실현할 수 없는 동사나 형용사가 생겨 ‘-게 하다’는 통사적 방법으로 사동법을 실현하다.
2.3.5. 피동법의 변화
15세기 국어에서 피동법은 파생 접미사 ‘-히-’(다티고)나 ‘-이-’(들이니)로 파동법이 실현되고 있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이-’에서 ‘-리-’로 실현하고 있음이 다르다. 또한 현대 국어에는 파생 접미사에 의하지 않고 통사적 구서 ‘-어 지-’에 의해 피동법이 실현되고 있다.
2.3.6. 부정법의 변화
15세기 국어의 부정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아니/
키워드
추천자료
 국어교육의 목표와 성격
국어교육의 목표와 성격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 국어교사의 임무와 내가 지향하는 교사상 - 국어교사, 임무, 교사상, 지향
국어교사의 임무와 내가 지향하는 교사상 - 국어교사, 임무, 교사상, 지향 국어교육의 이해 요약정리
국어교육의 이해 요약정리 고등학교 국어과(국어교육)의 성격, 고등학교 국어과(국어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국어과(국...
고등학교 국어과(국어교육)의 성격, 고등학교 국어과(국어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국어과(국... 중학교(중등) 국어교육(국어과) 내용구성, 중학교(중등) 국어교육(국어과) 수준별교육과정 편...
중학교(중등) 국어교육(국어과) 내용구성, 중학교(중등) 국어교육(국어과) 수준별교육과정 편... 『학교문법론』7장 문장론과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6장 문장론비교
『학교문법론』7장 문장론과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6장 문장론비교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의미,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특징,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영역, ...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의미,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특징, 국어과수업(국어교육)의 영역, ... [학습평가][교육평가][수학][국어][과학][도덕][실과][음악][체육]수학교육 학습평가, 국어교...
[학습평가][교육평가][수학][국어][과학][도덕][실과][음악][체육]수학교육 학습평가, 국어교... [교육평가][국어과교육][수학과교육][사회과교육][과학과교육][도덕과교육][체육과교육]국어...
[교육평가][국어과교육][수학과교육][사회과교육][과학과교육][도덕과교육][체육과교육]국어...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 학습 과정안 3학년 4단원 차근차근 하나씩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 학습 과정안 3학년 4단원 차근차근 하나씩 어휘 능력과 학교 교육과정 (어휘 능력의 중요성,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능력 및 어휘 교...
어휘 능력과 학교 교육과정 (어휘 능력의 중요성,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능력 및 어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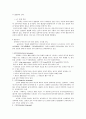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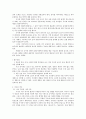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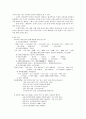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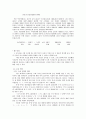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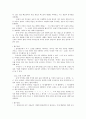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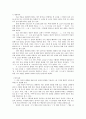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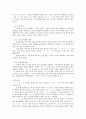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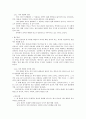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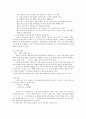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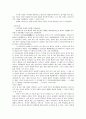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