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생사관과 타계관
2. 타계의 설정
3. 현세와 타계의 관계
4. 타계관의 변천
맺음말
1. 생사관과 타계관
2. 타계의 설정
3. 현세와 타계의 관계
4. 타계관의 변천
맺음말
본문내용
그것은 역사와 문화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보아왔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고대 한국사의 한 면을 ‘고대 한국의 生死觀’이라는 주제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처음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이라는 주제를 풀어나갈 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었다. 우선은 고대 한국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가(여기에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도 포함된다), 나아가 죽음이 인간의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그리하여 고대 한국인들이 품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체계가 당대의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는 고대 한국인들의 그 설명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문제들을 검토하다보니, 기본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한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 관련한 문제를 몇가지로 나누어 발표하게 되었다. 우선 고대 한국인들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의 문제를 <고대 한국인의 生死觀 - 靈魂觀을 중심으로 -> 나희라, 2003 고대 한국의 生死觀 - 靈魂觀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47, 근간
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후속편으로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대 한국인들이 죽음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또한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면 관계상 고대 한국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초두에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여기서는 죽음 이후 인간의 상태에 대한 관심인 他界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 生死觀과 他界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죽음과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크게 두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죽음은 인정하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도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형식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원시 및 고대인들의 생명일체화(solidarity of life) 관념에 의한 신화적 사고를 통해 잘 드러나며, 초기 인류에게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어서, 많은 고대의 신화와 종교들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윤회설도 결국에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고 반대편에 선 生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 생의 영구한 존속을 희구한 중국의 神仙說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후자도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시 몇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입장은 육체적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삶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보여, 죽음 이후 어떤 식으로든 삶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대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보는 二元論을 취한다. 그리하여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사후에 영혼은 삶을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적 생사관이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한편 죽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생사관의 무게중심을 적극적으로 현실의 삶에 두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끊고 현실 삶에서의 도덕과 생명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儒家의 생사관도 있다. 이들과 달리 죽음을 인정하면서 또한 삶에 대한 집착마저 끊어 삶과 죽음 모두를 넘어서려는 것이 불교의 생사관이다.
고대 한국인들의 생과 사를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이는 별도로 다루어야할 큰 문제이므로, 본 논문 구성상 필요한 부분에서만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삶과 죽음을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육체적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삶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죽음 이후의 삶을 상정하는 입장은 한국 고대사에서는 흔히 계세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죽음이나 삶에 대한 집착보다는 生死 현상의 진실을 직시하려는 ‘生死有命’을 내세우는 입장도 있었다. “先生仰天嘆曰, 夫死生有命, 富貴在天. 其來也不可拒, 其往也不可追. 汝何償乎.”(三國史記 卷第48 列傳第8 百結先生)
“春秋入唐, 請得兵二十萬來. 見庾信曰, 死生有命, 故得生還, 復與公相見, 何幸如焉.”(三國史記 卷第41 列傳第1 金庾信上)
“六年 是月(正月), 王寢疾彌留. 乃下詔曰 (中略) 死生有命, 顧復何恨.”(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第9 宣德王)
“十九年秋九月, 王不豫, 降遺詔曰 (中略) 爰釋重負, 委之賢德, 付託得人, 夫復何恨. 生死始終, 物之大期, 壽夭修短, 命之常分. 逝者可以達理. 存者不必過哀.”(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第11 文聖王)
‘生死有命’이란 표현은 중국의 도가와 유가의 생사관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死生存亡, 窮達貧富, 賢與不肖毁譽, 飢渴寒暑, 是事之變, 命之行也. 日夜相代乎前, 而不能規乎其始者也.”(莊子 德充符)
“死生, 命也, 其有夜旦之常, 天也. 人之有所不得與, 皆物之情也.”(莊子 大宗師)
“死生有命, 富貴在天”(論語 顔淵第12)
“墨家之論 以爲人死無命 儒家之議 以爲人死有命 言有命者 見子夏言 生死有命 富貴在天 言無命者 謂歷陽之都 一宿沈而爲湖...” (論衡 卷2 命義篇)
물론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생사유명’과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생사유명’은 차이가 있다. 노장사상에서 ‘命’은 만물은 스스로 그러하며 끊임없이 변동하여 고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데 이 변동을 ‘命’이라 하여 생사 역시 그러한 ‘命’이 행한 결과라는 것이며, 유가사상에서는 생사가 불가지적인 ‘命’에 달려있으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장자는 죽음이 또 다른 생이므로 생과 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유가는 영원한 생명은 현실세계에서 공을
그리하여 필자는 고대 한국사의 한 면을 ‘고대 한국의 生死觀’이라는 주제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처음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이라는 주제를 풀어나갈 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었다. 우선은 고대 한국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가(여기에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도 포함된다), 나아가 죽음이 인간의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그리하여 고대 한국인들이 품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체계가 당대의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는 고대 한국인들의 그 설명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문제들을 검토하다보니, 기본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한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 관련한 문제를 몇가지로 나누어 발표하게 되었다. 우선 고대 한국인들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의 문제를 <고대 한국인의 生死觀 - 靈魂觀을 중심으로 -> 나희라, 2003 고대 한국의 生死觀 - 靈魂觀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47, 근간
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후속편으로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대 한국인들이 죽음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또한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면 관계상 고대 한국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초두에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여기서는 죽음 이후 인간의 상태에 대한 관심인 他界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 生死觀과 他界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죽음과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크게 두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죽음은 인정하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도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형식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원시 및 고대인들의 생명일체화(solidarity of life) 관념에 의한 신화적 사고를 통해 잘 드러나며, 초기 인류에게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어서, 많은 고대의 신화와 종교들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윤회설도 결국에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고 반대편에 선 生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 생의 영구한 존속을 희구한 중국의 神仙說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후자도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시 몇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입장은 육체적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삶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보여, 죽음 이후 어떤 식으로든 삶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대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보는 二元論을 취한다. 그리하여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사후에 영혼은 삶을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적 생사관이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한편 죽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생사관의 무게중심을 적극적으로 현실의 삶에 두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끊고 현실 삶에서의 도덕과 생명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儒家의 생사관도 있다. 이들과 달리 죽음을 인정하면서 또한 삶에 대한 집착마저 끊어 삶과 죽음 모두를 넘어서려는 것이 불교의 생사관이다.
고대 한국인들의 생과 사를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이는 별도로 다루어야할 큰 문제이므로, 본 논문 구성상 필요한 부분에서만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고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삶과 죽음을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육체적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삶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죽음 이후의 삶을 상정하는 입장은 한국 고대사에서는 흔히 계세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죽음이나 삶에 대한 집착보다는 生死 현상의 진실을 직시하려는 ‘生死有命’을 내세우는 입장도 있었다. “先生仰天嘆曰, 夫死生有命, 富貴在天. 其來也不可拒, 其往也不可追. 汝何償乎.”(三國史記 卷第48 列傳第8 百結先生)
“春秋入唐, 請得兵二十萬來. 見庾信曰, 死生有命, 故得生還, 復與公相見, 何幸如焉.”(三國史記 卷第41 列傳第1 金庾信上)
“六年 是月(正月), 王寢疾彌留. 乃下詔曰 (中略) 死生有命, 顧復何恨.”(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第9 宣德王)
“十九年秋九月, 王不豫, 降遺詔曰 (中略) 爰釋重負, 委之賢德, 付託得人, 夫復何恨. 生死始終, 物之大期, 壽夭修短, 命之常分. 逝者可以達理. 存者不必過哀.”(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第11 文聖王)
‘生死有命’이란 표현은 중국의 도가와 유가의 생사관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死生存亡, 窮達貧富, 賢與不肖毁譽, 飢渴寒暑, 是事之變, 命之行也. 日夜相代乎前, 而不能規乎其始者也.”(莊子 德充符)
“死生, 命也, 其有夜旦之常, 天也. 人之有所不得與, 皆物之情也.”(莊子 大宗師)
“死生有命, 富貴在天”(論語 顔淵第12)
“墨家之論 以爲人死無命 儒家之議 以爲人死有命 言有命者 見子夏言 生死有命 富貴在天 言無命者 謂歷陽之都 一宿沈而爲湖...” (論衡 卷2 命義篇)
물론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생사유명’과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생사유명’은 차이가 있다. 노장사상에서 ‘命’은 만물은 스스로 그러하며 끊임없이 변동하여 고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은데 이 변동을 ‘命’이라 하여 생사 역시 그러한 ‘命’이 행한 결과라는 것이며, 유가사상에서는 생사가 불가지적인 ‘命’에 달려있으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장자는 죽음이 또 다른 생이므로 생과 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유가는 영원한 생명은 현실세계에서 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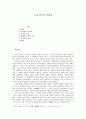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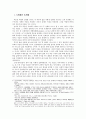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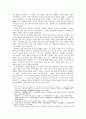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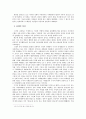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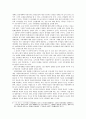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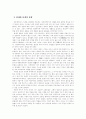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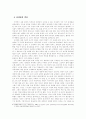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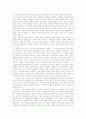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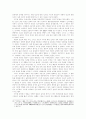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