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타악기의 역사
2. 타악기의 종류
(1) 서양 타악기
1)유율 타악기
2)무율 타악기
3)라틴음악에 쓰이는 악기
(2)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3. 타악기의 특징
2. 타악기의 종류
(1) 서양 타악기
1)유율 타악기
2)무율 타악기
3)라틴음악에 쓰이는 악기
(2)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3. 타악기의 특징
본문내용
베스
클라베스는 한 쌍의 나무 조각으로 서로 부딪쳐서 소리낸다.(목탁소리 효과)
2.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편 종
편종은 쇠붙이로 된 유율 타악기로 고려 예종 11년 (1116)에 송나라로부터 수입하여 궁중제례악에 사용하였고, 세종 11년 (1429) 주종소를 설치하여 국내에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도는 약 30cm미만의 길이를 가진 똑같은 크기의 종 16개를 두께에 따라 고저를 다르게 하여 12율과 4청성을 나무틀의 위, 아래 두단으로 된 가로목에 음높이 순에 따라 한단에 8개씩 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종을 연주할 때는 각퇴로 종 아래 정면에 둥근 수를 치고 지금은 아악, 속악을 가리지 않고 바른손 한손으로 연주하나, 예전에는 아악은 황종부터 임종까지 아랫단은 바른손으로 치고, 이칙부터 청협종까지 윗단은 왼손으로 쳤으며, 속악의 경우는 두 손을 편한대로 쳤다. 현재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낙양춘\", \"보허자\" 등의 연주에 쓰이고 있다.
편 경
편경은 돌로 된 유율 타악기로 고려 예종 11년 (1116) 송나라로부터 등가에 정성과 중성의 편경 각 한틀, 헌가에 정성과 중성의 편경 각 아홉틀을 들여왔고, 공민왕 때와 조선조 태종 때에도 명나라에서 들여다가 궁중제례악에 사용하였다. 그 뒤 조선 세종 7년 (1425) 경기도 남양에서 경돌이 발견되어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제도는 \"ㄱ\"자 모양으로 만든 16개의 경돌을 음높이의 순서대로 위,아래 두 단에 8개씩 끈으로 매어단다. 경의 두께에 따라 음높이가 다른데, 경이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그 소리가 낮다. 경의 소리가 높으면 그 돌을 갈아서 얇게하고, 소리가 낮으면 긴 쪽의 아래 끝을 짧게 깎아 음정을 맞춘다. 편경을 연주할 때는 각퇴로 긴 쪽의 위끝을 쳐야 하며, 지금은 오른손 한 손으로 연주하나, 『악학궤범』에 따르면, 예전에는 아악은 황종부터 임종까지의 아랫단은 오른손으로 치고, 이칙부터 청협종까지의 윗단은 왼손으로 쳤으며, 속악의 경우는 두손으로 편한 대로 쳤다.
특 종
특종은 단 한개의 종으로 된 유율타악기이다. 특종의 종은 편종의 종보다 2배가 크다. 조선조 세종 때 박연이 아악을 정비할 무렵 『주례도』를 참고하여 황종에 맞추어 만들어 궁중 아악에 사용하여 왔다. 세종때에는 등가에 한틀, 헌가에 아홉틀을 썼다. 등가의 특종은 황종으로 되어 있었고 헌가의 9틀의 특종은 12율을 갖추었다. 오늘날에는 문묘 석전의 등가에서만 사용되는 데, 특종의 음은 황종이다. 주법은 제례악을 시작할 때 박을 치고 난 다음 특종을 한번 치고, 그 다음 축을 세번, 북을 한번 치는 것을 세번 반복하고 다시 특종을 한번 치고 나서 음악이 시작된다.
특 경
특경은 아악기로 편경보다 큰 황경종 하나를 가자에 매달고 제례악의 등가에서 음악이 그칠 때 쓰고, 음악을 시작할 때 쓰는 특종과 한쌍으로 대를 이룬다. 세종때에는 등가에 한틀, 헌가에 아홉틀이 쓰였으나 성종때에는 등가에 황종특경 한틀만이 사용되었다. 지금은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의 등가에서 황종 특경 한 틀이 쓰인다. 장식은 편경과 같으나, 다만 목공작이 다섯이 아니고 셋일 뿐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절고를 세번 치고, 어를 절고소리에 따라 세번 긁고, 특경은 절고의 첫소리와 끝소리에 각각 한 번 치면 박을 치고 음악을 끝낸다.
축
축은 아악연주에서 시작을 알리는 타악기이다. 네모진 나무 상자 윗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나무 방망이를 세워 상자 밑바닥을 내려친다.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축은 음악의 종지를 알리는 어와 짝이 된다. 축은 양의 상징으로 동쪽에 위치하며 겉면은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칠하고 사면에는 산수화를 그린다. 축을 치는 수직적인 동작은 땅과 하늘을 열어 음악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상자는 바닥면이 좁고 위가 약간 넓은 사다리꼴 모양의 육면체이며, 방대라고 하는 받침대위에 올려놓고 친다. 고려시대에 대성아악의 한 가지로 수용된 이래 아악 연주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에서 연주된다.
정 주
정주는 진도 씻김굿 등 남도지방 무악에서 쓰이는 금속 타악기다. 정주는 대체로 놋주발 모양의 작은 종에 손잡이 혹은 끈을 단 것인데, 이를 왼손에 잡고, 사슴뿔로 만든 채를 오른손에 들고 쳐서 소리낸다. 여음이 길고 맑고 높은 소리가 나며, 근래에 와서는 창작 작
용 고
용고는 대취타를 연주할 때 매고 치는 북이다. 북면의 지름이 약 40.5cm, 북통의 길이가 25cm 가량된다. 용고라는 북 이름은 이왕직아악부 시대의 기록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양손에 한삼을 끼고 친다.
영고, 영도
영고는 여덟개의 북을 모아서 틀에 매단 것이다. 즉 팔면의 북을 가진 악기이다. 북통은 노란 칠을 한다. 영고, 영도가 팔면인 것은 지신의 제사에서 같은 곡을 여덟 번 반복하는 것과 일치한다. 영고와 영도의 치는 법은 뇌고, 뇌도와 같다. 사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이 악기도 연주되지 않는다.
어
어는 나무를 엎드린 호랑이의 모습으로 깎아 만든 악기이다. 호랑이의 등에는 등줄기를 따라 꼬리 부분까지 27개 톱니를 길게 박아 놓았다. 둥근 대나무 끝을 세 가닥씩 셋으로 쪼갠 채로 호랑이의 머리를 세 번 치고는 나무톱을 꼬리 쪽으로 한번 훑어 내린다. 이러기를 세 번 함으로써 음악의 끝을 장식한다. 어를 치고 나면 박을 세번 울려 음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의식음악을 연주할 때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므로 동쪽에 놓았지만 어는 음악의 끝남을 알리는 것이므로 서쪽에 놓는다. 또 축은 동쪽을 상징하는 악기이므로 푸른 색깔이지만 어는 서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개 흰칠을 하고 검정으로 긴 얼룩무늬를 그린다. 우리 나라의 악기는 앉아서 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와 축은 방대 위에 올려 놓으므로 서서 연주한다. 어는 축과 함께 고려 대성아악에 편성되오 들어온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
부(缶)는 지름이 32cm, 높이가 23cm 정도되는 질화로 모양의 타악기이다. 24cm 정도 높이의 조그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대나무 채로 친다. 채는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아랫쪽이 아홉 가닥으로 갈라져 있으며 연주자는 이 채로 부의 가장자리를 친다. 세종
클라베스는 한 쌍의 나무 조각으로 서로 부딪쳐서 소리낸다.(목탁소리 효과)
2.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편 종
편종은 쇠붙이로 된 유율 타악기로 고려 예종 11년 (1116)에 송나라로부터 수입하여 궁중제례악에 사용하였고, 세종 11년 (1429) 주종소를 설치하여 국내에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도는 약 30cm미만의 길이를 가진 똑같은 크기의 종 16개를 두께에 따라 고저를 다르게 하여 12율과 4청성을 나무틀의 위, 아래 두단으로 된 가로목에 음높이 순에 따라 한단에 8개씩 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종을 연주할 때는 각퇴로 종 아래 정면에 둥근 수를 치고 지금은 아악, 속악을 가리지 않고 바른손 한손으로 연주하나, 예전에는 아악은 황종부터 임종까지 아랫단은 바른손으로 치고, 이칙부터 청협종까지 윗단은 왼손으로 쳤으며, 속악의 경우는 두 손을 편한대로 쳤다. 현재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낙양춘\", \"보허자\" 등의 연주에 쓰이고 있다.
편 경
편경은 돌로 된 유율 타악기로 고려 예종 11년 (1116) 송나라로부터 등가에 정성과 중성의 편경 각 한틀, 헌가에 정성과 중성의 편경 각 아홉틀을 들여왔고, 공민왕 때와 조선조 태종 때에도 명나라에서 들여다가 궁중제례악에 사용하였다. 그 뒤 조선 세종 7년 (1425) 경기도 남양에서 경돌이 발견되어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제도는 \"ㄱ\"자 모양으로 만든 16개의 경돌을 음높이의 순서대로 위,아래 두 단에 8개씩 끈으로 매어단다. 경의 두께에 따라 음높이가 다른데, 경이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그 소리가 낮다. 경의 소리가 높으면 그 돌을 갈아서 얇게하고, 소리가 낮으면 긴 쪽의 아래 끝을 짧게 깎아 음정을 맞춘다. 편경을 연주할 때는 각퇴로 긴 쪽의 위끝을 쳐야 하며, 지금은 오른손 한 손으로 연주하나, 『악학궤범』에 따르면, 예전에는 아악은 황종부터 임종까지의 아랫단은 오른손으로 치고, 이칙부터 청협종까지의 윗단은 왼손으로 쳤으며, 속악의 경우는 두손으로 편한 대로 쳤다.
특 종
특종은 단 한개의 종으로 된 유율타악기이다. 특종의 종은 편종의 종보다 2배가 크다. 조선조 세종 때 박연이 아악을 정비할 무렵 『주례도』를 참고하여 황종에 맞추어 만들어 궁중 아악에 사용하여 왔다. 세종때에는 등가에 한틀, 헌가에 아홉틀을 썼다. 등가의 특종은 황종으로 되어 있었고 헌가의 9틀의 특종은 12율을 갖추었다. 오늘날에는 문묘 석전의 등가에서만 사용되는 데, 특종의 음은 황종이다. 주법은 제례악을 시작할 때 박을 치고 난 다음 특종을 한번 치고, 그 다음 축을 세번, 북을 한번 치는 것을 세번 반복하고 다시 특종을 한번 치고 나서 음악이 시작된다.
특 경
특경은 아악기로 편경보다 큰 황경종 하나를 가자에 매달고 제례악의 등가에서 음악이 그칠 때 쓰고, 음악을 시작할 때 쓰는 특종과 한쌍으로 대를 이룬다. 세종때에는 등가에 한틀, 헌가에 아홉틀이 쓰였으나 성종때에는 등가에 황종특경 한틀만이 사용되었다. 지금은 문묘제례악과 종묘제례악의 등가에서 황종 특경 한 틀이 쓰인다. 장식은 편경과 같으나, 다만 목공작이 다섯이 아니고 셋일 뿐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절고를 세번 치고, 어를 절고소리에 따라 세번 긁고, 특경은 절고의 첫소리와 끝소리에 각각 한 번 치면 박을 치고 음악을 끝낸다.
축
축은 아악연주에서 시작을 알리는 타악기이다. 네모진 나무 상자 윗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나무 방망이를 세워 상자 밑바닥을 내려친다.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축은 음악의 종지를 알리는 어와 짝이 된다. 축은 양의 상징으로 동쪽에 위치하며 겉면은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칠하고 사면에는 산수화를 그린다. 축을 치는 수직적인 동작은 땅과 하늘을 열어 음악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상자는 바닥면이 좁고 위가 약간 넓은 사다리꼴 모양의 육면체이며, 방대라고 하는 받침대위에 올려놓고 친다. 고려시대에 대성아악의 한 가지로 수용된 이래 아악 연주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에서 연주된다.
정 주
정주는 진도 씻김굿 등 남도지방 무악에서 쓰이는 금속 타악기다. 정주는 대체로 놋주발 모양의 작은 종에 손잡이 혹은 끈을 단 것인데, 이를 왼손에 잡고, 사슴뿔로 만든 채를 오른손에 들고 쳐서 소리낸다. 여음이 길고 맑고 높은 소리가 나며, 근래에 와서는 창작 작
용 고
용고는 대취타를 연주할 때 매고 치는 북이다. 북면의 지름이 약 40.5cm, 북통의 길이가 25cm 가량된다. 용고라는 북 이름은 이왕직아악부 시대의 기록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양손에 한삼을 끼고 친다.
영고, 영도
영고는 여덟개의 북을 모아서 틀에 매단 것이다. 즉 팔면의 북을 가진 악기이다. 북통은 노란 칠을 한다. 영고, 영도가 팔면인 것은 지신의 제사에서 같은 곡을 여덟 번 반복하는 것과 일치한다. 영고와 영도의 치는 법은 뇌고, 뇌도와 같다. 사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이 악기도 연주되지 않는다.
어
어는 나무를 엎드린 호랑이의 모습으로 깎아 만든 악기이다. 호랑이의 등에는 등줄기를 따라 꼬리 부분까지 27개 톱니를 길게 박아 놓았다. 둥근 대나무 끝을 세 가닥씩 셋으로 쪼갠 채로 호랑이의 머리를 세 번 치고는 나무톱을 꼬리 쪽으로 한번 훑어 내린다. 이러기를 세 번 함으로써 음악의 끝을 장식한다. 어를 치고 나면 박을 세번 울려 음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의식음악을 연주할 때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므로 동쪽에 놓았지만 어는 음악의 끝남을 알리는 것이므로 서쪽에 놓는다. 또 축은 동쪽을 상징하는 악기이므로 푸른 색깔이지만 어는 서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개 흰칠을 하고 검정으로 긴 얼룩무늬를 그린다. 우리 나라의 악기는 앉아서 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와 축은 방대 위에 올려 놓으므로 서서 연주한다. 어는 축과 함께 고려 대성아악에 편성되오 들어온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
부(缶)는 지름이 32cm, 높이가 23cm 정도되는 질화로 모양의 타악기이다. 24cm 정도 높이의 조그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대나무 채로 친다. 채는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아랫쪽이 아홉 가닥으로 갈라져 있으며 연주자는 이 채로 부의 가장자리를 친다.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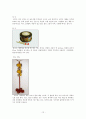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