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초의 한글 글꼴 판본체
2. 한글의 다른 이름과 변천과정
3.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시대까지, 궁체
4. 민족의 얼과 예술성이 살아있는 글씨, 민체
5. 초기한글의 형태와 요즘 한글의 형태의 특성
1) 옛 문헌의 한글 표기법
2) 현대의 한글 표기법
참고문헌
2. 한글의 다른 이름과 변천과정
3.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시대까지, 궁체
4. 민족의 얼과 예술성이 살아있는 글씨, 민체
5. 초기한글의 형태와 요즘 한글의 형태의 특성
1) 옛 문헌의 한글 표기법
2) 현대의 한글 표기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같다. 백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바른 소리(글자)”라는 뜻이된다. 그러나 당시의 양반들의 세도가나 위정자들은 배우가 쉬워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훈민장음이라는 문자의 출현을 달가워 할이없었다.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고 익혀서 유식해진다면 지금까지 무식한 백성들을 상대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날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을 도리어 상대하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한자와 한문에 비해 한글을 낮잡아 보는 태도가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한자/한문은 ‘진서(眞書)’라고 부르고 한글은 ‘언문(諺文)’ 이라고 흔히 불렀다. 더 한심한 것은 훈민정음이 사대부의 양반들이나 남자들보다는 부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글이라해서 사대부들간에는 ‘암클’ 이라고 불렀으며 한문이 어려워서 아직 배우지 못하고 대신 훈민정음이나 배우는 아이들의 글이라는 뜻의 ‘아햇글’ 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이설은 역사나 뚜렸한 기록은 없다. 그 후 개화기에 이르러 민족정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의 가치도 높이 평가하게 되어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바른 글이란 뜻의 ‘정음(正音)’ 또는 나라의 글이란 뜻의 국문(國文)’ 이란 새 이름을 얻기도 하였다. 그후 우리의 글이 한글이란 이름을 얻게되는데 처음 우리글을 한글이라 명명한걸로 알려진 주시경선생은 개화기에 우리 말과 글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힘쓴 사람으로서 훈민정음을 한글이란 이름을 붙이기전에는 한말, 한나라말, 한나라글등의 용어도 일찍부터 사용하였으며, ‘배달말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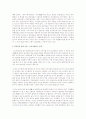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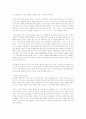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