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글 창제의 정치적 쟁점
-찬성 편-
《머릿말》
1.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
2. 세종이 한글을 만든 시기
1. 한글 발표 경위
1)한글 제정 발표와 제1차 반대 시기
2) 최만리들의 언문반대 상소문 내용을 통해 본 제 1차 반대 이유와 세종의 반박
3) 한글 제정의 제2차 반대
4) 언문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해명
2. 한글 창제와 관련된 몇 가지 정치적 쟁점
1) 한글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이다?
→ ★ 한글 창제 찬성 세력의 범위 규정
2)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진짜 목적
《맺음말》
-찬성 편-
《머릿말》
1.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
2. 세종이 한글을 만든 시기
1. 한글 발표 경위
1)한글 제정 발표와 제1차 반대 시기
2) 최만리들의 언문반대 상소문 내용을 통해 본 제 1차 반대 이유와 세종의 반박
3) 한글 제정의 제2차 반대
4) 언문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해명
2. 한글 창제와 관련된 몇 가지 정치적 쟁점
1) 한글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이다?
→ ★ 한글 창제 찬성 세력의 범위 규정
2)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진짜 목적
《맺음말》
본문내용
필요하고 우민계층은 글자가 필요 없다고 보았는데 이들 두 계층이 쓰는 글자는 이미 있으므로 새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유신들이 공통으로 가진 생각으로 세종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였던 것 같은데, 세종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반대를 무마시켰다.
① 언문은 모두 옛 글자에 근본을 두고 새 것이 아니다.
② 우민계층도 글자가 필요하므로 언문은 우민용 글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만리들의 언문 반대 상소문의 문제 제기의 가정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가령 언문은 모두 옛글자에 근본을 두고 새 글자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세종실록 26년 2월 쪽, 언문반대상소문>
② 만약 죄를 몰아부쳐 사형에 이르게 한 자백서는 이두글자로 적으면 글자 하나의 차이로 혹시 원통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으니 이제 언문으로써 말을 바로 적어서 읽고 그것을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쉽게 알아서 굽힐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
<세종실록 26년 2월 쪽, 언문반대상소문>
이렇듯 우민도 글자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은 우민용 글자를 새로 만듦이 옳음을 주장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다음처럼 삼계층 문자관에 선 것이다.
양반계층- 한자
서리계층- 이두
우민계층- 언문
우민용으로 언문을 만들었다는 세종의 답변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으로 일부 유신들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고 특히 김문은 세종에게 직접 「언문을 만듦은 옳다」고 계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세종은 최만리들의 제1차 반대 때 한글은 우민용 글자라고 답변하여 유신들의 저항을 꺾었는데, 그러한 점은 세종 25년 12월의 한글 교재의 글에서 분명히 하였다. 그 글에서 한글은 우민용 글자임을 분명히 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이름을 우민용 글자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② 서문을 붙여 한글은 우민을 위해 만든 글자임을 밝혔다.
이렇게 한글이 우민용 글자임을, 공식적 공표문이기도 한 세종 25년의 어제 훈민정음의 글에서 밝히므로 해서 양반계층의 반대를 피했으며 그 때문에 한글을 공표한 그 때 반대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3) 한글 제정의 제2차 반대
세종은 세종 25년 12월에 어제 동국정운의 표음 한글체계를 알리는 어제 훈민정음을 발표하여 한글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세종 26년 2월 16일에는 의사청에 나아가 운회의 번역을 명하였다. 그 뒤의 나흘이 지난 세종 26년 2월 20일에 최만리들이 언문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 이 언문 반대 사건은 최만리들의 제 2차 언문 반대이다. 제 1차 언문 반대를 시도했던 최만리들이 한글은 우민용 글자라고 하여 세종이 삼계층 문자론을 펴자 한글 만듦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 언문 반대를 끝까지 밀어 붙이지 못하다가 세종 26년 2월 20일에 갑자기 언문 반대 상소를 올렸다. 그 이유로는
①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캐지 아니하시고 서둘러 서리들 십여 명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십니다.
② 또 옛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를 가벼히 고쳐서 터무니없는 언문을 붙여 맞추어 장인바치 수십 명을 모아 그것을 새겨 갑자기 그것을 세상에 널리 펴고자 하시니 뒷날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종실록 26년 2월 쪽, 언문반대상소문>
①은 한글을 서리들에게 가르쳐 관용문자로 쓰고자 함이고 ②은 한글로 표음한 운서를 발간하고자 함의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②의 운서는 언문 반대 상소문을 올린 세종 26년 2월 20일보다 나흘 전에 세종이 명한 운회 번역의 운서와는 다른 운서이다. 이 운서는 한글 표음의 원고가 이미 완성되어 인쇄에 들어간 운서로 어제 동국정운을 뜻하며 우리 한자음을 한글로 표음한 운서이다. 최만리들이 언문 반대 상소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사건은 한글을 삼계층에 두루 쓰는 나랏글자로 사용함을 뜻한다.
양반계층-한글을 양반들이 쓰는 운서에 씀
서리계층-한글을 서리들이 배워 관용문자로 씀
우민계층-한글로 우리말을 적음.
이러한 사실은 제1차 언문 반대 때 세종이 한글은 우민들만이 사용하는 우민용 문자라고 공헌하며 반대를 무마했던 말과는 아주 다르다. 한글을 우민용 글자라고 한 것은 언문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책임 없는 말에 불과하고 속뜻은 삼계층이 다 쓰는 나랏글자로 만들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나랏글자로 씀을 서둘렀는데, 최만리들도 서둘러 반대하여 그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당시 많은 양반들이 한글을 삼계층이 다 쓰는 나랏글자로 씀에는 반대한 것 같다. 그래서 제 1차 언문 반대 때는 한글 만듦을 지지했던 김문도 이번에는 적극 반대한 것이다.
4) 언문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해명
임금님께서 상소문을 보시고 최만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 소리를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옛것에 다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설총의 이두 또한 다른 소리가 아닌가? 또 이두를 지은 본래의 뜻은 곧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의 뜻이 없더냐? 만약 그것 본래의 뜻은 곧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의 뜻이 없더냐? 만약 그것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면 지금의 언문 또한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너희들이 설총을 옳다 하면서 제 임금의 한일은 그르다 함이 무엇인가?
또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과 자모는 몇 개가 있느냐? 만일 내가 운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것을 바르게 하겠는가?
또 소문에서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재주」라고 하였으나 내가 늘그막에 소일하기가 어려워 책으로 벗을 삼을 뿐이다.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즐겨서 그것을 하겠는가? 또 밭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는 따위가 아닌데 너희들의 말이 너무 지나침이 있다. 또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 나라의 뭇 일을 세자가 전적으로 권장하니 비록 적은 일이라도 진실로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언문이랴, 만약 세자가 동궁에만 늘 있으면 환관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너희들이 나를 모시는 신하로서 내 뜻을 환히 알면서 이런 말을 하여서 옳을 것인가?」하셨다.
최만리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다른 소리」라 말씀하시나 소리에 의하고 풀이에 의하니 한자와 어조와 이두가 원래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유신들이 공통으로 가진 생각으로 세종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였던 것 같은데, 세종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반대를 무마시켰다.
① 언문은 모두 옛 글자에 근본을 두고 새 것이 아니다.
② 우민계층도 글자가 필요하므로 언문은 우민용 글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만리들의 언문 반대 상소문의 문제 제기의 가정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가령 언문은 모두 옛글자에 근본을 두고 새 글자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세종실록 26년 2월 쪽, 언문반대상소문>
② 만약 죄를 몰아부쳐 사형에 이르게 한 자백서는 이두글자로 적으면 글자 하나의 차이로 혹시 원통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으니 이제 언문으로써 말을 바로 적어서 읽고 그것을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쉽게 알아서 굽힐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
<세종실록 26년 2월 쪽, 언문반대상소문>
이렇듯 우민도 글자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은 우민용 글자를 새로 만듦이 옳음을 주장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다음처럼 삼계층 문자관에 선 것이다.
양반계층- 한자
서리계층- 이두
우민계층- 언문
우민용으로 언문을 만들었다는 세종의 답변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으로 일부 유신들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고 특히 김문은 세종에게 직접 「언문을 만듦은 옳다」고 계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세종은 최만리들의 제1차 반대 때 한글은 우민용 글자라고 답변하여 유신들의 저항을 꺾었는데, 그러한 점은 세종 25년 12월의 한글 교재의 글에서 분명히 하였다. 그 글에서 한글은 우민용 글자임을 분명히 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이름을 우민용 글자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② 서문을 붙여 한글은 우민을 위해 만든 글자임을 밝혔다.
이렇게 한글이 우민용 글자임을, 공식적 공표문이기도 한 세종 25년의 어제 훈민정음의 글에서 밝히므로 해서 양반계층의 반대를 피했으며 그 때문에 한글을 공표한 그 때 반대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3) 한글 제정의 제2차 반대
세종은 세종 25년 12월에 어제 동국정운의 표음 한글체계를 알리는 어제 훈민정음을 발표하여 한글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세종 26년 2월 16일에는 의사청에 나아가 운회의 번역을 명하였다. 그 뒤의 나흘이 지난 세종 26년 2월 20일에 최만리들이 언문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 이 언문 반대 사건은 최만리들의 제 2차 언문 반대이다. 제 1차 언문 반대를 시도했던 최만리들이 한글은 우민용 글자라고 하여 세종이 삼계층 문자론을 펴자 한글 만듦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 언문 반대를 끝까지 밀어 붙이지 못하다가 세종 26년 2월 20일에 갑자기 언문 반대 상소를 올렸다. 그 이유로는
①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캐지 아니하시고 서둘러 서리들 십여 명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십니다.
② 또 옛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를 가벼히 고쳐서 터무니없는 언문을 붙여 맞추어 장인바치 수십 명을 모아 그것을 새겨 갑자기 그것을 세상에 널리 펴고자 하시니 뒷날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종실록 26년 2월 쪽, 언문반대상소문>
①은 한글을 서리들에게 가르쳐 관용문자로 쓰고자 함이고 ②은 한글로 표음한 운서를 발간하고자 함의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②의 운서는 언문 반대 상소문을 올린 세종 26년 2월 20일보다 나흘 전에 세종이 명한 운회 번역의 운서와는 다른 운서이다. 이 운서는 한글 표음의 원고가 이미 완성되어 인쇄에 들어간 운서로 어제 동국정운을 뜻하며 우리 한자음을 한글로 표음한 운서이다. 최만리들이 언문 반대 상소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사건은 한글을 삼계층에 두루 쓰는 나랏글자로 사용함을 뜻한다.
양반계층-한글을 양반들이 쓰는 운서에 씀
서리계층-한글을 서리들이 배워 관용문자로 씀
우민계층-한글로 우리말을 적음.
이러한 사실은 제1차 언문 반대 때 세종이 한글은 우민들만이 사용하는 우민용 문자라고 공헌하며 반대를 무마했던 말과는 아주 다르다. 한글을 우민용 글자라고 한 것은 언문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책임 없는 말에 불과하고 속뜻은 삼계층이 다 쓰는 나랏글자로 만들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나랏글자로 씀을 서둘렀는데, 최만리들도 서둘러 반대하여 그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당시 많은 양반들이 한글을 삼계층이 다 쓰는 나랏글자로 씀에는 반대한 것 같다. 그래서 제 1차 언문 반대 때는 한글 만듦을 지지했던 김문도 이번에는 적극 반대한 것이다.
4) 언문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해명
임금님께서 상소문을 보시고 최만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 소리를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옛것에 다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설총의 이두 또한 다른 소리가 아닌가? 또 이두를 지은 본래의 뜻은 곧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의 뜻이 없더냐? 만약 그것 본래의 뜻은 곧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의 뜻이 없더냐? 만약 그것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면 지금의 언문 또한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너희들이 설총을 옳다 하면서 제 임금의 한일은 그르다 함이 무엇인가?
또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과 자모는 몇 개가 있느냐? 만일 내가 운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것을 바르게 하겠는가?
또 소문에서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재주」라고 하였으나 내가 늘그막에 소일하기가 어려워 책으로 벗을 삼을 뿐이다.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즐겨서 그것을 하겠는가? 또 밭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는 따위가 아닌데 너희들의 말이 너무 지나침이 있다. 또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 나라의 뭇 일을 세자가 전적으로 권장하니 비록 적은 일이라도 진실로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언문이랴, 만약 세자가 동궁에만 늘 있으면 환관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너희들이 나를 모시는 신하로서 내 뜻을 환히 알면서 이런 말을 하여서 옳을 것인가?」하셨다.
최만리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다른 소리」라 말씀하시나 소리에 의하고 풀이에 의하니 한자와 어조와 이두가 원래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키워드
추천자료
 남북한 언어관과 통일시대 남북어(南北語) 수용에 대한 고찰
남북한 언어관과 통일시대 남북어(南北語) 수용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여류문학 고찰
조선시대 여류문학 고찰 훈민정음 창제설 훈민정음 유래 훈민정음 특징 한글 특징 한글
훈민정음 창제설 훈민정음 유래 훈민정음 특징 한글 특징 한글 국문학사 시대구분 이견
국문학사 시대구분 이견 문화광광 해설사의 내용
문화광광 해설사의 내용 조선시대의 교육 제도
조선시대의 교육 제도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 조선의 CEO -대왕 세종 (다시 주목 받는 세종)
조선의 CEO -대왕 세종 (다시 주목 받는 세종) 르네상스에 대한 자료조사
르네상스에 대한 자료조사  비잔틴 제국과 콘스탄틴의 멸망에 대해서
비잔틴 제국과 콘스탄틴의 멸망에 대해서 한국 근현대사(조선시대~산업화)의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관 분석
한국 근현대사(조선시대~산업화)의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관 분석 [경영, 사학 등등] 경영자의 역할
[경영, 사학 등등] 경영자의 역할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세종실록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또는 내용 조사와 자신의 견해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세종실록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또는 내용 조사와 자신의 견해 [감상문] 나의 전공에서 바라본 세종 시대
[감상문] 나의 전공에서 바라본 세종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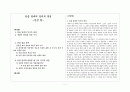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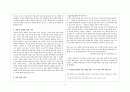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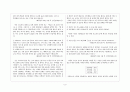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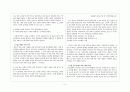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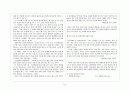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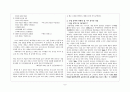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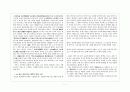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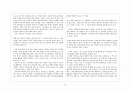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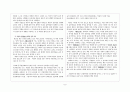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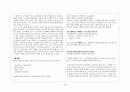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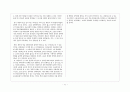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