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띄어쓰기의 원리
3.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2. 띄어쓰기의 원리
3.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본문내용
\'-예요\', \'여요\' 형으로 나타난다.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이에요\', \'-이어요\' 형 대신 그 준말인 \'-예요\', \'-여요\' 형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1) 책+이에요/이어요 ⇒ 책이에요/책이어요 (받침 있는 체언 뒤)
(2) 저+이에요/이어요(→예요/여요) ⇒ 저예요/저여요 (받침 없는 체언 뒤)
그러나 위의 규정은 \'아니에요\'가 맞는지, \'아니예요\'가 맞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알려 주지 못한다. \'-이에요, -이어요\'에서 \'-이-\'는 서술격조사 \'이다\'의 어간이므로 \'-이에요, -이어요\'는 그 앞에 체언이 오게 되는데, \'아니다\'는 체언이 아니라 용언(형용사)이어서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3)에서 보듯이 형용사 \'아니다\'는 서술격조사 \'이다\'와 활용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3) \'이다\', \'아니다\'의 활용 양상
가. \'-어서/-아서\' 형 대신 \'-라서\' 형이 쓰이기도 함: 책이라서, 책이 아니라서
나. \'-는구나, -구나\' 형 대신 \'-로구나\' 형이 쓰이기도 함: 책이로구나, 책이 아니로구나
(3가)는 보통의 용언 어간이라면 \'-어서/-아서\'가 올 자리에(예: 먹어서, 좋아서) \'-라서\'가 온 예이고, (3나)는 보통의 용언 어간이라면 \'-는구나\', \'-구나\'가 올 자리에(예: 먹는구나, 좋구나) \'-로구나\'가 온 예이다. 이는 서술격조사 \'이다\'와 형용사 \'아니다\'가 어미 활용에서는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원적으로 형용사 \'아니다\'는 명사 \'아니\'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아니\'(명사)+\'이-\'(서술격조사)]의 구조를 가지던 말이 근대국어 말기에 형용사 어간 \'아니-\'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다\'는 비록 체언이 아니나 서술격조사 \'이다\'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이므로 \'-이에요, -이어요\'에서 서술격조사 부분 \'-이-\'가 빠진 \'-에요, -어요\'가 결합하게 된다. 즉 \'아니다\'에 [표준어 규정] 26항을 적용하면 아래 (4)와 같다.
(4) 아니-+-에요/-어요 → 아니에요/아니어요
44. \'머물러, 가졌다\'인지 \'머물어, 갖었다\'인지?
(가)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니, 머물러/머물렀다
(가)\' 머다: 머물고, 머무니(←머물-+-으니), *
머물어/*
머물었다 ※ \'머무르다, 서투르다, 서두라다\'의 준말인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어, -었-\'과 같은 모음어미 앞에서는 쓰이지 않음.
(가)\'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나) 가지다: 가지고, 가지니, 가져/가졌다
(나)\' 갖다: 갖고, *
갖으니, *
갖어/*
갖었다 ※ \'가지다\'의 준말 \'갖다\'는 자음어미 앞에서만 쓰임
(나)\' 디디다/딛다: 발을 디뎠다(←디디었다)/*
딛었다(←*
딛었다) ※ \'디디다\'의 준말 \'딛다\' 역시 자음어미 앞에서만 쓰임.
45. \'바람\'인지 \'바램\'인지?
(가) 우리의 바람은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나) 저고리의 색이 바램
※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바라요\'는 아주 어색한 어형임. \"저는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요/바래요.\"
46. \'흡연을 {삼가, 삼가해} 주십시오.
(가) 흡연을 {삼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가하다\'는 없는 말임.
(나) 서슴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 보아라.
47.\'다르다\'인가, \'틀리다\'인가: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틀리다\'를 쓰면 틀림.
(가) 이론과 현실은 {틀려요 / 달라요}. ※ 뜻: \"같지 않다\". \'다르다\'는 형용사
(가)\' 선생님, 제 생각은 {틀립니다 / 다릅니다}.
(나) 계산이 틀리다. ☞ 동사, \"셈이나 사실 따위가 맞지 않다\". \'틀리다\'는 동사.
(나)\' 어, 약속이 틀리는데. ☞ 동사, \"어떤 일이나 사물이 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다\"
(다) 자, 보세요. 이건 물건이 틀리다니까요. / 야, 이곳은 분위기부터 틀리다. 그렇지?
☞ 형용사, \"보통의 것과 다르거나 특출나다\". 일부의 \'틀리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문맥에 쓰여 차츰 \'다르다\'와 비슷한 용법을 획득해 가고 있으나 아직 표준어라고 하기 어렵다.
48. \'빌다\'와 \'빌리다\'의 구분
(가) 밥을 빌어먹다 / 잘못했다고 빌다 /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 \"乞, 祝\"의 뜻일 때만 \'빌다\'로 쓰고 \"借, 貸\"의 뜻일 때는 \'빌리다\'로 씀.
(나) 돈을 빌려 주다 / 술의 힘을 빌려 사랑을 고백하다 /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자유는 곧 책임을 수반한다고 한다
49. \'자문(諮問)\'과 \'주책(<主着)\': 의미가 변화 중인 단어들
(가) 전문가에게 자문하다(→ 반대말은 \'자문에 응하다\') ※ 뜻(사전적 정의): \"물음이란 뜻으로, 특히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이 일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물음\". 따라서 \'자문\'은 하는 것이지 구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
(가)? 이번 일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조언을 구해서, 도움말을 청해서, 문의해서) 처리했다.
(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다, 받다} ※ \"자문하여 얻게 되는 판단이나 의견\"이라는 뜻으로 쓰임. 의미 변화 중.
(나) 주책없다: 말을 주책없이 하다 ※ 뜻: \"일정하게 자리잡힌 생각\"
(나)? 주책이다, 주책을 {부리다, 떨다} ※ \"일정한 줏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라는 뜻으로 쓰임. 의미 변화 중.
50. \'멋장이, 중매장이\'인지 \'멋쟁이, 중매쟁이\'인지?
(가) 미장이, 유기장이, 땜장이 ※ 전통적인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는 뜻일 때만 \'-장이\'
(나) 요술쟁이, 욕심쟁이, 중매쟁이, 점쟁이
51. \'왠지\'인가, \'웬지\'인가: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 \'웬\'은 관형사.
(가) {왠지, 웬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52. \'웃어른\'인가, \'윗어른\'인가: 위와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만 \'윗-\'으로 씀
(가) 윗니, 윗눈썹, 윗도리, 윗목
(가)\' 위쪽, 위채, 위층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
(1) 책+이에요/이어요 ⇒ 책이에요/책이어요 (받침 있는 체언 뒤)
(2) 저+이에요/이어요(→예요/여요) ⇒ 저예요/저여요 (받침 없는 체언 뒤)
그러나 위의 규정은 \'아니에요\'가 맞는지, \'아니예요\'가 맞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알려 주지 못한다. \'-이에요, -이어요\'에서 \'-이-\'는 서술격조사 \'이다\'의 어간이므로 \'-이에요, -이어요\'는 그 앞에 체언이 오게 되는데, \'아니다\'는 체언이 아니라 용언(형용사)이어서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3)에서 보듯이 형용사 \'아니다\'는 서술격조사 \'이다\'와 활용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
(3) \'이다\', \'아니다\'의 활용 양상
가. \'-어서/-아서\' 형 대신 \'-라서\' 형이 쓰이기도 함: 책이라서, 책이 아니라서
나. \'-는구나, -구나\' 형 대신 \'-로구나\' 형이 쓰이기도 함: 책이로구나, 책이 아니로구나
(3가)는 보통의 용언 어간이라면 \'-어서/-아서\'가 올 자리에(예: 먹어서, 좋아서) \'-라서\'가 온 예이고, (3나)는 보통의 용언 어간이라면 \'-는구나\', \'-구나\'가 올 자리에(예: 먹는구나, 좋구나) \'-로구나\'가 온 예이다. 이는 서술격조사 \'이다\'와 형용사 \'아니다\'가 어미 활용에서는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원적으로 형용사 \'아니다\'는 명사 \'아니\'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아니\'(명사)+\'이-\'(서술격조사)]의 구조를 가지던 말이 근대국어 말기에 형용사 어간 \'아니-\'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다\'는 비록 체언이 아니나 서술격조사 \'이다\'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이므로 \'-이에요, -이어요\'에서 서술격조사 부분 \'-이-\'가 빠진 \'-에요, -어요\'가 결합하게 된다. 즉 \'아니다\'에 [표준어 규정] 26항을 적용하면 아래 (4)와 같다.
(4) 아니-+-에요/-어요 → 아니에요/아니어요
44. \'머물러, 가졌다\'인지 \'머물어, 갖었다\'인지?
(가)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니, 머물러/머물렀다
(가)\' 머다: 머물고, 머무니(←머물-+-으니), *
머물어/*
머물었다 ※ \'머무르다, 서투르다, 서두라다\'의 준말인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어, -었-\'과 같은 모음어미 앞에서는 쓰이지 않음.
(가)\'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나) 가지다: 가지고, 가지니, 가져/가졌다
(나)\' 갖다: 갖고, *
갖으니, *
갖어/*
갖었다 ※ \'가지다\'의 준말 \'갖다\'는 자음어미 앞에서만 쓰임
(나)\' 디디다/딛다: 발을 디뎠다(←디디었다)/*
딛었다(←*
딛었다) ※ \'디디다\'의 준말 \'딛다\' 역시 자음어미 앞에서만 쓰임.
45. \'바람\'인지 \'바램\'인지?
(가) 우리의 바람은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나) 저고리의 색이 바램
※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바라요\'는 아주 어색한 어형임. \"저는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요/바래요.\"
46. \'흡연을 {삼가, 삼가해} 주십시오.
(가) 흡연을 {삼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가하다\'는 없는 말임.
(나) 서슴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 보아라.
47.\'다르다\'인가, \'틀리다\'인가: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틀리다\'를 쓰면 틀림.
(가) 이론과 현실은 {틀려요 / 달라요}. ※ 뜻: \"같지 않다\". \'다르다\'는 형용사
(가)\' 선생님, 제 생각은 {틀립니다 / 다릅니다}.
(나) 계산이 틀리다. ☞ 동사, \"셈이나 사실 따위가 맞지 않다\". \'틀리다\'는 동사.
(나)\' 어, 약속이 틀리는데. ☞ 동사, \"어떤 일이나 사물이 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다\"
(다) 자, 보세요. 이건 물건이 틀리다니까요. / 야, 이곳은 분위기부터 틀리다. 그렇지?
☞ 형용사, \"보통의 것과 다르거나 특출나다\". 일부의 \'틀리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문맥에 쓰여 차츰 \'다르다\'와 비슷한 용법을 획득해 가고 있으나 아직 표준어라고 하기 어렵다.
48. \'빌다\'와 \'빌리다\'의 구분
(가) 밥을 빌어먹다 / 잘못했다고 빌다 /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 \"乞, 祝\"의 뜻일 때만 \'빌다\'로 쓰고 \"借, 貸\"의 뜻일 때는 \'빌리다\'로 씀.
(나) 돈을 빌려 주다 / 술의 힘을 빌려 사랑을 고백하다 /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자유는 곧 책임을 수반한다고 한다
49. \'자문(諮問)\'과 \'주책(<主着)\': 의미가 변화 중인 단어들
(가) 전문가에게 자문하다(→ 반대말은 \'자문에 응하다\') ※ 뜻(사전적 정의): \"물음이란 뜻으로, 특히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이 일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물음\". 따라서 \'자문\'은 하는 것이지 구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
(가)? 이번 일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조언을 구해서, 도움말을 청해서, 문의해서) 처리했다.
(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다, 받다} ※ \"자문하여 얻게 되는 판단이나 의견\"이라는 뜻으로 쓰임. 의미 변화 중.
(나) 주책없다: 말을 주책없이 하다 ※ 뜻: \"일정하게 자리잡힌 생각\"
(나)? 주책이다, 주책을 {부리다, 떨다} ※ \"일정한 줏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라는 뜻으로 쓰임. 의미 변화 중.
50. \'멋장이, 중매장이\'인지 \'멋쟁이, 중매쟁이\'인지?
(가) 미장이, 유기장이, 땜장이 ※ 전통적인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는 뜻일 때만 \'-장이\'
(나) 요술쟁이, 욕심쟁이, 중매쟁이, 점쟁이
51. \'왠지\'인가, \'웬지\'인가: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 \'웬\'은 관형사.
(가) {왠지, 웬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52. \'웃어른\'인가, \'윗어른\'인가: 위와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만 \'윗-\'으로 씀
(가) 윗니, 윗눈썹, 윗도리, 윗목
(가)\' 위쪽, 위채, 위층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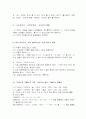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