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부패하고, 그들과의 유리를 초래하였다. 한국불교는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여기, 우리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라는 상황으로부터 조명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불교의 모순가운데 문벌주의, 문중의식을 손꼽고 있다. 진리와 화합을 본령으로 하는 승가정신에 비좁은 파벌의식처럼 어울리지 않은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도 한국불교는 권력의 시녀, 일부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종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타락한 궁중불교, 귀족불교를 정법불교로 바로잡은 지눌의 실천은 깊이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불교는 지눌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찰은 그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불교가 새로 태어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사는 한국불교의 미래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철저한 현실인식과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호랑이 눈”의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소의 걸음”의 실천이야말로 오늘의 한국불교가 가장 소중히 새겨야 할 교훈이다.
Ⅲ.결론
보조국사 지눌은 800여 년 전 고려에 살았다. 그의 삶은 투철한 현실인식과 그를 바로잡으려는 쉼없는 실천으로 일관되었다. 현실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호랑이 눈”의 날카로움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걸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의 걸음”의 실천이 있다. 우리가 그를 조용한 혁신가라고 불러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타락된 고려불교에 대한 처방으로 정법에 입각한 수심불교를 강조하였다. 정혜사상의 기본이 그것이다. 마음 닦는 일에 투철하지 못할 때, 쓸데없는 쟁론에 떨어지고 명리에 이끌리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수심의 바른 길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 전력하였다. 깨침과 닦음이 본성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 때문이다. 돈오점수, 정혜쌍수 등의 사상체계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애써 드러내보이 닦음의 체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가지 길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기의 능력과 소질을 중요시하는 폭넓은 것이었으며, 또 모든 생명을 위한 이타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나와, 이웃,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닌 참마음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대한 투철한 눈뜸과 실천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일이 수심의 본령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가장 직접적인 인간형성, 자기형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조사상은 단순한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자기상실, 인간상실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보조사상은 참다운 인간회복, 자기회복의 원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가치를 회복하는 지혜의 동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의 한국불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그의 투철한 현실인식과 사상, 그리고 쉼 없는 실천이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지혜의 거울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불교의 모순가운데 문벌주의, 문중의식을 손꼽고 있다. 진리와 화합을 본령으로 하는 승가정신에 비좁은 파벌의식처럼 어울리지 않은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도 한국불교는 권력의 시녀, 일부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종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타락한 궁중불교, 귀족불교를 정법불교로 바로잡은 지눌의 실천은 깊이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불교는 지눌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찰은 그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불교가 새로 태어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사는 한국불교의 미래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철저한 현실인식과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호랑이 눈”의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소의 걸음”의 실천이야말로 오늘의 한국불교가 가장 소중히 새겨야 할 교훈이다.
Ⅲ.결론
보조국사 지눌은 800여 년 전 고려에 살았다. 그의 삶은 투철한 현실인식과 그를 바로잡으려는 쉼없는 실천으로 일관되었다. 현실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호랑이 눈”의 날카로움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걸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의 걸음”의 실천이 있다. 우리가 그를 조용한 혁신가라고 불러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타락된 고려불교에 대한 처방으로 정법에 입각한 수심불교를 강조하였다. 정혜사상의 기본이 그것이다. 마음 닦는 일에 투철하지 못할 때, 쓸데없는 쟁론에 떨어지고 명리에 이끌리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수심의 바른 길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 전력하였다. 깨침과 닦음이 본성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 때문이다. 돈오점수, 정혜쌍수 등의 사상체계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애써 드러내보이 닦음의 체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가지 길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각기의 능력과 소질을 중요시하는 폭넓은 것이었으며, 또 모든 생명을 위한 이타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나와, 이웃,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닌 참마음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대한 투철한 눈뜸과 실천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일이 수심의 본령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가장 직접적인 인간형성, 자기형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조사상은 단순한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자기상실, 인간상실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보조사상은 참다운 인간회복, 자기회복의 원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가치를 회복하는 지혜의 동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의 한국불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그의 투철한 현실인식과 사상, 그리고 쉼 없는 실천이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지혜의 거울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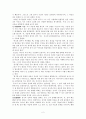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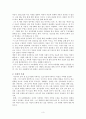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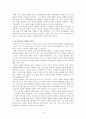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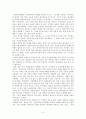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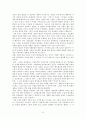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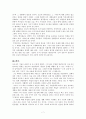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