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희극성 연구의 의미
1. 유치진의 연극관으로 본 희극성 연구의 의미
2. 초기 리얼리즘극에서 희극성 연구의 의미
2) 토막
1. 줄거리
2. 희극성을 통한 인물과 대사 분석
3) 소
1. 줄거리
2. 희극성을 통한 인물과 대사 분석
III. <결론>
II. <본론>
1) 희극성 연구의 의미
1. 유치진의 연극관으로 본 희극성 연구의 의미
2. 초기 리얼리즘극에서 희극성 연구의 의미
2) 토막
1. 줄거리
2. 희극성을 통한 인물과 대사 분석
3) 소
1. 줄거리
2. 희극성을 통한 인물과 대사 분석
III. <결론>
본문내용
그래. 인제 이놈아 소 보고 절이나 해라. 귀찬이 같은 색시를 점지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구 절을 해! 코가 땅에 닿도록---.(무리로 절을 시키려 한다.)
말똥이 어머니, 그만둬! 누가 보면 어떻게? 부끄러워요. 귀찬이 나와보면---힛힛힛---(은근히 좋 아서 웃으면서 반항한다. 그러나 그모는 그예 절을 시켰다. 그럴 적에 귀찬이가 등장. 말 똥이가 절하는 것을 주춤 서서 본다.) 네이버 통합 검색(http://www.seelotus.com/gojeon/hyeon-dae/hi-gok/so.htm)
물론 말똥이 이외에도 이 극의 희극성을 북돋우는 인물은 다양하다.
귀찬이 아버지가 밀린 도지 때문에 귀찬이를 일본으로 팔아야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적인 의미는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처 에그, 댁에는 딸을 잘가져서 보퉁이신세는 면하시겠구려. 우리 집에는 사내새끼가 둘이나 있으면서 무슨 팔자소관으로 그런지 사람의 간장을 이처럼 썩이는구려…
귀찬이부 (일어서며)…계집애가 나서 귀찮스럽다구 해서 걔 애미가 귀찬이란 이름을 부쳤지요. 그 랬는데 그게 되려 우리한테 덕을 뵈겠지요. 이히힛…
처 참 세상일은 모를 일이야요. 뭐든지 그저 거꾸로만 돼 가거든요. 춘향모의 문자가 아니라 도 인젠 아들 낳기는 바라지 말구, 딸 낳기만 바래야겠군요…이왕이면 저 뒤에 가서 술 한잔 자시고 가슈. 네이버, 위의 사이트
살기 위해서 자식을 팔아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그래도 딸을 가져서 보퉁이 신세는 면하겠다는 대화를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슬픔의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소가 내력 있는 소라는 자랑을 늘어놓는 국서의 소에 대한 자부심도 희극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서 뭐? 소를 팔어? 원, 이 지각없는 자식놈의 소리 좀 들어보게. 이놈아, 우리 소는 저래뵈도 딴데 있는 그런 너절한 소하고는 씨가 다르다. 너두 알지? 우리 집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님뻘 되는 소가, 그러니까 우리 소의 사촌의 큰아버지뻘 되는 소지, 그 소가 읍내 공진회에 나가서 도 장관 나리한테서 일등상을 받았어. 정신 채려라! 일등상이야. 그 저 밭이나 갈고 이웃에 불려가서 품아시나 들고 하니까 그저 이놈이 업수이 여겨서. 네이버, 위의 사이트
그리고 말 끝마다 “도처에 춘풍”을 읊조리는 문진의 익살, 그에 못지 않는 우삼의 익살 등은 이 극에 희극성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문진 (어깨춤을 추며 헛간으로 나온다.)
우삼 (문진이와 같이 따라 나오며)---유월 저승을 지나며 팔월 신선이 닥쳐 온다는 것은 이때를 두고 한 말이지. 밋건덩 유얼, 둥둥 칠월, 어정 팔월이란 말은 잘헌 말이거든! 더구나 금년같 이 철이 잘 들고서야 어느 빌어먹을 놈이 농사짓기를 마다하겠는가, 허허헛---덥석부리!
문진 (어깨춤을 추며)---암, 도처에 춘풍이지 키키키 네이버, 앞의 사이트
마지막으로 유자나무집딸도 희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유자나무집 딸 개똥어머니. 개똥이 어디갔우?
처 이년아! 밤낮 개똥이는 오해 찾어다녀? 그놈을 망쳐 놓지를 못해서 그러니?
유자나무집 딸 (힘없는 미소를 입가에 바르며) 이것 봐. 이거 분 넣는거야. 냄새 맡어 보. 좋츄? 히리 나지미상이 사준거요. 눈 세수하는 하이카라상이 사주었어.
처 얼른 나가거라! 걔 아버지 나오시겠다. 이 방에 계시다.
국서 (새 저고리를 갈아입고 방에서 나온다. 유자나무집 딸을 보더니 맨발로 뛰어나와 닭 쫓듯 소리친다.) 후어! 후어!
유자나무집 딸 히힛힛 왜 이래요. 날덜. 나를 닭인 줄 아나. ([후어] 소리에 그에 쫓겨 나갔다.) 네이버, 앞의 사이트
`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유자나무집 딸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이 극중에서 희극적 요소를 더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자나무집 딸은 서울로 팔려간 후 미쳐서 돌아온 인물인데 유자나무집딸의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미치지 않고서야 살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이것은 당 대 현실이 만들어낸 희생양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 극에서 농촌 현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문제적 인물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바보스러운 조롱의 대상인 말똥이이다. 그가 문제적 인물이 되기 때문에 농민의 생존권을 상징하는 소의 탈취에 저항하여 지주의 곡간에 불을 지른 것인데, 이러한 문제적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 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소>는 그러한 글쓰기가 검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유치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말똥이 어머니, 그만둬! 누가 보면 어떻게? 부끄러워요. 귀찬이 나와보면---힛힛힛---(은근히 좋 아서 웃으면서 반항한다. 그러나 그모는 그예 절을 시켰다. 그럴 적에 귀찬이가 등장. 말 똥이가 절하는 것을 주춤 서서 본다.) 네이버 통합 검색(http://www.seelotus.com/gojeon/hyeon-dae/hi-gok/so.htm)
물론 말똥이 이외에도 이 극의 희극성을 북돋우는 인물은 다양하다.
귀찬이 아버지가 밀린 도지 때문에 귀찬이를 일본으로 팔아야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적인 의미는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처 에그, 댁에는 딸을 잘가져서 보퉁이신세는 면하시겠구려. 우리 집에는 사내새끼가 둘이나 있으면서 무슨 팔자소관으로 그런지 사람의 간장을 이처럼 썩이는구려…
귀찬이부 (일어서며)…계집애가 나서 귀찮스럽다구 해서 걔 애미가 귀찬이란 이름을 부쳤지요. 그 랬는데 그게 되려 우리한테 덕을 뵈겠지요. 이히힛…
처 참 세상일은 모를 일이야요. 뭐든지 그저 거꾸로만 돼 가거든요. 춘향모의 문자가 아니라 도 인젠 아들 낳기는 바라지 말구, 딸 낳기만 바래야겠군요…이왕이면 저 뒤에 가서 술 한잔 자시고 가슈. 네이버, 위의 사이트
살기 위해서 자식을 팔아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그래도 딸을 가져서 보퉁이 신세는 면하겠다는 대화를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슬픔의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소가 내력 있는 소라는 자랑을 늘어놓는 국서의 소에 대한 자부심도 희극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서 뭐? 소를 팔어? 원, 이 지각없는 자식놈의 소리 좀 들어보게. 이놈아, 우리 소는 저래뵈도 딴데 있는 그런 너절한 소하고는 씨가 다르다. 너두 알지? 우리 집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님뻘 되는 소가, 그러니까 우리 소의 사촌의 큰아버지뻘 되는 소지, 그 소가 읍내 공진회에 나가서 도 장관 나리한테서 일등상을 받았어. 정신 채려라! 일등상이야. 그 저 밭이나 갈고 이웃에 불려가서 품아시나 들고 하니까 그저 이놈이 업수이 여겨서. 네이버, 위의 사이트
그리고 말 끝마다 “도처에 춘풍”을 읊조리는 문진의 익살, 그에 못지 않는 우삼의 익살 등은 이 극에 희극성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문진 (어깨춤을 추며 헛간으로 나온다.)
우삼 (문진이와 같이 따라 나오며)---유월 저승을 지나며 팔월 신선이 닥쳐 온다는 것은 이때를 두고 한 말이지. 밋건덩 유얼, 둥둥 칠월, 어정 팔월이란 말은 잘헌 말이거든! 더구나 금년같 이 철이 잘 들고서야 어느 빌어먹을 놈이 농사짓기를 마다하겠는가, 허허헛---덥석부리!
문진 (어깨춤을 추며)---암, 도처에 춘풍이지 키키키 네이버, 앞의 사이트
마지막으로 유자나무집딸도 희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유자나무집 딸 개똥어머니. 개똥이 어디갔우?
처 이년아! 밤낮 개똥이는 오해 찾어다녀? 그놈을 망쳐 놓지를 못해서 그러니?
유자나무집 딸 (힘없는 미소를 입가에 바르며) 이것 봐. 이거 분 넣는거야. 냄새 맡어 보. 좋츄? 히리 나지미상이 사준거요. 눈 세수하는 하이카라상이 사주었어.
처 얼른 나가거라! 걔 아버지 나오시겠다. 이 방에 계시다.
국서 (새 저고리를 갈아입고 방에서 나온다. 유자나무집 딸을 보더니 맨발로 뛰어나와 닭 쫓듯 소리친다.) 후어! 후어!
유자나무집 딸 히힛힛 왜 이래요. 날덜. 나를 닭인 줄 아나. ([후어] 소리에 그에 쫓겨 나갔다.) 네이버, 앞의 사이트
`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유자나무집 딸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이 극중에서 희극적 요소를 더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자나무집 딸은 서울로 팔려간 후 미쳐서 돌아온 인물인데 유자나무집딸의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미치지 않고서야 살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이것은 당 대 현실이 만들어낸 희생양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 극에서 농촌 현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문제적 인물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바보스러운 조롱의 대상인 말똥이이다. 그가 문제적 인물이 되기 때문에 농민의 생존권을 상징하는 소의 탈취에 저항하여 지주의 곡간에 불을 지른 것인데, 이러한 문제적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 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소>는 그러한 글쓰기가 검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유치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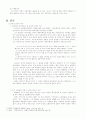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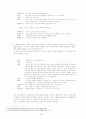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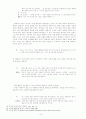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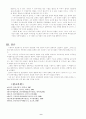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