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기로, 121>
떡심이 풀리다
‘떡심’은 “억세고 질긴 근육”, “성질이 매우 질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떡심’과 관련된 관용어로 ‘떡심이 풀리다’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낙담하여 맥이 풀리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법 날렵하게 떼어 놓던 발걸음이 갈수록 차차 떡심이 풀리고, 제물에 발이 터덜거리게 되어, 두보의 낡은 구두코는 진흙 묻은 메기 주둥이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은파의 말쑥하던 옥양목 버선도 단번에 꾀죄하게 망해 버렸다. <기로, 95>
벙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
“애매하고 모호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만식이는 급기야 벙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를 하더니 별안간 은파의 손목을 잡았다.”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가리지 않는다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속담과 비슷하다. 이 속담은 다급해지면 무엇이든지 가릴 여지가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격으로, 두보는 실상 아까부터 시무룩거리던 울화까지를 괜히 은파에게 죄다 집어씌울 모양으로 본을 더 사납게 떴다.” <기로, 109>
쇠가죽(을) 뒤집어쓰다[무릅쓰다]
“부끄러움을 생각하거나 체면을 돌아보지 않다.”라는 뜻이다.
“은파는 그의 쇠가죽 무릅쓴 듯한 수작에 한없이 속이 뭉클거렸지만” <기로, 116>
싸고 싼 향내도 난다
“어떤 일을 아무리 노력하여 숨기려 하여도 결국에는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재주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은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도 저절로 알려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싸고 싼 사향도 냄새 난다“와 같은 말이다.
“소문이 날까 두려워도 하였지만 싸고 싼 향내도 난다는 격으로 결국 은파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까지 되었다.” <기로, 122>
주먹 맞은 감투
이 말은 “아주 쭈그러져서 다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된 모양”이나 “잘난 체하다가 핀잔을 듣고 무안하여 아무 말 없이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보니 은파는 제 처지가 갑자기 빼도 박도 못하게 궁해져서, 그만 주먹 맞은 감투상이 되어 가지고 덤덤하게 남편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기로, 109>
중이 미우면 가사(袈裟)도 밉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에 딸린 사람까지도 밉게 보인다는 말. ≒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도 밉다.
“하기야 중이 밉다고 가사까지야 미울 리 없을 테니까.” <기로, 115>
진날 개 사귄 이 같다
“귀찮고 더러운 일을 당한 경우”나 달갑지 아니한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처음의 진날 개 사귀는 듯한 생각도 차차 사라져 버렸다.” <기로, 122>
걀죽하다
“들기 쉬우라고 두 귀에 달아 둔 걀죽한 나무손잡이를 노려보던 은파의 눈에는” <기로, 112>
개화주머니
“개화주머니에서 궐련 동강을 꺼내 물며” <기로, 115>
사전에 없는 단어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자료를 보면 ‘주머니’ 또는 ‘조끼주머니’, ‘호주머니’의 방언이라고 한다.
거무하게
“거무하게 만식이는 자동차로 들이닥쳤다.”
궁둥떡
“그만 제물에 털썩 궁둥떡을 치고 말았다.” <기로, 119>
‘궁둥떡’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다. 문맥으로 보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을 의미하는 것 같으므로 ‘궁둥방아’ 또는 ‘엉덩방아’의 방언으로 보인다.
귀주다
‘귀주다’라는 말은 없고, ‘귀(를) 주다’라는 관용어가 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엿듣다”, “남에게 살그머니 알려 조심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두보는 묻기만 했지 대답을랑 별로이 귀주어 듣지도 않고서 일남이만 꼭 껴안고 누웠다.” <기로, 114>
하지만 소설의 문맥은 ‘주의 깊게’ 정도이기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덩더꿍의 소출
“고향을 떠나올 때, 기생 퇴물로 있는 늙은 논나니 어머니의 덩더꿍의 소출을 얼마쯤 얻어오긴 했지만” <기로, 104>
사전에는 ‘덩더꿍이 소출’이라는 관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이 말은 “먹고 살아갈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생긴 대로 흥청망청 쓰고, 없으면 어렵게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소설 속의 문맥과는 맞지 않다. ‘덩더꿍’은 “북이나 장구 따위를 흥겹게 두드리는 소리”, “덩달아 덤비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고, ‘소출(所出)’은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덩더꿍이 소출’은 북이나 장구를 치며 놀이를 하면서 번 돈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땀
“이러다가 이자한테 괜히 땀이라도 내게 되잖을까?” <기로, 121>
말조(調)
“만식이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쪼였다.” <기로, 120>
‘말조’는 ‘말투’와 같은 말인데, 발음이 [말쪼]로 난다.
맨발장이
“이건 아주 맨발장이의 호령이다.” <기로, 100>
사전에 없는 말이다.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맨발’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격으로, 두보는 실상 아까부터 시무룩거리던 울화까지를 괜히 은파에게 죄다 집어씌울 모양으로 본을 더 사납게 떴다.” <기로, 109>
‘본(本)’은 ‘본보기’, “버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에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관향(貫鄕)’, ‘본전(本錢)’을 이르는 말이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아근자근히
“그러나 두보는 아내의 그러한 마음 차림을 말 한마디로써도 아근자근히 위로해 주는 법도 없이” <기로, 103>
“밤이 되자, 예의 소주친구-자기와 같은 일깐의 석수장이가 두 사람 찾아왔다.” <기로, 112>
장비호통
“아주 의기양양하게 장비호통을 치겠지.” <기로, 113>
저어하다
“속으로 저어는 하면서도 오랫동안 남편을 못 만난 탓인지 만식이가 그다지 미워 보이지도 않았다.” <기로, 121>
‘저어하다’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저어하는’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어간의 일부인 ‘-하-’가 탈락된 형태이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다’의 옛말인 ‘
떡심이 풀리다
‘떡심’은 “억세고 질긴 근육”, “성질이 매우 질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떡심’과 관련된 관용어로 ‘떡심이 풀리다’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낙담하여 맥이 풀리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법 날렵하게 떼어 놓던 발걸음이 갈수록 차차 떡심이 풀리고, 제물에 발이 터덜거리게 되어, 두보의 낡은 구두코는 진흙 묻은 메기 주둥이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은파의 말쑥하던 옥양목 버선도 단번에 꾀죄하게 망해 버렸다. <기로, 95>
벙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
“애매하고 모호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만식이는 급기야 벙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를 하더니 별안간 은파의 손목을 잡았다.”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가리지 않는다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속담과 비슷하다. 이 속담은 다급해지면 무엇이든지 가릴 여지가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격으로, 두보는 실상 아까부터 시무룩거리던 울화까지를 괜히 은파에게 죄다 집어씌울 모양으로 본을 더 사납게 떴다.” <기로, 109>
쇠가죽(을) 뒤집어쓰다[무릅쓰다]
“부끄러움을 생각하거나 체면을 돌아보지 않다.”라는 뜻이다.
“은파는 그의 쇠가죽 무릅쓴 듯한 수작에 한없이 속이 뭉클거렸지만” <기로, 116>
싸고 싼 향내도 난다
“어떤 일을 아무리 노력하여 숨기려 하여도 결국에는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재주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은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도 저절로 알려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싸고 싼 사향도 냄새 난다“와 같은 말이다.
“소문이 날까 두려워도 하였지만 싸고 싼 향내도 난다는 격으로 결국 은파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까지 되었다.” <기로, 122>
주먹 맞은 감투
이 말은 “아주 쭈그러져서 다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된 모양”이나 “잘난 체하다가 핀잔을 듣고 무안하여 아무 말 없이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보니 은파는 제 처지가 갑자기 빼도 박도 못하게 궁해져서, 그만 주먹 맞은 감투상이 되어 가지고 덤덤하게 남편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기로, 109>
중이 미우면 가사(袈裟)도 밉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에 딸린 사람까지도 밉게 보인다는 말. ≒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도 밉다.
“하기야 중이 밉다고 가사까지야 미울 리 없을 테니까.” <기로, 115>
진날 개 사귄 이 같다
“귀찮고 더러운 일을 당한 경우”나 달갑지 아니한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처음의 진날 개 사귀는 듯한 생각도 차차 사라져 버렸다.” <기로, 122>
걀죽하다
“들기 쉬우라고 두 귀에 달아 둔 걀죽한 나무손잡이를 노려보던 은파의 눈에는” <기로, 112>
개화주머니
“개화주머니에서 궐련 동강을 꺼내 물며” <기로, 115>
사전에 없는 단어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자료를 보면 ‘주머니’ 또는 ‘조끼주머니’, ‘호주머니’의 방언이라고 한다.
거무하게
“거무하게 만식이는 자동차로 들이닥쳤다.”
궁둥떡
“그만 제물에 털썩 궁둥떡을 치고 말았다.” <기로, 119>
‘궁둥떡’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다. 문맥으로 보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을 의미하는 것 같으므로 ‘궁둥방아’ 또는 ‘엉덩방아’의 방언으로 보인다.
귀주다
‘귀주다’라는 말은 없고, ‘귀(를) 주다’라는 관용어가 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엿듣다”, “남에게 살그머니 알려 조심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두보는 묻기만 했지 대답을랑 별로이 귀주어 듣지도 않고서 일남이만 꼭 껴안고 누웠다.” <기로, 114>
하지만 소설의 문맥은 ‘주의 깊게’ 정도이기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덩더꿍의 소출
“고향을 떠나올 때, 기생 퇴물로 있는 늙은 논나니 어머니의 덩더꿍의 소출을 얼마쯤 얻어오긴 했지만” <기로, 104>
사전에는 ‘덩더꿍이 소출’이라는 관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이 말은 “먹고 살아갈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생긴 대로 흥청망청 쓰고, 없으면 어렵게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소설 속의 문맥과는 맞지 않다. ‘덩더꿍’은 “북이나 장구 따위를 흥겹게 두드리는 소리”, “덩달아 덤비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고, ‘소출(所出)’은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덩더꿍이 소출’은 북이나 장구를 치며 놀이를 하면서 번 돈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땀
“이러다가 이자한테 괜히 땀이라도 내게 되잖을까?” <기로, 121>
말조(調)
“만식이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쪼였다.” <기로, 120>
‘말조’는 ‘말투’와 같은 말인데, 발음이 [말쪼]로 난다.
맨발장이
“이건 아주 맨발장이의 호령이다.” <기로, 100>
사전에 없는 말이다.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맨발’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격으로, 두보는 실상 아까부터 시무룩거리던 울화까지를 괜히 은파에게 죄다 집어씌울 모양으로 본을 더 사납게 떴다.” <기로, 109>
‘본(本)’은 ‘본보기’, “버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에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관향(貫鄕)’, ‘본전(本錢)’을 이르는 말이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아근자근히
“그러나 두보는 아내의 그러한 마음 차림을 말 한마디로써도 아근자근히 위로해 주는 법도 없이” <기로, 103>
“밤이 되자, 예의 소주친구-자기와 같은 일깐의 석수장이가 두 사람 찾아왔다.” <기로, 112>
장비호통
“아주 의기양양하게 장비호통을 치겠지.” <기로, 113>
저어하다
“속으로 저어는 하면서도 오랫동안 남편을 못 만난 탓인지 만식이가 그다지 미워 보이지도 않았다.” <기로, 121>
‘저어하다’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저어하는’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어간의 일부인 ‘-하-’가 탈락된 형태이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다’의 옛말인 ‘
추천자료
 한국정보경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경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연구 태극 음양론은 성리학
태극 음양론은 성리학 노장 사상의 정리 및 비판
노장 사상의 정리 및 비판 경호무술외 현대 창시무술의 재조명
경호무술외 현대 창시무술의 재조명 지방행정발표 - 지역이기주의 : 화장터건립반대에 관하여
지방행정발표 - 지역이기주의 : 화장터건립반대에 관하여 경쟁아파트 광고비교
경쟁아파트 광고비교 月波洞中記 제요 흉포5장 악사5장 질병5장 요절 5장
月波洞中記 제요 흉포5장 악사5장 질병5장 요절 5장 EBS 다큐프라임 동과서 비디오 요약
EBS 다큐프라임 동과서 비디오 요약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과 영향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과 영향 제4판 한국문학통사 4 (조동일) 요약, 정리
제4판 한국문학통사 4 (조동일) 요약, 정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  기혈이란 무엇인가
기혈이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관 평가][장애인복지관 평가 대상][장애인복지관 평가 연구 사례][사회복지]장애...
[장애인복지관 평가][장애인복지관 평가 대상][장애인복지관 평가 연구 사례][사회복지]장애... [산과환자를 위한 운동의 원리] 임신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 임신 중 유산소운동 효과, ...
[산과환자를 위한 운동의 원리] 임신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 임신 중 유산소운동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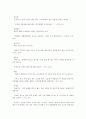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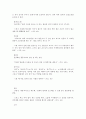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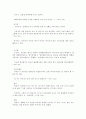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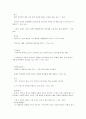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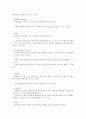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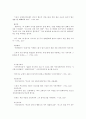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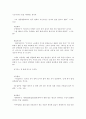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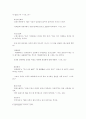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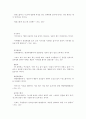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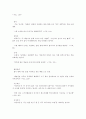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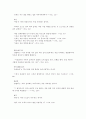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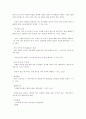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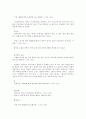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