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악장가사
(1) 악장가사의 소개
(2) 악장가사의 편찬과정
(3) 악장가사의 내용
Ⅲ. 악학궤범
(1) 악학궤범의 소개
(2) 악학궤범의 편찬
(3) 악학궤범의 내용
Ⅳ. 시용향악보
(1) 시용향악보의 소개 및 편찬
(2) 시용향악보의 내용
Ⅴ. 결론
Ⅱ. 악장가사
(1) 악장가사의 소개
(2) 악장가사의 편찬과정
(3) 악장가사의 내용
Ⅲ. 악학궤범
(1) 악학궤범의 소개
(2) 악학궤범의 편찬
(3) 악학궤범의 내용
Ⅳ. 시용향악보
(1) 시용향악보의 소개 및 편찬
(2) 시용향악보의 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여러 가지 고취악단들의 배치도가 무려 38종이나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제3,4,5권에는 당시까지 전해져온 정재(악무)종목들과 거기서 사용한 수많은 악곡 및 가사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그 운용의 시대적 변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한글로 적힌 <동동><정읍><처용가><진작(眞勺,정과정)> 등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동동><정읍>의 가사는〈대악후보(大樂後譜)〉〈악장가사〉에도 없고 오직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래여서 국문학사상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의 제6,7,8,9권은 기물의 상편에 속한다. 여기서는 특히 궁중음악에서 사용한 60여종의 악기들에 대하여 그 형태와 도면, 역사적 유래, 제작법, 연주법, 조율법, 악보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주고 있다. 그밖에 무대의상과 소도구, 가장물들의 도해와 제작법 및 사용법을 비롯하여 당시 궁중에서 진행된 제례, 연례, 회례 의식들의 순서와 절차, 의상 및 인물차림, 인물배치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악학궤범』에 수록된 시문학 작품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에 걸쳐,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두 시대에 걸쳐, 문자체계로 보더라도 한문작품과 국문작품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도 아악·당악·향악작품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별로 악학궤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권의 시용향악정재도설조에 속요 4편 <동동>, <정읍사>, <정과정>, <처용가>가 수록되어 있다. 제4권의 시용당악정재도설과 5권의시용향악정재도설조, 그리고 2권의 시용속악부 제악조에는 악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건국초기 예악정비의 일환으로 세조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악장들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대단히 많다.
국문악장 : 2편, 제5권『용비어천가』의 일부인 <치화평>과 <취풍형>
현토악장 한시체에 토를 달아 우리말 구조로 재편한 것
: 6편, 제2권 <납씨가>, 제5권 <정동방곡>, <문덕곡>, <봉황음>, <북전(신사)>, <관음찬>
한문악장 : 양적으로 가장 많이 수록, 대부분 왕업의 기초를 닦은 태조·태종·세종 등 3대에 걸쳐 제작된 작품들이며 작자 역시 정도전·하륜·변계량 등에 집중
제4권 <몽금척>, <수보록>, <관천정>, <수명명>, <하황은>, <하성명>, <성택> 제2권 <문명지곡>, <무열지곡>
제5권 <용비어천가-여민락>, <보태평>, <정대업>
한문악장은 이밖에도 제2권에 <문소전>, <연은전>, <소경전> 악장 및 <친경적전>, <대사례>, <친잠>의 악장들도 있다.
Ⅳ. 시용향악보
(1) 시용향악보의 소개 및 편찬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는 조선 성종∼중종 연간(1469년 ~ 1544년)에 향악의 악보를 기록한 악보집으로 시가의 사설도 함께 수록된 1권 1책의 목판본이다. 향악은 아악과는 달리 고려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면서도 종묘와 다른 제례에서 이를 연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악원 악공들에게 교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궁중에서도 연주하게 되었다.
『시용향악보』는 악장·사(詞)·단가·가사·창작가사·민요·무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 초기의 가요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말 선초에 불리던 노래 총 26편의 초장만이 세조가 창간한 16정간 정간보법(井間譜法) : 가로 세로 친 줄들이 이룬 네모난 공간에 음계와 가사를 써 넣었음.
에 오음약보로 기보되어있다. 다양한 종류의 악보가 실려 있어 조선 초기 궁중에서 불리던 가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무가 계통의 노래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고려 궁중악사들에서 조선에 전해지고 다시 조선 초기의 구악(舊樂) 정리 과정을 거쳐 남겨진 작품들이다.
26편 중 10편은 『악학궤범』, 『악장가사』에 실린 노래이고 나머지 16편은 다른 문헌에 실려있지 않은 노래이다. 이 악보에는 『악학궤범』이나 『악장가사』에는 전하지 않는 고려가요가 상당히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노래는 총 26편이다.
26중 새로이 발견된 16편에는 순 한문으로 된 「생가요량」, 한글로 된 「나례가」, 「상저가」등이 있고, 「구천」, 「별대왕」등과 같이 가사가 아닌 ‘리로노런나 로리라 리로런나’와 같은 여음 소리가 끊어진 다음에 나는 울림소리
(餘音)만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이는 모두 고려나 조선 초에 춘추로 내관이나 무당을 보내어 명산대천에 제사지낼 때 불린 무가를 악보로 정리한 것으로 국속 전통을 이어받은 무속 전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국문학과 민속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시용향악보의 내용
<납씨가>
태조2년 정도전의 작품으로 1362년(공민왕11) 이성계(李成桂)가 동북면에 침입한 원(元)나라의 유장(遺將) 나하추(納哈出)를 물리친 무공을 찬양한 내용. 『악학궤범』, 『악장가사』에도 실려 있음
<유림가>
연대와 작자는 미상이고 『악장가사』에 실려 있음.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창업의 위업을 송축하고 유림들의 궁차락(窮且樂)을 칭송한 모두 6장으로 된 노래
<횡살문>
연대와 작자는 미상으로『대악후보』에 실려 있음. 조선의 건국과 임금의 만수무강을 송축하는 작품
<사모곡>
『악장가사』에 실려 있음. 호미를 아버지에, 낫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만 못하기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엇노리’라고도 불린다.
<서경별곡>
『악장가사』에 실려 있음. 3연 13분절로 된 국문시가, 서경이란 고향과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별의 장소인 대동강 가에서 그 원망을 대동강·뱃사공·사공의 아내에게 돌리는 체념과 해학의 노래
<쌍화곡>
『악학궤범』에 실려 있음. 4연으로 된 국문시가, 만두집을 통해 회회아비 곧 외국인들의 도덕적 횡포를·귀족계급인 삼장사 승려들의 타락을·우물용을 빌어 왕실의 타락을·술팔 집을 빌어 부자들의 타락을 풍자함.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고 성종21년에 내용이 음란스럽다고 산개한 것이다. 이때 고친 〈북전〉이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나례가>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고, 가사는 『시용향악보』에 처음 나옴. 이는 민가와 궁중에서 잡귀를
이 책의 제6,7,8,9권은 기물의 상편에 속한다. 여기서는 특히 궁중음악에서 사용한 60여종의 악기들에 대하여 그 형태와 도면, 역사적 유래, 제작법, 연주법, 조율법, 악보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주고 있다. 그밖에 무대의상과 소도구, 가장물들의 도해와 제작법 및 사용법을 비롯하여 당시 궁중에서 진행된 제례, 연례, 회례 의식들의 순서와 절차, 의상 및 인물차림, 인물배치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악학궤범』에 수록된 시문학 작품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에 걸쳐,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두 시대에 걸쳐, 문자체계로 보더라도 한문작품과 국문작품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도 아악·당악·향악작품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별로 악학궤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권의 시용향악정재도설조에 속요 4편 <동동>, <정읍사>, <정과정>, <처용가>가 수록되어 있다. 제4권의 시용당악정재도설과 5권의시용향악정재도설조, 그리고 2권의 시용속악부 제악조에는 악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건국초기 예악정비의 일환으로 세조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악장들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대단히 많다.
국문악장 : 2편, 제5권『용비어천가』의 일부인 <치화평>과 <취풍형>
현토악장 한시체에 토를 달아 우리말 구조로 재편한 것
: 6편, 제2권 <납씨가>, 제5권 <정동방곡>, <문덕곡>, <봉황음>, <북전(신사)>, <관음찬>
한문악장 : 양적으로 가장 많이 수록, 대부분 왕업의 기초를 닦은 태조·태종·세종 등 3대에 걸쳐 제작된 작품들이며 작자 역시 정도전·하륜·변계량 등에 집중
제4권 <몽금척>, <수보록>, <관천정>, <수명명>, <하황은>, <하성명>, <성택> 제2권 <문명지곡>, <무열지곡>
제5권 <용비어천가-여민락>, <보태평>, <정대업>
한문악장은 이밖에도 제2권에 <문소전>, <연은전>, <소경전> 악장 및 <친경적전>, <대사례>, <친잠>의 악장들도 있다.
Ⅳ. 시용향악보
(1) 시용향악보의 소개 및 편찬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는 조선 성종∼중종 연간(1469년 ~ 1544년)에 향악의 악보를 기록한 악보집으로 시가의 사설도 함께 수록된 1권 1책의 목판본이다. 향악은 아악과는 달리 고려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면서도 종묘와 다른 제례에서 이를 연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악원 악공들에게 교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궁중에서도 연주하게 되었다.
『시용향악보』는 악장·사(詞)·단가·가사·창작가사·민요·무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 초기의 가요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말 선초에 불리던 노래 총 26편의 초장만이 세조가 창간한 16정간 정간보법(井間譜法) : 가로 세로 친 줄들이 이룬 네모난 공간에 음계와 가사를 써 넣었음.
에 오음약보로 기보되어있다. 다양한 종류의 악보가 실려 있어 조선 초기 궁중에서 불리던 가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무가 계통의 노래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고려 궁중악사들에서 조선에 전해지고 다시 조선 초기의 구악(舊樂) 정리 과정을 거쳐 남겨진 작품들이다.
26편 중 10편은 『악학궤범』, 『악장가사』에 실린 노래이고 나머지 16편은 다른 문헌에 실려있지 않은 노래이다. 이 악보에는 『악학궤범』이나 『악장가사』에는 전하지 않는 고려가요가 상당히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노래는 총 26편이다.
26중 새로이 발견된 16편에는 순 한문으로 된 「생가요량」, 한글로 된 「나례가」, 「상저가」등이 있고, 「구천」, 「별대왕」등과 같이 가사가 아닌 ‘리로노런나 로리라 리로런나’와 같은 여음 소리가 끊어진 다음에 나는 울림소리
(餘音)만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이는 모두 고려나 조선 초에 춘추로 내관이나 무당을 보내어 명산대천에 제사지낼 때 불린 무가를 악보로 정리한 것으로 국속 전통을 이어받은 무속 전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국문학과 민속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시용향악보의 내용
<납씨가>
태조2년 정도전의 작품으로 1362년(공민왕11) 이성계(李成桂)가 동북면에 침입한 원(元)나라의 유장(遺將) 나하추(納哈出)를 물리친 무공을 찬양한 내용. 『악학궤범』, 『악장가사』에도 실려 있음
<유림가>
연대와 작자는 미상이고 『악장가사』에 실려 있음.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창업의 위업을 송축하고 유림들의 궁차락(窮且樂)을 칭송한 모두 6장으로 된 노래
<횡살문>
연대와 작자는 미상으로『대악후보』에 실려 있음. 조선의 건국과 임금의 만수무강을 송축하는 작품
<사모곡>
『악장가사』에 실려 있음. 호미를 아버지에, 낫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만 못하기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엇노리’라고도 불린다.
<서경별곡>
『악장가사』에 실려 있음. 3연 13분절로 된 국문시가, 서경이란 고향과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별의 장소인 대동강 가에서 그 원망을 대동강·뱃사공·사공의 아내에게 돌리는 체념과 해학의 노래
<쌍화곡>
『악학궤범』에 실려 있음. 4연으로 된 국문시가, 만두집을 통해 회회아비 곧 외국인들의 도덕적 횡포를·귀족계급인 삼장사 승려들의 타락을·우물용을 빌어 왕실의 타락을·술팔 집을 빌어 부자들의 타락을 풍자함.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고 성종21년에 내용이 음란스럽다고 산개한 것이다. 이때 고친 〈북전〉이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나례가>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고, 가사는 『시용향악보』에 처음 나옴. 이는 민가와 궁중에서 잡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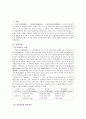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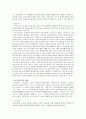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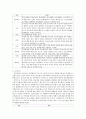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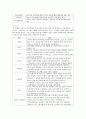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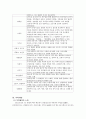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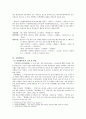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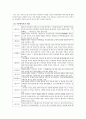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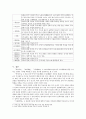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