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인 사회로 개화되어 가던 대를 이르는데 국문학상으로는 만민 평등사상과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고취 등 소위 개화사상을 담고 있는 동학가사가 처음 창작된 1860년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개화와 구국을 주장하는 가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개화가사로서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는 애국가류가 많은데 이들은 개화기 지식인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서 자주독립과 개화사상을 고취하였고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가사들은 민중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서 무비판적인 신문화 수용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하면서 현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대시의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서 가사의 작자층과 향유층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쇠퇴하고 말았다. 요사이도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가사가 창작되고 있으나 이는 가사문학의 잔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작품: 윤희순<방어장><안사람의병가>, 유홍석<고병정가사>, 신태식<신의관창의가>, 유영 무<오륜가>, 김경흠<삼재도가>, 류인목<북행가>, 박시현<울도선경가>
5. 가사의 갈래와 내용
가사는 인간이 겪은 삶의 모습과 이념을 읊은 것이기에 그 내용이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작품 안에서도 복합적인 경험을 읊은 것도 많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작품을 분류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사를 내용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적게는 3종류로부터 많게는 34종류에 이르기까지 진폭이 아주 넓다. 너무 단순히 구분하면 가사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세분하면 작품간의 교차분류가 불가피하여 내용상의 특성 파악이 모호해지기 쉽다.
가. 조윤제의 11항목설
나. 정형용의 10항목설
다. 이태극의 성격별 유형설
라. 서원섭의 7가사설
마. 김준영의 15항목설
바. 이상보의 8가사설
사. 최강현의 34항목설
아. 이재수의 내방 4류 15형설
자. 이능우의 수용 3가사설
차. 권영철의 규방 21유형설
카. 김기동의 7가사설 전일환, 「우리 옛 가사문학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3, pp193~196에 있는 여러 학자들의 가사 작품유형적 분류를 참고 하였음.
그래서 가사를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각 갈래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사를 서정적, 서사적, 극적, 교술적 가사로 나누어 살펴 볼 수도 있으나 현재의 모든 가사작품을 이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래에 흔히 나누어 오던 양반가사(兩班歌辭), 평민가사(平民歌辭), 규방가사(閨房歌辭)에다가 종교가사(宗敎歌辭), 개화가사(開化歌辭)를 덧붙여 가사의 갈래를 士大夫歌辭, 庶民歌辭, 閨房歌辭, 宗敎歌辭, 開化歌辭 등 5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사대부가사, 서민가사, 내방가사, 종교가사는 작가와 향유계층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다음으로 개화가사를 설정한 것은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계층의식이 점차 붕괴되었으며 가사의 형식도 전대의 가사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개화와 우국’이라는 특수한 방면에만 국한되어 신문이나 잡지에 실려 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사를 5가지로 갈래짓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작자나 향유계층에 따라 갈래를 구분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사문학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김광순 외 著, 「국문학개론」, 새문社, 2003, pp193~194(歌辭 金文基)
본 조도 김문기의 뜻을 좇아 가사의 갈래를 사대부가사, 서민가사, 규방가사, 종교가사, 개화가사 등 5가지로 구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갈래 구분 기준이 하나로 통일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자층과 시대라는 두 가지 구분 기준은 우리가 수천 편이나 되는 가사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데 아주 합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많은 학자들의 가사 내용별 갈래 구분도 물론 나름대로의 합당한 일리가 있지만, 매우 방대한 양의 가사를 내용별로 분류하다보면 작자의 계층이나 시대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문학작품이란 마땅히 가지게 되는 시대적,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옳다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갈래별 가사가 가지는 특징과 내용, 그리고 몇몇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사대부가사(士大夫歌辭) 김광순 외 著, 「국문학개론」, 새문社, 2003,을 참고 하였음.
사대부는 관직상으로는 5품 이하의 관료인 士와, 4품 이상의 관료인 大夫를 뜻하는데, 통칭 양반계급으로 일컬어진다. 양반 사대부는 조선조의 지배층으로서 유교이념을 사상적 배경으로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펼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주로 지어진 사대부가사는 강호생활의 즐거움, 정치적 패배와 회귀의지, 유교적인 생활과 이념, 명승지와 유적지의 기행,역사와 고실(古實)을 통한 회고의 정을 주로 읊고 있다.
1) 강호생활의 즐거움
양반 사대부들은 이기철학에 심취되어 모든 인사, 접물에 도를 기본으로 하여 왕도정치를 추구하였고 정치에서 이루지 못한 유교적 이상을 자연과의 융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여 이른바 江湖歌道를 형성하였다. 특히 江湖之樂을 읊은 가사는 처사문인(處士文人)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후에 평소 잊지 못하던 자연에 귀의한 歸去來型(귀거래형)文人과 出仕를 표기하고 자연에 은거하여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기완성을 추구한 은구형(隱求型) 문인들에 의해 주로 읊어졌다. 이들은 강호에 거닐면서 한정을 노래하거나 안빈낙도를 토로하였다.
이런 가사로는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 송순(宋純)의 〈면앙정가(潭仰亭歌)〉,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 차천로(車天輅)의 〈강촌별곡(江村別曲)〉, 이양오(李養五)의 〈강촌만조가(江村晩釣歌)〉, 박인로(朴仁老)의 〈사제곡(莎堤曲)〉〈노계가(蘆溪歌)〉, 허강(許艮)의 〈서호별곡(西湖別曲)〉, 정훈(鄭勳)의 〈수남방옹가(水南放翁歌)〉, 작자 미상의 〈낙민가(樂民歌)〉〈창랑곡(滄浪曲)〉〈안빈낙도가(安貧樂道歌)〉〈은사가(隱士歌)〉등이 있다.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춘곡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고
이 시기에는 개화와 구국을 주장하는 가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개화가사로서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는 애국가류가 많은데 이들은 개화기 지식인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서 자주독립과 개화사상을 고취하였고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가사들은 민중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서 무비판적인 신문화 수용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하면서 현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대시의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서 가사의 작자층과 향유층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쇠퇴하고 말았다. 요사이도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가사가 창작되고 있으나 이는 가사문학의 잔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작품: 윤희순<방어장><안사람의병가>, 유홍석<고병정가사>, 신태식<신의관창의가>, 유영 무<오륜가>, 김경흠<삼재도가>, 류인목<북행가>, 박시현<울도선경가>
5. 가사의 갈래와 내용
가사는 인간이 겪은 삶의 모습과 이념을 읊은 것이기에 그 내용이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작품 안에서도 복합적인 경험을 읊은 것도 많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작품을 분류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사를 내용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적게는 3종류로부터 많게는 34종류에 이르기까지 진폭이 아주 넓다. 너무 단순히 구분하면 가사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세분하면 작품간의 교차분류가 불가피하여 내용상의 특성 파악이 모호해지기 쉽다.
가. 조윤제의 11항목설
나. 정형용의 10항목설
다. 이태극의 성격별 유형설
라. 서원섭의 7가사설
마. 김준영의 15항목설
바. 이상보의 8가사설
사. 최강현의 34항목설
아. 이재수의 내방 4류 15형설
자. 이능우의 수용 3가사설
차. 권영철의 규방 21유형설
카. 김기동의 7가사설 전일환, 「우리 옛 가사문학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3, pp193~196에 있는 여러 학자들의 가사 작품유형적 분류를 참고 하였음.
그래서 가사를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각 갈래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사를 서정적, 서사적, 극적, 교술적 가사로 나누어 살펴 볼 수도 있으나 현재의 모든 가사작품을 이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래에 흔히 나누어 오던 양반가사(兩班歌辭), 평민가사(平民歌辭), 규방가사(閨房歌辭)에다가 종교가사(宗敎歌辭), 개화가사(開化歌辭)를 덧붙여 가사의 갈래를 士大夫歌辭, 庶民歌辭, 閨房歌辭, 宗敎歌辭, 開化歌辭 등 5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사대부가사, 서민가사, 내방가사, 종교가사는 작가와 향유계층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다음으로 개화가사를 설정한 것은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계층의식이 점차 붕괴되었으며 가사의 형식도 전대의 가사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개화와 우국’이라는 특수한 방면에만 국한되어 신문이나 잡지에 실려 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사를 5가지로 갈래짓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작자나 향유계층에 따라 갈래를 구분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사문학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김광순 외 著, 「국문학개론」, 새문社, 2003, pp193~194(歌辭 金文基)
본 조도 김문기의 뜻을 좇아 가사의 갈래를 사대부가사, 서민가사, 규방가사, 종교가사, 개화가사 등 5가지로 구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갈래 구분 기준이 하나로 통일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자층과 시대라는 두 가지 구분 기준은 우리가 수천 편이나 되는 가사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데 아주 합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많은 학자들의 가사 내용별 갈래 구분도 물론 나름대로의 합당한 일리가 있지만, 매우 방대한 양의 가사를 내용별로 분류하다보면 작자의 계층이나 시대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문학작품이란 마땅히 가지게 되는 시대적,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옳다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갈래별 가사가 가지는 특징과 내용, 그리고 몇몇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사대부가사(士大夫歌辭) 김광순 외 著, 「국문학개론」, 새문社, 2003,을 참고 하였음.
사대부는 관직상으로는 5품 이하의 관료인 士와, 4품 이상의 관료인 大夫를 뜻하는데, 통칭 양반계급으로 일컬어진다. 양반 사대부는 조선조의 지배층으로서 유교이념을 사상적 배경으로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펼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주로 지어진 사대부가사는 강호생활의 즐거움, 정치적 패배와 회귀의지, 유교적인 생활과 이념, 명승지와 유적지의 기행,역사와 고실(古實)을 통한 회고의 정을 주로 읊고 있다.
1) 강호생활의 즐거움
양반 사대부들은 이기철학에 심취되어 모든 인사, 접물에 도를 기본으로 하여 왕도정치를 추구하였고 정치에서 이루지 못한 유교적 이상을 자연과의 융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여 이른바 江湖歌道를 형성하였다. 특히 江湖之樂을 읊은 가사는 처사문인(處士文人)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후에 평소 잊지 못하던 자연에 귀의한 歸去來型(귀거래형)文人과 出仕를 표기하고 자연에 은거하여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기완성을 추구한 은구형(隱求型) 문인들에 의해 주로 읊어졌다. 이들은 강호에 거닐면서 한정을 노래하거나 안빈낙도를 토로하였다.
이런 가사로는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 송순(宋純)의 〈면앙정가(潭仰亭歌)〉,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 차천로(車天輅)의 〈강촌별곡(江村別曲)〉, 이양오(李養五)의 〈강촌만조가(江村晩釣歌)〉, 박인로(朴仁老)의 〈사제곡(莎堤曲)〉〈노계가(蘆溪歌)〉, 허강(許艮)의 〈서호별곡(西湖別曲)〉, 정훈(鄭勳)의 〈수남방옹가(水南放翁歌)〉, 작자 미상의 〈낙민가(樂民歌)〉〈창랑곡(滄浪曲)〉〈안빈낙도가(安貧樂道歌)〉〈은사가(隱士歌)〉등이 있다.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춘곡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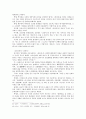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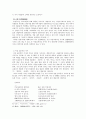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