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1.2. 연구방향
2. 텍스트 선정에 관한 문제와 정전의 선정
3. 고려 처용가의 형성과정
3.1 「고려사」에서 나타나는 처용희
3.2 고려 처용가의 형성시기
4. 고려 처용가 분석
4.1 화자에 따른 내용 분석
4.2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분석
4.3 고려 처용가의 무가적 특성
5. 결론
1.1. 연구사 검토
1.2. 연구방향
2. 텍스트 선정에 관한 문제와 정전의 선정
3. 고려 처용가의 형성과정
3.1 「고려사」에서 나타나는 처용희
3.2 고려 처용가의 형성시기
4. 고려 처용가 분석
4.1 화자에 따른 내용 분석
4.2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분석
4.3 고려 처용가의 무가적 특성
5. 결론
본문내용
우는 주연(酒宴)을 즐겨 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 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충혜왕은 황음무도(荒淫無道)의 대표적인 군주로서, 원의 권신(權臣)이 충혜왕을 두고 백안(伯顔)이 발피(潑皮) 건달, 무뢰배를 뜻함.
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우왕 역시 사대부가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일(婚日)에 앞서 여자를 빼앗는 등 패덕(敗德)한 왕이었다.
다른 왕대에서는 연행된 기록이 없는 처용놀이가 위의 세 왕때에 한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고려 처용가가 주술성이 깃든 무가이며, 가창과 더불어 나례 의식에서 행해지는 처용무는 벽사진경을 위한 국가적 행사라는 기존의 논의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위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왕의 경우 모두 처용희는 잔치자리나 놀이판에서 연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벽사진경의 원리로 연행되는 나례 의식과는 상이한 일종의 유희적 성격을 지닌 잡희 가까움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또 다른 근거로는 악사·기녀·악공들에 의해 행해진 벽사진경의 궁중 정악인 처용무와는 달리 연행자가 왕이나 신하, 궁인들인 것을 들 수 있다.
처용희가 행해진 시기를 볼 때도, 2월 8월, 6월, 정월에 각각 행해진 것이 문헌상에 명시되어 있기에 흥취가 발현될 때 비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유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용희와 처용무는 명칭이 유사하고 한 갈래에서 파생된 형식임에는 분명하나,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악학궤범」의 《학련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에는 연희자가 부끄러운 기색을 띌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송경인이 부끄러운 기색 없이 기술되어 있다는 항목을 볼 때 처용희와 처용무는 별개의 놀이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박노준(1990)은 향가 처용가 및 그 관계 기록에서 연유하여, 처용의 아내와 역신으로 비의된 외간남자와의 성행위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송경인이 평소에 처용희를 잘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처용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향가 처용가가 처음 나타난 헌강왕대에도 이른바 타락한 시대였는 바 『삼국유사』 「우사절유택」조에 “제 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성 안에 초가가 하나도 없었고, 가옥의 추녀와 담들이 맞닿아 있었으며 노래와 풍류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함. 김수경, 앞의 책 30쪽
, 타락한 시대의 산물로 출발하여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패덕한 군주의 집권기에 그 모습이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짐작건대, 유희적 성격의 처용희는 잠복하고 있다가 때를 만나면 다시 등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듯하다.
3.2 고려 처용가의 형성시기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향가 처용가가 고려에 전승 될 때에 처용희와 처용무의 이원적(二元的)인 전승을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박노준 외에도 이명구(1982)가 “이른바 처용가라고 불리우는 노래는 여대에 있어 단 한 종류에 한 편만이 잇었다고 하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하여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가의 성격을 띄는 고려 처용가는 언제쯤 형성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종 때 연행된 처용희가 곧 무가인 고려처용가의 첫 등장이라고 보는, 양주동의 주장의 근거가 희박해진 까닭이다. 따라서 고려 처용가의 형성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의 《처용랑망해사조》를 분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용랑망해사조》에는 8구체 향가 처용가만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말엽에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도 고려 처용가가 아닌 향가 처용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당시 무가적 성격을 지닌 고려 처용가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널리 향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일연이 향가를 취급할 때의 자세는 도솔가를 다룰 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일연은 월명사가 도솔가를 짓게 된 경위와 세속에서 부르는 산화가라는 이름은 잘못 된 것이며, 산화가는 따로 있지만 문장이 길어서 싣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풍요의 경우에도 민간 전승의 과정에서 시대에 따라 변천 되는 양상을 밝히고 있다. 박노준, 앞의 책 재인용. 330쪽
이처럼 명민한 기록을 남긴 일연이 유독 처용가에 있어서만 향가 처용가는 적시해 놓으되 고려 처용가를 누락한 것과, 「고려사」 속악조를 통해 추론해보면 고려 처용가는 고려 때 생성은 되었으나, 궁중 행사로서 조선왕조 때처럼 널리 연행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그 생성시기를 문헌의 기록에 의거하여 추찰한 박노준(1990)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현의 <해시(解詩)>에 고려 처용가를 관람하고 그 연행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현의 생몰연대는 충렬왕 13년~공민왕 6년이니 일연이 별세하기 3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다. 그리고 이색의 <구나행(驅儺行)>에도 고려 처용가의 가사와 상통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색의 생몰연대는 이제현과 불과 기십년 차이 밖에 없으므로 비슷한 시대의 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익재나 목은 이전에는 처용희가 아닌 고려 처용가를 연상시키는 한시나 기타 문헌적 자료가 없고, 익재와 목은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의 사람인 일연의 「삼국유사」에도 고려 처용가가 언급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충렬왕 13년에서 공민왕 사이에 고려 처용가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짐작 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고려 처용가 분석
< 표 2 > 원문 부분은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4, 150~151쪽의 내용을 김수경, 앞의 책, 148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 하였으며, 어석 부분은 이윤선, 앞의 논문, 173~174쪽을 참조하였다.
[서사(序詞)]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大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三災八難이 一時消滅샷다
(전강) 신라 성대 밝은 성대의
천하태평은 나후의 덕
처용 아비여
이로써 사람들이 별말이 없게 되니
이로써 사람들이 별말이 없게 되니
(부엽) 모든 재앙이 일시에 소멸하도다
[A-1]
[처용의 모습 찬양]
어와 아
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우왕 역시 사대부가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일(婚日)에 앞서 여자를 빼앗는 등 패덕(敗德)한 왕이었다.
다른 왕대에서는 연행된 기록이 없는 처용놀이가 위의 세 왕때에 한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고려 처용가가 주술성이 깃든 무가이며, 가창과 더불어 나례 의식에서 행해지는 처용무는 벽사진경을 위한 국가적 행사라는 기존의 논의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위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왕의 경우 모두 처용희는 잔치자리나 놀이판에서 연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벽사진경의 원리로 연행되는 나례 의식과는 상이한 일종의 유희적 성격을 지닌 잡희 가까움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또 다른 근거로는 악사·기녀·악공들에 의해 행해진 벽사진경의 궁중 정악인 처용무와는 달리 연행자가 왕이나 신하, 궁인들인 것을 들 수 있다.
처용희가 행해진 시기를 볼 때도, 2월 8월, 6월, 정월에 각각 행해진 것이 문헌상에 명시되어 있기에 흥취가 발현될 때 비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유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용희와 처용무는 명칭이 유사하고 한 갈래에서 파생된 형식임에는 분명하나,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악학궤범」의 《학련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에는 연희자가 부끄러운 기색을 띌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송경인이 부끄러운 기색 없이 기술되어 있다는 항목을 볼 때 처용희와 처용무는 별개의 놀이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박노준(1990)은 향가 처용가 및 그 관계 기록에서 연유하여, 처용의 아내와 역신으로 비의된 외간남자와의 성행위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송경인이 평소에 처용희를 잘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처용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향가 처용가가 처음 나타난 헌강왕대에도 이른바 타락한 시대였는 바 『삼국유사』 「우사절유택」조에 “제 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성 안에 초가가 하나도 없었고, 가옥의 추녀와 담들이 맞닿아 있었으며 노래와 풍류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함. 김수경, 앞의 책 30쪽
, 타락한 시대의 산물로 출발하여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패덕한 군주의 집권기에 그 모습이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짐작건대, 유희적 성격의 처용희는 잠복하고 있다가 때를 만나면 다시 등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듯하다.
3.2 고려 처용가의 형성시기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향가 처용가가 고려에 전승 될 때에 처용희와 처용무의 이원적(二元的)인 전승을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박노준 외에도 이명구(1982)가 “이른바 처용가라고 불리우는 노래는 여대에 있어 단 한 종류에 한 편만이 잇었다고 하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하여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가의 성격을 띄는 고려 처용가는 언제쯤 형성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종 때 연행된 처용희가 곧 무가인 고려처용가의 첫 등장이라고 보는, 양주동의 주장의 근거가 희박해진 까닭이다. 따라서 고려 처용가의 형성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의 《처용랑망해사조》를 분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용랑망해사조》에는 8구체 향가 처용가만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말엽에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도 고려 처용가가 아닌 향가 처용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당시 무가적 성격을 지닌 고려 처용가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널리 향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일연이 향가를 취급할 때의 자세는 도솔가를 다룰 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일연은 월명사가 도솔가를 짓게 된 경위와 세속에서 부르는 산화가라는 이름은 잘못 된 것이며, 산화가는 따로 있지만 문장이 길어서 싣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풍요의 경우에도 민간 전승의 과정에서 시대에 따라 변천 되는 양상을 밝히고 있다. 박노준, 앞의 책 재인용. 330쪽
이처럼 명민한 기록을 남긴 일연이 유독 처용가에 있어서만 향가 처용가는 적시해 놓으되 고려 처용가를 누락한 것과, 「고려사」 속악조를 통해 추론해보면 고려 처용가는 고려 때 생성은 되었으나, 궁중 행사로서 조선왕조 때처럼 널리 연행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그 생성시기를 문헌의 기록에 의거하여 추찰한 박노준(1990)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현의 <해시(解詩)>에 고려 처용가를 관람하고 그 연행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현의 생몰연대는 충렬왕 13년~공민왕 6년이니 일연이 별세하기 3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다. 그리고 이색의 <구나행(驅儺行)>에도 고려 처용가의 가사와 상통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색의 생몰연대는 이제현과 불과 기십년 차이 밖에 없으므로 비슷한 시대의 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익재나 목은 이전에는 처용희가 아닌 고려 처용가를 연상시키는 한시나 기타 문헌적 자료가 없고, 익재와 목은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의 사람인 일연의 「삼국유사」에도 고려 처용가가 언급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충렬왕 13년에서 공민왕 사이에 고려 처용가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짐작 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고려 처용가 분석
< 표 2 > 원문 부분은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4, 150~151쪽의 내용을 김수경, 앞의 책, 148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 하였으며, 어석 부분은 이윤선, 앞의 논문, 173~174쪽을 참조하였다.
[서사(序詞)]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大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三災八難이 一時消滅샷다
(전강) 신라 성대 밝은 성대의
천하태평은 나후의 덕
처용 아비여
이로써 사람들이 별말이 없게 되니
이로써 사람들이 별말이 없게 되니
(부엽) 모든 재앙이 일시에 소멸하도다
[A-1]
[처용의 모습 찬양]
어와 아
추천자료
 [고려속요][경기체가][청산별곡][처용가]고려속요와 경기체가 비교 및 작품 분석(고려속요, ...
[고려속요][경기체가][청산별곡][처용가]고려속요와 경기체가 비교 및 작품 분석(고려속요, ... [향가][제망매가][처용가][도이장가][예경제불가][칭찬여래가]통일신라 향가(제망매가), 통일...
[향가][제망매가][처용가][도이장가][예경제불가][칭찬여래가]통일신라 향가(제망매가), 통일... 고려가요(고려속요) 처용가의 유래와 배경설화, 고려가요(고려속요) 처용가의 원문, 고려가요...
고려가요(고려속요) 처용가의 유래와 배경설화, 고려가요(고려속요) 처용가의 원문, 고려가요... [고려속요][고려가요][처용가]고려속요(고려가요) 처용가의 배경설화, 고려속요(고려가요) 처...
[고려속요][고려가요][처용가]고려속요(고려가요) 처용가의 배경설화, 고려속요(고려가요) 처... [향가][제망매가][처용가][도이장가][보개회향가][총결무진가]통일신라 제망매가(향가), 통일...
[향가][제망매가][처용가][도이장가][보개회향가][총결무진가]통일신라 제망매가(향가), 통일... 처용가(고려가요, 고려속요)의 성격, 처용가(고려가요, 고려속요)의 형성과정과 처용가(고려...
처용가(고려가요, 고려속요)의 성격, 처용가(고려가요, 고려속요)의 형성과정과 처용가(고려... 《고려처용가》의 해체적 글읽기
《고려처용가》의 해체적 글읽기 고려속요(고려가요) 가시리, 정과정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처용가, 쌍화점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가시리, 정과정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처용가, 쌍화점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청산별곡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서경별곡 작품분석, 고려속요(고...
고려속요(고려가요) 청산별곡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서경별곡 작품분석, 고려속요(고... 신라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의 비교
신라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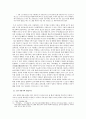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