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간주된다. 예컨대 민요형태인 4행체의 원가(原歌)를 단순한 반복에 의해 6행으로 늘여놓은 점을 들 수 있다.
또 매 연마다 후렴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다든지, 이러한 후렴구가 보이지 않는 맨 끝 연은 다른 작품에도 완전히 일치하는 사설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애초에 4행체의 민요였던 원가를 궁중의 새로운 악곡에 맞추어 조절하고 재창작한 흔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당대의 민요가 궁중으로 상승하여 재편성된 가요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원작자는 민중계층일 것이고, 이것이 궁중의 악장으로 재창작되어 상승한 이후로는 가창자 및 향유자가 상층귀족 또는 주변 인물인 기녀와 악공으로 변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 ‘정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 ‘정석’은 이 작품의 제1연에 보이는 “딩하 돌하”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정(鄭)’은 ‘딩’과, ‘석(石)’은 ‘돌’과 대응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면서, 그 의미를 추출함에 있어서는 얼마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징〔鉦〕과 돌〔磬〕이라는 금석악기(金石樂器)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그와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딩ㆍ동’을 의성어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작중화자의 연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생명신ㆍ우주신 등 신격화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와는 달리 금석악기로서 8음의 악기를 집대성한 악기 자체를 가리킨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제1연이 이 작품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사(本詞)에 해당하는 제2연 이하 제5연까지의 내용은 구운밤에서 싹이 나거나, 옥으로 된 연꽃에 꽃이 피거나, 무쇠 철릭이 다 헐어버리거나, 무쇠 소가 철초(鐵草)를 먹거나,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구슬을 꿰었던 끈까지 끊어지거나 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면 “有德(유덕)하신 님”과 여읠 수 있다는 사설로 구성되었다.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勘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勘
구은 밤 닷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有德悧신 님을 여羸陶와지이다 (제2연)
제2연을 들어보면 이와 같다. ‘바삭바삭한 잔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하고서,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거든 유덕하신 님과 여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말이 단순하고 유식한 문구는 없으나, 불가능한 것을 극단화해서 자신의 소망이 이토록 간절하다는 말을 역설로 드러냈다.
이 작품에 표출된 미의식은 유덕(有德)한 임과의 현실적 사랑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 우아미를 심층에 깔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랑을 영구화 내지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어 숭고미를 아울러 구현하고 있다.
즉, 구운 밤 닷 되가 모래밭에서 싹이 돋아 자랄 때까지(제2연),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에 접붙여 그 꽃이 활짝 필 때까지(제3연), 무쇠로 마른 철릭(天翼 : 무관의 옷)을 철사로 박아 그 옷이 해질 때까지(제4연),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 쇠붙이나무〔鐵樹〕가 우거진 산에 방목하여 쇠붙이 풀〔鐵草〕을 다 먹을 때까지(제5연) 사랑의 영구 불변성과 무한대성을 추구함으로써 현세적이고 유한한 사랑을 초극하는 숭고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는 주술이나 종교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의 힘에 근거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추구되고 있어 비극적인 일면을 아울러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노래의 선법(旋法)은 평조와 계면조로 모두 통용되고, 곡의 길이는 한 장단에 16박자로 된 아홉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문헌 : 國文學의 探究(金學成,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7)
韓國古典詩歌의 硏究(金學成, 圓光大學校出版局, 1980)
鄭石歌硏究(李相寶, 韓國言語文學 1, 1963)
鄭石에 대하여(趙鍾業, 韓國言語文學 11, 1973)
‘鄭石歌’ 考(金尙憶, 高麗時代의 가요문학, 새문社, 1986).
위의 작품들 외에도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달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노래하며 이별한 후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한 <동동> 또한 잘 알려진 고려속요가 있다.
또한, 原歌는 전해지지 않지만 익제현의 <소악부>에 한역되어 전하는 노래 중에 부역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애틋한 심정을 노래한 <거사련 居士戀>이 있으며, 도박으로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이별의 슬픔과 회한을 노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禮成江>, 해설과 한역된 작품이 상반된 내용을 보여 눈길을 끄는 <濟危寶> 등의 작품들 역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고려속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번 발표과제를 위해 조사했던 작품들은 중ㆍ고등학교에서 한번쯤 접해봤던 것들이었으나 이렇게 여러 서적들을 읽어보며 내 스스로 찾아서 다시 공부하고 나니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글 이면에 담긴 내용들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는 데 새삼스레 놀라움을 느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지어진 노래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居士戀>, <禮成江>, <濟危寶> 등 교재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작품들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
● 참고자료 ●
☞ 고전시가론 (성기옥ㆍ손종흠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최미정,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 고려속요 연구 (조연숙, 국학자료원, 2004)
☞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연구 (김쾌덕, 국학자료원, 2001)
☞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최철,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http://www.seelotus.com/
☞ http://korean.new21.org/pds_main.php?id=goryeogayo
☞ http://www.kanggo.net/~pooh/munhak/korea/gasiri.htm
☞ 동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엠파스 백과사전
또 매 연마다 후렴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다든지, 이러한 후렴구가 보이지 않는 맨 끝 연은 다른 작품에도 완전히 일치하는 사설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애초에 4행체의 민요였던 원가를 궁중의 새로운 악곡에 맞추어 조절하고 재창작한 흔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당대의 민요가 궁중으로 상승하여 재편성된 가요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원작자는 민중계층일 것이고, 이것이 궁중의 악장으로 재창작되어 상승한 이후로는 가창자 및 향유자가 상층귀족 또는 주변 인물인 기녀와 악공으로 변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 ‘정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 ‘정석’은 이 작품의 제1연에 보이는 “딩하 돌하”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정(鄭)’은 ‘딩’과, ‘석(石)’은 ‘돌’과 대응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면서, 그 의미를 추출함에 있어서는 얼마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징〔鉦〕과 돌〔磬〕이라는 금석악기(金石樂器)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그와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딩ㆍ동’을 의성어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작중화자의 연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생명신ㆍ우주신 등 신격화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와는 달리 금석악기로서 8음의 악기를 집대성한 악기 자체를 가리킨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제1연이 이 작품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사(本詞)에 해당하는 제2연 이하 제5연까지의 내용은 구운밤에서 싹이 나거나, 옥으로 된 연꽃에 꽃이 피거나, 무쇠 철릭이 다 헐어버리거나, 무쇠 소가 철초(鐵草)를 먹거나,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구슬을 꿰었던 끈까지 끊어지거나 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면 “有德(유덕)하신 님”과 여읠 수 있다는 사설로 구성되었다.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勘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勘
구은 밤 닷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有德悧신 님을 여羸陶와지이다 (제2연)
제2연을 들어보면 이와 같다. ‘바삭바삭한 잔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하고서,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거든 유덕하신 님과 여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말이 단순하고 유식한 문구는 없으나, 불가능한 것을 극단화해서 자신의 소망이 이토록 간절하다는 말을 역설로 드러냈다.
이 작품에 표출된 미의식은 유덕(有德)한 임과의 현실적 사랑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 우아미를 심층에 깔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랑을 영구화 내지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어 숭고미를 아울러 구현하고 있다.
즉, 구운 밤 닷 되가 모래밭에서 싹이 돋아 자랄 때까지(제2연),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에 접붙여 그 꽃이 활짝 필 때까지(제3연), 무쇠로 마른 철릭(天翼 : 무관의 옷)을 철사로 박아 그 옷이 해질 때까지(제4연),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 쇠붙이나무〔鐵樹〕가 우거진 산에 방목하여 쇠붙이 풀〔鐵草〕을 다 먹을 때까지(제5연) 사랑의 영구 불변성과 무한대성을 추구함으로써 현세적이고 유한한 사랑을 초극하는 숭고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는 주술이나 종교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의 힘에 근거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추구되고 있어 비극적인 일면을 아울러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노래의 선법(旋法)은 평조와 계면조로 모두 통용되고, 곡의 길이는 한 장단에 16박자로 된 아홉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문헌 : 國文學의 探究(金學成,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7)
韓國古典詩歌의 硏究(金學成, 圓光大學校出版局, 1980)
鄭石歌硏究(李相寶, 韓國言語文學 1, 1963)
鄭石에 대하여(趙鍾業, 韓國言語文學 11, 1973)
‘鄭石歌’ 考(金尙憶, 高麗時代의 가요문학, 새문社, 1986).
위의 작품들 외에도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달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노래하며 이별한 후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한 <동동> 또한 잘 알려진 고려속요가 있다.
또한, 原歌는 전해지지 않지만 익제현의 <소악부>에 한역되어 전하는 노래 중에 부역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애틋한 심정을 노래한 <거사련 居士戀>이 있으며, 도박으로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 이별의 슬픔과 회한을 노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禮成江>, 해설과 한역된 작품이 상반된 내용을 보여 눈길을 끄는 <濟危寶> 등의 작품들 역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고려속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번 발표과제를 위해 조사했던 작품들은 중ㆍ고등학교에서 한번쯤 접해봤던 것들이었으나 이렇게 여러 서적들을 읽어보며 내 스스로 찾아서 다시 공부하고 나니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글 이면에 담긴 내용들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는 데 새삼스레 놀라움을 느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지어진 노래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居士戀>, <禮成江>, <濟危寶> 등 교재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작품들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
● 참고자료 ●
☞ 고전시가론 (성기옥ㆍ손종흠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최미정,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 고려속요 연구 (조연숙, 국학자료원, 2004)
☞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연구 (김쾌덕, 국학자료원, 2001)
☞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최철,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http://www.seelotus.com/
☞ http://korean.new21.org/pds_main.php?id=goryeogayo
☞ http://www.kanggo.net/~pooh/munhak/korea/gasiri.htm
☞ 동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엠파스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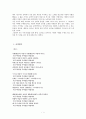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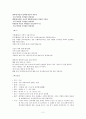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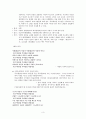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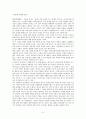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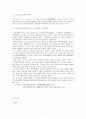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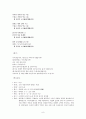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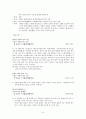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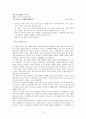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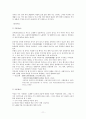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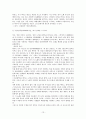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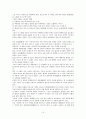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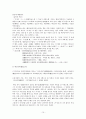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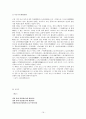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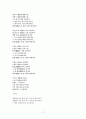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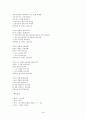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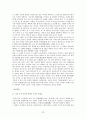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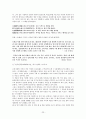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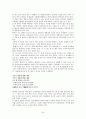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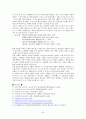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