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만나려는 심사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 된다고
훗길
개여울
첫치마
전체감상
만나려는 심사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 된다고
훗길
개여울
첫치마
전체감상
본문내용
몇 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차근차근 소월의 시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노래로 만들어진 시가 많았다. <진달래꽃>은 어려서부터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김소월의 시 중 가장 유명해서 알고 있었지만 <밤>, <왕십리>, <초혼>, <산유화>, 특히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개여울>은 마냥 촌스러운 옛날 노래 같지 않고 정말 감성적이고 애달프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이래서 ‘시인이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하는 탄성이 나왔다.
소월의 많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율격이나 리듬이 음악에 맞춘 가사처럼 정형화되어 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외래어를 의도적으로 배제 시킨 만큼 일상 언어로 쓰인 시가 이해하기 쉬웠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특히 소월의 시에서 원통, 한탄, 정한 등 내면적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많은데, 슬픔을 노래하는 한국적인 한(恨)의 정서가 같은 민족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을 슬픔으로 이겨낸다는 말도 마냥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이라고만 느껴졌었는데, 소월의 시를 반복해 읽으며 그 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슬픔대로 그 안에 충분히 빠져들어 온전히 모든 슬픔을 소진하고 난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다. 슬픔을 한으로 승화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수단이 소월에게는 시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월의 많은 시들이 한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그렇다. 남편 같은 경우는 슬플 때 일부러 웃기고 즐거운 코믹 영화를 찾아보며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 기분이 풀린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슬픈 영화를 찾아보고 한 시간 내내 눈물 콧물 다 빼며 엉엉 울어버림으로써 나의 슬픔도 함께 울어내 털어버린다. 어렴풋이 예상해 보자면 소월이 개인의 슬픔과 민족적인 슬픔을 시로 풀어낸 것과 내가 슬픈 영화를 보며 털어버리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같은 원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자고로 ‘시’는 어렵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멋에 취해 쓴 글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꼭 숨바꼭질하듯이 함축적인 시어 가운데서 시의 주제와 화자의 감정을 찾아내기만 해야 했던 입시 교육의 폐해일지도 모르겠다. 소월의 시는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의 영원한 현재를 보여준다.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그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현재로 만들어버린 민족 시인 김소월이 몇 십 년이 지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나 힘들다고, 그립고 외롭고 속상하다고. 그런 시인의 표현들이 시를 읽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감의 울림을 준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에게 나를 투영시켜 같은 상황에서 위로받는 것이다. 시대가 다를 뿐 우리도 소월과 똑같이 그리움, 외로움, 슬픔 모두 느끼는 한 명의 인간이니까. 소월과 같은 모국어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제는 내가 그를 꼭 안아주고 싶다.
소월의 많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율격이나 리듬이 음악에 맞춘 가사처럼 정형화되어 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외래어를 의도적으로 배제 시킨 만큼 일상 언어로 쓰인 시가 이해하기 쉬웠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특히 소월의 시에서 원통, 한탄, 정한 등 내면적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많은데, 슬픔을 노래하는 한국적인 한(恨)의 정서가 같은 민족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을 슬픔으로 이겨낸다는 말도 마냥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이라고만 느껴졌었는데, 소월의 시를 반복해 읽으며 그 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슬픔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슬픔대로 그 안에 충분히 빠져들어 온전히 모든 슬픔을 소진하고 난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다. 슬픔을 한으로 승화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수단이 소월에게는 시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월의 많은 시들이 한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그렇다. 남편 같은 경우는 슬플 때 일부러 웃기고 즐거운 코믹 영화를 찾아보며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 기분이 풀린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슬픈 영화를 찾아보고 한 시간 내내 눈물 콧물 다 빼며 엉엉 울어버림으로써 나의 슬픔도 함께 울어내 털어버린다. 어렴풋이 예상해 보자면 소월이 개인의 슬픔과 민족적인 슬픔을 시로 풀어낸 것과 내가 슬픈 영화를 보며 털어버리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같은 원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자고로 ‘시’는 어렵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멋에 취해 쓴 글 정도로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꼭 숨바꼭질하듯이 함축적인 시어 가운데서 시의 주제와 화자의 감정을 찾아내기만 해야 했던 입시 교육의 폐해일지도 모르겠다. 소월의 시는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의 영원한 현재를 보여준다.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그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현재로 만들어버린 민족 시인 김소월이 몇 십 년이 지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나 힘들다고, 그립고 외롭고 속상하다고. 그런 시인의 표현들이 시를 읽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감의 울림을 준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에게 나를 투영시켜 같은 상황에서 위로받는 것이다. 시대가 다를 뿐 우리도 소월과 똑같이 그리움, 외로움, 슬픔 모두 느끼는 한 명의 인간이니까. 소월과 같은 모국어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제는 내가 그를 꼭 안아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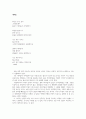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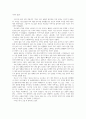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