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가와 묵가와 도가
성선설적 교육관
귀족주의적 왕도정치
맹자와 순자
성선설적 교육관
귀족주의적 왕도정치
맹자와 순자
본문내용
스런 일들 때문에 다시 교란되어 사라져 버린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 가서는 밤의 기운도 없어지고, 밤의 기운이 없어지만 인간이 아닌 금수(禽獸)와 가까운 상태에 빠진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금수가 된 꼴 만을 보고 본래부터 착한 재성(才性)이 없었던 것과 같이 생각하겠지만 어찌 그런 것이 사람의 본성이겠는가? (고자상 우산장 1-2)
그러나 맹자가 성선설을 견지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仁), 의(義) 등의 도덕적 개념은 원천적으로 인간 혹은 인간의 마음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內在)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둘째로, 인과 의가 인간의 성품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래 똑 같은 심성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째로,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이 선하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의 의문은 이것이다. 만약에 인과 의가 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습에서 온 것이라면,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는 판단이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선악의 판단은 인간의 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습 혹은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선악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는 것이거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 도덕적 기준은 내재적인 것인가? 맹자와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린 고자는 인의 경우에는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의 경우에는 외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가지의 예를 들었다. 첫째, 음식을 먹는 것과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내재적인 것이다. 그러나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연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치 어떤 물체가 흰색인 경우에 그것을 희다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희다고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물체가 희기 때문에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은 내재적인 것이며 의는 외재적인 것이다. 둘째, 자기 동생은 사랑하지만 먼 나라 사람의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며, 남의 나라 영장자도 내 나라의 연장자처럼 모시는 것은 연장자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한 것이므로 의는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다.(고자상 식생장) 이러한 고자의 논변에 대하여 맹자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흰 말과 흰 사람의 경우에 희다는 사실은 같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말과 사람이 같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을 의라고 하지 연장자 그 자체를 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흰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며,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존경의 대상만을 두고 의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의 의문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인과 의의 설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래 성인은 성인으로 태어나고 범인은 범인으로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즉, 시경(詩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모든 사람들을 낳고 만물에는 법칙이 있게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그 법칙을 지키고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였듯이, 사람들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법칙을 지키고 덕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자 상 공도장) 만물에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사물은 비슷하게 마련인데 어찌 오직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인이나 나나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부세장 3) 성인은 이(理)와 의(義)로 충만하므로 성인의 본성은 선하다. 성인과 나는 동류이므로 나는 동류에 속하므로 나의 성도 선할 수밖에 없다. 맹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이 될 수 있다”(고자하 조교)고 하였다.
세째의 의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이 선하다면 그 선성을 나타내어 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고자는 사람의 본성이란 마치 버드나무의 가지나 물과 같이 이리저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선하거나 악하거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햐였다.(고자 상 기류장, 湍水章) 그러나 맹자는 어렇게 대응하였다. 즉, 버드나무의 가지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 본성을 어기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물이 이리저리 좌우로 흐를 수 있으나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물로, 이러한 일정한 본성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대답이 바로 맹자의 유명한 “사단설”(四端說)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측은함을 느끼는 마음(惻隱之心)이 있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마음(羞惡之心)이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恭敬之心)이 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있다.(고자상 공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仁)의 단서이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의(義)의 단서이며, 공경하는 바음이 바로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바로 지(知)의 단서이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와서 나를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본래 있는 것이나 단지 우리는 마음에 내재하는 바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찾아서 닦으면 그것을 얻지만 스스로 버리면 잃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찾는 사람과 스스로 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성인과 법인의 차이처럼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자상 공도장)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본래의 선성을 확충하는 양성(養性)과 그것을 잃어 버리는 실성(失性)의 차이이다. 이러한 인성관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선단(善端)을 확충하는 것과 잃어버린 선단을 회복하는 것으로 함축될 수 있다. 사단은 인간의 인의예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단서라면, 확충하고 회복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즉, 선한 성품의 실체는 무엇인가? 마음은 본래 인의예지의 덕을
그러나 맹자가 성선설을 견지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仁), 의(義) 등의 도덕적 개념은 원천적으로 인간 혹은 인간의 마음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內在)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둘째로, 인과 의가 인간의 성품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래 똑 같은 심성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째로,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이 선하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의 의문은 이것이다. 만약에 인과 의가 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습에서 온 것이라면,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는 판단이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선악의 판단은 인간의 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습 혹은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선악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는 것이거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 도덕적 기준은 내재적인 것인가? 맹자와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린 고자는 인의 경우에는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의 경우에는 외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가지의 예를 들었다. 첫째, 음식을 먹는 것과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내재적인 것이다. 그러나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연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치 어떤 물체가 흰색인 경우에 그것을 희다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희다고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물체가 희기 때문에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은 내재적인 것이며 의는 외재적인 것이다. 둘째, 자기 동생은 사랑하지만 먼 나라 사람의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며, 남의 나라 영장자도 내 나라의 연장자처럼 모시는 것은 연장자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한 것이므로 의는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다.(고자상 식생장) 이러한 고자의 논변에 대하여 맹자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흰 말과 흰 사람의 경우에 희다는 사실은 같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말과 사람이 같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을 의라고 하지 연장자 그 자체를 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흰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며,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존경의 대상만을 두고 의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의 의문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인과 의의 설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래 성인은 성인으로 태어나고 범인은 범인으로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즉, 시경(詩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모든 사람들을 낳고 만물에는 법칙이 있게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그 법칙을 지키고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였듯이, 사람들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법칙을 지키고 덕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자 상 공도장) 만물에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사물은 비슷하게 마련인데 어찌 오직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인이나 나나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부세장 3) 성인은 이(理)와 의(義)로 충만하므로 성인의 본성은 선하다. 성인과 나는 동류이므로 나는 동류에 속하므로 나의 성도 선할 수밖에 없다. 맹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이 될 수 있다”(고자하 조교)고 하였다.
세째의 의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이 선하다면 그 선성을 나타내어 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고자는 사람의 본성이란 마치 버드나무의 가지나 물과 같이 이리저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선하거나 악하거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햐였다.(고자 상 기류장, 湍水章) 그러나 맹자는 어렇게 대응하였다. 즉, 버드나무의 가지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 본성을 어기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물이 이리저리 좌우로 흐를 수 있으나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물로, 이러한 일정한 본성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대답이 바로 맹자의 유명한 “사단설”(四端說)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측은함을 느끼는 마음(惻隱之心)이 있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마음(羞惡之心)이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恭敬之心)이 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있다.(고자상 공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仁)의 단서이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의(義)의 단서이며, 공경하는 바음이 바로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바로 지(知)의 단서이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와서 나를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본래 있는 것이나 단지 우리는 마음에 내재하는 바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찾아서 닦으면 그것을 얻지만 스스로 버리면 잃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찾는 사람과 스스로 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성인과 법인의 차이처럼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자상 공도장)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본래의 선성을 확충하는 양성(養性)과 그것을 잃어 버리는 실성(失性)의 차이이다. 이러한 인성관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선단(善端)을 확충하는 것과 잃어버린 선단을 회복하는 것으로 함축될 수 있다. 사단은 인간의 인의예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단서라면, 확충하고 회복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즉, 선한 성품의 실체는 무엇인가? 마음은 본래 인의예지의 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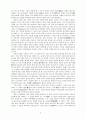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