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신 신앙이란? p 2
2. 가신 신앙의 성격 p 2 ~ 5
3. 가정 신앙의 종류별 고찰
1) 성주 p 5 ~ 7
2) 조상 p 7 ~ 8
3) 삼신 p 8 ~ 10
4) 조왕 p 10 ~ 11
5) 측신 p 11 ~ 12
6) 안택제 p 12 ~ 14
7) 고사 p 14
8) 수문신 p 14 ~ 16
9) 토신제 p 16
10) 지신 p 16 ~ 18
11) 업신앙 p 18
12) 조령 p 18
13) 터주와 철륭 p 18 ~ 19
14) 주당 p 19
15) 우마신 p 19
16) 용왕 p 19
17) 쇠구영신 p 19
2. 가신 신앙의 성격 p 2 ~ 5
3. 가정 신앙의 종류별 고찰
1) 성주 p 5 ~ 7
2) 조상 p 7 ~ 8
3) 삼신 p 8 ~ 10
4) 조왕 p 10 ~ 11
5) 측신 p 11 ~ 12
6) 안택제 p 12 ~ 14
7) 고사 p 14
8) 수문신 p 14 ~ 16
9) 토신제 p 16
10) 지신 p 16 ~ 18
11) 업신앙 p 18
12) 조령 p 18
13) 터주와 철륭 p 18 ~ 19
14) 주당 p 19
15) 우마신 p 19
16) 용왕 p 19
17) 쇠구영신 p 19
본문내용
것이 보통이다. 제물은 일반적으로 메 · 떡 · 과일 · 나물 · 생선 · 술 등을 차린다. 제의는 거의 주부에 의해 진행되며 특별한 의식은 없고 음식을 차린 후 가족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정도이다. 조상을 제석단지 · 세존단지 등으로 부르는 것은 불교와 연관 관계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석이 조신(祖神) · 농신(農神) · 산신(産神) · 수명신(壽命神) 등의 다양성을 띠고 있고 조상단지에 쌀을 넣는 것도 조신 · 농신을 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신은 후손을 보살펴 주는 일을 한다. 이 신이 있는 자리는 안방의 윗목벽 밑인데, 일정한 실체는 없다. \'시준단지\'라 하여 쌀을 조그만 항아리에 넣어 봉한 뒤 방 한구석에 두거나 안방 천장에 매달아 놓고 1년에 한번씩 추수 후 갈아 넣기도 한다. 시준단지는 1970년대 이후 완전히 소멸되었다.
3. 삼 신
삼신은 산신(産神)으로서 삼신할머니라고도 한다. 이 삼신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신으로서 기자(祈子)의 대상으로부터 출산 및 육아 그리고 산모의 건강까지를 담당하는 신으로 생각하여 왔다. 산신인 삼신을‘三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 말에 태(胎)를 가리켜 ‘삼’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음기(音記)만 따서 ‘三’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삼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삼신의 신체로는 자루에 쌀을 넣어 안방에 걸어 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그러한 표상이 없이 집안에 삼신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출산이 있으면 \'삼신상\'을 차린다. 상에는 물·밥·미역국 한 그릇씩을 올려 놓는데, 이것을 산모 바의 장롱 앞에 가져다 놓고 절을 하고 부정을 가린다. 부정은 정화수를 3번 갈고 축원을 한다. 축원의 사설은 일정한 것이 없고, 점지해 준 아기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 달라는 내용이다. 아기가 아플 때는 미역국과 밥을 올리고 4-7배를 한다. 매년 음력 3월3일(삼신날이라고도 함)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삼신은 원래 집안에서 살고 있는 신인데, 가정이 불화하거나 삼신을 잘 받들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다. 집을 나간 삼신은 은행나무에 붙어서 사는데, 다시 모셔 들이려면 대나무를 은행나무에 대고 정성을 들여 빌면 대나무에 접신한다는 것이다. 이 대나무를 이불 같은 것으로 꼭 싸서 산모가 있는 방이나 병이 난 아이의 방에 모셔 놓아야 순산을 하고 아이의 병도 낫는다고 믿어 왔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도 속칭 삼신에 대해서
「대개 풍속에 태(胎)를 보호하는 신을 삼신이라 한다. 우리말에 태를 ‘삼(三 ; sam)’이라 하는 것은 삼신을 이르는 것으로 태신(胎神)을 말한다 삼신의 ‘삼’을 하나의 숫자로 봐서는 안된다.[註]」
라고 하여 이의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임동권(任東權) 역시 ‘서울의 산속(産俗)’에서
「산신(産神)은 속칭(俗稱) 삼신할머니라 해서 여신(女神)으로 산(産)의 다과(多寡)나 유무(有無)가 모두 그의 소관(所管)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註]」
고 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삼신은 태신으로서 산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옛 사회에서는 산모나 출산아의 사망율이 높았고, 또 자식을 못낳는 여인은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되어 내쫓김을 당하기도 해서 기자신앙(祈子信仰), 삼신신앙은 더욱 자극되어 왔다.
아이가 탄생되는 것은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금기하여 부정한 것을 막고 아이의 잉태에서부터 출산 · 육아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원하여 온 것이 우리 산속(産俗)의 역사이다. 삼신은 주로 주부나 산모 · 산아의 할머니에 의해 섬겨지지만 동네에서 잘 비는 할머니를 모셔다 빌기도 한다.
신체(神體)의 봉안은 가정에서 성주나 조왕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고 형태 역시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가지나 주머니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다. 호남과 영남지방에서는 쌀이나 보리 또는 타래실을 바가지에 넣고 금줄을 동여매어 아랫목 한 쪽에 모셔두는 경우가 있고 새끼로 그물처럼 얽은 속에 바가지를 얹어 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충북지방에서는 베(麻布)로 만든 주머니 2개를 안방의 시렁 한쪽에 매어 다는데 두 주머니에 모두 쌀을 넣거나 아니면 한쪽 주머니에는 쌀을, 다른 주머니에는 미역을 넣어 두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방에서는 종이 헝겊 또는 실을 안방의 한 구석에 높이 달아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서는 신체 봉안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삼신신앙에서 특히 잉태를 위한 기원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산에서 산신에 대해 기도를 한다든가 바위에 대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서 부처나 칠성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여 그 형태가 다양하면서 더욱 간절한 기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산후 3일과 초이렛날 · 두이렛날 · 세이렛날 등 7일 간격으로 음식을 차리고 삼신을 위하는 제례를 갖는다. 이러한 제례는 산후 세이레까지만 갖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일곱이레까지 삼신을 위하기도 한다. 이 제례를 주관하는 주부는 이때에 산모의 회복과 산아의 무사함을 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식을 차릴 때에는 짚을 깔고 그 짚 위에 밥 · 미역국 · 떡을 올려 놓으며 또는 그 옆에 상을 놓고 음식을 차리기도 한다. 이때 삼신에게 비는 말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장삼신∼
활량하신 손빈삼신
선망삼신 불삼신
새삼신 나력삼신
부릅삼신 새삼신
나력삼신 부릅삼신
새삼신∼
삼신할머니는∼
남자방석을 점지해서
순산해 주셨으니
일추월장 키우실 적에
긴 명은 서리 담고
짧은 명은 이서 담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오복을 점지해서
수복 갖춰 점지하고
미련한 인간이 뭐 압니까
삼신께서∼
추들고 받들어서
키워주실 적에
눈에는 열기를 주고
귀에는 총기를 주고
일추월장 가꾸실 적에
잘 크게 해주십사[註]」
또한 삼신에게 기원할 때 다음과 같은 축문도 있다.
아이고 어진 삼신님내요. 미련 인간
3. 삼 신
삼신은 산신(産神)으로서 삼신할머니라고도 한다. 이 삼신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신으로서 기자(祈子)의 대상으로부터 출산 및 육아 그리고 산모의 건강까지를 담당하는 신으로 생각하여 왔다. 산신인 삼신을‘三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 말에 태(胎)를 가리켜 ‘삼’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음기(音記)만 따서 ‘三’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삼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삼신의 신체로는 자루에 쌀을 넣어 안방에 걸어 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그러한 표상이 없이 집안에 삼신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출산이 있으면 \'삼신상\'을 차린다. 상에는 물·밥·미역국 한 그릇씩을 올려 놓는데, 이것을 산모 바의 장롱 앞에 가져다 놓고 절을 하고 부정을 가린다. 부정은 정화수를 3번 갈고 축원을 한다. 축원의 사설은 일정한 것이 없고, 점지해 준 아기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 달라는 내용이다. 아기가 아플 때는 미역국과 밥을 올리고 4-7배를 한다. 매년 음력 3월3일(삼신날이라고도 함)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삼신은 원래 집안에서 살고 있는 신인데, 가정이 불화하거나 삼신을 잘 받들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다. 집을 나간 삼신은 은행나무에 붙어서 사는데, 다시 모셔 들이려면 대나무를 은행나무에 대고 정성을 들여 빌면 대나무에 접신한다는 것이다. 이 대나무를 이불 같은 것으로 꼭 싸서 산모가 있는 방이나 병이 난 아이의 방에 모셔 놓아야 순산을 하고 아이의 병도 낫는다고 믿어 왔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도 속칭 삼신에 대해서
「대개 풍속에 태(胎)를 보호하는 신을 삼신이라 한다. 우리말에 태를 ‘삼(三 ; sam)’이라 하는 것은 삼신을 이르는 것으로 태신(胎神)을 말한다 삼신의 ‘삼’을 하나의 숫자로 봐서는 안된다.[註]」
라고 하여 이의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임동권(任東權) 역시 ‘서울의 산속(産俗)’에서
「산신(産神)은 속칭(俗稱) 삼신할머니라 해서 여신(女神)으로 산(産)의 다과(多寡)나 유무(有無)가 모두 그의 소관(所管)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註]」
고 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삼신은 태신으로서 산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옛 사회에서는 산모나 출산아의 사망율이 높았고, 또 자식을 못낳는 여인은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되어 내쫓김을 당하기도 해서 기자신앙(祈子信仰), 삼신신앙은 더욱 자극되어 왔다.
아이가 탄생되는 것은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금기하여 부정한 것을 막고 아이의 잉태에서부터 출산 · 육아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원하여 온 것이 우리 산속(産俗)의 역사이다. 삼신은 주로 주부나 산모 · 산아의 할머니에 의해 섬겨지지만 동네에서 잘 비는 할머니를 모셔다 빌기도 한다.
신체(神體)의 봉안은 가정에서 성주나 조왕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고 형태 역시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가지나 주머니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다. 호남과 영남지방에서는 쌀이나 보리 또는 타래실을 바가지에 넣고 금줄을 동여매어 아랫목 한 쪽에 모셔두는 경우가 있고 새끼로 그물처럼 얽은 속에 바가지를 얹어 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충북지방에서는 베(麻布)로 만든 주머니 2개를 안방의 시렁 한쪽에 매어 다는데 두 주머니에 모두 쌀을 넣거나 아니면 한쪽 주머니에는 쌀을, 다른 주머니에는 미역을 넣어 두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방에서는 종이 헝겊 또는 실을 안방의 한 구석에 높이 달아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서는 신체 봉안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삼신신앙에서 특히 잉태를 위한 기원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산에서 산신에 대해 기도를 한다든가 바위에 대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에서 부처나 칠성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여 그 형태가 다양하면서 더욱 간절한 기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산후 3일과 초이렛날 · 두이렛날 · 세이렛날 등 7일 간격으로 음식을 차리고 삼신을 위하는 제례를 갖는다. 이러한 제례는 산후 세이레까지만 갖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일곱이레까지 삼신을 위하기도 한다. 이 제례를 주관하는 주부는 이때에 산모의 회복과 산아의 무사함을 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식을 차릴 때에는 짚을 깔고 그 짚 위에 밥 · 미역국 · 떡을 올려 놓으며 또는 그 옆에 상을 놓고 음식을 차리기도 한다. 이때 삼신에게 비는 말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장삼신∼
활량하신 손빈삼신
선망삼신 불삼신
새삼신 나력삼신
부릅삼신 새삼신
나력삼신 부릅삼신
새삼신∼
삼신할머니는∼
남자방석을 점지해서
순산해 주셨으니
일추월장 키우실 적에
긴 명은 서리 담고
짧은 명은 이서 담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오복을 점지해서
수복 갖춰 점지하고
미련한 인간이 뭐 압니까
삼신께서∼
추들고 받들어서
키워주실 적에
눈에는 열기를 주고
귀에는 총기를 주고
일추월장 가꾸실 적에
잘 크게 해주십사[註]」
또한 삼신에게 기원할 때 다음과 같은 축문도 있다.
아이고 어진 삼신님내요. 미련 인간
추천자료
 [사회과학] 일본문화에 관하여
[사회과학] 일본문화에 관하여 일본인의 종교 성향-자연 종교에 관하여-
일본인의 종교 성향-자연 종교에 관하여- 이혼후의 심리와 상담
이혼후의 심리와 상담 아동심리 이해와 상담
아동심리 이해와 상담 듀이의 도덕교육
듀이의 도덕교육 몬테소리 연구
몬테소리 연구 한국교회16인의 설교를 말한다.
한국교회16인의 설교를 말한다. 교회와 기독교 교육 개론
교회와 기독교 교육 개론 존 웨슬리의 교육론
존 웨슬리의 교육론 [원불교][원불교 설교][원불교 현대 설교][원불교 설교 제목][원불교 설교 과제]원불교의 설...
[원불교][원불교 설교][원불교 현대 설교][원불교 설교 제목][원불교 설교 과제]원불교의 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사적 중요성,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사적 중요성,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 [말(馬)의 의미][준마의식]
[말(馬)의 의미][준마의식] [청소년심리] 1. 자아정체감이란 무엇이고, 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한지, 자...
[청소년심리] 1. 자아정체감이란 무엇이고, 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한지, 자... 설날 예배 주보
설날 예배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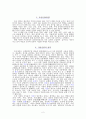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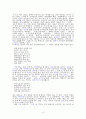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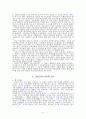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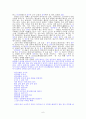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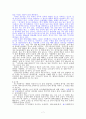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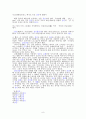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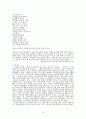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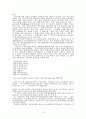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