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주요 어구 해석과 내용
2. 1. 난해 어구 해석
2. 2. 내용
2. 2. 1. 지식인의 노래
2. 2. 2. 평민의 노래
3. <청산별곡>에 대한 쟁점
3. 1. 작품 내적 측면
3. 1. 1. 청산별곡의 구조
3. 1. 2. 청산별곡의 주제
3. 1. 3. 청산별곡의 화자
3. 2. 작품 외적 측면
3. 2. 1. 창작 시기
3. 2. 2. 작자계층
4. 결론
참고문헌
2. 주요 어구 해석과 내용
2. 1. 난해 어구 해석
2. 2. 내용
2. 2. 1. 지식인의 노래
2. 2. 2. 평민의 노래
3. <청산별곡>에 대한 쟁점
3. 1. 작품 내적 측면
3. 1. 1. 청산별곡의 구조
3. 1. 2. 청산별곡의 주제
3. 1. 3. 청산별곡의 화자
3. 2. 작품 외적 측면
3. 2. 1. 창작 시기
3. 2. 2. 작자계층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酒), 농도가 강한 술
⑤ 비조라 : 빚(釀)+ 오라(감탄형 어미)+빚노라, 빚는구나
⑥ 조롱곶 누로기
조롱박꽃 모양으로 잘 핀 누룩(양주동, 박병채)
조롱박 만한 누룩(서재극)
⑦ 잡와니
(술이 나를)붙잡으니- 양주동,전규태, 김형규
(내가 잔을)잡으니- 서재극
(맛좋은 강술이 우리 님을) 붙잡으니-김완진
강술이 나의 마음을 붙잡으니 - 성현경
자.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는 각 연의 각 연의 종결기능, 연과 연 사이를 분리시켜 주는 분리기능, 시가를 가창할 때 흥을 돋우어 주는 조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병채는 조율음(調律音), 즉 현성(絃聲)을 맞추기 위한 악기의 의성어, 날나리(태평소) 계통의 악기 소리라고 보았다. 정병욱은 ‘얄리 얄라’등을 날나리의 구음으로 ‘셩’을 바라나 징의 구음으로 보았다.
2. 2. 내용
2. 2. 1. 지식인의 노래
<청산별곡>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현실 도피적인 은둔 사상의 산물이라고 한것과 달리 정병욱은 작자를 지식층으로 보고 오히려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노래라고 규정짓고 있다. 아래의 내용 분석은 <청산별곡>을 고려 지식인들이 순간적 향락 추구의 한 표현으로 ‘술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보는 정병욱의 주장을 골자로 삼아 살펴 본 것이다.
1연은 “과거에 내가 만일 좀더 현명했더라면 청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을 것을”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연에서는 비세속적인 청산을 찾아들고 보니 오직 벗이 되어 주는 것은 새 뿐이다. 자기와 더불어 이 세상을 저주하고 괴로운 심정을 통곡으로 지새우는 비탄 속에 잠긴 작중화자를 위로해주는 새를 통해 작중화자의 고독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3연에서는, 2연에서 보여준 유일한 벗이었던 새마저 이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을 일러 주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새일망정 그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잉무든 장기” 즉 “녹슨 무기”를 손에 들고 자기 곁을 떠나는 새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연에서 유일한 벗이었던 새마저 떠나버린 화자는 4연에 와서 “ 그래도 밝은 낮에는 이러 저러하여 지낼 수 있었지만 나를 찾아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 갈 어느 누구도 없는 밤을 어찌 지낼 것이가.” 라고 하여 절망에 빠지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밤’이라는 어휘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암흑의 세계, 광명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작중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5연에서는 한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56연 교체설이 나오게 된다. <청산별곡>은 흔히 ‘청산’과 ‘바다’의 두단락으로 구분되는데 5연과 6연을 바꾸어야 내용상 대칭구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연부터 보게 되면 괴로운 청산으로부터 바닷가로 생활 무대를 바꾸어 보려고 한다. 이 바닷가도 앞서 본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딴 곳임은 “자기 구조개\" 로써 표현되고 있다. 그런 바닷가에 와서도 괴로운 것을 달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이리 괴로우며 통곡의 낮밤을 지새워야 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본 것이 5연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미워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인지 날아온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는 것이다. 작중화자는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운명 때문이며 그 운명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무한히 가보는 것이다. 그러나 7연에서 새 세계를 추구한 끝에 얻은 것은 사슴이 높은 짐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광경이다. 사슴이 짐대 위에서 해금을 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곧 이것은 기적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은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8연에서 드디어 기적을 만나게 된다. 기적을 찾아서 끝없이 가다가 보니까 배가 불룩한 독에 술이 한참 피어서 딱딱하게 사리가 져 있고, 누룩냄새가 몹시 나면서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니 내 이 술을 마시지 않고 어찌 배겨내겠는가. 이리하여 작중화자는 술에서 기적을 찾았고 괴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오직 술밖에 없다고 하여 <청산별곡>을 지식인층의 현실 도피적 노래로 귀결시키고 있다.
2. 2. 2. 평민의 노래
작품이 평민들에 의해 삶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현전하는 작품의 전개 순서에 의지하여 박노준과 신동욱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연의 살어리랏다는 살아갈 것이다로 보아 화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머무랑 다래로 목숨을 연명해야 할 것을 체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듯하다.
2연은 1연의 한숨이 심화되어 통곡으로 하강하고야 마는 과정이다. 처음 작중 화자는 새를 자신과 같은 시름이 많은 존재로 보았다. 하지만 화자 자신의 처지와 새의 처지는 같지 않다. 화자와는 달리 새는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자유의 존재이다. 또한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울음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새의 울음은 다른 것이다.
3연은 땅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서 노래하고 있다. 7연과 같이 조용한 세계를 표현했다. 하지만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특히 ‘가던 새를 본다‘를 세 번 반복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갈던 사래로 본다. 작품의 화자는 농토를 잃었거나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불행한 농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가던 사래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즉 가던 새(갈던 사래)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과거의 것이자 금역의 장소이다. 반복과 이끼 낀 쟁기라는 표현은 평상적인 삶의 정지와 과거에 대한 애착과 귀환 심정을 나타낸다.
4연은 혼자서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시간이 주는 고통을 빌려서 표현했다. ‘바므란 엇디하리오’는 시간과 시간끼리인 ‘낮 -밤’의 대립을 통해 절망적 순간이 임박을 두려워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외로움은 살아가기에 매우 고달프다는 뜻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는 전란과 과중한 부역과 세금은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유민으로 떠돌게 하는 시대적 중압감과도 연결이 된다.
5연은 돌에 맞아 우는 화자가
⑤ 비조라 : 빚(釀)+ 오라(감탄형 어미)+빚노라, 빚는구나
⑥ 조롱곶 누로기
조롱박꽃 모양으로 잘 핀 누룩(양주동, 박병채)
조롱박 만한 누룩(서재극)
⑦ 잡와니
(술이 나를)붙잡으니- 양주동,전규태, 김형규
(내가 잔을)잡으니- 서재극
(맛좋은 강술이 우리 님을) 붙잡으니-김완진
강술이 나의 마음을 붙잡으니 - 성현경
자.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는 각 연의 각 연의 종결기능, 연과 연 사이를 분리시켜 주는 분리기능, 시가를 가창할 때 흥을 돋우어 주는 조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병채는 조율음(調律音), 즉 현성(絃聲)을 맞추기 위한 악기의 의성어, 날나리(태평소) 계통의 악기 소리라고 보았다. 정병욱은 ‘얄리 얄라’등을 날나리의 구음으로 ‘셩’을 바라나 징의 구음으로 보았다.
2. 2. 내용
2. 2. 1. 지식인의 노래
<청산별곡>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현실 도피적인 은둔 사상의 산물이라고 한것과 달리 정병욱은 작자를 지식층으로 보고 오히려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노래라고 규정짓고 있다. 아래의 내용 분석은 <청산별곡>을 고려 지식인들이 순간적 향락 추구의 한 표현으로 ‘술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보는 정병욱의 주장을 골자로 삼아 살펴 본 것이다.
1연은 “과거에 내가 만일 좀더 현명했더라면 청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을 것을”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2연에서는 비세속적인 청산을 찾아들고 보니 오직 벗이 되어 주는 것은 새 뿐이다. 자기와 더불어 이 세상을 저주하고 괴로운 심정을 통곡으로 지새우는 비탄 속에 잠긴 작중화자를 위로해주는 새를 통해 작중화자의 고독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3연에서는, 2연에서 보여준 유일한 벗이었던 새마저 이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을 일러 주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새일망정 그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잉무든 장기” 즉 “녹슨 무기”를 손에 들고 자기 곁을 떠나는 새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연에서 유일한 벗이었던 새마저 떠나버린 화자는 4연에 와서 “ 그래도 밝은 낮에는 이러 저러하여 지낼 수 있었지만 나를 찾아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 갈 어느 누구도 없는 밤을 어찌 지낼 것이가.” 라고 하여 절망에 빠지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밤’이라는 어휘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암흑의 세계, 광명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작중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5연에서는 한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56연 교체설이 나오게 된다. <청산별곡>은 흔히 ‘청산’과 ‘바다’의 두단락으로 구분되는데 5연과 6연을 바꾸어야 내용상 대칭구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연부터 보게 되면 괴로운 청산으로부터 바닷가로 생활 무대를 바꾸어 보려고 한다. 이 바닷가도 앞서 본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딴 곳임은 “자기 구조개\" 로써 표현되고 있다. 그런 바닷가에 와서도 괴로운 것을 달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이리 괴로우며 통곡의 낮밤을 지새워야 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본 것이 5연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미워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인지 날아온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는 것이다. 작중화자는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운명 때문이며 그 운명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무한히 가보는 것이다. 그러나 7연에서 새 세계를 추구한 끝에 얻은 것은 사슴이 높은 짐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광경이다. 사슴이 짐대 위에서 해금을 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곧 이것은 기적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은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8연에서 드디어 기적을 만나게 된다. 기적을 찾아서 끝없이 가다가 보니까 배가 불룩한 독에 술이 한참 피어서 딱딱하게 사리가 져 있고, 누룩냄새가 몹시 나면서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니 내 이 술을 마시지 않고 어찌 배겨내겠는가. 이리하여 작중화자는 술에서 기적을 찾았고 괴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오직 술밖에 없다고 하여 <청산별곡>을 지식인층의 현실 도피적 노래로 귀결시키고 있다.
2. 2. 2. 평민의 노래
작품이 평민들에 의해 삶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현전하는 작품의 전개 순서에 의지하여 박노준과 신동욱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연의 살어리랏다는 살아갈 것이다로 보아 화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머무랑 다래로 목숨을 연명해야 할 것을 체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듯하다.
2연은 1연의 한숨이 심화되어 통곡으로 하강하고야 마는 과정이다. 처음 작중 화자는 새를 자신과 같은 시름이 많은 존재로 보았다. 하지만 화자 자신의 처지와 새의 처지는 같지 않다. 화자와는 달리 새는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자유의 존재이다. 또한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울음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새의 울음은 다른 것이다.
3연은 땅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서 노래하고 있다. 7연과 같이 조용한 세계를 표현했다. 하지만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특히 ‘가던 새를 본다‘를 세 번 반복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갈던 사래로 본다. 작품의 화자는 농토를 잃었거나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불행한 농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가던 사래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즉 가던 새(갈던 사래)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과거의 것이자 금역의 장소이다. 반복과 이끼 낀 쟁기라는 표현은 평상적인 삶의 정지와 과거에 대한 애착과 귀환 심정을 나타낸다.
4연은 혼자서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시간이 주는 고통을 빌려서 표현했다. ‘바므란 엇디하리오’는 시간과 시간끼리인 ‘낮 -밤’의 대립을 통해 절망적 순간이 임박을 두려워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외로움은 살아가기에 매우 고달프다는 뜻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는 전란과 과중한 부역과 세금은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유민으로 떠돌게 하는 시대적 중압감과도 연결이 된다.
5연은 돌에 맞아 우는 화자가
추천자료
 <단군신화>와 <동명왕편>의 내용의 측면에서 두 신화의 같고 다른점
<단군신화>와 <동명왕편>의 내용의 측면에서 두 신화의 같고 다른점 평생 교육 전체적인 내용, 문답집, 시험 문제와 답안
평생 교육 전체적인 내용, 문답집, 시험 문제와 답안 [신화][단군신화][신화 특징][신화 기원][단군신화 의미][단군신화 내용][단군신화 분석]신화...
[신화][단군신화][신화 특징][신화 기원][단군신화 의미][단군신화 내용][단군신화 분석]신화... 김인향전 내용 인물상
김인향전 내용 인물상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종류][산업재산권 중요성][산업재산권 목적][산업재산권 역할][산업...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종류][산업재산권 중요성][산업재산권 목적][산업재산권 역할][산업... 일연의 삼국유사 내용분석 감상 및 비평
일연의 삼국유사 내용분석 감상 및 비평 동국사략 체제 및 내용
동국사략 체제 및 내용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통일교육 내용으로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요인 분석 교육 내용 상세화 (5학년 읽기 - ⑺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교육 내용 상세화 (5학년 읽기 - ⑺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교육내용상세화 (인물의 사고방식)
교육내용상세화 (인물의 사고방식) [향가][향가 형식][향가 개념][향가 성격][향가 역사][향가 명칭][향가 문법][향가 내용]향가...
[향가][향가 형식][향가 개념][향가 성격][향가 역사][향가 명칭][향가 문법][향가 내용]향가... [마당극][마당극 정의와 특성][마당극 특성][마당극 구성과 인물][마당극 내용][공연과정]마...
[마당극][마당극 정의와 특성][마당극 특성][마당극 구성과 인물][마당극 내용][공연과정]마... 영유아 음악교육의 활동내용 (음악의 개념, 영유아 음악교육의 활동,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
영유아 음악교육의 활동내용 (음악의 개념, 영유아 음악교육의 활동,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 향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작품들의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하시오.
향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작품들의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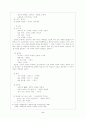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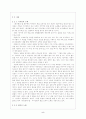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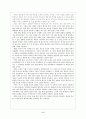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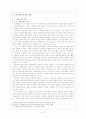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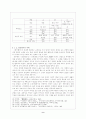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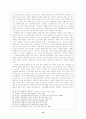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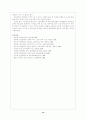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