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김유정의 생애
3. 김유정의 문단활동
4. 김유정의 작품세계-현실 인식의 양상
5. 김유정의 작품세계-희극적 미의식의 표출
6. 김유정의 작품세계-문체적 특성
7. 맺음말
2. 김유정의 생애
3. 김유정의 문단활동
4. 김유정의 작품세계-현실 인식의 양상
5. 김유정의 작품세계-희극적 미의식의 표출
6. 김유정의 작품세계-문체적 특성
7. 맺음말
본문내용
회남의 소개로 이석훈과 깊게 사귀게 된다. 또 그의 소개로 구인회(九人會) 구인회 :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문단의 중견급 작가 9명에 의하여 결성된 문학동인회.
1933년 문단작가 김기림(金起林)이효석(李孝石)이종명(李鍾鳴)김유영(金幽影)유치진(柳致 眞)조용만(趙容萬)이태준(李泰俊)정지용(鄭芝溶)이무영(李無影) 등 9명이 결성하였다.
얼마 후 이종명김유영이효석이 탈퇴하고, 박태원(朴泰遠)이상(李箱)박팔양(朴八陽)이 가입하였으며, 다시 유치진조용만 대신에 김유정(金裕貞)김환태(金換泰)로 교체되어, 항상 9명의 회원을 유지하였다.
1930년대 경향문학이 쇠퇴하고 문단의 주류가 된 이들은 계급주의 및 공리주의 문학을 배격하고 순수문학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당시 순수문학의 가장 유력한 단체로 활동하였으나 3~4년 만에 해체하였다. 이상과 박태원이 중심이 되어 《시와 소설》이라는 기관지를 펴냈다.
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상과 알게된다. 이상과의 친분관계는 꽤 깊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함께 폐결핵을 앓는 그야말로 동병상련 같은 것이요. 서로의 천재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우로서의 교제였을 것이다. 유정이 병석에 누워 있던 어느 날 이상이 찾아와 둘이 함께 죽자고 제의한 것을 거절했었던 일은 지금도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다. 유정은 문학에 있어 최고 이상을 ‘사랑’에 두었다. 그가 말하는 개념은 보편적인 대상을 우의적으로 한 끈에 꿸 수 있을수록 위대한 생명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유정이 누구를 위해 작품을 썼으며 어떤 문제에 관심을 쏟았겠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사랑’에 기댄다면 그는 당대에 넓은 독자층을 위해 소설을 썼으며 주제도 그들의 관심사를 선택하려했다는 것을 암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소설세계는 이와 같은 그의 문학의식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유정의 문단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공식적인 문학활동을 한 것은 불과 2년 남짓 되지만 실제 창작에 임한 기간은 그보다 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가 산문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문학의식은 대중을 하나의 끈에 꿰려 하는 ‘사랑’과 ‘혈맥’이 통하는 전통지향이었다. 이것은 작가가 당대 민중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곧 그들의 생활을 소설로 쓰려고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기 시대의 삶을 반영하되 그것이 서구적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혈맥을 강조했음은 곧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으로 소설화하겠다는 작가의식의 일단으로 받아들여진다.
4. 김유정의 작품세계-현실 인식의 양상
김유정의 소설을 읽으면 30년대 한국의 농촌 현실 및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농촌 피폐의 모습은 자력이 약한 자작농들이 토지를 방매함으로써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계급적 분화의 심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김유정은 이러한 농촌의 피폐의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그의 소설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자작농의 소작농화→ 빚 → 도시로의 이농 → 도시 속에서의 극빈’과 같은 이 모든 현상을 김유정은 각각의 단편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총각과 맹꽁이」, 「金따는 콩밧」, 「만무방」, 「안해」, 「소낙비」등 은 30년대 농민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객관화된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대목들이다. 일년 농사를 짓고 남는 것이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뿐이라는 인식(만무방)은 당시의 소작인들의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농토로서는 전혀 부적합한 정자터마저 도지를 놓아 소작인을 착취하는 것이라든지(총각과 맹꽁이), 섣불리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빌엉뱅이’밖에 될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콩밭을 파헤치고 금줄을 찾는 일만이 살 길 이라는 주인곡의 인식(金따는 콩밧), 그 속수무책의 가난에 대한 화풀이로 고작 죄없는 아내를 ‘한바탕 두들겨대는’ 것으로 속을 푸는(안해), 그러나 결국엔 밤도주로 고향을 등지고 아내까지 파는 행위(소낙비)는 작가 김유정이 근본적으로 30년대의 궁핍화되고 피폐화된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김유정의 문학을 일컬어 김현은 ‘하나의 소설적 트릭도 없이 있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그 어떤 작가보다도 식민지 치하 농촌의 궁핍상을 여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국문학사 (김유정 혹은 농촌의 궁핍화 현상), 김윤식김현 저, 1984, 민음사
고 보고 있으며, 김병익 역시 김유정은 ‘자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 농민들이 왜 가난한가를 명백하게, 그리고 정확히 통찰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참상을 완벽하게 우리의 고전적 언어와 서정으로 농축시켰기 때문에 이 작가야말로 가장 당대적이며 초시대적인 문학성을 획득’ 한국근대문학사론, 임형택 외편, 1982, 한길사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유정의 현실인식이 농촌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작할 토지를 잃고 떠도는 농민들은 광부가 되거나 도시로 나아가 ‘빠아’의 여급 혹은 도시 빈민의 모습으로 근근이 연명하게 되는데 이들의 곤궁한 삶의 모습은 「땡볕」, 「따라지」, 「정조(貞操)」등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땡볕」은 농촌에서 살길을 찾아 올라온 한 부부의 절망적인 삶의 순간을 그려나가고 있다. 덕순의 아내는 죽은 아이를 그대로 뱃속에 넣어두므로 자꾸만 배가 부어오른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덕순은 대학병원에서 이상한 병은 월급을 주고 고쳐준다는 소문을 곧이 듣고 아내를 지게에 태워 땡볕을 걸어서 병원으로 간다. 하지만 간신히 찾아간 병원에서는 월급은커녕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비웃음만 사고 돌아온다. 김유정은 이런 절박한 부부에 대해 어떤 동정심이나 친근감을 강요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웃음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김유정은 무지하고 무능한 덕순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 농촌에서 이주한 도시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극명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지」는 ‘사직골 꼭대기에 올라붙은 깨웃한 초가집’에 세들어 사는 인물들을 통해 도시 변두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다. ‘밑둥의 벽이 확 나가서 어떤게
1933년 문단작가 김기림(金起林)이효석(李孝石)이종명(李鍾鳴)김유영(金幽影)유치진(柳致 眞)조용만(趙容萬)이태준(李泰俊)정지용(鄭芝溶)이무영(李無影) 등 9명이 결성하였다.
얼마 후 이종명김유영이효석이 탈퇴하고, 박태원(朴泰遠)이상(李箱)박팔양(朴八陽)이 가입하였으며, 다시 유치진조용만 대신에 김유정(金裕貞)김환태(金換泰)로 교체되어, 항상 9명의 회원을 유지하였다.
1930년대 경향문학이 쇠퇴하고 문단의 주류가 된 이들은 계급주의 및 공리주의 문학을 배격하고 순수문학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당시 순수문학의 가장 유력한 단체로 활동하였으나 3~4년 만에 해체하였다. 이상과 박태원이 중심이 되어 《시와 소설》이라는 기관지를 펴냈다.
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상과 알게된다. 이상과의 친분관계는 꽤 깊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함께 폐결핵을 앓는 그야말로 동병상련 같은 것이요. 서로의 천재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우로서의 교제였을 것이다. 유정이 병석에 누워 있던 어느 날 이상이 찾아와 둘이 함께 죽자고 제의한 것을 거절했었던 일은 지금도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다. 유정은 문학에 있어 최고 이상을 ‘사랑’에 두었다. 그가 말하는 개념은 보편적인 대상을 우의적으로 한 끈에 꿸 수 있을수록 위대한 생명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유정이 누구를 위해 작품을 썼으며 어떤 문제에 관심을 쏟았겠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사랑’에 기댄다면 그는 당대에 넓은 독자층을 위해 소설을 썼으며 주제도 그들의 관심사를 선택하려했다는 것을 암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소설세계는 이와 같은 그의 문학의식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유정의 문단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공식적인 문학활동을 한 것은 불과 2년 남짓 되지만 실제 창작에 임한 기간은 그보다 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가 산문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문학의식은 대중을 하나의 끈에 꿰려 하는 ‘사랑’과 ‘혈맥’이 통하는 전통지향이었다. 이것은 작가가 당대 민중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곧 그들의 생활을 소설로 쓰려고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기 시대의 삶을 반영하되 그것이 서구적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혈맥을 강조했음은 곧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으로 소설화하겠다는 작가의식의 일단으로 받아들여진다.
4. 김유정의 작품세계-현실 인식의 양상
김유정의 소설을 읽으면 30년대 한국의 농촌 현실 및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농촌 피폐의 모습은 자력이 약한 자작농들이 토지를 방매함으로써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계급적 분화의 심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김유정은 이러한 농촌의 피폐의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그의 소설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자작농의 소작농화→ 빚 → 도시로의 이농 → 도시 속에서의 극빈’과 같은 이 모든 현상을 김유정은 각각의 단편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총각과 맹꽁이」, 「金따는 콩밧」, 「만무방」, 「안해」, 「소낙비」등 은 30년대 농민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객관화된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대목들이다. 일년 농사를 짓고 남는 것이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뿐이라는 인식(만무방)은 당시의 소작인들의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농토로서는 전혀 부적합한 정자터마저 도지를 놓아 소작인을 착취하는 것이라든지(총각과 맹꽁이), 섣불리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빌엉뱅이’밖에 될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콩밭을 파헤치고 금줄을 찾는 일만이 살 길 이라는 주인곡의 인식(金따는 콩밧), 그 속수무책의 가난에 대한 화풀이로 고작 죄없는 아내를 ‘한바탕 두들겨대는’ 것으로 속을 푸는(안해), 그러나 결국엔 밤도주로 고향을 등지고 아내까지 파는 행위(소낙비)는 작가 김유정이 근본적으로 30년대의 궁핍화되고 피폐화된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김유정의 문학을 일컬어 김현은 ‘하나의 소설적 트릭도 없이 있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그 어떤 작가보다도 식민지 치하 농촌의 궁핍상을 여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국문학사 (김유정 혹은 농촌의 궁핍화 현상), 김윤식김현 저, 1984, 민음사
고 보고 있으며, 김병익 역시 김유정은 ‘자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 농민들이 왜 가난한가를 명백하게, 그리고 정확히 통찰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참상을 완벽하게 우리의 고전적 언어와 서정으로 농축시켰기 때문에 이 작가야말로 가장 당대적이며 초시대적인 문학성을 획득’ 한국근대문학사론, 임형택 외편, 1982, 한길사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유정의 현실인식이 농촌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작할 토지를 잃고 떠도는 농민들은 광부가 되거나 도시로 나아가 ‘빠아’의 여급 혹은 도시 빈민의 모습으로 근근이 연명하게 되는데 이들의 곤궁한 삶의 모습은 「땡볕」, 「따라지」, 「정조(貞操)」등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땡볕」은 농촌에서 살길을 찾아 올라온 한 부부의 절망적인 삶의 순간을 그려나가고 있다. 덕순의 아내는 죽은 아이를 그대로 뱃속에 넣어두므로 자꾸만 배가 부어오른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덕순은 대학병원에서 이상한 병은 월급을 주고 고쳐준다는 소문을 곧이 듣고 아내를 지게에 태워 땡볕을 걸어서 병원으로 간다. 하지만 간신히 찾아간 병원에서는 월급은커녕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비웃음만 사고 돌아온다. 김유정은 이런 절박한 부부에 대해 어떤 동정심이나 친근감을 강요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웃음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김유정은 무지하고 무능한 덕순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 농촌에서 이주한 도시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극명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지」는 ‘사직골 꼭대기에 올라붙은 깨웃한 초가집’에 세들어 사는 인물들을 통해 도시 변두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다. ‘밑둥의 벽이 확 나가서 어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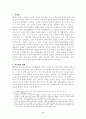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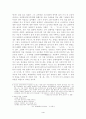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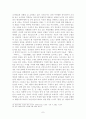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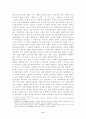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