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의 발생시기
7. 대항력의 존속
◆ 대항력 및 확정일자 관련판례◆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
Ⅵ. 結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의 발생시기
7. 대항력의 존속
◆ 대항력 및 확정일자 관련판례◆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
Ⅵ. 結
본문내용
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대판2001. 1. 19, 2000다556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 갑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을이 전입신고,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전대하고 병은 자신의 주민등록을 전 거주지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을은 위 주택에 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9) 임차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 <공 1989, 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 고점순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7나423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단독세대주인 경우 당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 4. 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1985. 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 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 재 성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윤 영 철
Ⅵ. 結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 발생한다. A는 1982. 2. 2. 임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하였고 1982. 11. 3.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A와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중간임차인이 되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A의 항변은 인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A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경락인 B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A의 항변은 인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전장헌,「민법연습」, 법론사, 2005.
박종두,「채권법각론」, 삼영사, 2005.
유정, 「민법정리Ⅱ」, 형설출판사, 2003.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http://cafe.naver.com/auction114.cafe
http://cafe.naver.com/bbundang.cafe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대판2001. 1. 19, 2000다556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 갑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을이 전입신고,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전대하고 병은 자신의 주민등록을 전 거주지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을은 위 주택에 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9) 임차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 <공 1989, 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 고점순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7나423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단독세대주인 경우 당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 4. 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1985. 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 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 재 성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윤 영 철
Ⅵ. 結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 발생한다. A는 1982. 2. 2. 임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하였고 1982. 11. 3.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A와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은 중간임차인이 되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A의 항변은 인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A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경락인 B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A의 항변은 인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전장헌,「민법연습」, 법론사, 2005.
박종두,「채권법각론」, 삼영사, 2005.
유정, 「민법정리Ⅱ」, 형설출판사, 2003.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http://cafe.naver.com/auction114.cafe
http://cafe.naver.com/bbundang.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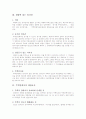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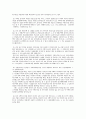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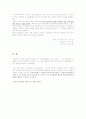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