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 주제 선정의 계기
Ⅱ 본론
1. 작가계층의 특성
2. 형식상의 특성
1) 언어의 중의성 : 자신을 빗대어 말하다.
2) 평시조의 정형성
3) 우리말 어휘의 활용
3. 내용상의 특성 : 자설적 자아 표출
1) 규방가사와의 비교고찰
2)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 고찰
3) 기녀문학의 내면세계 (시조문학, 한시문학)
Ⅲ. 마치며
Ⅱ 본론
1. 작가계층의 특성
2. 형식상의 특성
1) 언어의 중의성 : 자신을 빗대어 말하다.
2) 평시조의 정형성
3) 우리말 어휘의 활용
3. 내용상의 특성 : 자설적 자아 표출
1) 규방가사와의 비교고찰
2) 사대부 시조와의 비교 고찰
3) 기녀문학의 내면세계 (시조문학, 한시문학)
Ⅲ. 마치며
본문내용
로는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정병욱의 시조문학사전(時調文學事典)에 실려 있는 기녀시조 54수와 기타문헌에서의 기녀 한시를 자료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작가계층의 특성
가부장제 사회라는 남성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문학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었다. 여성은 남성의 피조물일 뿐이었다. 조선전기에는 고려의 습속이 남아 있어 남녀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창작 작품이 문학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조차 없는 금수(禽獸)는 아니었고 일부 재능이 뛰어난 여성들은 그 총명함이 발산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적 윤리관의 영향으로 강요된 이념의 실천, 가부장제 질서를 정립하게 된다. 가사문학의 영역에 여성주체가 등장하였으나 글쓰기가 여성의 본분이 아니라는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작품을 전하려는 노력을 한 여성들이 많지 않았고 사실상 작품을 창작하더라도 알릴 길이 없었다. 양반집 규수들은 효경, 열녀전 등을 배움으로써 유교 이념의 지배에 귀속되었고 문학을 통해 자신들의 정신적 고고함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시문을 지으며 자신의 불행을 넘어서려했고, 가문을 빛내기 위해 힘을 쏟았다. 조선 후기 여성상은 유교적 법도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여성이었다. 즉, 아름다운 자질로 태어나 출가 후에는 시부모에 효성지극하고, 남편을 예우하고, 자신을 훈육하는 등의 모습이다. 특히 교훈가사는 개인적, 독백적, 교술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문학적 가치도 낮다.
그런 점에 있어 기녀라는 집단은 신분이나 문학주체 상정에 있어서 특기할 만하다. 기녀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천민인 이중의 타자였으나 사대부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조창작의 주체로 자리했다.
기녀의 역사에 대해서는 흔히들 신라시대 화랑제도 이전에 있었던 원화(源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황충기, 기생시조와 한시, 푸른사상사, 2004.
고려 초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고려시대 기생은 연희나 국가행사에서 가무(歌舞)를 위한 역할을 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노래와 춤, 의술, 사신 접대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직업적 특성상 남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도 했을 것이다. 조선 초기의 황진이는 명사들과 교유하며 풍부한 정감으로 한시와 시조를 창작하였고, 중기의 기녀 시인으로 매창이 대표적이다. 매창은 유희경, 허균 등 당대 쟁쟁한 문사들과 교유하며 시문학의 족적을 남기고 37세에 요절하였다.
2. 형식상의 특성
1) 언어의 중의성 : 자신을 빗대어 말하다.
靑山裏 碧溪水ㅣ야 수이 감을 쟈랑마라
一到滄海면 도라 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니 수여 간들 엇더리 (珍靑 286)
황진이 시조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이 작품은 이름자를 유희하여 상대를 유혹한 작품이다. ‘碧溪水’가 ‘(푸른 산 속에) 흐르는 시냇물’임과 동시에 벽계수(守)라는 호를 사용하는 당시 임금의 친족이었던 이혼연(李渾然)을 빗대어 이르고 있다. ‘明月’ 역시도 ‘밝은 달’임과 동시에 황진이의 기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언어의 중의성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밝은 달이 텅 빈 산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다. 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에 비유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읊으며 삶의 즐거움을 권유하는 시이다. 그러니 자신과 인생을 즐기자는 유혹의 시라고 할 수 있겠다. 황진이는 실로 빼어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박연폭포·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松都三絶)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재색을 겸비한 조선조 최고의 명기였다. 뛰어난 미모, 활달한 성격, 청아한 소리, 예술적 재능으로 인해 외국 사신들에게까지 천하절색이라는 감탄을 받았으며, <송도기이>는 황진이를 선녀(仙)라고 극찬한다. ‘자색이 아름답고 재예(才藝)가 절세하고 가창(歌唱)역시 뛰어나 사림들이 그를 선녀라 하였다.’- 송도기이 中
그러나 언어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자부심을 드러낸 것 자체로 그 가치가 다한 듯이 제한하고 싶지 않다. 황진이의 시조가 시상표현에 탁월했으며 그 인식의 폭도 깊었다.
<明月이 滿空山니>에서의 ‘명월’이 황진이 자신을 빗대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빈산을 채워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냇물(‘이혼연’)이 흘러가 버리고 없어도 자신은 밝게 솟아 빈 산을 가득 채워주는 존재임을 드러내므로 ‘여성’이라는 일반적 굴레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이 솔이라 하니 무슨 솔마 너겻난다
천심절벽(千尋絶壁)의 낙락장송(落落長松) 니 긔로다
길 아래 초동(樵童)의 졉낫시야 거러 볼 줄이 이시랴 -송이(松伊),해동가요(海東歌謠)
언어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기녀로써의 자부심을 드러낸 또 다른 시조이다.
천 길이나 되는 절벽에 우뚝 솟은 큰 소나무가 바로 자신이며 길 아래 지나가는 초동의 작은 낫으로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고고한 자존심이 드러난다.
흔히 기녀를 해어화(解語花) 즉,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노류장화(路柳墻花)라 하여 길가의 버들이나 담장의 꽃처럼 흔하다고 비유했다. 기녀에게 ‘지조’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으로써의 정절을 강요 받아온 일반적 여성과 달리 기녀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아 성찰에 있어서 ‘기녀’로써의 자아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재인 자아로 인식하고자 함일 것이다. 예로 들어 놓은 위의 시조들은, 기녀 자신들이 선비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아야 하는 천한 신분이기는 하나, 쉽게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신적인 지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인상을 상대자에게 뚜렷이 남기고 이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시조 속에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읊음으로써 존재를 각인 시키는 것은 기녀문학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시구들은 기명(妓名)이 중의적 수법을 통하여 작품 중에 가사로 삽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柳一枝 휘여다가 굿이굿이 얏는듸 (구지)
- 梅花
Ⅱ 본론
1. 작가계층의 특성
가부장제 사회라는 남성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문학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었다. 여성은 남성의 피조물일 뿐이었다. 조선전기에는 고려의 습속이 남아 있어 남녀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창작 작품이 문학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조차 없는 금수(禽獸)는 아니었고 일부 재능이 뛰어난 여성들은 그 총명함이 발산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적 윤리관의 영향으로 강요된 이념의 실천, 가부장제 질서를 정립하게 된다. 가사문학의 영역에 여성주체가 등장하였으나 글쓰기가 여성의 본분이 아니라는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작품을 전하려는 노력을 한 여성들이 많지 않았고 사실상 작품을 창작하더라도 알릴 길이 없었다. 양반집 규수들은 효경, 열녀전 등을 배움으로써 유교 이념의 지배에 귀속되었고 문학을 통해 자신들의 정신적 고고함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시문을 지으며 자신의 불행을 넘어서려했고, 가문을 빛내기 위해 힘을 쏟았다. 조선 후기 여성상은 유교적 법도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여성이었다. 즉, 아름다운 자질로 태어나 출가 후에는 시부모에 효성지극하고, 남편을 예우하고, 자신을 훈육하는 등의 모습이다. 특히 교훈가사는 개인적, 독백적, 교술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문학적 가치도 낮다.
그런 점에 있어 기녀라는 집단은 신분이나 문학주체 상정에 있어서 특기할 만하다. 기녀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천민인 이중의 타자였으나 사대부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조창작의 주체로 자리했다.
기녀의 역사에 대해서는 흔히들 신라시대 화랑제도 이전에 있었던 원화(源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황충기, 기생시조와 한시, 푸른사상사, 2004.
고려 초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고려시대 기생은 연희나 국가행사에서 가무(歌舞)를 위한 역할을 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노래와 춤, 의술, 사신 접대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직업적 특성상 남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도 했을 것이다. 조선 초기의 황진이는 명사들과 교유하며 풍부한 정감으로 한시와 시조를 창작하였고, 중기의 기녀 시인으로 매창이 대표적이다. 매창은 유희경, 허균 등 당대 쟁쟁한 문사들과 교유하며 시문학의 족적을 남기고 37세에 요절하였다.
2. 형식상의 특성
1) 언어의 중의성 : 자신을 빗대어 말하다.
靑山裏 碧溪水ㅣ야 수이 감을 쟈랑마라
一到滄海면 도라 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니 수여 간들 엇더리 (珍靑 286)
황진이 시조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이 작품은 이름자를 유희하여 상대를 유혹한 작품이다. ‘碧溪水’가 ‘(푸른 산 속에) 흐르는 시냇물’임과 동시에 벽계수(守)라는 호를 사용하는 당시 임금의 친족이었던 이혼연(李渾然)을 빗대어 이르고 있다. ‘明月’ 역시도 ‘밝은 달’임과 동시에 황진이의 기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언어의 중의성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밝은 달이 텅 빈 산에 가득하다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다. 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에 비유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읊으며 삶의 즐거움을 권유하는 시이다. 그러니 자신과 인생을 즐기자는 유혹의 시라고 할 수 있겠다. 황진이는 실로 빼어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박연폭포·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松都三絶)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재색을 겸비한 조선조 최고의 명기였다. 뛰어난 미모, 활달한 성격, 청아한 소리, 예술적 재능으로 인해 외국 사신들에게까지 천하절색이라는 감탄을 받았으며, <송도기이>는 황진이를 선녀(仙)라고 극찬한다. ‘자색이 아름답고 재예(才藝)가 절세하고 가창(歌唱)역시 뛰어나 사림들이 그를 선녀라 하였다.’- 송도기이 中
그러나 언어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자부심을 드러낸 것 자체로 그 가치가 다한 듯이 제한하고 싶지 않다. 황진이의 시조가 시상표현에 탁월했으며 그 인식의 폭도 깊었다.
<明月이 滿空山니>에서의 ‘명월’이 황진이 자신을 빗대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빈산을 채워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냇물(‘이혼연’)이 흘러가 버리고 없어도 자신은 밝게 솟아 빈 산을 가득 채워주는 존재임을 드러내므로 ‘여성’이라는 일반적 굴레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이 솔이라 하니 무슨 솔마 너겻난다
천심절벽(千尋絶壁)의 낙락장송(落落長松) 니 긔로다
길 아래 초동(樵童)의 졉낫시야 거러 볼 줄이 이시랴 -송이(松伊),해동가요(海東歌謠)
언어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기녀로써의 자부심을 드러낸 또 다른 시조이다.
천 길이나 되는 절벽에 우뚝 솟은 큰 소나무가 바로 자신이며 길 아래 지나가는 초동의 작은 낫으로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고고한 자존심이 드러난다.
흔히 기녀를 해어화(解語花) 즉,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노류장화(路柳墻花)라 하여 길가의 버들이나 담장의 꽃처럼 흔하다고 비유했다. 기녀에게 ‘지조’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으로써의 정절을 강요 받아온 일반적 여성과 달리 기녀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아 성찰에 있어서 ‘기녀’로써의 자아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존재인 자아로 인식하고자 함일 것이다. 예로 들어 놓은 위의 시조들은, 기녀 자신들이 선비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아야 하는 천한 신분이기는 하나, 쉽게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신적인 지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인상을 상대자에게 뚜렷이 남기고 이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시조 속에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읊음으로써 존재를 각인 시키는 것은 기녀문학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시구들은 기명(妓名)이 중의적 수법을 통하여 작품 중에 가사로 삽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柳一枝 휘여다가 굿이굿이 얏는듸 (구지)
- 梅花
추천자료
 [한국문학][문학][고전문학][현대문학]한국(한국문학) 고전문학, 한국(한국문학) 근대문학, ...
[한국문학][문학][고전문학][현대문학]한국(한국문학) 고전문학, 한국(한국문학) 근대문학, ... [환상문학][환상성][환상문학 조건][환상문학 전개][환상문학 사례]환상문학의 개념, 환상문...
[환상문학][환상성][환상문학 조건][환상문학 전개][환상문학 사례]환상문학의 개념, 환상문... [한국문학][문학][해외번역][해방문학][리얼리즘][투쟁사상]한국문학의 갈래, 한국문학의 시...
[한국문학][문학][해외번역][해방문학][리얼리즘][투쟁사상]한국문학의 갈래, 한국문학의 시... [문학교육][상징논리][문학평가][텍스트]문학교육의 범주, 문학교육의 필요성, 문학교육의 상...
[문학교육][상징논리][문학평가][텍스트]문학교육의 범주, 문학교육의 필요성, 문학교육의 상... [문학][전쟁문학][이야기문학][민족문학][연행문학][대중문학]문학의 심미성(심미의식), 문학...
[문학][전쟁문학][이야기문학][민족문학][연행문학][대중문학]문학의 심미성(심미의식), 문학... [아동문학][아동문학단체][아동문학지도][아동][문학]아동문학의 개념, 아동문학의 장르, 아...
[아동문학][아동문학단체][아동문학지도][아동][문학]아동문학의 개념, 아동문학의 장르, 아... [영국문학][풍자문학][구조주의]영국문학의 역사, 영국문학과 풍자문학, 영국문학과 마르크스...
[영국문학][풍자문학][구조주의]영국문학의 역사, 영국문학과 풍자문학, 영국문학과 마르크스... [중국문학][민간문학][소수민족문학][육유][몽롱시]중국문학의 변천, 중국문학과 되돌아보기...
[중국문학][민간문학][소수민족문학][육유][몽롱시]중국문학의 변천, 중국문학과 되돌아보기... [지역문학][지역문학단체]지역문학의 필요성, 지역문학의 배경, 지역문학의 교재, 지역문학의...
[지역문학][지역문학단체]지역문학의 필요성, 지역문학의 배경, 지역문학의 교재, 지역문학의... [한국문학][민족문학][민중문학][분단문학][문학]한국문학의 특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
[한국문학][민족문학][민중문학][분단문학][문학]한국문학의 특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 [구비문학, 동유럽 구비문학, 헝가리 구비문학, 루마니아 구비문학, 폴란드 구비문학, 유고슬...
[구비문학, 동유럽 구비문학, 헝가리 구비문학, 루마니아 구비문학, 폴란드 구비문학, 유고슬... [문학표현, 문학표현과 비유, 문학표현과 처용가, 자연주의, 심미, 이야기, 표현주의]문학표...
[문학표현, 문학표현과 비유, 문학표현과 처용가, 자연주의, 심미, 이야기, 표현주의]문학표... [구비문학, 양주지역 구비문학, 안동지역 구비문학, 양구지역 구비문학, 전북지역 구비문학, ...
[구비문학, 양주지역 구비문학, 안동지역 구비문학, 양구지역 구비문학, 전북지역 구비문학, ... 아동 문학 교육과 관련한 주요 이론을 반응중심 문학활동과 통합적 문학활동의 개념을 중심으...
아동 문학 교육과 관련한 주요 이론을 반응중심 문학활동과 통합적 문학활동의 개념을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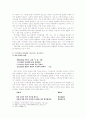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