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도화원(圖畵院)에서의 미술 교육
ⅱ) 불화(佛畵)를 통해 살펴본 미술 교육
ⅲ) 여기(餘技)적 문인 화가
ⅳ) 창작 이론
ⅴ) 회화비평의 방법과 기준
Ⅲ. 결론
Ⅱ. 본론
ⅰ) 도화원(圖畵院)에서의 미술 교육
ⅱ) 불화(佛畵)를 통해 살펴본 미술 교육
ⅲ) 여기(餘技)적 문인 화가
ⅳ) 창작 이론
ⅴ) 회화비평의 방법과 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받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을 모방함으로써 미술 교육을 대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원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감상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타작품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시를 쓰면서, 혹은 풍류를 즐기면서 그들 나름대로 재창조하였으므로 이를 ‘모방했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당시 미술이 ‘수묵화’중심의 회화나 ‘불화’중심의 회화에 편중되어있었지만, 그것은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으므로 그 당시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한 것에 만족해야할 것이다.
고려 미술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에 시사하는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1. 미술 작품을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하여, 학생들이 감상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감상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적 안목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그림을‘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통합학습이라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국한되어있다. 다른 교과와의 통합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이‘자기 표현 수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그리는 것 보다 마음으로 그 대상을 관조하며 그리는 태도를 길러야한다. ‘보이는 것’만 그리게 하는 것보다, 보면서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4. 표현기법보다는 창작의 정신적 깊이와 높이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삼았다.
실제 지금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가는 작품 수준을 수량화하는 양적평가이다. 미술은 개개인의 정서와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성격 자체가 주관적인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미술에서의 평가는 ‘성취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습 자료로 삼아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한 교육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고려시대의 평가 기준을 참고로 하여 미술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갖춘 교사가 학생들의 작품을 ‘비평’하는 질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정수 외 (1999). 테마가 있는 한국문화. 선인
고병익 외 (1996). 재미있게 간추린 한국인물탐사기 2 (고려의 인물). 오늘
곽동해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최기옥 (1998). 21세기 세계대백과사전-30권 한국미술. 범한
안휘준 (1980). 고려사, 한국회화사. 일지사
홍선표 (1984). 고려시대의 일반회화. 예술원
안형재 (2005). 한국의 매화. 북랜드
김기탁 (2002.) 한국시가문학론. 아세아문화사
고유섭 (1949). 조선미술문화사 논총 고려화적에대하여. 서울신문사
홍선표 (1999). 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
고려 미술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에 시사하는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1. 미술 작품을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하여, 학생들이 감상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감상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적 안목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그림을‘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미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통합학습이라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국한되어있다. 다른 교과와의 통합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이‘자기 표현 수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지식적으로 분석해서 그리는 것 보다 마음으로 그 대상을 관조하며 그리는 태도를 길러야한다. ‘보이는 것’만 그리게 하는 것보다, 보면서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4. 표현기법보다는 창작의 정신적 깊이와 높이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삼았다.
실제 지금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가는 작품 수준을 수량화하는 양적평가이다. 미술은 개개인의 정서와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성격 자체가 주관적인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미술에서의 평가는 ‘성취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습 자료로 삼아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한 교육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고려시대의 평가 기준을 참고로 하여 미술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갖춘 교사가 학생들의 작품을 ‘비평’하는 질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정수 외 (1999). 테마가 있는 한국문화. 선인
고병익 외 (1996). 재미있게 간추린 한국인물탐사기 2 (고려의 인물). 오늘
곽동해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최기옥 (1998). 21세기 세계대백과사전-30권 한국미술. 범한
안휘준 (1980). 고려사, 한국회화사. 일지사
홍선표 (1984). 고려시대의 일반회화. 예술원
안형재 (2005). 한국의 매화. 북랜드
김기탁 (2002.) 한국시가문학론. 아세아문화사
고유섭 (1949). 조선미술문화사 논총 고려화적에대하여. 서울신문사
홍선표 (1999). 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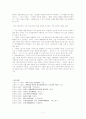









소개글